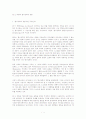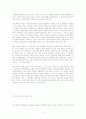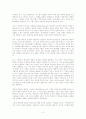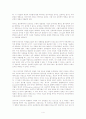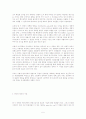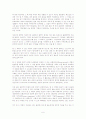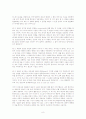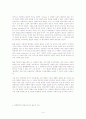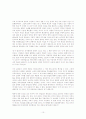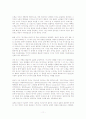목차
1. \'형이상학적 경험\'이란 무엇인가?
2. \'방법\'으로서의 원초적 사실
3. 하나의 원초적 사실
4. 존재범주의 원천으로서의 원초적 사실
2. \'방법\'으로서의 원초적 사실
3. 하나의 원초적 사실
4. 존재범주의 원천으로서의 원초적 사실
본문내용
성'을 지각하고 이 개념을 실체적 자아와 신체나 외부대상이라는 실체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실적이며 실제적이고 하나이며 단순하고 시간 속에서 동일한 주체"에 대한 직접적 통각은 가능해도 "실체, 본체(le noumene), 영혼존재"에 대한 경험적 인식은 불가능하다20)
자아의 영속성에 대한 내적 감정은 분명 직접적인 경험이며 이것은 믿음(la croyance)이나 추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아라고 부르는 나의 영속적 개체성에 대한 내감(le sens intime)은 분명 나의 영혼이 내적 시각에 나타나는 현상적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텍스트는 맨 드 비랑이 틀림없이 실체의 차원이 아닌 의식적 현상의 차원에 자아 동일성을 놓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그가 곧바로 "이와 같은 실재는 우리가 현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다.21) 왜냐하면 맨 드 비랑은 자아의 영속성에 대한 내적 감정은 현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절대적 질서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나 한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초적 사실 속에서 확인되는 영속적 자아가 경험적 소여이면서도 또한 경험적 자아를 넘어서 있다는 설명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
베르크손은 1915년 「프랑스 철학」에서 맨 드 비랑의 사상을 해석하면서 '프랑스 칸트'라는 표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랑의 노력의 인식이야말로 혜택받은 인식으로 순수 현상을 넘어서서, 칸트가 우리의 사고로는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선고한 실재, 즉 '물 자체'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22) 하지만 절대적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단 말인가? 맨 드 비랑에게 있어서 인식은 상대적 존재 즉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는 존재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절대적 존재의 인식은 그 표현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맨 드 비랑에게 있어서 절대적 존재는 근본적으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la croyance)'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적 질서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은 존재의 단순한 상정이다. 그러나 '믿음'은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과는 다른 것이어서, 증명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존재질서에 대한 확인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절대에 대한 인정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상대적 인식에서 얻어지는 현상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이 '믿음'은 인식의 조건으로서 절대 존재를 인정하려는 일종의 지성적 필요인 것이다.
원초적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모든 이론들을 성립시키는 지점이지 이론 자체는 아니다. '이론'은 잘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반면, 사실은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 한 언제나 그 가치를 지닌다. 맨 드 비랑은 지금 의식의 사실만을 문제삼고 있으며, 이 때 자아동일성은 노력하는 자아의 동일성으로 확인될 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가지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은 현상학적 자아존재론에서 볼 때 '자아동일성' 자체가 과연 어떤 성질의 것으로 주어지냐는 물음이다. 맨 드 비랑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경험'은 구체적 실재를 겨냥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존재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때 존재는 분명 현상적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절대적 존재는 아니다. 그러면 현상적 자아의 영역에서 길어 올려진 개념들을 사용하는 형이상학은 그 개념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는 경험의 방법으로 시도되는 형이상학의 분명한 난점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자아의 인식을 오로지 현상적 차원에서 유지하려는 입장과 자아 인식을 통해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넘어가려는 입장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물리쳐버릴 것인가? 이것은 분명 맨 드 비랑의 원초적 사실을 일종의 '형이상학적 경험'으로 보려는 우리의 시도를 어색하게 만드는 물음이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본다. 자아 인식은 자아의 실존과의 접촉이며 동시에 존재파악을 위한 시추점이다. 그런데 원초적 사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이상학적 경험'은 분명 순수하게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실재를 겨냥한다. 그러므로 이 접점에서 우리는 존재규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실재가 절대적인 존재일 수는 없고 상대적인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자아는 근원적인 상대성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여기서 '인식의 상대성'은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맨 드 비랑은 '상대적(relatif)'이란 말을 그 통상의 철학적 의미가 아닌 '관계를 맺고 있음'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의식의 '직접적 통각'은 원초적 사실이라는 상황이 '관계적(relationnel)'임을 증언해주며, 이 관계를 이루는 두 항의 이원성은 '하나의 원초적 이원성(une dualite primitive)'이다. 이렇게 자아의 실존양식은 상대성 속에서 항상 관계(la relation)로 주어진다는 뜻에서, 절대적 인식이 아니고 상대적 인식이다. 반면에 모든 실체는 다른 것과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독립된 사물이기 때문에 '실체로서의 자아'는 모든 관계로부터 절연된 자아, 즉 초월적 존재로서의 영혼이지,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순수 내재성 바로 그 속에서 확인되는 실재적 자아와는 거리가 있다.
요컨대 형이상학적 경험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인식은 우리의 인식 능력에 상대적이거나 따라서 순수하게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다. 자아의 내적 통각은 직접적인 파악이기 때문에 비록 실체적 자아는 아니라고 해도 결코 그 대상이 변형된 채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아의 통각은 실존적 실재 안에서 존재와 접촉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지점을 형이상학의 단초로 제공받으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존재와의 접점에서 존재의 중요양상을 넘겨다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이상학은 나의 실존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또 그 길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에, 맨 드 비랑에게 있어서도 형이상학은 우선 '자아학(自我學)'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유심론 철학의 공식이다.
자아의 영속성에 대한 내적 감정은 분명 직접적인 경험이며 이것은 믿음(la croyance)이나 추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아라고 부르는 나의 영속적 개체성에 대한 내감(le sens intime)은 분명 나의 영혼이 내적 시각에 나타나는 현상적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텍스트는 맨 드 비랑이 틀림없이 실체의 차원이 아닌 의식적 현상의 차원에 자아 동일성을 놓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그가 곧바로 "이와 같은 실재는 우리가 현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다.21) 왜냐하면 맨 드 비랑은 자아의 영속성에 대한 내적 감정은 현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절대적 질서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나 한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초적 사실 속에서 확인되는 영속적 자아가 경험적 소여이면서도 또한 경험적 자아를 넘어서 있다는 설명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
베르크손은 1915년 「프랑스 철학」에서 맨 드 비랑의 사상을 해석하면서 '프랑스 칸트'라는 표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랑의 노력의 인식이야말로 혜택받은 인식으로 순수 현상을 넘어서서, 칸트가 우리의 사고로는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선고한 실재, 즉 '물 자체'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22) 하지만 절대적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단 말인가? 맨 드 비랑에게 있어서 인식은 상대적 존재 즉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는 존재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절대적 존재의 인식은 그 표현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맨 드 비랑에게 있어서 절대적 존재는 근본적으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la croyance)'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적 질서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은 존재의 단순한 상정이다. 그러나 '믿음'은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과는 다른 것이어서, 증명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존재질서에 대한 확인인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절대에 대한 인정으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상대적 인식에서 얻어지는 현상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이 '믿음'은 인식의 조건으로서 절대 존재를 인정하려는 일종의 지성적 필요인 것이다.
원초적 사실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모든 이론들을 성립시키는 지점이지 이론 자체는 아니다. '이론'은 잘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반면, 사실은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 한 언제나 그 가치를 지닌다. 맨 드 비랑은 지금 의식의 사실만을 문제삼고 있으며, 이 때 자아동일성은 노력하는 자아의 동일성으로 확인될 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가지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은 현상학적 자아존재론에서 볼 때 '자아동일성' 자체가 과연 어떤 성질의 것으로 주어지냐는 물음이다. 맨 드 비랑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경험'은 구체적 실재를 겨냥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존재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때 존재는 분명 현상적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절대적 존재는 아니다. 그러면 현상적 자아의 영역에서 길어 올려진 개념들을 사용하는 형이상학은 그 개념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는 경험의 방법으로 시도되는 형이상학의 분명한 난점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자아의 인식을 오로지 현상적 차원에서 유지하려는 입장과 자아 인식을 통해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넘어가려는 입장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물리쳐버릴 것인가? 이것은 분명 맨 드 비랑의 원초적 사실을 일종의 '형이상학적 경험'으로 보려는 우리의 시도를 어색하게 만드는 물음이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본다. 자아 인식은 자아의 실존과의 접촉이며 동시에 존재파악을 위한 시추점이다. 그런데 원초적 사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이상학적 경험'은 분명 순수하게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실재를 겨냥한다. 그러므로 이 접점에서 우리는 존재규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실재가 절대적인 존재일 수는 없고 상대적인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자아는 근원적인 상대성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여기서 '인식의 상대성'은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맨 드 비랑은 '상대적(relatif)'이란 말을 그 통상의 철학적 의미가 아닌 '관계를 맺고 있음'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의식의 '직접적 통각'은 원초적 사실이라는 상황이 '관계적(relationnel)'임을 증언해주며, 이 관계를 이루는 두 항의 이원성은 '하나의 원초적 이원성(une dualite primitive)'이다. 이렇게 자아의 실존양식은 상대성 속에서 항상 관계(la relation)로 주어진다는 뜻에서, 절대적 인식이 아니고 상대적 인식이다. 반면에 모든 실체는 다른 것과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독립된 사물이기 때문에 '실체로서의 자아'는 모든 관계로부터 절연된 자아, 즉 초월적 존재로서의 영혼이지,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순수 내재성 바로 그 속에서 확인되는 실재적 자아와는 거리가 있다.
요컨대 형이상학적 경험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인식은 우리의 인식 능력에 상대적이거나 따라서 순수하게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다. 자아의 내적 통각은 직접적인 파악이기 때문에 비록 실체적 자아는 아니라고 해도 결코 그 대상이 변형된 채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아의 통각은 실존적 실재 안에서 존재와 접촉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지점을 형이상학의 단초로 제공받으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존재와의 접점에서 존재의 중요양상을 넘겨다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이상학은 나의 실존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또 그 길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에, 맨 드 비랑에게 있어서도 형이상학은 우선 '자아학(自我學)'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유심론 철학의 공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