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헬레니즘
(2) 헤브라이즘
(3) 종말의 필연성과 그 의미
(4) 신-인간의 관계구조
(2) 헤브라이즘
(3) 종말의 필연성과 그 의미
(4) 신-인간의 관계구조
본문내용
이었다. 인간과 신의 서로간의 관계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 협소한 의미의 주고받는 구조가 성립할 수 있을까? 헤브라이즘은 제사로 대표되는 제례의식 대신 기도와 회개가 일반적이다. 특히 회개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선물로 제물을 바치는 헬레니즘 시대의 제사- 것이 아니다. 신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행위자 자신을 위한 행위이다. 자신의 양심에 의해, 혹은 자신의 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순수성을 위해 시작된 행위인 것이다. 그것의 결과로 신이 기뻐할지 안할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신이 신자들에게 베푸는 용서도 헬레니즘 시대의 전쟁에서의 승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보상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밥을 먹고 잠을 자듯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전제해야 할 기본적인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이다. 신에게 있어 신자의 회개는 당연한 일이고 신자를 구원할지 안할지는 무조건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와 구원은 신이 최후에 판단할 일인 것이다. 헤브라이즘에서는 위에서 우리가 상정한 협소한 의미의 ‘주고받는’관계가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신자는 헬레니즘 시대보다 더 많은 의무를 가지며 그 중에 하나가 회개이다. 신은 헬레니즘 시대보다 더 자율적이고 권위적인데 그것이 ‘심판’으로 드러난다.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살펴 줘야했던 헬레니즘의 신과 회개를 듣고도-신자들의 진실한 믿음과 뉘우침을 보고도- 그들에 대한 구원은 신의 판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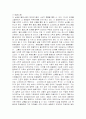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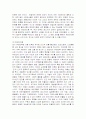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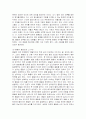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