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화시대의 도래
2. 문화의 사회적 존재가치
1) 문화의 사회적 존재양상
3. 문화체계와 사회체계
1) 반영론
2) 물상화론
3) 쌍방향적 상호결정론의 필요성
4. 문화연구의 최근 동향
1) 문화연구의 부흥
2) 기본 관점
5. 문화연구 방법론
1) 연구대상론
2) 연구방법론
3) 약한 프로그램(Weak Program)
4) 강한 프로그램(Strong Program)
2. 문화의 사회적 존재가치
1) 문화의 사회적 존재양상
3. 문화체계와 사회체계
1) 반영론
2) 물상화론
3) 쌍방향적 상호결정론의 필요성
4. 문화연구의 최근 동향
1) 문화연구의 부흥
2) 기본 관점
5. 문화연구 방법론
1) 연구대상론
2) 연구방법론
3) 약한 프로그램(Weak Program)
4) 강한 프로그램(Strong Program)
본문내용
한 다. 즉, 분과론적 입장을 추구하는 전자는 문화를 그 외적 존재물인 사회체계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종속변인으로 규정하는 반면, 전망론적 입장을 준수하는 후자는 문화를 자율적 질서를 견지하며 사회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하는 독립변인으로 간주한다. 사회체계에 대한 문화체계의 자율성 문제를 과학기술사회학자 D. 블루어가 창안한 “강한 프로그램(strong program)”이라는 개념틀로 재해석하는 그들은 문화연구가 사회학계에서 장기간 부진했던 이유를 문화적 예지가 결여된 속류 사회학자들이 의미의 문제에 무심한 나머지 개인의 행위를 도구적 차원으로 풀이한 채 문화체계의 내적 구성 원리를 온전히 적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회학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초창기 고전 학자들의 영향력이 소진되기 지난 한 세기간 ‘몰문화적’(acultural)인 유약한 자세는 시기나 학풍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존속해 왔다는 것이다.
3) 약한 프로그램(Weak Program)
강단 사회학의 대두인 파슨스가 자신의 일반적 행위론(general theory of action)에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가치의 효과를 상술하는데 주력했을 뿐 가치 자체의 성격 규명을 외면하였고, 그 결과 가치체계로서의 문화의 자율성을 포착해 내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능주의와 경향을 달리하는 여타 이론가들에게 답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행위자의 주관성을 크게 강조하는 고프만이나 가핑클 같은 미시계열의 연구가들도 문화체계를 인상적 행위(impressive action)나 해명적 행위(accountable action)을 외적 환경으로 인식하였으며, CCCS 문화주의자들은 물론 푸코나 부르디외와 같은 석학급 대가들 역시 문화를 사회적 제력과의 헤게모니 형성을 통해 실제적 힘을 발휘한다는 환원론적 인식틀(reductionist lines of reasoning)을 초극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현상은 최근 학자층에도 널리 파급되어, 문화생산론(production of culture theorists)들은 문화를 후원가나 후원제도 혹은 후원단체의 이해관계가 체현된 결과로 해석하며, W. 그리스올드나 R. 우드노우와 같은 중진 연구가들 역시 의미체계가 사회적 여건에 휘둘리는 순응적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체계의 자율적 역량을 부정하는 약한 프로그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판적 평가에 대한 역비판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문화연구방법의 유형을 경험주의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으로 구분한 G. 머독은 두터운 진술(thick description)이 그간 문화분석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세계에 대한 민속지적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지난 오랜 세월동안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방법론적으로 경계지워온 두터운 진술과 구조적 분석, 다시 말해 경험적 접근과 해석적 접근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얕은 진술(thin description)을 제안하고 있다.
4) 강한 프로그램(Strong Program)
알렉산더와 스미스는 지난날 대부분의 사회학적 연구가 문화체계를 암흑상자(black box)로 간주한 채 그 내적 구조 파악을 등한시해 왔음을 역설하면서, 문화체계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강한 프로그램을 주장한다. “진정한”(bona fide) 강한 프로그램의 효시로서 그들은 두터운 진술을 주창한 C. 기어츠의 해석학적 접근을 꼽는다. (후기)구조주의 병합과 함께 텍스트가 종족을 대신하면서 기어츠의 핵석학적 정신이 주지주의로 빠져들기도 했으나, 기어츠의 문화분석은 문화의 사회학을 문화사회학으로 전환시켜 문화연구의 전망론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특수성의 해석학(hermeneutics of the universal)을 위해 보편성의 해석학(hermeneutics of the universal)을 희생시킴으로써 강한 프로그램의 완성시킬 수 없었다고 말한다.
강한 프로그램으로의 진전은 P 디마지오, V. 터너, M. 살린즈, M 더글러스 등과 같이 사회생활의 텍스트성을 규명하는 데 노력한 학자들에 의해 촉진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뒤르켐, 모스, 헤르치 등 뒤르켐 학파의 문화연구 전통이 병합함으로써 구조주의와 해석학이 동반자적 관계에 기반한 명실공한 강한 프로그램으로서의 구조 해석학(structural hermeneutics)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약한 프로그램(Weak Program)
강단 사회학의 대두인 파슨스가 자신의 일반적 행위론(general theory of action)에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가치의 효과를 상술하는데 주력했을 뿐 가치 자체의 성격 규명을 외면하였고, 그 결과 가치체계로서의 문화의 자율성을 포착해 내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능주의와 경향을 달리하는 여타 이론가들에게 답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행위자의 주관성을 크게 강조하는 고프만이나 가핑클 같은 미시계열의 연구가들도 문화체계를 인상적 행위(impressive action)나 해명적 행위(accountable action)을 외적 환경으로 인식하였으며, CCCS 문화주의자들은 물론 푸코나 부르디외와 같은 석학급 대가들 역시 문화를 사회적 제력과의 헤게모니 형성을 통해 실제적 힘을 발휘한다는 환원론적 인식틀(reductionist lines of reasoning)을 초극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현상은 최근 학자층에도 널리 파급되어, 문화생산론(production of culture theorists)들은 문화를 후원가나 후원제도 혹은 후원단체의 이해관계가 체현된 결과로 해석하며, W. 그리스올드나 R. 우드노우와 같은 중진 연구가들 역시 의미체계가 사회적 여건에 휘둘리는 순응적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체계의 자율적 역량을 부정하는 약한 프로그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판적 평가에 대한 역비판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문화연구방법의 유형을 경험주의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으로 구분한 G. 머독은 두터운 진술(thick description)이 그간 문화분석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세계에 대한 민속지적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지난 오랜 세월동안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방법론적으로 경계지워온 두터운 진술과 구조적 분석, 다시 말해 경험적 접근과 해석적 접근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얕은 진술(thin description)을 제안하고 있다.
4) 강한 프로그램(Strong Program)
알렉산더와 스미스는 지난날 대부분의 사회학적 연구가 문화체계를 암흑상자(black box)로 간주한 채 그 내적 구조 파악을 등한시해 왔음을 역설하면서, 문화체계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강한 프로그램을 주장한다. “진정한”(bona fide) 강한 프로그램의 효시로서 그들은 두터운 진술을 주창한 C. 기어츠의 해석학적 접근을 꼽는다. (후기)구조주의 병합과 함께 텍스트가 종족을 대신하면서 기어츠의 핵석학적 정신이 주지주의로 빠져들기도 했으나, 기어츠의 문화분석은 문화의 사회학을 문화사회학으로 전환시켜 문화연구의 전망론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특수성의 해석학(hermeneutics of the universal)을 위해 보편성의 해석학(hermeneutics of the universal)을 희생시킴으로써 강한 프로그램의 완성시킬 수 없었다고 말한다.
강한 프로그램으로의 진전은 P 디마지오, V. 터너, M. 살린즈, M 더글러스 등과 같이 사회생활의 텍스트성을 규명하는 데 노력한 학자들에 의해 촉진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뒤르켐, 모스, 헤르치 등 뒤르켐 학파의 문화연구 전통이 병합함으로써 구조주의와 해석학이 동반자적 관계에 기반한 명실공한 강한 프로그램으로서의 구조 해석학(structural hermeneutics)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천자료
 기술적 형상 시대의 영상문화
기술적 형상 시대의 영상문화 [N세대][엔세대][N세대문화][엔세대문화]N세대(엔세대)의 정의, N세대(엔세대)의 특징, N세대...
[N세대][엔세대][N세대문화][엔세대문화]N세대(엔세대)의 정의, N세대(엔세대)의 특징, N세대... [남북통일][남북통합][사회통합][문화통합]남북통일의 의미, 남북통일의 인식, 남북통일의 필...
[남북통일][남북통합][사회통합][문화통합]남북통일의 의미, 남북통일의 인식, 남북통일의 필... 뉴미디어 시대의 인터넷문화
뉴미디어 시대의 인터넷문화 [문화재생산론][경제재생산론][문화재생산론의 해석방법][문화재생산론의 비판]문화재생산론...
[문화재생산론][경제재생산론][문화재생산론의 해석방법][문화재생산론의 비판]문화재생산론... [기업문화][기업][문화][기업문화 개념][기업문화 종류]기업문화의 개념, 기업문화의 종류, ...
[기업문화][기업][문화][기업문화 개념][기업문화 종류]기업문화의 개념, 기업문화의 종류, ... [다문화사회와 교육] 간문화교육과 사업의 방법 및 수단 - 간문화교육 방법의 약자, 인지적 ...
[다문화사회와 교육] 간문화교육과 사업의 방법 및 수단 - 간문화교육 방법의 약자, 인지적 ... 한류문화의 특징과 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 한류문화
한류문화의 특징과 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 한류문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 현대의서양문화C형+국내의 공공조형물(공공미술)의 사례를 들어,공공미술이 사회 속에 지닌 ...
현대의서양문화C형+국내의 공공조형물(공공미술)의 사례를 들어,공공미술이 사회 속에 지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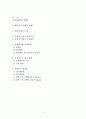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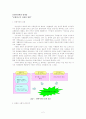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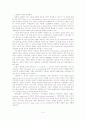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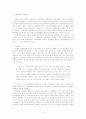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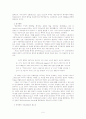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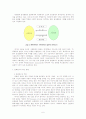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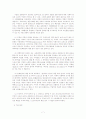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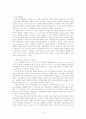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