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이론적 배경
1. 접근권의 개념
2.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
3.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
4. 법제도상으로 본 이동권
Ⅱ. 장애인 이동권 실태
1.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의 실태
2. 이동수단의 실태
Ⅲ.문제점
1. 법적 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Ⅳ. 해결방안
1. 편의증진법상의 개정
2. 상위법(헌법)의 개정
3. 전달체계의 개선
4. 저상버스(low floor bus)제 도입
5. 특별운송서비스의 개선
6. 지하철 안전성 확보와 엘리베이터 의무설치
7.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의지가 필요하다
1. 접근권의 개념
2.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
3.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
4. 법제도상으로 본 이동권
Ⅱ. 장애인 이동권 실태
1.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의 실태
2. 이동수단의 실태
Ⅲ.문제점
1. 법적 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Ⅳ. 해결방안
1. 편의증진법상의 개정
2. 상위법(헌법)의 개정
3. 전달체계의 개선
4. 저상버스(low floor bus)제 도입
5. 특별운송서비스의 개선
6. 지하철 안전성 확보와 엘리베이터 의무설치
7.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의지가 필요하다
본문내용
로 장애인의 이동문제, 특히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버스 정류소는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지하철역사는 28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도 8천대의 버스가 서울 시내 곳곳을 거미줄처럼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 정류소는 지하철 역 보다 집에서 혹은 출발장소나 도착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버스는 수직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다.
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버스를 타기 위해 수직 이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역처럼 깊게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하는 부담이 없이 보도에서 바로 버스를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승하차를 위한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저상버스만 도입이 된다면, 장애인은 보도에서 바로 버스에 오를 수 있다. 수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것이다.
셋째, 버스는 구조나 기술상의 문제가 적다.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인도의 높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면 된다. 보도의 높이가 횡단보도의 턱낮추기와 상충되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문제도 보도의 높이를 15cm정도로 정비를 하면 가능할 것이다. 15cm 정도면 횡단보도 턱낮추기에서 연석경사로의 경사도를 낮추는데도 큰 문제가 없으며, 저상버스에 탑승하기 위한 높이를 갖추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우선 버스에 닐링시스템(kneeling system)을 도입하고 버스에서 경사로(ramp)가 나온다면, 적어도 8분의 1정도의 경사도는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노약자들에게도 편리하다.
저상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될 경우 노인들 역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며, 어린이와 유모차 역시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목발을 사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 역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된 지하철역의 경우 노인, 어린이, 유모차,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그대로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에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같은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훨씬 효과적이다.
지하철에 4천억 원을 투자하고서도 지하철이 완전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면, 그 예산을 버스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상버스 1대 가격을 2억 원으로 보고, 현재 약 5천만 원 정도인 일반버스 가격에서 추가되는 비용인 1억5천만 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준다면, 4천억 원으로 약 2천6백 대의 저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서울 시내 버스의 약 3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대량 생산으로 저상버스 가격을 보다 낮춰서 1억5천만 원 정도로만 버스 가격을 낮춘다고 한다면, 4천 대의 저상버스 구입가격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며, 이것은 서울 시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 특별운송서비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안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동에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이동문제는 도외시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특별운송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이동에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차별적 전략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특별운송서비스의 이용자는 대중교통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할 뿐아니라 서비스의 종류도 정기,고정노선인 셔틀버스 형과 Door to Door 서비스 외에는 다른 서비스가 전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특별운송서비스의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지하철 안전성 확보와 엘리베이터 의무설치
승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를 벽으로 차단하고 지하철 출입문과 동시에 계폐되는 스크린 도어(PSD : Platform Screen Door)의 확대 설치(현재 서울의 신길역과 광주 지하철 도청역에서 시범운영)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처럼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적으로 담당하는 공익요원이 승객의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전담 역무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지하철 리프트 사고를 막기 위한 전 지하철 역의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인 뿐 아니라 이동에 불편한 이동약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2004년까지 263개의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687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7.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의지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시내 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일과 같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이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난관은 해결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도 마련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kr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 http://www.cowalk.or.kr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현상>, 김기룡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 홍승진,2002년
장애인 이동권 연대 www.access.jinbo.net
첫째, 버스 정류소는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지하철역사는 28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도 8천대의 버스가 서울 시내 곳곳을 거미줄처럼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 정류소는 지하철 역 보다 집에서 혹은 출발장소나 도착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휠체어 사용자들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버스는 수직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다.
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버스를 타기 위해 수직 이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역처럼 깊게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하는 부담이 없이 보도에서 바로 버스를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승하차를 위한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저상버스만 도입이 된다면, 장애인은 보도에서 바로 버스에 오를 수 있다. 수없이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것이다.
셋째, 버스는 구조나 기술상의 문제가 적다.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인도의 높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면 된다. 보도의 높이가 횡단보도의 턱낮추기와 상충되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문제도 보도의 높이를 15cm정도로 정비를 하면 가능할 것이다. 15cm 정도면 횡단보도 턱낮추기에서 연석경사로의 경사도를 낮추는데도 큰 문제가 없으며, 저상버스에 탑승하기 위한 높이를 갖추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우선 버스에 닐링시스템(kneeling system)을 도입하고 버스에서 경사로(ramp)가 나온다면, 적어도 8분의 1정도의 경사도는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노약자들에게도 편리하다.
저상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될 경우 노인들 역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며, 어린이와 유모차 역시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목발을 사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 역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된 지하철역의 경우 노인, 어린이, 유모차,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그대로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에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같은 예산을 사용하고서도 훨씬 효과적이다.
지하철에 4천억 원을 투자하고서도 지하철이 완전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면, 그 예산을 버스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상버스 1대 가격을 2억 원으로 보고, 현재 약 5천만 원 정도인 일반버스 가격에서 추가되는 비용인 1억5천만 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준다면, 4천억 원으로 약 2천6백 대의 저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서울 시내 버스의 약 3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대량 생산으로 저상버스 가격을 보다 낮춰서 1억5천만 원 정도로만 버스 가격을 낮춘다고 한다면, 4천 대의 저상버스 구입가격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며, 이것은 서울 시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 특별운송서비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안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동에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이동문제는 도외시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특별운송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이동에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차별적 전략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특별운송서비스의 이용자는 대중교통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할 뿐아니라 서비스의 종류도 정기,고정노선인 셔틀버스 형과 Door to Door 서비스 외에는 다른 서비스가 전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특별운송서비스의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지하철 안전성 확보와 엘리베이터 의무설치
승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를 벽으로 차단하고 지하철 출입문과 동시에 계폐되는 스크린 도어(PSD : Platform Screen Door)의 확대 설치(현재 서울의 신길역과 광주 지하철 도청역에서 시범운영)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처럼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적으로 담당하는 공익요원이 승객의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전담 역무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지하철 리프트 사고를 막기 위한 전 지하철 역의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인 뿐 아니라 이동에 불편한 이동약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2004년까지 263개의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687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7.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의지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시내 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일과 같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이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난관은 해결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도 마련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kr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 http://www.cowalk.or.kr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현상>, 김기룡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 홍승진,2002년
장애인 이동권 연대 www.access.jinb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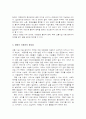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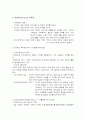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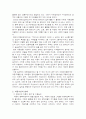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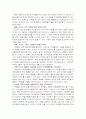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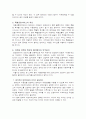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