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朝鮮前期의 漢詩 개관
2. 16,17세기 당시풍의 성행
3. 삼당시인(三唐詩人)
① 孤竹 崔慶昌
② 玉峯 白光勳
③ 蓀谷 李達
Ⅲ. 결론
Ⅱ. 본론
1. 朝鮮前期의 漢詩 개관
2. 16,17세기 당시풍의 성행
3. 삼당시인(三唐詩人)
① 孤竹 崔慶昌
② 玉峯 白光勳
③ 蓀谷 李達
Ⅲ. 결론
본문내용
3. 삼당시인(三唐詩人)
삼당시인이란, 조선 선조 때의 孤竹 崔慶昌, 玉峯 白光勳, 蓀谷 李達 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사장파나 사림파처럼 권위와 규범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고, 체제 밖의 의식적 반발이나 괴변적 초탈을 과하기 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진솔한 경험, 인간적 정감의 세계를 노래함으로 문학의 본질을 개혁했으며, 무엇보다도 공명과 경륜을 위한 관인이기보다 문인이기를 자처했던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전문시인들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만당(晩唐)에 머물렀으며, 성당(盛唐)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① 孤竹 崔慶昌(1539~1583)
자는 가운(嘉運), 호는 고죽(孤竹)으로, 백광훈과 같이 박순의 문인으로 일찍이(선조 1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외직 말단의 관인이기보다는 시서화에 전념하며 스스로 문인이기를 자처했는가 하면, 뜨거운 가슴의 참사랑을 실천했던 풍류 문사였다. 허균은 <鶴山樵談>에서 그의 시적 특질을 淸勁이라 했다.
古郡無城郭 오래된 고을이라 성곽조차 없는데
山齋有樹林 산 서재엔 나무숲만 둘러졌네.
蕭條人吏散 쓸쓸하게 아전사람 흩어진 뒤에
隔水搗寒砧 물 저편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위의 시는 <高峰山齋>라는 시이다. 사뭇 두보의 <春望>의 “나라가 망하니 산과 물만 예롭고, 성에 봄이 드니 초목만 깊다”(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에서 시상을 앗은듯한 영사시이다. 고봉군에 있는 산속 서재에서 읊은 시로서, 폐허된 고양군의 고봉산재를 들러보고 쓴 시로 퇴락함으로 인한 적막감이 잘 형상화된 작품이다. 기,승구는 폐허던 고봉군의 산재는 사람의 자취가 이미 끊겼는지, 오직 풀숲으로 둘러
삼당시인이란, 조선 선조 때의 孤竹 崔慶昌, 玉峯 白光勳, 蓀谷 李達 세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사장파나 사림파처럼 권위와 규범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고, 체제 밖의 의식적 반발이나 괴변적 초탈을 과하기 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진솔한 경험, 인간적 정감의 세계를 노래함으로 문학의 본질을 개혁했으며, 무엇보다도 공명과 경륜을 위한 관인이기보다 문인이기를 자처했던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전문시인들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만당(晩唐)에 머물렀으며, 성당(盛唐)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① 孤竹 崔慶昌(1539~1583)
자는 가운(嘉運), 호는 고죽(孤竹)으로, 백광훈과 같이 박순의 문인으로 일찍이(선조 1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외직 말단의 관인이기보다는 시서화에 전념하며 스스로 문인이기를 자처했는가 하면, 뜨거운 가슴의 참사랑을 실천했던 풍류 문사였다. 허균은 <鶴山樵談>에서 그의 시적 특질을 淸勁이라 했다.
古郡無城郭 오래된 고을이라 성곽조차 없는데
山齋有樹林 산 서재엔 나무숲만 둘러졌네.
蕭條人吏散 쓸쓸하게 아전사람 흩어진 뒤에
隔水搗寒砧 물 저편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
위의 시는 <高峰山齋>라는 시이다. 사뭇 두보의 <春望>의 “나라가 망하니 산과 물만 예롭고, 성에 봄이 드니 초목만 깊다”(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에서 시상을 앗은듯한 영사시이다. 고봉군에 있는 산속 서재에서 읊은 시로서, 폐허된 고양군의 고봉산재를 들러보고 쓴 시로 퇴락함으로 인한 적막감이 잘 형상화된 작품이다. 기,승구는 폐허던 고봉군의 산재는 사람의 자취가 이미 끊겼는지, 오직 풀숲으로 둘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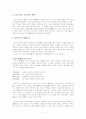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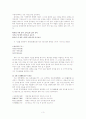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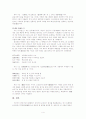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