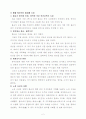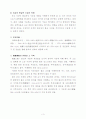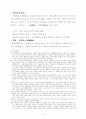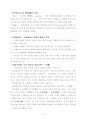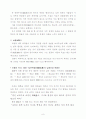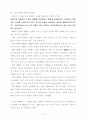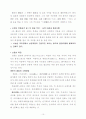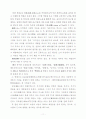목차
◎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중국으로 불교의 전래와 전개
불교의 중국 전래
◎ 東晉 初로부터 南北朝 시대
○ 불교가 중국에 전래, 정착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
1) 정치에서 종교, 철학으로
2) 중화의식의 변화
3) 노장 사상의 성행
4) 유교의 현실적 기능의 약화
◎ 隋․唐시대
○ 수당 시대 불교 융성의 배경
○ 종파 불교
○ 천태종(天台宗)
○ 화엄종(華嚴宗)
○ 선종(禪宗)
중국으로 불교의 전래와 전개
불교의 중국 전래
◎ 東晉 初로부터 南北朝 시대
○ 불교가 중국에 전래, 정착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
1) 정치에서 종교, 철학으로
2) 중화의식의 변화
3) 노장 사상의 성행
4) 유교의 현실적 기능의 약화
◎ 隋․唐시대
○ 수당 시대 불교 융성의 배경
○ 종파 불교
○ 천태종(天台宗)
○ 화엄종(華嚴宗)
○ 선종(禪宗)
본문내용
적이나 의도까지도 버려야(無心)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심의 상태에서 문득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頓悟).
北宗의 神秀와 그 계통은 長安, 洛陽을 위시하여 北方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神秀 이후 義福(652-736), 普寂(651-739) 등에 이르러 극성기를 이루다가 이들이 죽은 후 쇠퇴하게 되었다.
南宗의 慧能과 그 계통은 廣東省 및 江西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 및 일본에 전래되어 융성하게 되었다. 그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는 靑原 行思, 南嶽 懷讓, 荷澤 神會, 永嘉 玄覺(665-713), 南陽 慧忠( -755), 法海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의 가르침은 六祖壇經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 신회의 북종공격 및 7조 옹립 작전 : 남북 대결과 종권다툼
6조 혜능의 제자 신회는 북종을 선호하던 사대부의 미움을 사서 사회교란 및 선동죄의 누명을 쓰고 낙양에서 쫓겨남. 안록산의 난으로 황제가 피난할 때, 도첩을 팔아 황실 금고를 채워줌으로써 황실의 총애를 받게 된 신회. 황제의 비호를 입고 대집회를 열어 7조 자리를 찾게 됨. 종권 획득.
→ 사실상 교리면에서 남돈북점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며 종권다툼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 선종의 특징
선종은 불경에 얽매이지 않고(不立文字), 바깥이 아닌 바로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불성(性)을 체험적, 직관적으로 깨달으며(直指人心, 見性成), 말이나 문자가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참된 가르침을 전한다(以心心, 外別)는 특징. 이는 고도의 철학적 논변에 가까운 인도 불교와는 다른 중국 불교의 독자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宗의 要旨와 수행방법
선종은 <不立文字> <以心傳心> <敎外別傳>을 주장하여 진리란 언어로 표현이 불가하며 이의 전달도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의 전달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붓다가 전한 진리는 오로지 문자화된 경전에 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전을 떠날 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不立文字-말로는 전할 수없는 부처의 마음을 강조. 즉 문자로써 교(敎)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선종(禪宗)의 입장을 표명한 표어.
敎外別傳-선종(禪宗)에서 말이나 문자를 쓰지 않고, 따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 석가가 언어로써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교내(敎內)의 법이라면, 교외(敎外)의 법은 석가의 마음을 직접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월지(標月指: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진리를 달에 비유한다면 교(敎)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반해 선(禪)은 달을 직접 체험하는 것.
또한 선불교는 見性成佛, 直指人心을 주장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心性을 올바로 알고 이해할 때 깨달은 존재가 된다. 그러한 깨달음 또는 지혜란 고의적인 노력을 배제하며, 부단한 자기반성과 참회에 의해 心身을 淸淨케 하고, 육신의 감각적 욕구를 절제하고, 일체의 외물에 대한 욕구(명예, 재산 등)를 버리고, 일체의 탐욕과 편견, 갈등을 떠나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진리(道)를 직관(道觀 vision of Tao)할 수 있다.
直指人心-직역하면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는 뜻으로, 눈을 외계로 돌리지 말고 자기 마음을 곧바로 잡을 것, 즉 생각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파악하라는 것이다. 이는 선종의 개조(開祖) 달마(達摩)의 가르침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였음을 알게 되고 그대로 부처가 된다. 흔히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하는데,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고 있어 교리를 공부하거나 계행을 떠나서 직접 마음을 교화하고 수행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 선종의 2대조 혜가(慧可)와 달마와의 문답에서 유래하였다. 혜가가 달마에게 불도를 얻는 법을 묻자 달마는 한 마디로 마음을 보라고 대답하였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을 깨달으면 만 가지 행을 다 갖추게 된다는 것.
見性成佛-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는 말로, 본 마음을 깨치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
禪을 중시한 소승불교의 경전으로는 坐禪三昧經 達摩多羅禪經 등이 있으며, 대승경전으로는 般若三昧經 반야경 화엄경 능가경 유마경 등을 들 수 있다. 禪宗은 所依經典으로 특히 楞伽經을 받들고 있으며, 空宗과 道家의 특징을 결합한 종파라 할 수 있다.
cf. 염화미소 [拈집을념華微笑]=염화시중(拈花示衆)이라고도 한다. 선종에서 선(禪)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전하는 이야기로서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기록되어 있다.
영산(靈山)에서 범왕(梵王)이 석가에게 설법을 청하며 연꽃을 바치자, 석가가 연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가섭(迦葉)만은 참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고 이에 석가는 가섭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묘한 덕)과 열반묘심(涅槃妙心:번뇌와 미망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는 마음), 실상무상(實相無相:생멸계를 떠난 불변의 진리), 미묘법문(微妙法門:진리를 깨닫는 마음) 등의 불교 진리를 전해 주었다.
즉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선 수행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화두이다.
※ 간화선이란 옛 조사들의 깨달음의 기연(機緣 : 因緣)인 공안(公案: 話頭)을 참구하는 선수 행법이다. 공안이란 관공서의 문서라는 뜻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대성의 법칙을 말한다. 선문에서는 불조(佛祖)가 개시한 불법의 도리를 의미하며, 수선자들이 분별의식을 떨쳐버리고 조사들의 공안을 참구하여 깨달아야 할 문제의식(現成公案)으로 보고 있다. 즉 인식주관과 객관대상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분별심과 차별심을 떨쳐버리고 그 곳에서 화두를 참구하는 것. 따라서 화두는 일체의 허구적이고 비실제적인 의식의 작용을 끊는 절대적인 참선의 방편이며, 이러한 화두 참구의 목적과 방법은 화두에 대해 간절한 의심을 일으켜 이 의심에 모든 의식작용을 집중시켜 바깥 경계로 의식이 지향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직관(直觀)하는 것이다.
北宗의 神秀와 그 계통은 長安, 洛陽을 위시하여 北方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神秀 이후 義福(652-736), 普寂(651-739) 등에 이르러 극성기를 이루다가 이들이 죽은 후 쇠퇴하게 되었다.
南宗의 慧能과 그 계통은 廣東省 및 江西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 및 일본에 전래되어 융성하게 되었다. 그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는 靑原 行思, 南嶽 懷讓, 荷澤 神會, 永嘉 玄覺(665-713), 南陽 慧忠( -755), 法海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의 가르침은 六祖壇經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 신회의 북종공격 및 7조 옹립 작전 : 남북 대결과 종권다툼
6조 혜능의 제자 신회는 북종을 선호하던 사대부의 미움을 사서 사회교란 및 선동죄의 누명을 쓰고 낙양에서 쫓겨남. 안록산의 난으로 황제가 피난할 때, 도첩을 팔아 황실 금고를 채워줌으로써 황실의 총애를 받게 된 신회. 황제의 비호를 입고 대집회를 열어 7조 자리를 찾게 됨. 종권 획득.
→ 사실상 교리면에서 남돈북점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며 종권다툼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 선종의 특징
선종은 불경에 얽매이지 않고(不立文字), 바깥이 아닌 바로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불성(性)을 체험적, 직관적으로 깨달으며(直指人心, 見性成), 말이나 문자가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참된 가르침을 전한다(以心心, 外別)는 특징. 이는 고도의 철학적 논변에 가까운 인도 불교와는 다른 중국 불교의 독자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宗의 要旨와 수행방법
선종은 <不立文字> <以心傳心> <敎外別傳>을 주장하여 진리란 언어로 표현이 불가하며 이의 전달도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의 전달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붓다가 전한 진리는 오로지 문자화된 경전에 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전을 떠날 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不立文字-말로는 전할 수없는 부처의 마음을 강조. 즉 문자로써 교(敎)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선종(禪宗)의 입장을 표명한 표어.
敎外別傳-선종(禪宗)에서 말이나 문자를 쓰지 않고, 따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 석가가 언어로써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교내(敎內)의 법이라면, 교외(敎外)의 법은 석가의 마음을 직접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월지(標月指: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진리를 달에 비유한다면 교(敎)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반해 선(禪)은 달을 직접 체험하는 것.
또한 선불교는 見性成佛, 直指人心을 주장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心性을 올바로 알고 이해할 때 깨달은 존재가 된다. 그러한 깨달음 또는 지혜란 고의적인 노력을 배제하며, 부단한 자기반성과 참회에 의해 心身을 淸淨케 하고, 육신의 감각적 욕구를 절제하고, 일체의 외물에 대한 욕구(명예, 재산 등)를 버리고, 일체의 탐욕과 편견, 갈등을 떠나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진리(道)를 직관(道觀 vision of Tao)할 수 있다.
直指人心-직역하면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는 뜻으로, 눈을 외계로 돌리지 말고 자기 마음을 곧바로 잡을 것, 즉 생각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파악하라는 것이다. 이는 선종의 개조(開祖) 달마(達摩)의 가르침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였음을 알게 되고 그대로 부처가 된다. 흔히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하는데,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고 있어 교리를 공부하거나 계행을 떠나서 직접 마음을 교화하고 수행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 선종의 2대조 혜가(慧可)와 달마와의 문답에서 유래하였다. 혜가가 달마에게 불도를 얻는 법을 묻자 달마는 한 마디로 마음을 보라고 대답하였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을 깨달으면 만 가지 행을 다 갖추게 된다는 것.
見性成佛-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는 말로, 본 마음을 깨치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
禪을 중시한 소승불교의 경전으로는 坐禪三昧經 達摩多羅禪經 등이 있으며, 대승경전으로는 般若三昧經 반야경 화엄경 능가경 유마경 등을 들 수 있다. 禪宗은 所依經典으로 특히 楞伽經을 받들고 있으며, 空宗과 道家의 특징을 결합한 종파라 할 수 있다.
cf. 염화미소 [拈집을념華微笑]=염화시중(拈花示衆)이라고도 한다. 선종에서 선(禪)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전하는 이야기로서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기록되어 있다.
영산(靈山)에서 범왕(梵王)이 석가에게 설법을 청하며 연꽃을 바치자, 석가가 연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가섭(迦葉)만은 참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고 이에 석가는 가섭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묘한 덕)과 열반묘심(涅槃妙心:번뇌와 미망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는 마음), 실상무상(實相無相:생멸계를 떠난 불변의 진리), 미묘법문(微妙法門:진리를 깨닫는 마음) 등의 불교 진리를 전해 주었다.
즉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선 수행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화두이다.
※ 간화선이란 옛 조사들의 깨달음의 기연(機緣 : 因緣)인 공안(公案: 話頭)을 참구하는 선수 행법이다. 공안이란 관공서의 문서라는 뜻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대성의 법칙을 말한다. 선문에서는 불조(佛祖)가 개시한 불법의 도리를 의미하며, 수선자들이 분별의식을 떨쳐버리고 조사들의 공안을 참구하여 깨달아야 할 문제의식(現成公案)으로 보고 있다. 즉 인식주관과 객관대상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분별심과 차별심을 떨쳐버리고 그 곳에서 화두를 참구하는 것. 따라서 화두는 일체의 허구적이고 비실제적인 의식의 작용을 끊는 절대적인 참선의 방편이며, 이러한 화두 참구의 목적과 방법은 화두에 대해 간절한 의심을 일으켜 이 의심에 모든 의식작용을 집중시켜 바깥 경계로 의식이 지향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직관(直觀)하는 것이다.
추천자료
 중국역사 개관(동양역사,선사문화에서통일제국까지)
중국역사 개관(동양역사,선사문화에서통일제국까지) [중국역사] 명나라 역사
[중국역사] 명나라 역사 역사 독후감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읽고
역사 독후감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읽고 [중국역사] 동아시아(중국)의 고대사 분석 (진제국. 한나라)
[중국역사] 동아시아(중국)의 고대사 분석 (진제국. 한나라)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점을 통한 우리나라 초등 역사교육의 실태와 대응방안 분석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점을 통한 우리나라 초등 역사교육의 실태와 대응방안 분석 [종교정책][종교정책의 목표][종교정책의 역사][일제식민지시대의 종교정책][중국의 종교정책...
[종교정책][종교정책의 목표][종교정책의 역사][일제식민지시대의 종교정책][중국의 종교정책...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발전을 통해 분석한 중국의 고찰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발전을 통해 분석한 중국의 고찰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한 중국의 입장 (동북공정 정의, 동북공정 문제, 중국의 변방민족국...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한 중국의 입장 (동북공정 정의, 동북공정 문제, 중국의 변방민족국... [중국 역사의 진실] 중국 전통과학은 왜 근대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중국 역사의 진실] 중국 전통과학은 왜 근대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중국 역사의 진실 ] 중국 전통과학은 왜 근대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중국 역사의 진실 ] 중국 전통과학은 왜 근대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세계의역사1B)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 중 하나를 선택, 관련된 보...
세계의역사1B)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 중 하나를 선택, 관련된 보...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 보도자료 7건 이상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세계의...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 보도자료 7건 이상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세계의... [중국역사] 중국제국쇠망사 독후감
[중국역사] 중국제국쇠망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