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들어가는 말
2.박인로
3.정훈
4.강복중
5.맺음말
2.박인로
3.정훈
4.강복중
5.맺음말
본문내용
의 기쁨과 환회, 태평성대 등은 구체적 현실의 반영으로서의 작품의 정서적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념적 의도로서 채색된 구호로서의 아송적(雅頌的) 성격이 짙다.
즉,〈태평사〉는 그 창작의 계기가 되는 전쟁의 현실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개인적 정서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의도된 집단적 정서를 형상화해 내고 있다.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과의 교유가 작품 창작의 동기가 된 예는 노계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보이지만, 〈태평사〉는 이러한 창작의 배경이 작품의 진술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전언의 의도를 띠고 작품에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구별된다.
〈선상탄〉(船上歎)은 〈태평사〉보다 늦은 시기인 선조 38년(1605)에 7년 간의 전쟁이 끝나고 노계가 통주사(統舟師)로 부산을 방어하기 위해 부임했을 때 지은 작품으로, 〈태평사〉와 같이 전쟁의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이긴 하지만,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정서적 지향이 〈태평사〉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내용은 서사에서 헌원씨(軒轅氏)의 중국의 고사와 관련된 배의 유래를 말하면서 배를 향한 원망과 한탄을 하는데, 이는 결국 병든 몸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배를 탈 수 밖에 없었던 노계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때 배가 아닌 전쟁의 현실에 대한 원망과 한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시황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과 한탄의 정서를 더욱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현실에 지친 병사의 회포는 집단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정서이다. 본사에서는 원망과 한탄을 늘어놓았던 푸념을 마감하고 병사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러면서 조선이 왜구의 침략을 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뼈저린 자각을 한다. 그리고 임금을 모시지 못하고 늙어가는 자신의 무상함을 책하는 것에서 전란에 시든 병사가 한 임금의 신하로서 우국단심(憂國丹心)으로 자신을 추스리고자 하는 충심 어린 정서가 드러난다. 그리고 결사에서는 왜적들의 항복을 받아 태평시대가 되어 임금의 덕을 드높이고 싶다고 하며 개인적 정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태평시대에 뱃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고 노래한 것 역시 태평시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한 개인의 정서적 지향 속에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상탄〉은 〈태평사〉와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여 전쟁의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태평사〉에 비하여 전쟁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개인적인 정서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
강호 자연의 경물은 유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이면서 동시에 삶의 현실을 투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지향되는 이상세계는 때로는 삶의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과 긴밀하게 호응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므로 강호 자연이 형상화된 모습은 이상세계와 삶의 현실 사이에 놓인 거리를 살피는 잣대가 된다. 노계의 가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강호의 모습과 의미는 언뜻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향반이라는 노계의 사회적 신분적 처지에 주목할 때 그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는 <누항사>, <사제곡>, <노계가>, <소유정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누항사>는 박인로가 51세(1611)에 경기도 용진면 별서촌 사제에 은거하던 한음을 찾았을 때, 한음이 노계에게 산거궁약(山居窮若)의 생활을 물었을 때 그것에 답하여 빈이무원(貧而無怨)하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심회와 생활상을 읊은 157구의 강호한정가사이다. 작품 내용은 임진란 후 곤궁한 생활을 노래하고 가난하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도를 즐기는 장부의 뜻은 변화가 없다는 것과 이웃에 농우를 얻으러 갔다가 뜻대로 되지 못하자 세상일에 대한 체념적인 심회를 읊었다. 이는 현실생활을 실감 있게 나타낸 작품으로서 이 시기 가사의 특징을 대변하였다. 끝에서는 청풍명월을 벗삼아 자연과 더불어 늙기를 바라며, 가난한 생활이라도 만족하게 여기고 충효와 우애에 힘쓸 것을 노래했다.
어리고 우활(迂闊) 산 이ㅣ우ㅣ 더니업다.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하날긔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깁푼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딥히 셥히 되야,
셔 홉 밥 닷 홉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뷘ㅣ쇤일 뿐이로다.
생애 이러다 장부(丈夫) 뜻을 옴길넌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즉,〈태평사〉는 그 창작의 계기가 되는 전쟁의 현실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개인적 정서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의도된 집단적 정서를 형상화해 내고 있다.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과의 교유가 작품 창작의 동기가 된 예는 노계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보이지만, 〈태평사〉는 이러한 창작의 배경이 작품의 진술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전언의 의도를 띠고 작품에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구별된다.
〈선상탄〉(船上歎)은 〈태평사〉보다 늦은 시기인 선조 38년(1605)에 7년 간의 전쟁이 끝나고 노계가 통주사(統舟師)로 부산을 방어하기 위해 부임했을 때 지은 작품으로, 〈태평사〉와 같이 전쟁의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이긴 하지만,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정서적 지향이 〈태평사〉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내용은 서사에서 헌원씨(軒轅氏)의 중국의 고사와 관련된 배의 유래를 말하면서 배를 향한 원망과 한탄을 하는데, 이는 결국 병든 몸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배를 탈 수 밖에 없었던 노계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때 배가 아닌 전쟁의 현실에 대한 원망과 한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시황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과 한탄의 정서를 더욱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현실에 지친 병사의 회포는 집단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정서이다. 본사에서는 원망과 한탄을 늘어놓았던 푸념을 마감하고 병사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러면서 조선이 왜구의 침략을 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뼈저린 자각을 한다. 그리고 임금을 모시지 못하고 늙어가는 자신의 무상함을 책하는 것에서 전란에 시든 병사가 한 임금의 신하로서 우국단심(憂國丹心)으로 자신을 추스리고자 하는 충심 어린 정서가 드러난다. 그리고 결사에서는 왜적들의 항복을 받아 태평시대가 되어 임금의 덕을 드높이고 싶다고 하며 개인적 정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태평시대에 뱃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고 노래한 것 역시 태평시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한 개인의 정서적 지향 속에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상탄〉은 〈태평사〉와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여 전쟁의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태평사〉에 비하여 전쟁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개인적인 정서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
강호 자연의 경물은 유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이면서 동시에 삶의 현실을 투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지향되는 이상세계는 때로는 삶의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과 긴밀하게 호응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므로 강호 자연이 형상화된 모습은 이상세계와 삶의 현실 사이에 놓인 거리를 살피는 잣대가 된다. 노계의 가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강호의 모습과 의미는 언뜻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향반이라는 노계의 사회적 신분적 처지에 주목할 때 그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는 <누항사>, <사제곡>, <노계가>, <소유정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누항사>는 박인로가 51세(1611)에 경기도 용진면 별서촌 사제에 은거하던 한음을 찾았을 때, 한음이 노계에게 산거궁약(山居窮若)의 생활을 물었을 때 그것에 답하여 빈이무원(貧而無怨)하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심회와 생활상을 읊은 157구의 강호한정가사이다. 작품 내용은 임진란 후 곤궁한 생활을 노래하고 가난하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도를 즐기는 장부의 뜻은 변화가 없다는 것과 이웃에 농우를 얻으러 갔다가 뜻대로 되지 못하자 세상일에 대한 체념적인 심회를 읊었다. 이는 현실생활을 실감 있게 나타낸 작품으로서 이 시기 가사의 특징을 대변하였다. 끝에서는 청풍명월을 벗삼아 자연과 더불어 늙기를 바라며, 가난한 생활이라도 만족하게 여기고 충효와 우애에 힘쓸 것을 노래했다.
어리고 우활(迂闊) 산 이ㅣ우ㅣ 더니업다.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하날긔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깁푼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딥히 셥히 되야,
셔 홉 밥 닷 홉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뷘ㅣ쇤일 뿐이로다.
생애 이러다 장부(丈夫) 뜻을 옴길넌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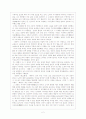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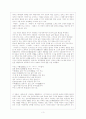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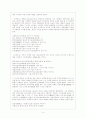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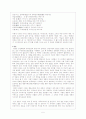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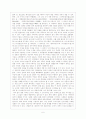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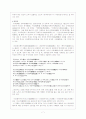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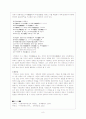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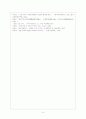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