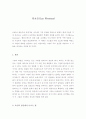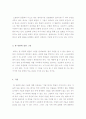본문내용
응하는 세 가지 형상으로 분할된 채 그림 내에 투사되는 데 그것은 화가와 출입구의 방문객, 중앙에서 모델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국왕과 왕비의 반영이다. 이 반영은 그림 앞쪽의 모든 사람들이 응시하고 있는 그 무엇을 매우 소박하고 희미하게 보여줌으로써, 마치 마술처럼 모든 시선에 있어 결여된 어떤 것을 회복해 준다. 거울에 있어서 반영된 모습은 가장된 것일 수도 있다. 거울은 드러내고 있는 만큼보다 훨씬더 많은 것을 감추고 있어서 이다. 국왕과 왕비가 지배하는 공간은 예술가와 감상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속해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지나가는 사람의 익명의 얼굴과 화가의 얼굴이 나타나야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다. 예술가와 방문객이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치우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견일 수는 있지만 이는 마치 국왕이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거울 깊숙이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작용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다.
8. 작품이 가지는 의미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 속에는 고전주의 시대의 표현법에 대한 표상과 그 표상이 우리 앞에 열어놓은 공간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사실상 그 표상은 자체의 모든 요소들(시선들, 얼굴들, 동작들) 속에서 표현되지만 이 확산의 와중에서 어쩔수 없이 지시된 하나의 본질적인 공백이 존재하게 된다. 표상이 근거하고 있는 인물과 단지 유사물에 지나지 않는 인물의 필연적인 소멸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주제가 생략되어 온 것이다. 벨라스케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표상을 구속하고 있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표상만이 순수한 표상으로서 자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8. 작품이 가지는 의미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 속에는 고전주의 시대의 표현법에 대한 표상과 그 표상이 우리 앞에 열어놓은 공간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사실상 그 표상은 자체의 모든 요소들(시선들, 얼굴들, 동작들) 속에서 표현되지만 이 확산의 와중에서 어쩔수 없이 지시된 하나의 본질적인 공백이 존재하게 된다. 표상이 근거하고 있는 인물과 단지 유사물에 지나지 않는 인물의 필연적인 소멸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주제가 생략되어 온 것이다. 벨라스케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표상을 구속하고 있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표상만이 순수한 표상으로서 자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