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목차
■태양 전지 동작 원리 및 구성
■태양전지의 종류
■투자 대비 경제성 평가
■ 태양전지의 숙원, 효율향상과 원가절감
■ 태양전지 많은 기술적 진보 이뤄
■태양전지의 종류
■투자 대비 경제성 평가
■ 태양전지의 숙원, 효율향상과 원가절감
■ 태양전지 많은 기술적 진보 이뤄
본문내용
잘 맞고 매우 강한 광흡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하의 이동도 등 전기적 물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Acceptor 물질로는, 그림 9(b)의 fullerene(C60) 자체 혹은 C60이 유기 용매에 잘 녹도록 설계된 PCBM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24그 외 단분자로 perylene, PTCBI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C60의 유도체들은 대체로 반도체 고분자와 복합하여 BHJ 구조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C60의 경우 진공 증착법을 이용하여 bilayer 구조의 소자에도 자주 쓰이고 있다. Perylene, PTCBI 등 단분자 물질은 bi-layer 구조에 주로 사용된다. Acceptor 물질은 가시광 영역에서 광흡수가 적어야 하며 동시에 donor와 비교하여 전자 친화도가 커야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5.기술적 난제
5.1 광 안정성 (Stability & Life Time)
유기물을 사용할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유기물 자체가 가지는 광 안정성 문제이다. 대부분의 유기물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광산화(photo- oxidation)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랫동안 빛에 노출되면 유기물의 색이 변하고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PPV 계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안정한 물질인
polythiophene(PT)과 polyfluorene(PF)계 물질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37,38 하지만 PT는 밴드갭도 작아(Eg < 2 eV) 태양전지로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PF는 밴드갭이 비교적 큰(Eg>2 eV) 물질로서 이용 가능한 빛의 파장이 다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PF의 경우, 작은 밴드갭을 가진 물질과 공중합체 형태로 합성을 하여, PF의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태양전
지용 물질로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또 한가지 방안으로 소자나 모듈 제조 시 자외선 blocking 층을 상부에 적층하여 유기물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결국, 광 안정성과 광 흡수성이 동시에 양호한 새로운 유기계 재료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볼수 있다.
5.2 유기물의 낮은 전하 이동도 및 전하 주입 (Mobility)
유기 태양전지의 광전류 및 효율을 제한하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벌크 상태에서 유기물의 exciton 및 전자, 정공의 낮은 전하 이동도이다. 유기물 반도체는 분자구조 상으로나 결정 구조적으로 결함이 많아 전하 이동도가 무기물에 비해서 매우 낮다. 예를 들면, 반도체 고분자/C60의 경우 매우 높은 전자-정공 분리효율에도 불구하고 광전류가 낮은 이유가 이러한 전하의 낮은 이동도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유기 반도체에서는 전자의 이동도가 정공의 이동도보다 일반적으로 낮은데, 이러한 낮은 전하 이동도는 유기 발광소자와 같은 유기 반도체 소자에서도 항상 문제시 되어왔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박막 제작 시 유기박막의 morphology를 개선하고 유기 반도체의 결정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추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자 형태에서 전극으로의 전하 주입의 원활함을 위해 전극과 유기 박막 사이에 buffer layer를 첨가하여 전극과 유기물 계면 사이의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5.3 태양광 스펙트럼 대비 유기물의 비효율적 광에너지 흡수대
유기 태양전지 제조용 물질 중 metallo-phthalocyanine 단분자가 어느 정도 태양광 스펙트럼에 다가서 있지만, 현재 유기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상당수의 물질들은 태양광 스펙트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파장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태양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광전하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높은 효율의 유기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 11은 태양광 스펙트럼의 에너지 분포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PV, P3HT 반도체 고분자의 광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다 태양광 AM 1.5 스펙트럼의 일부만 흡수하며
특히 장파장 부분의 흡수가 매우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파장 영역에 걸쳐 광흡수율이 높은 donor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즉, low band gap 물질의 개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최근에 보고된 APFO-Green1 같은 물질은 광흡수를 1000 nm까지 증가 시켰지만 효율은 여전히 높지 못하다. 이 경우 donor의전하이동도 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23 polythiophene 유도체들처럼 결정성이 우수하면서도 넓은 광흡수 범위를 갖는 물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6. 전망 및 결론
지금까지 나노박막형 유기 태양전지의 원리와 개발 동향, 문제점 등을 짚어 보았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값싸고 다양하며 종이처럼 얇아 손쉽게 대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flexible 태양전지”는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미래의 기술이 아님이 분명하다. 더욱이 현재 실용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flexible display”와 함께 사용하기에 알맞은 소자이다. 비록, 유기 태양전지의 효율이 현재 4~5%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유기 태양전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기술 발전 속도는 머지않아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의 수준보다 2배 정도의 효율 증가와 장기 안정성 확보시 급속한 실용화의 바람을 탈 것이 확실하다.
현재 유기 태양전지는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국내의 수준도 짧은 연구 역사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태양전지의 전반적인 시장과 기술 발전 추이에 비춰볼 때 현재의 유기 태양전지 기술은 기존의 다른 무기계 전지들에 비해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 있음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현황을 기회로 삼고 국내의 산업적 기반과 연구개발력을 십분 활용한다면 머지 않아 세계적인 결과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ceptor 물질로는, 그림 9(b)의 fullerene(C60) 자체 혹은 C60이 유기 용매에 잘 녹도록 설계된 PCBM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24그 외 단분자로 perylene, PTCBI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C60의 유도체들은 대체로 반도체 고분자와 복합하여 BHJ 구조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C60의 경우 진공 증착법을 이용하여 bilayer 구조의 소자에도 자주 쓰이고 있다. Perylene, PTCBI 등 단분자 물질은 bi-layer 구조에 주로 사용된다. Acceptor 물질은 가시광 영역에서 광흡수가 적어야 하며 동시에 donor와 비교하여 전자 친화도가 커야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5.기술적 난제
5.1 광 안정성 (Stability & Life Time)
유기물을 사용할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유기물 자체가 가지는 광 안정성 문제이다. 대부분의 유기물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광산화(photo- oxidation)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랫동안 빛에 노출되면 유기물의 색이 변하고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PPV 계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안정한 물질인
polythiophene(PT)과 polyfluorene(PF)계 물질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37,38 하지만 PT는 밴드갭도 작아(Eg < 2 eV) 태양전지로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PF는 밴드갭이 비교적 큰(Eg>2 eV) 물질로서 이용 가능한 빛의 파장이 다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PF의 경우, 작은 밴드갭을 가진 물질과 공중합체 형태로 합성을 하여, PF의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태양전
지용 물질로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또 한가지 방안으로 소자나 모듈 제조 시 자외선 blocking 층을 상부에 적층하여 유기물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결국, 광 안정성과 광 흡수성이 동시에 양호한 새로운 유기계 재료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볼수 있다.
5.2 유기물의 낮은 전하 이동도 및 전하 주입 (Mobility)
유기 태양전지의 광전류 및 효율을 제한하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벌크 상태에서 유기물의 exciton 및 전자, 정공의 낮은 전하 이동도이다. 유기물 반도체는 분자구조 상으로나 결정 구조적으로 결함이 많아 전하 이동도가 무기물에 비해서 매우 낮다. 예를 들면, 반도체 고분자/C60의 경우 매우 높은 전자-정공 분리효율에도 불구하고 광전류가 낮은 이유가 이러한 전하의 낮은 이동도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유기 반도체에서는 전자의 이동도가 정공의 이동도보다 일반적으로 낮은데, 이러한 낮은 전하 이동도는 유기 발광소자와 같은 유기 반도체 소자에서도 항상 문제시 되어왔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박막 제작 시 유기박막의 morphology를 개선하고 유기 반도체의 결정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추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자 형태에서 전극으로의 전하 주입의 원활함을 위해 전극과 유기 박막 사이에 buffer layer를 첨가하여 전극과 유기물 계면 사이의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5.3 태양광 스펙트럼 대비 유기물의 비효율적 광에너지 흡수대
유기 태양전지 제조용 물질 중 metallo-phthalocyanine 단분자가 어느 정도 태양광 스펙트럼에 다가서 있지만, 현재 유기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상당수의 물질들은 태양광 스펙트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파장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태양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광전하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높은 효율의 유기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 11은 태양광 스펙트럼의 에너지 분포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PV, P3HT 반도체 고분자의 광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다 태양광 AM 1.5 스펙트럼의 일부만 흡수하며
특히 장파장 부분의 흡수가 매우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파장 영역에 걸쳐 광흡수율이 높은 donor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즉, low band gap 물질의 개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최근에 보고된 APFO-Green1 같은 물질은 광흡수를 1000 nm까지 증가 시켰지만 효율은 여전히 높지 못하다. 이 경우 donor의전하이동도 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23 polythiophene 유도체들처럼 결정성이 우수하면서도 넓은 광흡수 범위를 갖는 물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6. 전망 및 결론
지금까지 나노박막형 유기 태양전지의 원리와 개발 동향, 문제점 등을 짚어 보았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값싸고 다양하며 종이처럼 얇아 손쉽게 대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flexible 태양전지”는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미래의 기술이 아님이 분명하다. 더욱이 현재 실용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flexible display”와 함께 사용하기에 알맞은 소자이다. 비록, 유기 태양전지의 효율이 현재 4~5%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유기 태양전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기술 발전 속도는 머지않아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의 수준보다 2배 정도의 효율 증가와 장기 안정성 확보시 급속한 실용화의 바람을 탈 것이 확실하다.
현재 유기 태양전지는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국내의 수준도 짧은 연구 역사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태양전지의 전반적인 시장과 기술 발전 추이에 비춰볼 때 현재의 유기 태양전지 기술은 기존의 다른 무기계 전지들에 비해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 있음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현황을 기회로 삼고 국내의 산업적 기반과 연구개발력을 십분 활용한다면 머지 않아 세계적인 결과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자료
 태양광 에어컨(Solar Aircon) 시스템
태양광 에어컨(Solar Aircon)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 태양열 풍력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해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 태양열 풍력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해양 에너지 ) 대체에너지 (태양광) 전망,국내외현황,가능성의 이유
대체에너지 (태양광) 전망,국내외현황,가능성의 이유 LG마이크론 태양광 연구개발 파트 지원자 자기소개서 [그룹사 인사팀 출신 현직 컨설턴트 작성]
LG마이크론 태양광 연구개발 파트 지원자 자기소개서 [그룹사 인사팀 출신 현직 컨설턴트 작성] 태양광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태양열에너지] 태양광 산업 전망과 업체들의 경쟁전략 보고서
[태양열에너지] 태양광 산업 전망과 업체들의 경쟁전략 보고서 [태양열에너지] 태양광 산업 전망과 업체들의 경쟁전략 PPT자료
[태양열에너지] 태양광 산업 전망과 업체들의 경쟁전략 PPT자료 태양광 산업의 동향
태양광 산업의 동향 태양광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에너지 장치] 건물부착 태양광시스템 BIPV
[에너지 장치] 건물부착 태양광시스템 BIPV 태양광 시스템 설명 및 사례 - 송도SC호텔 태양광 시스템 (BIPV 시공법).pptx
태양광 시스템 설명 및 사례 - 송도SC호텔 태양광 시스템 (BIPV 시공법).pptx 실험 5 예비(태양광에너지)
실험 5 예비(태양광에너지) 태양광 발표
태양광 발표 태양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설비) 실사례(벡스코 2전시장, 가야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태양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설비) 실사례(벡스코 2전시장, 가야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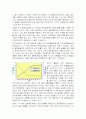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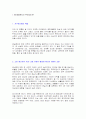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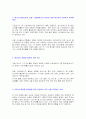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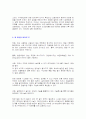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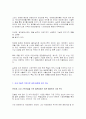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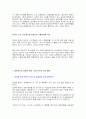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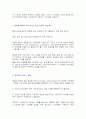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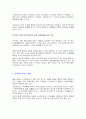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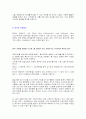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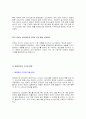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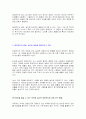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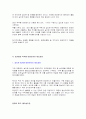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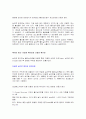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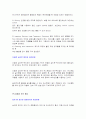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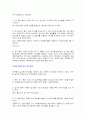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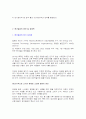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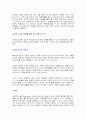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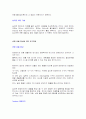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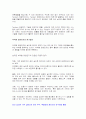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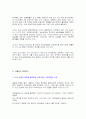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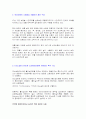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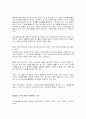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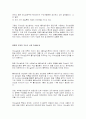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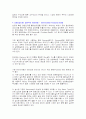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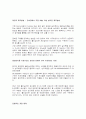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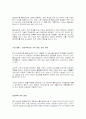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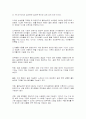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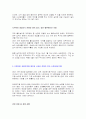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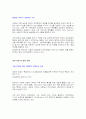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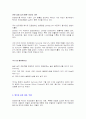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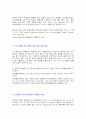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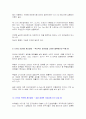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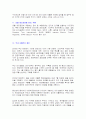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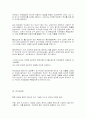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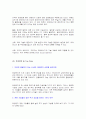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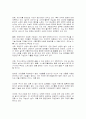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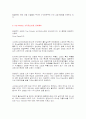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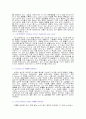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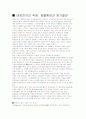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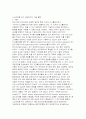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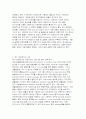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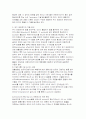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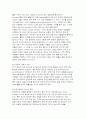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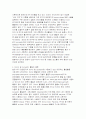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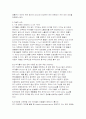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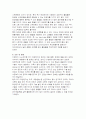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