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활동 대상
☀ 활동 주제
☀ 주제 선정 배경
☀ 활동 목표
☀ 선정 작품
☀ 관련 영역
☀ 활동흐름
<발전 심화>
☀ 활동 주제
☀ 주제 선정 배경
☀ 활동 목표
☀ 선정 작품
☀ 관련 영역
☀ 활동흐름
<발전 심화>
본문내용
림이나 글, 혹은 광고 문구를 작성해보자.
- 주제를 부각시켜줄 방법을 찾아보자.
7) 결과 적용응용수정
○ 적용할 문제 파악하기
- 자신이 경험했던 일과 수집했던 자료에서 유사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기.
-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편견이었는지 생각해보기.
○ 새로운 문제에 결과 적용하기
- 권고 포스터나 글에 자신이 의도했던 바가 잘 드러나 있는지 반성해보기
-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우리가 가지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가지기.
○ 적용 결과에 따라 도출 결과 수정하기
- (3번 작품과 연계) 피부색이 다른 다섯 사람을 한 사람의 초상화처럼 표현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서로 다른 다섯 사람을 한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둠별로 이야기 나누기.
- 친구들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그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
- 이번 탐구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
- 우리가 가지는 작은 편견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작은 편견이 크나큰 상처를 부르는 화가 되지는 않는가?
- 이번 탐구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말해보자. 바뀐 생각이 맘에 드는가? 맘에 든다면 왜 그러한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단일민족국가’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이러한 배타성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태로 이어졌다. 학교에서는 자신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하고, 직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 대우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진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아이들에게 자신과 다른 타인의 모습은 자칫 격심한 공포와 외면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미술 비평적 학습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타인을 ‘틀리다’의 개념이 아닌 ‘다르다’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발전 심화>
*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보기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거나, 선생님이 줄거리와 감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거대한 뿌리” - 김중미 (‘괭이부리말 아이들’ 작가)
혼혈인에 대한 이중태도 ‘고발’
도시 빈민촌에서 태어난 정아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와 묵묵히 폭력을 견디는 어머니 밑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자랐다. 지역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정아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봐온 ‘나’는 정아를 이주노동자 축제에 데려가는 등 세상의 다른 면을 보여주려고 애쓴다. 하지만 정아가 네팔 이주노동자 자히드의 아기를 가졌다는 말에 크게 당황한다. 정아와 자히드,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겪을 고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동두천에서 자란 ‘나’는 혼혈인 가족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곳에서 보낸 유년의 기억에는 첫사랑 재민도 있다. 백인 혼혈인 재민은 동네 사람들의 심한 멸시를 받았다.“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튀기가 뭐 어쨌다는 거야? 물건은 미제라면 사족을 못 쓰면서, 왜 우리 같은 애들은 싫어해?”(150쪽)
‘나’는 정아를 위해, 그리고 동두천에서의 기억이 시시때때로 가슴을 내리누르는 자신을 위해 중학생 때 떠나온 이후 한번도 가지 않았던 동두천을 찾아간다. 미국으로 간 줄 알았던 재민을 다시 만난 ‘나’가 그에게 털어놓는 속마음은 바로 작가의 목소리다. “재민아, 동두천은 말이야.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곳이야. 여기 살던 사람들에게 동두천은 특별한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중략)왜냐하면 동두천은 현실이거든. 이 땅 어디를 가도 지워버릴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거야.”(189쪽)
1963년생인 작가는 동두천에서 14살 때까지 살았다. “사춘기 이후 내 안에 큰 의미로 자리 잡은 동두천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쓰고 싶었다.”는 작가는 “동두천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1년 ‘작가들’에 발표했던 중편 분량의 소설을 다시 손질해 내놓은 그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걸맞게 사회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제를 부각시켜줄 방법을 찾아보자.
7) 결과 적용응용수정
○ 적용할 문제 파악하기
- 자신이 경험했던 일과 수집했던 자료에서 유사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기.
-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편견이었는지 생각해보기.
○ 새로운 문제에 결과 적용하기
- 권고 포스터나 글에 자신이 의도했던 바가 잘 드러나 있는지 반성해보기
-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우리가 가지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가지기.
○ 적용 결과에 따라 도출 결과 수정하기
- (3번 작품과 연계) 피부색이 다른 다섯 사람을 한 사람의 초상화처럼 표현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서로 다른 다섯 사람을 한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둠별로 이야기 나누기.
- 친구들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그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
- 이번 탐구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
- 우리가 가지는 작은 편견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작은 편견이 크나큰 상처를 부르는 화가 되지는 않는가?
- 이번 탐구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말해보자. 바뀐 생각이 맘에 드는가? 맘에 든다면 왜 그러한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단일민족국가’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이러한 배타성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태로 이어졌다. 학교에서는 자신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하고, 직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 대우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진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아이들에게 자신과 다른 타인의 모습은 자칫 격심한 공포와 외면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미술 비평적 학습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타인을 ‘틀리다’의 개념이 아닌 ‘다르다’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발전 심화>
*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보기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거나, 선생님이 줄거리와 감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거대한 뿌리” - 김중미 (‘괭이부리말 아이들’ 작가)
혼혈인에 대한 이중태도 ‘고발’
도시 빈민촌에서 태어난 정아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와 묵묵히 폭력을 견디는 어머니 밑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자랐다. 지역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정아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봐온 ‘나’는 정아를 이주노동자 축제에 데려가는 등 세상의 다른 면을 보여주려고 애쓴다. 하지만 정아가 네팔 이주노동자 자히드의 아기를 가졌다는 말에 크게 당황한다. 정아와 자히드,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겪을 고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동두천에서 자란 ‘나’는 혼혈인 가족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곳에서 보낸 유년의 기억에는 첫사랑 재민도 있다. 백인 혼혈인 재민은 동네 사람들의 심한 멸시를 받았다.“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튀기가 뭐 어쨌다는 거야? 물건은 미제라면 사족을 못 쓰면서, 왜 우리 같은 애들은 싫어해?”(150쪽)
‘나’는 정아를 위해, 그리고 동두천에서의 기억이 시시때때로 가슴을 내리누르는 자신을 위해 중학생 때 떠나온 이후 한번도 가지 않았던 동두천을 찾아간다. 미국으로 간 줄 알았던 재민을 다시 만난 ‘나’가 그에게 털어놓는 속마음은 바로 작가의 목소리다. “재민아, 동두천은 말이야.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곳이야. 여기 살던 사람들에게 동두천은 특별한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중략)왜냐하면 동두천은 현실이거든. 이 땅 어디를 가도 지워버릴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거야.”(189쪽)
1963년생인 작가는 동두천에서 14살 때까지 살았다. “사춘기 이후 내 안에 큰 의미로 자리 잡은 동두천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쓰고 싶었다.”는 작가는 “동두천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1년 ‘작가들’에 발표했던 중편 분량의 소설을 다시 손질해 내놓은 그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걸맞게 사회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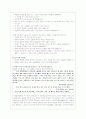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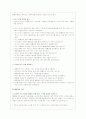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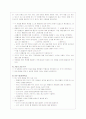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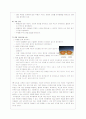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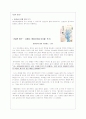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