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1. 머리말
2. 황금책갈피에 대한 감상
가. 균열의 무늬
나. 환각과 서정
다. 숭고의 비전
3. 맺음말
1. 머리말
2. 황금책갈피에 대한 감상
가. 균열의 무늬
나. 환각과 서정
다. 숭고의 비전
3. 맺음말
본문내용
향으로 인해 발생한 예술적 분화라고 설명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 시의 지형도는 다원주의의 발판으로 형성된 표현의 자유로부터 시작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4) 이원조의 포즈론과 전통시학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의 자각으로서의 포즈. 쉽게 말해 시를 쓰는 사람의 고정된 자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시를 쓰는 것이란 ‘어떠한 자세를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 주리론에서의 리란 결국 하나의 객관적 진리이고 곧 주체적 진리다. 이것은 문학에서 일정한 자세를 가지고 객관적 진리에 대응하는 주체의 진실성으로 대표된다. 문학자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는 이원조가 마르크시즘에서 절대 이념의 근대적 대안으로서의 포즈를 발견했듯이 한 개의 원리에 대한 집요한 갈망으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진리와 주체의 상관관계 안에서 진실한 자태로 인식 주체의 자아 역할이 강조된 매뉴얼을 찾고자 하는데 있겠다. 그것은 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변모하고 문학이 그 모습을 달리하더라도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진리가 반영된 자아의 갈망을 진실 되게 표현하는 것이 시선을 끄는 제스처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보다 이상적인 문학자의 자세에 가깝다는 말일 것이다. 이러한 이원조의 전통시학, 포즈론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시인에게 있어 잊지 말아야할 약속이 아닐까?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이고 진실 된 원리를 부정하고 사회에 아첨하며 스스로를 기만하는 삶에 익숙하고 또한 그러한 것이 반영된 시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인들에게 따끔한 질책이자 올바른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서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덧붙여 여기서의 포즈란 문학을 향한 고정된 자세, 문학을 떠난 인간이라는 개체가 지녀야할 의무자로서의 숭고한 미적 자세가 아닐까 고민해 본다.
(5)숭고와 동이적 상상력
화하적 상상력이 인간이 정한 규범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상상력이라면 동이적 상상력이란 인간 사유의 극한을 돌파한 신비적 비전의 숭고라는 것이 그 정의다. 가령 상희구 시인의 작품에서 모티브가 된 발해나 최정례 시인의 작품 속에서의 태양, 강태열 시인의 작품에서 나오는 우주가 그 예이다. 이들 작품 속에서 모티브가 된 동이적 상상력은 인간의 상상력 밖에 있는 어떠한 숭고미를 추구한다. 결국 이것은 고대적 사유를 바탕으로 오래된 낯선 이미지를 상상력의 새로운 차원으로 영입하고 문학의 새로운 전망을 선취하고자 하는 타자의 상상력이다.
그렇다면 이 타자의 상상력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의 사람과 그들이 살아가며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가 이룩한 무어인의 상상력일 것이다. 한마디로 시간이 창조한 무형의 예술가적 상상력이란 말이다. 마치 고대인이 유령이 되어 중천을 떠돌 때 현대인이 그것의 영감을 주워 사용한 것이라 보면 이해가 쉽겠다. 이와 관련 있는 말로 개미를 지은 소설가 베르메르는 예술가란 지상파나 우주를 떠도는 위성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나 마찬가지라고 한 말이 기억난다. 그렇듯 예술가, 여기서 시인은 과거가 만들어낸 수많은 무형의, 혹은 자신에게 내제된 파장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신하여 실체화한 것이 동이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이적 상상력이란 과거의 상상력이자 무형인이 발산하는 실체화 되지 않은 가능성의 에너지로서 실현의 주인은 살아있는 현대 예술가이며 - 이곳에서는 시인을 말하겠다. - 그리고 그들이 실체화한 작품 속의 숭고 미 또한 긴 긴 역사 속에서 자신을 이어가고자 했던 무형인이 발산한 무형어의 문자적 이미지라고 말하고 싶다.
3. 맺음말
책을 다 읽고 과제를 마무리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정성, 숭고의 미, 수사학, 기표와 기의’다. 현대시의 주된 특징인 서정성, 역사 속, 개인의 무의식에 잠재된 가능성을 개발해 현재의 미로 탈바꿈하는 송고의 미, 갖가지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이 담고 있는, 그중에서도 은유의 힘에 의지해 살아가는 현대의 수사학, 이미지로서의 기표와 의미로서의 기의가 만난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문자. 이 모든 것들이 섞이고 섞여 만들어진 시라는 장르. 그것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문자, 언어 그것만으로도 가슴 벅찬데, 무형에서 실오리를 뽑아 언어를 만들고 이것을 다시 꿰고 꿰어서 두터운 언어의 실을 만들고 다시 이것을 자수 놓듯이 한 땀 한 땀 떠서 그림 같은 시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신비로울 따름이다. 끝으로 이러한 배움의 장을 열어준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4) 이원조의 포즈론과 전통시학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의 자각으로서의 포즈. 쉽게 말해 시를 쓰는 사람의 고정된 자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시를 쓰는 것이란 ‘어떠한 자세를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 주리론에서의 리란 결국 하나의 객관적 진리이고 곧 주체적 진리다. 이것은 문학에서 일정한 자세를 가지고 객관적 진리에 대응하는 주체의 진실성으로 대표된다. 문학자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는 이원조가 마르크시즘에서 절대 이념의 근대적 대안으로서의 포즈를 발견했듯이 한 개의 원리에 대한 집요한 갈망으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진리와 주체의 상관관계 안에서 진실한 자태로 인식 주체의 자아 역할이 강조된 매뉴얼을 찾고자 하는데 있겠다. 그것은 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변모하고 문학이 그 모습을 달리하더라도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진리가 반영된 자아의 갈망을 진실 되게 표현하는 것이 시선을 끄는 제스처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보다 이상적인 문학자의 자세에 가깝다는 말일 것이다. 이러한 이원조의 전통시학, 포즈론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시인에게 있어 잊지 말아야할 약속이 아닐까?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이고 진실 된 원리를 부정하고 사회에 아첨하며 스스로를 기만하는 삶에 익숙하고 또한 그러한 것이 반영된 시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인들에게 따끔한 질책이자 올바른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서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덧붙여 여기서의 포즈란 문학을 향한 고정된 자세, 문학을 떠난 인간이라는 개체가 지녀야할 의무자로서의 숭고한 미적 자세가 아닐까 고민해 본다.
(5)숭고와 동이적 상상력
화하적 상상력이 인간이 정한 규범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상상력이라면 동이적 상상력이란 인간 사유의 극한을 돌파한 신비적 비전의 숭고라는 것이 그 정의다. 가령 상희구 시인의 작품에서 모티브가 된 발해나 최정례 시인의 작품 속에서의 태양, 강태열 시인의 작품에서 나오는 우주가 그 예이다. 이들 작품 속에서 모티브가 된 동이적 상상력은 인간의 상상력 밖에 있는 어떠한 숭고미를 추구한다. 결국 이것은 고대적 사유를 바탕으로 오래된 낯선 이미지를 상상력의 새로운 차원으로 영입하고 문학의 새로운 전망을 선취하고자 하는 타자의 상상력이다.
그렇다면 이 타자의 상상력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의 사람과 그들이 살아가며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가 이룩한 무어인의 상상력일 것이다. 한마디로 시간이 창조한 무형의 예술가적 상상력이란 말이다. 마치 고대인이 유령이 되어 중천을 떠돌 때 현대인이 그것의 영감을 주워 사용한 것이라 보면 이해가 쉽겠다. 이와 관련 있는 말로 개미를 지은 소설가 베르메르는 예술가란 지상파나 우주를 떠도는 위성의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나 마찬가지라고 한 말이 기억난다. 그렇듯 예술가, 여기서 시인은 과거가 만들어낸 수많은 무형의, 혹은 자신에게 내제된 파장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신하여 실체화한 것이 동이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이적 상상력이란 과거의 상상력이자 무형인이 발산하는 실체화 되지 않은 가능성의 에너지로서 실현의 주인은 살아있는 현대 예술가이며 - 이곳에서는 시인을 말하겠다. - 그리고 그들이 실체화한 작품 속의 숭고 미 또한 긴 긴 역사 속에서 자신을 이어가고자 했던 무형인이 발산한 무형어의 문자적 이미지라고 말하고 싶다.
3. 맺음말
책을 다 읽고 과제를 마무리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정성, 숭고의 미, 수사학, 기표와 기의’다. 현대시의 주된 특징인 서정성, 역사 속, 개인의 무의식에 잠재된 가능성을 개발해 현재의 미로 탈바꿈하는 송고의 미, 갖가지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이 담고 있는, 그중에서도 은유의 힘에 의지해 살아가는 현대의 수사학, 이미지로서의 기표와 의미로서의 기의가 만난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문자. 이 모든 것들이 섞이고 섞여 만들어진 시라는 장르. 그것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문자, 언어 그것만으로도 가슴 벅찬데, 무형에서 실오리를 뽑아 언어를 만들고 이것을 다시 꿰고 꿰어서 두터운 언어의 실을 만들고 다시 이것을 자수 놓듯이 한 땀 한 땀 떠서 그림 같은 시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신비로울 따름이다. 끝으로 이러한 배움의 장을 열어준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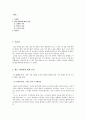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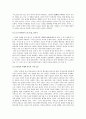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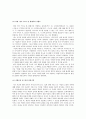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