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칭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두 작품은 서로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영화는 각색되면서 추가한 짧은 장면 감독은 여주인공의 표정이나 행동에 주목하며 심리상태를 그리는 표현기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작품 내내 주인공 신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들 \'준\'이고, 그가 죽은 후에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고 눈에 비치는 것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었다. 이런 그녀의 시선을 한번에 집중시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렁이였다.
을 통해 소설의 핵심인 ‘절대자 앞의 무력자 모티브’를 교차시키며 주제를 복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Hypertext
작품 중반부에 신애(전도연분)가 종찬(송강호분)과 목사님 등이 모인 자리에서 절규하는 부분이 있다. 뒤이어 신애는 주방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따라나간 종찬은 지렁이가 있을 뿐이라며, 비명을 지르는 신애를 진정시킨다.
선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적 텍스트 선형성(線形性)안에서 하나의 장면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장면의 수는 두 개다(앞, 뒤 장면). 이는 특정한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관련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한다.
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장면은 1차적인 의미 밖에 가질 수 없다. 예컨대 신애의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기 위한 극적 요소 한편, 영화에서 종찬이 실제로 지렁이를 들고 있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는데, 거기에서 과연 그곳에 지렁이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자세히 보면 신애는 주방의 설거지대 쪽을 보며 놀라는데 다음에 나타난 종찬의 시선은 엉뚱하게도 바닥을 향해 있는 채로 지렁이를 내
을 통해 소설의 핵심인 ‘절대자 앞의 무력자 모티브’를 교차시키며 주제를 복합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Hypertext
작품 중반부에 신애(전도연분)가 종찬(송강호분)과 목사님 등이 모인 자리에서 절규하는 부분이 있다. 뒤이어 신애는 주방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따라나간 종찬은 지렁이가 있을 뿐이라며, 비명을 지르는 신애를 진정시킨다.
선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적 텍스트 선형성(線形性)안에서 하나의 장면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장면의 수는 두 개다(앞, 뒤 장면). 이는 특정한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관련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한다.
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장면은 1차적인 의미 밖에 가질 수 없다. 예컨대 신애의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기 위한 극적 요소 한편, 영화에서 종찬이 실제로 지렁이를 들고 있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는데, 거기에서 과연 그곳에 지렁이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자세히 보면 신애는 주방의 설거지대 쪽을 보며 놀라는데 다음에 나타난 종찬의 시선은 엉뚱하게도 바닥을 향해 있는 채로 지렁이를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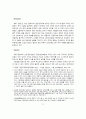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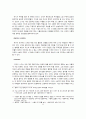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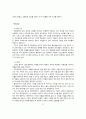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