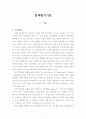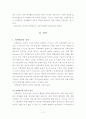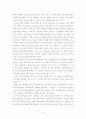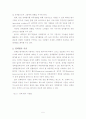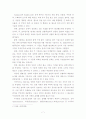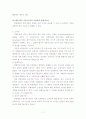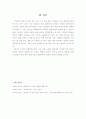본문내용
기준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실행가능성 기준의 개념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의 채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가기준들이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개념들의 관련성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대안의 궁극적인 가치는 그것이 채택되어 집행되는 경우 가져오게 될 편익의 정도와, 실제로 이러한 정책대안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한 정책대안의 가치는 그 대안의 소망성과 실행가능성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책대안의 소망성은 대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정도를 분석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실행가능성은 그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3) 윤리적 판단기준
정책대안의 분석에 있어서 어떤 정책대안의 소망성에 대한 평가는 사익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비추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소망성의 평가기준을 윤리적 판단기준이라고 부른다.
정책분석가가 정책분석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윤리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 첫째 유형은 목적론적(teleological)인 판단기준이고, 둘째 유형은 비목적론적(nonteleological)인 판단기준이다. Ducan MacRae, Jr. and James A. Wilde, Policy Analysis for Public Decisions, Belmont, California: Duxbury Press, 1979, pp.51-55.
목적론적 판단기준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 대안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결과가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 공헌도가 그 기준이 된다. 이러한 분석에는 인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과 지식이 더 중요시되는 판단의 기준이다.
한편 비목적론적인 판단의 기준은 성격상 금지적 및 의무적인 판단기준에 속하며 행동 대안이 가져올 결과와는 독립적인 판단기준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손실이 따르더라도 이러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수행하여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좋은 본보기이다. 일반적으로 비목적론적인 판단의 기준은 정치적 공약에 의하여 유래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제도적윤리적 특수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이 이와 같이 어떤 한 사회의 제도적윤리적 특수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회에서는 소망스러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회에서는 이것을 소망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동일한 사회에서도 과거에는 금지되어 있던 것이 현재에는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또 현재에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에는 정책대안을 분석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사항이 금지적 또는 의무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은 사회제도적 또는 사회 윤리적 상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파생되기도 한다. 산업이 발전하여 공해물질의 배출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의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널리 알려진 비목적론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에 대한 제한은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성격상으로 볼 때 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은 각 대안들이 창출해 낸 구체적인 결과의 상대적인 가치나 효용을 따지고 비교하는데 비해서,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다. 만일 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이 명시적이고 조작적인 것이 될 경우에는 대안의 평가결과는 계량적이며 연속적인 값을 취하는 경향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안들 간의 결과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가 가능하게 되고, 이로서 목적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 금전적 편익 등은 이러한 성격을 띄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비목적론적 평가의 기준에 의한 어떤 대안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불연속성을 띈다. 분석의 결과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었거나 또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가능하다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목적론적 판단의 기준과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이 동시에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통합되게 되면 ‘비목적론적인 제약(평가기준)하에서 목적론적 평가의 기준을 극대화’하라고 하는 형태를 띈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책 평가 기준들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본문에서도 봤듯이 정책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평가자에 따라서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넓게는 정책철학에 입각하여 광범위하게 평가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지표에 의해서 좁은 범위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대개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관련성이 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준의 아래 개념을 구성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기준들을 포괄하여 사용되는 한 차원 높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의미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와는 다른 의미를 띠기도 하고 서로 인과 관계에 있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정책평가기준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며 체계적, 연관성, 실현가능성, 시의성, 합법성, 창의성, 적정성, 반응성, 형평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평가기준을 넓고 광범위하게 살피는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노화준 (2002)《정책분석의 기초적 방법과 활용 5강》
노화준 (1991),《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이강래 (1984),《정책평가 기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어떤 정책대안의 궁극적인 가치는 그것이 채택되어 집행되는 경우 가져오게 될 편익의 정도와, 실제로 이러한 정책대안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한 정책대안의 가치는 그 대안의 소망성과 실행가능성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책대안의 소망성은 대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정도를 분석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실행가능성은 그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3) 윤리적 판단기준
정책대안의 분석에 있어서 어떤 정책대안의 소망성에 대한 평가는 사익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비추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소망성의 평가기준을 윤리적 판단기준이라고 부른다.
정책분석가가 정책분석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윤리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 첫째 유형은 목적론적(teleological)인 판단기준이고, 둘째 유형은 비목적론적(nonteleological)인 판단기준이다. Ducan MacRae, Jr. and James A. Wilde, Policy Analysis for Public Decisions, Belmont, California: Duxbury Press, 1979, pp.51-55.
목적론적 판단기준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 대안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결과가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 공헌도가 그 기준이 된다. 이러한 분석에는 인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과 지식이 더 중요시되는 판단의 기준이다.
한편 비목적론적인 판단의 기준은 성격상 금지적 및 의무적인 판단기준에 속하며 행동 대안이 가져올 결과와는 독립적인 판단기준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손실이 따르더라도 이러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수행하여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좋은 본보기이다. 일반적으로 비목적론적인 판단의 기준은 정치적 공약에 의하여 유래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제도적윤리적 특수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이 이와 같이 어떤 한 사회의 제도적윤리적 특수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회에서는 소망스러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회에서는 이것을 소망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동일한 사회에서도 과거에는 금지되어 있던 것이 현재에는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또 현재에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에는 정책대안을 분석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사항이 금지적 또는 의무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은 사회제도적 또는 사회 윤리적 상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파생되기도 한다. 산업이 발전하여 공해물질의 배출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의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널리 알려진 비목적론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에 대한 제한은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성격상으로 볼 때 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은 각 대안들이 창출해 낸 구체적인 결과의 상대적인 가치나 효용을 따지고 비교하는데 비해서,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다. 만일 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이 명시적이고 조작적인 것이 될 경우에는 대안의 평가결과는 계량적이며 연속적인 값을 취하는 경향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안들 간의 결과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가 가능하게 되고, 이로서 목적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 금전적 편익 등은 이러한 성격을 띄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비목적론적 평가의 기준에 의한 어떤 대안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불연속성을 띈다. 분석의 결과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었거나 또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가능하다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목적론적 판단의 기준과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이 동시에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통합되게 되면 ‘비목적론적인 제약(평가기준)하에서 목적론적 평가의 기준을 극대화’하라고 하는 형태를 띈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책 평가 기준들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본문에서도 봤듯이 정책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평가자에 따라서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넓게는 정책철학에 입각하여 광범위하게 평가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지표에 의해서 좁은 범위로 평가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대개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관련성이 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준의 아래 개념을 구성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기준들을 포괄하여 사용되는 한 차원 높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의미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와는 다른 의미를 띠기도 하고 서로 인과 관계에 있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정책평가기준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며 체계적, 연관성, 실현가능성, 시의성, 합법성, 창의성, 적정성, 반응성, 형평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평가기준을 넓고 광범위하게 살피는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노화준 (2002)《정책분석의 기초적 방법과 활용 5강》
노화준 (1991),《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이강래 (1984),《정책평가 기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