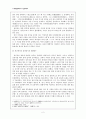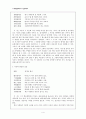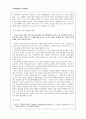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빈공제자란 누구인가?
Ⅲ. 빈공제자의 입당방식과 생활대우
Ⅳ. 빈공제자의 합격자 발표 방식
Ⅴ. 빈공제자의 재당기(在唐期) 시와 의미
Ⅵ. 빈공과와 신라 한문학의 관계
Ⅶ. 나오며
Ⅱ. 빈공제자란 누구인가?
Ⅲ. 빈공제자의 입당방식과 생활대우
Ⅳ. 빈공제자의 합격자 발표 방식
Ⅴ. 빈공제자의 재당기(在唐期) 시와 의미
Ⅵ. 빈공과와 신라 한문학의 관계
Ⅶ. 나오며
본문내용
기에 이르러서는 육조와 당나라 초의 문풍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다. 또한 통일 후 신라는 유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학을 세우고, <文選>을 교과서로 선정, 교수 방법, 학생의 선발요강 등을 발표하는 한편, 과거에 화랑제(花郞制)로 인물을 선발하던 방침을 고쳐서 독서삼품제(讀書三品制)에서는 고시과목으로써 <文選>을 채택하여 실시하였다. 지방의 관리까지도 독서 출신이나 당나라 유학생이 아니면 등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빈공제자들에 의하여 만당문풍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는 오로지 변문으로 일관되어 문장은 변문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미 전대(前代)에 불교는 이제 확고한 자리를 굳혀 신하나 귀족층을 형성한 승려나 화랑의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예술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무르익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타난 것이 이두(吏讀)와 그것을 표기수단으로 하는 향가문학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통일신라 때에는 빈공제자들이 등장하여 문단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Ⅶ. 나오며
지금까지 빈공제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이며, 이 시기를 담당했던 문학인들은 신라 육두품의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당에 건너갔고, 빈공과에 합격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지식인이었다. 그 지식인들이 바로 빈공제자이며, 특히 이들이 바로 이 땅의 한문학을 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빈공제자는 본국인 신라에서도 신분적인 차별을 당했지만, 당에서 벼슬을 하면서도 완전한 차별을 면치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에 가서도 고향에 대한 향수와 과거에 대한 압박, 그리고 자신이 육두품이라는 출신 성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그들의 작품 속에서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그들의 극복 방향이였지만 결국은 그들의 이상(理想)이였을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1. 이혜순(1984),「신라말 빈공제자의 시에 관하여」,『한국한문학연구』7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29면.
2. 유승민(1993),「賓貢諸子와 鄕歌 消滅과의 관련성에 대한 試考」, 동아어문논집.
3. 조성환(1995),『경주문화-최치원과 당대 빈공 제자의 특수 체체 고찰』, 경주문화원.
4. 이구의(2004),『최고운 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5. 최치원, 최준옥(편)(1973),『국역 고운선생문집』상.하, 민중서관.
Ⅶ. 나오며
지금까지 빈공제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이며, 이 시기를 담당했던 문학인들은 신라 육두품의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당에 건너갔고, 빈공과에 합격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지식인이었다. 그 지식인들이 바로 빈공제자이며, 특히 이들이 바로 이 땅의 한문학을 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빈공제자는 본국인 신라에서도 신분적인 차별을 당했지만, 당에서 벼슬을 하면서도 완전한 차별을 면치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에 가서도 고향에 대한 향수와 과거에 대한 압박, 그리고 자신이 육두품이라는 출신 성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그들의 작품 속에서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그들의 극복 방향이였지만 결국은 그들의 이상(理想)이였을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1. 이혜순(1984),「신라말 빈공제자의 시에 관하여」,『한국한문학연구』7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29면.
2. 유승민(1993),「賓貢諸子와 鄕歌 消滅과의 관련성에 대한 試考」, 동아어문논집.
3. 조성환(1995),『경주문화-최치원과 당대 빈공 제자의 특수 체체 고찰』, 경주문화원.
4. 이구의(2004),『최고운 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5. 최치원, 최준옥(편)(1973),『국역 고운선생문집』상.하, 민중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