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향악 정재의 대칭 개념이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당악은 순수한 가악(歌樂)으로 또는 정재의 반주음악으로 활발히 연주되었다.
현재 전하지 않는 ≪속악보≫의 당악곡 때의 수효보다 ≪경국대전≫에 소개된 당악곡이 많고, 영조 때의 ≪대악전보≫에는 그것이 세종 때의 음악이라고 하면서도 세종 때의 ≪속악보≫보다도 훨씬 적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까지 전승된 당악곡의 수효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당악은 주로 정재 반주에 많이 쓰였으나 그 밖에도 조하(朝賀) 때 전정헌가(殿庭軒架) 또는 회례연(會禮宴)에서도 쓰였다.
세종 때의 어전예연(御前禮宴)에서 향악은 동쪽에, 당악은 서쪽에 자리하여 동서로 갈라져 연주되었으나, 조선의 당악은 고려의 그것에 비하여 곡목과 사용 악기가 감소하여 변모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가속되는 당악의 향악화(鄕樂化)로 인하여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고려 때 들어온 당악 중 현재 전하는 곡은 〈보허자〉와 〈낙양춘〉뿐인데, 모두 향악화되었다.
즉, 오늘날 〈향당교주〉라고 불리며 연주되고 있는 곡은, 〈표정만방지곡 表正萬方之曲〉, 일명 〈관악영산회상 管樂靈山會相〉 또는 〈삼현영산회상 三絃靈山會相〉의 첫째 곡 〈상영산 上靈山〉의 처음 부분만을 변주해서 연주하고 그 이하는 원곡과 같은데, 이것은 춤의 장단에 알맞게 원곡의 리듬과 음고(音高) 박절(拍節)을 변형시킨 것이다.
-향악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사용되던 궁중음악의 한 갈래.
일명 속악(俗樂)이라고도 한다. 삼국시대에 당악(唐樂)이 유입된 뒤 외래의 당악과 토착음악인 향악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름지어졌다.
이 후 중국과 계속되는 음악교류를 통하여 송나라의 사악(詞樂)이 들어와 기존의 당악에 수용되고, 의식음악인 아악(雅樂)이 수입된 뒤로 궁중음악의 갈래는 아악과 당악·향악으로 나누어져 전승되었는데, 삼국시대 이후 조선 말까지의 향악용례 및 개념은 외래음악의 대칭어로서 한국전래음악을 지칭하였다.
이와 같은 향·당의 구분은 악기의 명칭에도 영향을 미쳐 당비파에 대한 향비파, 당피리에 대한 향피리와 같은 이름을 탄생시켰으며, 정재(呈才)의 경우에도 중국 전래의 것은 당악정재라 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전래의 것은 향악정재라 일컬어진다.
한편, 향악은 당악의 다른 명칭인 좌방악(左方樂)에 대하여 우방악(右方樂)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일본에서 당악은 좌방악으로, 삼국시대의 한반도 전래의 음악인 ‘고려악(高麗樂)’이 우방악으로 지칭되고 있는 점과 같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구분법은 조선시대에 들어 변화를 겪었다. 즉, 좌방의 자리는 고려시대에 수용된 아악이 차지하게 되고, 우방의 자리에 당악과 향악이 함께 합쳐진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당악의 향악화경향이 뚜렷해져서 음악내용의 변화는 물론, 악기의 사용면에서도 향악기와 당악기의 구분편성이 거의 모호해졌다. 오늘날의 음악 중 이상과 같은 향악전통을 잇고 있는 악곡으로는 종묘제례악의 〈정대업〉과 〈보태평〉·〈여민락〉·〈수제천〉·〈취타〉·〈영산회상〉이 대표적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음악은 ‘향악’이라는 명칭보다는 전통음악의 큰 범주로 악기편성의 특징에 따라 ‘향피리 중심의 음악’, ‘거문고 중심의 음악’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악과 민속악의 차이
1. 정악(아악)의 분류
(1) 영상회상
(2) 가곡(歌曲)
(3) 가사(歌詞)
(4) 시조
2. 민속악의 분류
(1) 산조
(2) 시나위
(3) 무속음악(무악)
(4) 민요(民謠)
(5) 잡가(雜歌)
(6) 풍물(농악놀이)
(7) 판소리
-정악
의미로는 아악, 당악, 민속악을 제외한 향악을 다 포함하여 정악이라고 한다. 아악이라는말은 원래 유교의 예악사상에서 나온말로 깨끗하고 바른 음악이란 뜻이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음악을 아악이라 일컬었는데 점점 우리나라 자신의 향악을 아악이라고도 일컫게 된다. 이는 우리 음악이 초기에는 중국 유교사상에 본받아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다가 음악까지 중국의 것을 수입하였으나 점차 우리의 음악이 주체적으로 발전을 하여 향악도 아악의 대열에 끼게 된 것이다. 또 중국음악의 특색을 지니던 아악도 점점 향악과 같은 풍으로 변하게 되어 아악과 정악을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고대 중국의 음악으로는 당대의 음악, 송대의 음악이 수입되었는데 중국에도 남아있지 않는 고대의 음악이 우리 나라에서 그 원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중국에서 수입된 음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화되고 보완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음악 자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당악으로는 <관악 보허자>와 <낙양춘> 단 2곡이다.
향악이란 중국음악이 수입되면서부터 쓰인 당악이라는 말과 상반된 의미 즉, 우리나라의 순수한 음악을 일컫는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정악곡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모든음악, 고려시대의 음악(중국음악이 아닌)과 조선 시대 만들어진 궁중음악이 이에 속한다. 향악으로는 <여민락>, <영산회상>, <수제천>과 같은 많은 곡이 전해지고 있다.
다시 아악과 정악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면 궁중에서 연회, 조회, 제사와 같은궁중의식에 쓰이던 음악은 아악, 선비들의 수양 음악을 정악이라고 보면 되고, 향악은 우리나라에서 작곡되고 불리어지는 모든 음악을 일컫는다고 보면 되겠다.
아악: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경모궁제례악, 수제천, 동동, 여민락, 보허자, 수연장 지곡, 취타 등
정악: 영산회상, 천년만세, 여러가지 가곡, 가사, 시조들
향악: 문묘제례악 등 몇가지 중국음악 외 모든 음악 영산회상(靈山會相)
-민속악
음악 민속악의 분류
현재 남아 있는 민속악은 거의 조선시대 후기 문화융성기에 형성된 음악형식이
그 전에는 민속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여러가지 책들 속에 가사만이 적혀서 남아 있다.
옛날에는 소리를 전해 줄 방법이 글씨로 남기는 방법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글로 남아있지 않는 오랜 옛날의 음악은 거의 알기가 힘들다. 다만 조선 시대 후기에 형성된 음악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당악은 순수한 가악(歌樂)으로 또는 정재의 반주음악으로 활발히 연주되었다.
현재 전하지 않는 ≪속악보≫의 당악곡 때의 수효보다 ≪경국대전≫에 소개된 당악곡이 많고, 영조 때의 ≪대악전보≫에는 그것이 세종 때의 음악이라고 하면서도 세종 때의 ≪속악보≫보다도 훨씬 적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까지 전승된 당악곡의 수효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당악은 주로 정재 반주에 많이 쓰였으나 그 밖에도 조하(朝賀) 때 전정헌가(殿庭軒架) 또는 회례연(會禮宴)에서도 쓰였다.
세종 때의 어전예연(御前禮宴)에서 향악은 동쪽에, 당악은 서쪽에 자리하여 동서로 갈라져 연주되었으나, 조선의 당악은 고려의 그것에 비하여 곡목과 사용 악기가 감소하여 변모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가속되는 당악의 향악화(鄕樂化)로 인하여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고려 때 들어온 당악 중 현재 전하는 곡은 〈보허자〉와 〈낙양춘〉뿐인데, 모두 향악화되었다.
즉, 오늘날 〈향당교주〉라고 불리며 연주되고 있는 곡은, 〈표정만방지곡 表正萬方之曲〉, 일명 〈관악영산회상 管樂靈山會相〉 또는 〈삼현영산회상 三絃靈山會相〉의 첫째 곡 〈상영산 上靈山〉의 처음 부분만을 변주해서 연주하고 그 이하는 원곡과 같은데, 이것은 춤의 장단에 알맞게 원곡의 리듬과 음고(音高) 박절(拍節)을 변형시킨 것이다.
-향악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사용되던 궁중음악의 한 갈래.
일명 속악(俗樂)이라고도 한다. 삼국시대에 당악(唐樂)이 유입된 뒤 외래의 당악과 토착음악인 향악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름지어졌다.
이 후 중국과 계속되는 음악교류를 통하여 송나라의 사악(詞樂)이 들어와 기존의 당악에 수용되고, 의식음악인 아악(雅樂)이 수입된 뒤로 궁중음악의 갈래는 아악과 당악·향악으로 나누어져 전승되었는데, 삼국시대 이후 조선 말까지의 향악용례 및 개념은 외래음악의 대칭어로서 한국전래음악을 지칭하였다.
이와 같은 향·당의 구분은 악기의 명칭에도 영향을 미쳐 당비파에 대한 향비파, 당피리에 대한 향피리와 같은 이름을 탄생시켰으며, 정재(呈才)의 경우에도 중국 전래의 것은 당악정재라 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전래의 것은 향악정재라 일컬어진다.
한편, 향악은 당악의 다른 명칭인 좌방악(左方樂)에 대하여 우방악(右方樂)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일본에서 당악은 좌방악으로, 삼국시대의 한반도 전래의 음악인 ‘고려악(高麗樂)’이 우방악으로 지칭되고 있는 점과 같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구분법은 조선시대에 들어 변화를 겪었다. 즉, 좌방의 자리는 고려시대에 수용된 아악이 차지하게 되고, 우방의 자리에 당악과 향악이 함께 합쳐진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당악의 향악화경향이 뚜렷해져서 음악내용의 변화는 물론, 악기의 사용면에서도 향악기와 당악기의 구분편성이 거의 모호해졌다. 오늘날의 음악 중 이상과 같은 향악전통을 잇고 있는 악곡으로는 종묘제례악의 〈정대업〉과 〈보태평〉·〈여민락〉·〈수제천〉·〈취타〉·〈영산회상〉이 대표적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음악은 ‘향악’이라는 명칭보다는 전통음악의 큰 범주로 악기편성의 특징에 따라 ‘향피리 중심의 음악’, ‘거문고 중심의 음악’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악과 민속악의 차이
1. 정악(아악)의 분류
(1) 영상회상
(2) 가곡(歌曲)
(3) 가사(歌詞)
(4) 시조
2. 민속악의 분류
(1) 산조
(2) 시나위
(3) 무속음악(무악)
(4) 민요(民謠)
(5) 잡가(雜歌)
(6) 풍물(농악놀이)
(7) 판소리
-정악
의미로는 아악, 당악, 민속악을 제외한 향악을 다 포함하여 정악이라고 한다. 아악이라는말은 원래 유교의 예악사상에서 나온말로 깨끗하고 바른 음악이란 뜻이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음악을 아악이라 일컬었는데 점점 우리나라 자신의 향악을 아악이라고도 일컫게 된다. 이는 우리 음악이 초기에는 중국 유교사상에 본받아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다가 음악까지 중국의 것을 수입하였으나 점차 우리의 음악이 주체적으로 발전을 하여 향악도 아악의 대열에 끼게 된 것이다. 또 중국음악의 특색을 지니던 아악도 점점 향악과 같은 풍으로 변하게 되어 아악과 정악을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고대 중국의 음악으로는 당대의 음악, 송대의 음악이 수입되었는데 중국에도 남아있지 않는 고대의 음악이 우리 나라에서 그 원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중국에서 수입된 음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화되고 보완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음악 자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당악으로는 <관악 보허자>와 <낙양춘> 단 2곡이다.
향악이란 중국음악이 수입되면서부터 쓰인 당악이라는 말과 상반된 의미 즉, 우리나라의 순수한 음악을 일컫는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정악곡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모든음악, 고려시대의 음악(중국음악이 아닌)과 조선 시대 만들어진 궁중음악이 이에 속한다. 향악으로는 <여민락>, <영산회상>, <수제천>과 같은 많은 곡이 전해지고 있다.
다시 아악과 정악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면 궁중에서 연회, 조회, 제사와 같은궁중의식에 쓰이던 음악은 아악, 선비들의 수양 음악을 정악이라고 보면 되고, 향악은 우리나라에서 작곡되고 불리어지는 모든 음악을 일컫는다고 보면 되겠다.
아악: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경모궁제례악, 수제천, 동동, 여민락, 보허자, 수연장 지곡, 취타 등
정악: 영산회상, 천년만세, 여러가지 가곡, 가사, 시조들
향악: 문묘제례악 등 몇가지 중국음악 외 모든 음악 영산회상(靈山會相)
-민속악
음악 민속악의 분류
현재 남아 있는 민속악은 거의 조선시대 후기 문화융성기에 형성된 음악형식이
그 전에는 민속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여러가지 책들 속에 가사만이 적혀서 남아 있다.
옛날에는 소리를 전해 줄 방법이 글씨로 남기는 방법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글로 남아있지 않는 오랜 옛날의 음악은 거의 알기가 힘들다. 다만 조선 시대 후기에 형성된 음악으로 추정된다
추천자료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교육배경과 교육필요성,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교수학습방법...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교육배경과 교육필요성,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교수학습방법... 초등학교 체육과(체육교육) 성격, 초등학교 체육과(체육교육) 필요성, 초등학교 체육과(체육...
초등학교 체육과(체육교육) 성격, 초등학교 체육과(체육교육) 필요성, 초등학교 체육과(체육... 초등학교 사회과(사회과교육) 시대변천과 성격, 초등학교 사회과(사회과교육) 편제와 시간배...
초등학교 사회과(사회과교육) 시대변천과 성격, 초등학교 사회과(사회과교육) 편제와 시간배...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목표와 성격,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필요성, 초등학교 ...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목표와 성격,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필요성, 초등학교 ... 초등학교 수학과(수학교육) 교육과정 변천과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수학교육) 내용체계와 단...
초등학교 수학과(수학교육) 교육과정 변천과 개정, 초등학교 수학과(수학교육) 내용체계와 단...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성격과 중점내용,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교육환경조성과 교...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성격과 중점내용,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교육환경조성과 교... 초등학교 음악과(음악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교육과정변천, 초등학교 음악과(음악교육)의 실...
초등학교 음악과(음악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교육과정변천, 초등학교 음악과(음악교육)의 실... 미국 초등학교의 언어교육과 미술교육 사례, 미국 초등학교의 원격교육과 인터넷활용교육 사...
미국 초등학교의 언어교육과 미술교육 사례, 미국 초등학교의 원격교육과 인터넷활용교육 사... 초등학교 실과교과(실과교육) 목표와 해석시각, 초등학교 실과교과(실과교육) 동향과 문제점,...
초등학교 실과교과(실과교육) 목표와 해석시각, 초등학교 실과교과(실과교육) 동향과 문제점,...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성격,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목표,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성격,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 목표,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성격과 목표,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말하기지도와 스토...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성격과 목표,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말하기지도와 스토...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학습자료활용교육과 교과용도서활용교육, 초등학교 영어과(영어...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학습자료활용교육과 교과용도서활용교육, 초등학교 영어과(영어...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성격,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학생특성을 반영한 교육방...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성격, 초등학교 영어과(영어교육)의 학생특성을 반영한 교육방... 초등학교 도덕과(도덕교육)의 특성, 초등학교 도덕과(도덕교육)의 도덕성발달이론, 초등학교 ...
초등학교 도덕과(도덕교육)의 특성, 초등학교 도덕과(도덕교육)의 도덕성발달이론, 초등학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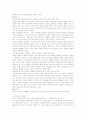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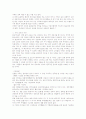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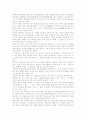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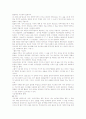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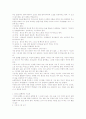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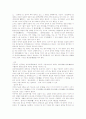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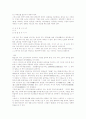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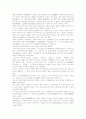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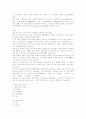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