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적합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역사 속에서의 사실들(물론 인간의 역사이지만)과 이어서 언급해 보자면 에보시를 후원하는 것은 장군가를 반역하려는 또 다른 봉건영주로 잠시 언급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또한 장군가(막부)가 일본의 본래의 지도자인 천황의 입장에서는 역시 반역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간 속의 반역의 논리들은 신들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것은 신성(神聖) 이라고 이름 붙여진 종교적 차원의 논리체계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 된다. (그리고 \'원령공주\'에서는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멧돼지들의 돌진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므로 미야자키의 원령공주는 자신의 이전 작품들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부터로부터 시작된 인간과 자연의 대립이라는 전체틀 속에서 인간 속의 권위체계들의 논리를 곧바로 자연과 인간의 대립 속에 적용해 놓고 있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들,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을 뿌리기 위해서 \'아시타카\'와 \'산\' 이라는 인물의 갈등과 화해를 집어넣고 있던 것이다.
다만 \'아시타카\'는 이미 중앙권력이나 막부시기에는 이미 잊혀져 버린 에미시족으로 등장하며 \'산\'은 어릴때부터 견신\'모로\'라는 이질적 존재에게 키워졌기에 인간의 사회속에 속한다기 보다는 자연계에 속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핸디캡을 안고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게 된다. 즉 두 사람의 존재는 모두 기존의 체제가 수용할 수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미 타자화 된 존재로서 스스로 커밍아웃한 이가 아니라면 인식하기 힘들다는 전제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다.(그러나 또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가치체계의 전제조건들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이다.) 둘 중 누가 더 인간에 가까운가라는 것을 묻는다면 대부분 아시타카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극중 약탈을 자행하는 사무라이들을 처치하는 씬에서의 아시타카를 보고서 사무라이들은 \'모노노케다\'라고 되뇌인다. 즉, 아시타카는 이미 동시대인들에게서 떨어져서 있는 귀신과 같은 존재이고 그것은 또한 \'산\'과 같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이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결론부분에서의 아시타카와 산과의 화해의 메시지는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라, 다행스럽게도 이것들은 모두 애니메이션 영화 속의 이야기들이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자연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작품들은 극단적인 회귀주의자들에게는 공허한 잠꼬대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야자키의 인터뷰 속에서는 원령공주라는 작품의 의도에 대해서 \'발전해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연이 더 이상 경외의 존재가 아니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예전부터 자신의 작품들 속에서 표현해내던 문명비판의 연장선상에서의 과정에 대한 탐색이기도 했다. 또한 그 과정은 전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은유적인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기도 하다. 결국 미야자키는 원령공주라는 작품을 통해서 본질적인 화해를 그려내기보다는 어정쩡한 타협의 논리로 다가가고 만다. 그것은 인간중심의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주인공들과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행위를 반복해서 그려냄으로 해서 빙둘러 말하는식의 타협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비주얼한 영상과 직설적인 인간비판의 대사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하고 있다.
5. 어설픈 타협의 논리
결론적으로 원령공주는 그 제목상으로는 인간의 논리로 해석된 자연을 그려내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대립을 적나라한 폭력과 적자생존의 논리(자연의 논리이기도 한)를 구현함으로 해서 스스로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를 가지려고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결론에서는 애매한 타협의 논리 (\'아시타카\'와 \'산\'의 화해는 인간과 자연의 화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립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만다. 이것은 일본역사 속에서의 반역과 타협의 논리를 적용시킨 결과이며 각기 다른 문화적 토양위에서 이기에 가능한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일본옷을 입고 일본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약간 어줍잖게 이야기하자면 머리로 일본인이 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일본인이 되어야만 느껴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캐치해 내는 것도 일본애니메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서 역사 속에서의 사실들(물론 인간의 역사이지만)과 이어서 언급해 보자면 에보시를 후원하는 것은 장군가를 반역하려는 또 다른 봉건영주로 잠시 언급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또한 장군가(막부)가 일본의 본래의 지도자인 천황의 입장에서는 역시 반역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간 속의 반역의 논리들은 신들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것은 신성(神聖) 이라고 이름 붙여진 종교적 차원의 논리체계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 된다. (그리고 \'원령공주\'에서는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멧돼지들의 돌진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므로 미야자키의 원령공주는 자신의 이전 작품들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부터로부터 시작된 인간과 자연의 대립이라는 전체틀 속에서 인간 속의 권위체계들의 논리를 곧바로 자연과 인간의 대립 속에 적용해 놓고 있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들,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을 뿌리기 위해서 \'아시타카\'와 \'산\' 이라는 인물의 갈등과 화해를 집어넣고 있던 것이다.
다만 \'아시타카\'는 이미 중앙권력이나 막부시기에는 이미 잊혀져 버린 에미시족으로 등장하며 \'산\'은 어릴때부터 견신\'모로\'라는 이질적 존재에게 키워졌기에 인간의 사회속에 속한다기 보다는 자연계에 속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핸디캡을 안고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게 된다. 즉 두 사람의 존재는 모두 기존의 체제가 수용할 수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미 타자화 된 존재로서 스스로 커밍아웃한 이가 아니라면 인식하기 힘들다는 전제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다.(그러나 또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가치체계의 전제조건들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이다.) 둘 중 누가 더 인간에 가까운가라는 것을 묻는다면 대부분 아시타카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극중 약탈을 자행하는 사무라이들을 처치하는 씬에서의 아시타카를 보고서 사무라이들은 \'모노노케다\'라고 되뇌인다. 즉, 아시타카는 이미 동시대인들에게서 떨어져서 있는 귀신과 같은 존재이고 그것은 또한 \'산\'과 같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이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결론부분에서의 아시타카와 산과의 화해의 메시지는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라, 다행스럽게도 이것들은 모두 애니메이션 영화 속의 이야기들이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자연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작품들은 극단적인 회귀주의자들에게는 공허한 잠꼬대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야자키의 인터뷰 속에서는 원령공주라는 작품의 의도에 대해서 \'발전해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연이 더 이상 경외의 존재가 아니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예전부터 자신의 작품들 속에서 표현해내던 문명비판의 연장선상에서의 과정에 대한 탐색이기도 했다. 또한 그 과정은 전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은유적인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기도 하다. 결국 미야자키는 원령공주라는 작품을 통해서 본질적인 화해를 그려내기보다는 어정쩡한 타협의 논리로 다가가고 만다. 그것은 인간중심의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주인공들과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행위를 반복해서 그려냄으로 해서 빙둘러 말하는식의 타협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비주얼한 영상과 직설적인 인간비판의 대사로 인해서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하고 있다.
5. 어설픈 타협의 논리
결론적으로 원령공주는 그 제목상으로는 인간의 논리로 해석된 자연을 그려내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대립을 적나라한 폭력과 적자생존의 논리(자연의 논리이기도 한)를 구현함으로 해서 스스로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를 가지려고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결론에서는 애매한 타협의 논리 (\'아시타카\'와 \'산\'의 화해는 인간과 자연의 화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립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만다. 이것은 일본역사 속에서의 반역과 타협의 논리를 적용시킨 결과이며 각기 다른 문화적 토양위에서 이기에 가능한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일본옷을 입고 일본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약간 어줍잖게 이야기하자면 머리로 일본인이 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일본인이 되어야만 느껴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캐치해 내는 것도 일본애니메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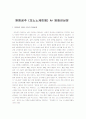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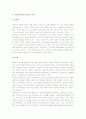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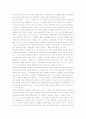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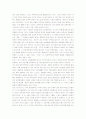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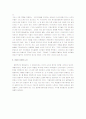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