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보면 정면의 좌우 협간은 벽체로 구획되어 있고, 부엌과 같은 판문을 달아 수장고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불전으로 사용되는 내부공간은 중앙 3칸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찰에서 명부전의 규모가 정면 5칸을 가질 만큼 크지 않다는 점과 좌우 협간이 기둥 간격도 좁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중건이나 중수과정에서 증축된 것이 아닌가 한다.
건축물의 세부 부재들은 비교적 장식적인 모습으로 처리되었다. 다포계 팔작집인 이 건물은 중앙 3칸에는 2개씩의 공간포를 두었다. 포는 바깥쪽으로 1추록을 받치고 있으나 안쪽으로는 출목없이 보아지를 두었다. 중앙 어간 기둥 위에는 용두 조각을 두었고 공포의 쇠서에는 연꽃과 봉두로 조각하여 장식적으로 처리하였다. 쇠서가 길게 뻗어나오고 장식적이며 내부를 보아지로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익공계의 포작처럼 보인다. 응진전보다 위격이 낮은 건물을 보다 더 장식적으로 처리한 수법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중창된 것을 알 수 있다.
금강계단
연못을 메우고 들어선 금강계단은 대웅전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통도사 창건의 근본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최상의 성지이며 전체 가람 배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실로 통도사는 이 금강계단이 있음으로해서 삼보 사찰가운데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불보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금강계단의 금강이란 말은 금강석 곧 다이아몬드를 의미한다. 어떤 물건이라도 금강석을 깨뜨릴 수 없지만 금강석은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이러한 금강석의 강인한 특징을 반야의 지혜를 표시하는 은유로 써왔다. 곧 반야의 지혜로 모든 번뇌,망상과 미혹의 뿌리를 끊어 버리므로 그 반야의 지혜가 금강석과 같다는 말이다.
금강계단은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최상의 성지이며 전체 가람배치의 중심을 이루는것을 몸으로 느낄수있었다. 계단주변에 석문과 석조담장을 둘러 불사리를 수호하고자 한 금강계단석문은 봉안의 정도를 넘어서 봉인의 의미로 까지 해석된다. 또한 금강계단의 석종 부도는 위아래 이중의 넓은 기단 중심부에 직경 1.5M정도의 복련과 앙련의 받침 대석을 놓고 그 위에 석종형 부도를 안치하한것이고 부도 표면에 비천과 사리함을 조각하여 옛 금강계단에 내려오는 설화를 증명해주는듯하였다.
반야의 지혜는 계, 정, 혜 삼학을 완성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이 삼학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은 계율의 실천에 있다. 계율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계율이란 그릇과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깨질 우려가 항상 있다. 그래서 계의 그릇은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보존해야 하는것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삼학의 결정체이며 반야의 물적 화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금강과 같이 견고하며 그 사리를 모시는 계단은 금강계단이라 부르는것이다.
기타..
부속 건물 및 유물
봉발탑
봉발탑은 통도사 경내의 석조물 가운데 유일한 국가 지정 문화재(보물 471호)로용화전 앞에 세워져있다. 전체 높이는 약 2.3M이며 네모난 지대석 위에 둥근 받침석을 놓고 그 위에 네 귀퉁이를 깎아 낸 4면체의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기둥위에 앙련이 새겨진 둥근 연화대가 있고 다시 구위에 뚜겅이 덮인 둥근 모양의 그릇을 올려 놓았다. 전체적으로 뚜껑이 약간 둥중해 보이기는 하나 그릇의 형태, 부분묘사가 사실적이어서 크기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며 받침대와도 시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있다.
이 봉발탑은 가섭존자가 석가의 발우와 가사를 미래불인 미륵불에게 바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불경의 내용을 상징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건조물의성격으로 미루어 볼때 그 명칭도 봉발탁이라고 하기보다는 석조 발우라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월교
일주문 앞에 있는 세 개의 무지개 석교로 구축한 다리이다. 이름은 불교의 상징인 마음을 뜻한다고 한다.
석당간
당간은 사찰 입구에 세우는 깃대의 일종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에 깃발을 달아 외부에 알려주는 시설이다 장간, 찰간, 기간, 번간, 등 여러 가지 명칭을 자기고있으며, 동, 철, 목, 석제등으로 구분한다.
통도사 당간은 기단부는 전체가 후대에 와서 중수 되었지만 지주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하에 매설된 2M가량은 원석 그대로 이며 지상 노출부분은 간공 을 뚫는 등 용도에 맞도록 가공한 상태로서 전체 높이는 7.54M이다.
석축의 상단부분에 콘크리트로 보수한자국이 유안으로 확인되었을때 문화제 보존 상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되었다.
건축물의 세부 부재들은 비교적 장식적인 모습으로 처리되었다. 다포계 팔작집인 이 건물은 중앙 3칸에는 2개씩의 공간포를 두었다. 포는 바깥쪽으로 1추록을 받치고 있으나 안쪽으로는 출목없이 보아지를 두었다. 중앙 어간 기둥 위에는 용두 조각을 두었고 공포의 쇠서에는 연꽃과 봉두로 조각하여 장식적으로 처리하였다. 쇠서가 길게 뻗어나오고 장식적이며 내부를 보아지로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익공계의 포작처럼 보인다. 응진전보다 위격이 낮은 건물을 보다 더 장식적으로 처리한 수법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중창된 것을 알 수 있다.
금강계단
연못을 메우고 들어선 금강계단은 대웅전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통도사 창건의 근본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최상의 성지이며 전체 가람 배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실로 통도사는 이 금강계단이 있음으로해서 삼보 사찰가운데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불보 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금강계단의 금강이란 말은 금강석 곧 다이아몬드를 의미한다. 어떤 물건이라도 금강석을 깨뜨릴 수 없지만 금강석은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이러한 금강석의 강인한 특징을 반야의 지혜를 표시하는 은유로 써왔다. 곧 반야의 지혜로 모든 번뇌,망상과 미혹의 뿌리를 끊어 버리므로 그 반야의 지혜가 금강석과 같다는 말이다.
금강계단은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최상의 성지이며 전체 가람배치의 중심을 이루는것을 몸으로 느낄수있었다. 계단주변에 석문과 석조담장을 둘러 불사리를 수호하고자 한 금강계단석문은 봉안의 정도를 넘어서 봉인의 의미로 까지 해석된다. 또한 금강계단의 석종 부도는 위아래 이중의 넓은 기단 중심부에 직경 1.5M정도의 복련과 앙련의 받침 대석을 놓고 그 위에 석종형 부도를 안치하한것이고 부도 표면에 비천과 사리함을 조각하여 옛 금강계단에 내려오는 설화를 증명해주는듯하였다.
반야의 지혜는 계, 정, 혜 삼학을 완성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이 삼학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은 계율의 실천에 있다. 계율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계율이란 그릇과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깨질 우려가 항상 있다. 그래서 계의 그릇은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보존해야 하는것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삼학의 결정체이며 반야의 물적 화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금강과 같이 견고하며 그 사리를 모시는 계단은 금강계단이라 부르는것이다.
기타..
부속 건물 및 유물
봉발탑
봉발탑은 통도사 경내의 석조물 가운데 유일한 국가 지정 문화재(보물 471호)로용화전 앞에 세워져있다. 전체 높이는 약 2.3M이며 네모난 지대석 위에 둥근 받침석을 놓고 그 위에 네 귀퉁이를 깎아 낸 4면체의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기둥위에 앙련이 새겨진 둥근 연화대가 있고 다시 구위에 뚜겅이 덮인 둥근 모양의 그릇을 올려 놓았다. 전체적으로 뚜껑이 약간 둥중해 보이기는 하나 그릇의 형태, 부분묘사가 사실적이어서 크기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며 받침대와도 시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있다.
이 봉발탑은 가섭존자가 석가의 발우와 가사를 미래불인 미륵불에게 바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불경의 내용을 상징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건조물의성격으로 미루어 볼때 그 명칭도 봉발탁이라고 하기보다는 석조 발우라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월교
일주문 앞에 있는 세 개의 무지개 석교로 구축한 다리이다. 이름은 불교의 상징인 마음을 뜻한다고 한다.
석당간
당간은 사찰 입구에 세우는 깃대의 일종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에 깃발을 달아 외부에 알려주는 시설이다 장간, 찰간, 기간, 번간, 등 여러 가지 명칭을 자기고있으며, 동, 철, 목, 석제등으로 구분한다.
통도사 당간은 기단부는 전체가 후대에 와서 중수 되었지만 지주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하에 매설된 2M가량은 원석 그대로 이며 지상 노출부분은 간공 을 뚫는 등 용도에 맞도록 가공한 상태로서 전체 높이는 7.54M이다.
석축의 상단부분에 콘크리트로 보수한자국이 유안으로 확인되었을때 문화제 보존 상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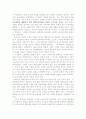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