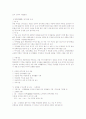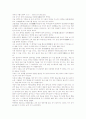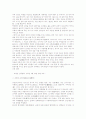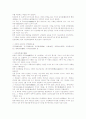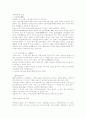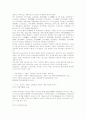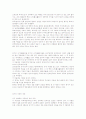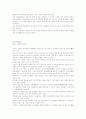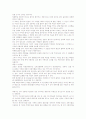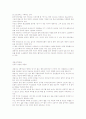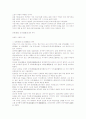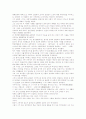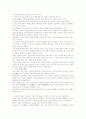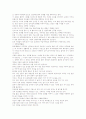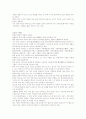목차
궁장현(弓藏峴) 쌈지공원 조성
□ 배 경
□ 방 침
□ 사업개요
□ 배 경
□ 방 침
□ 사업개요
본문내용
4시에서 6시까지 마음을 닦는 삼법수행을 하고 해맞이 경배를 드린다.
선식으로 아침을 들고 난 후 활쏘기와 검술 등 전통무예와 선무를 익힌다.
오후에는 솟대를 세우거나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법문 공부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또한 이 곳에는 일년에 한번, 가을 단풍 철을 전후하여 개천대제와 "열린 하늘 큰 마당"을 주제로 한 청학동단풍제라는 큰 행사가 열리는데 이 날은 한풀선사와 수자들이 북을 두드리고 말을 달리며 활 쏘는 시범과 전통무예를 일반인에게 선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무술이야말로 민족무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청학동(靑鶴洞)
동학(東學)의 교주였던 전북순창 출신의 강대성이 1945년 해방 이후 약간의 교주들을 데리고 와 이곳에서 생활하던 중, 강대성이 이단으로 몰려 옥사하게됨에 따라 대부분의 교주들이 이곳을 떠나게 되었으나, 1958년 서계룡이 교주 20여가구를 이끌고 들어와 다시 정착하게 되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상투를 올리고, 머리를 길게 땋고 잊혀진 옛 생활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언젠가는 그 이상의 세상이 여기에 올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
○ 청학동 계곡 이 계곡은 청학동 계곡과 회동 계곡물이 합류하여 횡천면 삼거리에 이르는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50리를 말한다.
계곡의 경치는 청학동으로 오를 수록 더욱 절경이다.
좌우로 둘러져 있는 울창한 숲과 깍아 세운 듯한 바위와 기암괴석은 기경을 이루며 맑은 물은 곳곳에 늪과 못을 이루어 진경을 보여 준다.
20리를 오르면 청암면 평촌이 한 폭의 그림 속에 나타난다.
깍아 지른 산들이 멀리 뒷걸음한 속에 넓은 분지가 시원하게 펼쳐지면서 계곡은 느린 걸음으로 산밑을 돌아 먼 산의 단풍이 짙게 물들어 있다.
이윽고, 계곡은 다시 좁아들면서 붉은 감들이 익어 여기저기 눈길을 끈다.
다시 깊은 계곡은 산과 마주하며 더 높게 더 깊게 아름다운 산천을 꾸며 가고 있다.
상이리 언덕 밑에는 여름에도 추위를 느끼는 늪이 있고 바위가 있다.
길에서 내려다보면 천길 낭떠러지 밑에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시퍼런 물은 쉬지 않고 바위 위를 흘러온다.
깍은듯한 벼랑에는 태고의 수림으로 엉켜 있고 조그마한 정자는 옛 향기를 풍긴다.
신라 경순왕을 추모하는 경춘묘도 있고, 고려유신 이색을 추모한 금남사도 있다.
산을 뚫고 올라오는 계곡의 물소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그 맑은 자태를 자랑하며 울창한 숲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다.
기암괴석이 물살과 어울려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낸다.
억조의 세월이 쌓여 바위는 부서지고 그 부서진 바위틈으로 낀 이끼는 꽂보다 곱다.
뒤돌아보면 점점이 모인 산봉우리들로 마치 구름 위에 서 있는 느낌을 준다.
다시 언덕을 내려오면 묵계리 계곡이다.
수많은 물줄기가 모이고 모여 폭포를 이루고 또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는 맑은 샘물은 계곡을 감돈다.
전하는 말에 이곳에 계곡을 걸쳐 절을 지었는데 절에서는 도무지 계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설화이다.
이로 인해 이곳을 묵계라고도 하며 영원한 신비의 대자연이 더욱 신비감을 뿜어내어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칠불암(七佛庵)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凡旺里)
칠불암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雙溪寺) 북쪽 20리쯤에 있다.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절로 처음엔 운상원(雲上院)또는 칠불암(七佛庵)이라 불렀다.
서기 97년 가락국의 김수로왕(金首露王)의 일곱 왕자(넷째에서 열번째 왕자)들이 출가해 가야산에 입산하여 3년간 수행한 뒤 두류산(頭流山-지리산)에 들어와 101년에 현재 칠불암 터(일설에는 운상원이라고 함)에 자리잡았다고 한다.
일곱 왕자는 출가한 지 6년만에 성불하여 김왕광불(金王光佛), 김왕동불(金王憧佛), 김왕상불(金王相佛), 김왕행불(金王行佛), 김왕향불(金王香佛), 김왕성불(金王性佛), 김왕공불(金王空佛)으로 불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불한 그곳을 칠불암이라 불렀다.
일곱 왕자는 모두 수로왕의 비인 허황옥(許黃玉)왕비의 소생이었다.
허왕비는 인도 아유다 왕국의 공주로서 A.D. 48년 석탑을 싣고 금관가야의 서울인 김해에 들어와 왕과 결혼하였다.
일곱 왕자는 지리산에 입산할 때 허왕비의 오라비인 장유화상(일명 寶玉禪師)과 동행했는데 그들이 그곳에 차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왕과 비가 아들을 보고자 지리산 운상원을 찾아 갈 때 그 경치가 가히 선경이라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다 간 곳이라 하여 대비마을이며, 그곳에 암자를 지어 대비암이라 하였다.
화개에서 칠불까지 가는 계곡 곳곳에 칠왕자와 수로왕, 허왕후와 연관된 마을 이름이 수두룩하며 많은 전설이 묻어 있는 곳이다칠불암 아자방(亞字房)
칠불암 경내에 위치한 승방으로 남북 장방형으로 놓인 정면 5칸, 측면 2칸 맞배집인데 남쪽 2칸은 부엌으로 되어 있고 북쪽 3칸은 방인데 방의 서쪽은 퇴칸을 두어 툇마루를 달아냈다.
그런데 여기 3칸 온돌방의 평면이 아자(亞字)로 되어 안쪽 十字 부분은 한 단 낮게 꾸미고, 네 귀와 남북 변은 바닥을 높게 꾸며서 걸터앉기 쉽게 하였다.
1981년 해체 수리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부엌 벽 중앙부에 큰 부뚜막 아궁이를 두어 불길이 부채살 방향으로 들어가 남북으로 놓인 줄 고래를 통하여 북벽 밖 중앙에 있는 굴뚝 쪽으로 유도되었다.
구들골과 굴뚝의 폭은 거의 같이 30cm 내외였고 둑의 높이는 30cm 이상인데 특히 앞서 기술한 높은 부분은 더 높여 구들장이 높게 얹히도록 하였다.
이 아자방(亞字房)은 그 동안 신비의 구들로 알려졌으나 몇 번에 걸쳐 수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어 본래의 구법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부엌과 방의 높이 차가 약 1.8m나 되어 불길이 잘 들도 록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디 이름이 벽안당이었던 건물로 신라 효공왕 때 구들도사로 불리던 담공선사가 구들을 놓으면서 버금 아(亞)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공간은 한꺼번에 50명의 스님이 벽을 보고 참선할 수 있는 크기인데, 이 온돌방은 한 번 불을 때면 한 달 반 동안이나 따뜻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전 쟁때 불탄 뒤 그 터만 겨우 보존되고 있다가, 1982년에 복원되었다.
선식으로 아침을 들고 난 후 활쏘기와 검술 등 전통무예와 선무를 익힌다.
오후에는 솟대를 세우거나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법문 공부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또한 이 곳에는 일년에 한번, 가을 단풍 철을 전후하여 개천대제와 "열린 하늘 큰 마당"을 주제로 한 청학동단풍제라는 큰 행사가 열리는데 이 날은 한풀선사와 수자들이 북을 두드리고 말을 달리며 활 쏘는 시범과 전통무예를 일반인에게 선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무술이야말로 민족무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청학동(靑鶴洞)
동학(東學)의 교주였던 전북순창 출신의 강대성이 1945년 해방 이후 약간의 교주들을 데리고 와 이곳에서 생활하던 중, 강대성이 이단으로 몰려 옥사하게됨에 따라 대부분의 교주들이 이곳을 떠나게 되었으나, 1958년 서계룡이 교주 20여가구를 이끌고 들어와 다시 정착하게 되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상투를 올리고, 머리를 길게 땋고 잊혀진 옛 생활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언젠가는 그 이상의 세상이 여기에 올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
○ 청학동 계곡 이 계곡은 청학동 계곡과 회동 계곡물이 합류하여 횡천면 삼거리에 이르는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50리를 말한다.
계곡의 경치는 청학동으로 오를 수록 더욱 절경이다.
좌우로 둘러져 있는 울창한 숲과 깍아 세운 듯한 바위와 기암괴석은 기경을 이루며 맑은 물은 곳곳에 늪과 못을 이루어 진경을 보여 준다.
20리를 오르면 청암면 평촌이 한 폭의 그림 속에 나타난다.
깍아 지른 산들이 멀리 뒷걸음한 속에 넓은 분지가 시원하게 펼쳐지면서 계곡은 느린 걸음으로 산밑을 돌아 먼 산의 단풍이 짙게 물들어 있다.
이윽고, 계곡은 다시 좁아들면서 붉은 감들이 익어 여기저기 눈길을 끈다.
다시 깊은 계곡은 산과 마주하며 더 높게 더 깊게 아름다운 산천을 꾸며 가고 있다.
상이리 언덕 밑에는 여름에도 추위를 느끼는 늪이 있고 바위가 있다.
길에서 내려다보면 천길 낭떠러지 밑에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시퍼런 물은 쉬지 않고 바위 위를 흘러온다.
깍은듯한 벼랑에는 태고의 수림으로 엉켜 있고 조그마한 정자는 옛 향기를 풍긴다.
신라 경순왕을 추모하는 경춘묘도 있고, 고려유신 이색을 추모한 금남사도 있다.
산을 뚫고 올라오는 계곡의 물소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그 맑은 자태를 자랑하며 울창한 숲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다.
기암괴석이 물살과 어울려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낸다.
억조의 세월이 쌓여 바위는 부서지고 그 부서진 바위틈으로 낀 이끼는 꽂보다 곱다.
뒤돌아보면 점점이 모인 산봉우리들로 마치 구름 위에 서 있는 느낌을 준다.
다시 언덕을 내려오면 묵계리 계곡이다.
수많은 물줄기가 모이고 모여 폭포를 이루고 또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는 맑은 샘물은 계곡을 감돈다.
전하는 말에 이곳에 계곡을 걸쳐 절을 지었는데 절에서는 도무지 계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설화이다.
이로 인해 이곳을 묵계라고도 하며 영원한 신비의 대자연이 더욱 신비감을 뿜어내어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칠불암(七佛庵)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凡旺里)
칠불암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雙溪寺) 북쪽 20리쯤에 있다.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절로 처음엔 운상원(雲上院)또는 칠불암(七佛庵)이라 불렀다.
서기 97년 가락국의 김수로왕(金首露王)의 일곱 왕자(넷째에서 열번째 왕자)들이 출가해 가야산에 입산하여 3년간 수행한 뒤 두류산(頭流山-지리산)에 들어와 101년에 현재 칠불암 터(일설에는 운상원이라고 함)에 자리잡았다고 한다.
일곱 왕자는 출가한 지 6년만에 성불하여 김왕광불(金王光佛), 김왕동불(金王憧佛), 김왕상불(金王相佛), 김왕행불(金王行佛), 김왕향불(金王香佛), 김왕성불(金王性佛), 김왕공불(金王空佛)으로 불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불한 그곳을 칠불암이라 불렀다.
일곱 왕자는 모두 수로왕의 비인 허황옥(許黃玉)왕비의 소생이었다.
허왕비는 인도 아유다 왕국의 공주로서 A.D. 48년 석탑을 싣고 금관가야의 서울인 김해에 들어와 왕과 결혼하였다.
일곱 왕자는 지리산에 입산할 때 허왕비의 오라비인 장유화상(일명 寶玉禪師)과 동행했는데 그들이 그곳에 차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왕과 비가 아들을 보고자 지리산 운상원을 찾아 갈 때 그 경치가 가히 선경이라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다 간 곳이라 하여 대비마을이며, 그곳에 암자를 지어 대비암이라 하였다.
화개에서 칠불까지 가는 계곡 곳곳에 칠왕자와 수로왕, 허왕후와 연관된 마을 이름이 수두룩하며 많은 전설이 묻어 있는 곳이다칠불암 아자방(亞字房)
칠불암 경내에 위치한 승방으로 남북 장방형으로 놓인 정면 5칸, 측면 2칸 맞배집인데 남쪽 2칸은 부엌으로 되어 있고 북쪽 3칸은 방인데 방의 서쪽은 퇴칸을 두어 툇마루를 달아냈다.
그런데 여기 3칸 온돌방의 평면이 아자(亞字)로 되어 안쪽 十字 부분은 한 단 낮게 꾸미고, 네 귀와 남북 변은 바닥을 높게 꾸며서 걸터앉기 쉽게 하였다.
1981년 해체 수리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부엌 벽 중앙부에 큰 부뚜막 아궁이를 두어 불길이 부채살 방향으로 들어가 남북으로 놓인 줄 고래를 통하여 북벽 밖 중앙에 있는 굴뚝 쪽으로 유도되었다.
구들골과 굴뚝의 폭은 거의 같이 30cm 내외였고 둑의 높이는 30cm 이상인데 특히 앞서 기술한 높은 부분은 더 높여 구들장이 높게 얹히도록 하였다.
이 아자방(亞字房)은 그 동안 신비의 구들로 알려졌으나 몇 번에 걸쳐 수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어 본래의 구법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부엌과 방의 높이 차가 약 1.8m나 되어 불길이 잘 들도 록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디 이름이 벽안당이었던 건물로 신라 효공왕 때 구들도사로 불리던 담공선사가 구들을 놓으면서 버금 아(亞)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공간은 한꺼번에 50명의 스님이 벽을 보고 참선할 수 있는 크기인데, 이 온돌방은 한 번 불을 때면 한 달 반 동안이나 따뜻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전 쟁때 불탄 뒤 그 터만 겨우 보존되고 있다가, 1982년에 복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