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1.1 서 론
▶2. 본 론
2.1 실루엣으로 남아있는 유년시절과 꺼지지 않는 불빛
2.2 방랑과 정착의 경계 '목계장터'
2.3 낙타의 혹을 안고 살았던 사막의 밤길에 서다
2.4 <참고자료>신경림 산문 '나는 왜 시를 쓰는가'(전문)
▶3. 결 론
참고문헌
1.1 서 론
▶2. 본 론
2.1 실루엣으로 남아있는 유년시절과 꺼지지 않는 불빛
2.2 방랑과 정착의 경계 '목계장터'
2.3 낙타의 혹을 안고 살았던 사막의 밤길에 서다
2.4 <참고자료>신경림 산문 '나는 왜 시를 쓰는가'(전문)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못했던 것 같다. 단 한 편도 발표하지 못하면서도 어쩌다 노트 조각 같은 데 시를 끄적였으니 말이다.
그때 그렇게 끄적였던 작품이 ‘눈길’, ‘그날’ 같은 시다. 뿐 아니다. 고(故) 김관식 시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우리 서울 가서 함께 좋은 시 한번 써보자는 권고를 받았을 때 나는 환호작약했다. 그의 말에 큰 무게가 실려 있지 않음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를 따라 무조건 상경했다. 갑자기 시를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상경해서 처음 쓴 시가 ‘겨울밤’이다. 이 시가 신문에 나오자 친구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 초기 시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 친구는 너무 오랫동안 시를 쓰지 않아 시에 대한 감각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는 투로 말했다. 그래도 나는 몇 해 동안 시골서 다시 글 쓸 기회가 오면 쓰겠다고 생각한 대로 시를 썼으니, 여기에는 내 시를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의 격려도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이때 내가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시는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 생각은 날이 가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이 무렵에도 나는 여기저기서 만난 사회과학 공부하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는데, 이들의 생각과 떠돌이 생활 10년에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서로 같았다.
이때 쓴 시들이 시집 ‘農舞(농무)’에 들어 있는 시들이다.
시는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나는 한동안 이 명제에 충실했다. 결국 반유신, 반군사독재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내 시는 그 무기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과격한 생각까지 했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아름다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시를 쓰고 싶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이 드러나면 동료나 후배는 나를 문학주의자로 매도했다.
이 매도를 감수하면서 내 시는 경직되었던 것 같다. 문득 나는 시를 쓰기가 싫어졌고, 지루해졌다. 내가 민요에 몰두한 것은 이 무렵부터가 아니었나 싶다. 민요적 정서를 시 속에 도입, 내 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보자는 의도였는데, 민요와의 접목은 내 시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민요는 역시 지난날의 정서요 그 말들은 오늘 살아있는 말이 되기 어려웠던 터이다. 80년대 전기간이 내게는 시 쓰기가 가장 어렵고 지루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
시집 ‘길’ 속의 시를 쓰면서 나는 서서히 민요의 중압에서 헤어났다. 고지식하게 민요 어쩌고 할 것이 아니라 민요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배울 것이 없으면 배우지 말자는 생각이 든 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란 명제도 그렇다. 그것도 그 시대의 삶에 깊이 뿌리박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 이상의 대답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오늘의 내 삶, 우리들의 삶에 충실한 시를 쓰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시 쓰는 일이 조금씩 편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새로 낸 시집 ‘뿔’의 후기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나는 나무를 심는 기분으로 시를 쓴다. 내가 심은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단 열매를 맺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보고도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들 무슨 상관이랴,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보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줄 것인데. 하지만 그 나무는 오늘의 내 삶, 우리들의 삶이 심은 나무요 키워낸 나무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나는 잊지 않고 있다. 신경림, 『낙타』, 창비, 2008, p119
3. 결 론
앞서 살펴본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목계장터』,『낙타』를 통해 우리는 작품 속에 녹아든 작가의 방랑벽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정착\'과 \'방랑\'의 경계에 놓여진 존재가 아닐까 싶다.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간 머물며 사색에 잠기고, 주변의 사물들을 탐구하고, 속세에 젖어있는 도시와 소통을 단절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이번에 조사하게 된 신경림은 그와 반대로 주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그것들을 언어로 빚어내었다. 그 빚어낸 언어들 마다에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난의 서글픔,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잘 반죽해냈다. 그런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방랑의 경계에 치우쳐진 신경림 작가의 삶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가 않다. 최근 발간된 시집 \'낙타\'는 그가 여행했던 수많은 나라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시집으로 남겨져있었고 그는 또다시 떠난다. 떠날 것이다.
이번 발표를 위해 조사한 조원들은 하나 같이 공통점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신경림의 방랑적인 삶으로 이루어진 문학적 가치관을 평가하였고 최근 신작부터 첫 시집까지 한결 같이 살아온 작가의식에 감탄을 하였다.
시인의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방랑을 바라보는 정착의 시선은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그것은 신경림 작품이 주는 메시지이다. 시를 읽다보면 우리는 가보지 않은 곳에 가있으며, 보지 못한 것을 언어라는 매체로 읽어낼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러한 \'방랑벽\'의 삶 속에서 작품을 썼던 그의 구체적인 여행기가 담겨있는 서적들이나, 기행문학을 집필했던 작품들에 대해 좀 더 재해석 해보고 그의 구체적인 삶의 배경까지 미루어 알아본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많은 것을 조사하기보다는 기행문학이라는 큰 부분에서 어쩌면 가장 크게 차지할 지도 모르는 작가 신경 림의 방랑을 찾아낸 것은 보다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번 과제를 통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렇게 다가가는 작가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정착\'과 \'방랑\'을 같이 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독자가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자료
1.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신경림 저, 창비, 1998)
2. 목계장터 (신경림 저, 찾을목, 1997)
3. 낙타 (신경림 저, 창비, 2008)
4. 신경림 시의 창작방법 연구 (공광규 저, 푸른사상, 2005)
5. 신경림 문학의 세계 (구중서 외 저, 창작과 비평사, 1995)
그때 그렇게 끄적였던 작품이 ‘눈길’, ‘그날’ 같은 시다. 뿐 아니다. 고(故) 김관식 시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우리 서울 가서 함께 좋은 시 한번 써보자는 권고를 받았을 때 나는 환호작약했다. 그의 말에 큰 무게가 실려 있지 않음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를 따라 무조건 상경했다. 갑자기 시를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상경해서 처음 쓴 시가 ‘겨울밤’이다. 이 시가 신문에 나오자 친구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 초기 시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 친구는 너무 오랫동안 시를 쓰지 않아 시에 대한 감각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는 투로 말했다. 그래도 나는 몇 해 동안 시골서 다시 글 쓸 기회가 오면 쓰겠다고 생각한 대로 시를 썼으니, 여기에는 내 시를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의 격려도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이때 내가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시는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 생각은 날이 가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이 무렵에도 나는 여기저기서 만난 사회과학 공부하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는데, 이들의 생각과 떠돌이 생활 10년에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서로 같았다.
이때 쓴 시들이 시집 ‘農舞(농무)’에 들어 있는 시들이다.
시는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나는 한동안 이 명제에 충실했다. 결국 반유신, 반군사독재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내 시는 그 무기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과격한 생각까지 했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아름다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시를 쓰고 싶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이 드러나면 동료나 후배는 나를 문학주의자로 매도했다.
이 매도를 감수하면서 내 시는 경직되었던 것 같다. 문득 나는 시를 쓰기가 싫어졌고, 지루해졌다. 내가 민요에 몰두한 것은 이 무렵부터가 아니었나 싶다. 민요적 정서를 시 속에 도입, 내 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보자는 의도였는데, 민요와의 접목은 내 시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민요는 역시 지난날의 정서요 그 말들은 오늘 살아있는 말이 되기 어려웠던 터이다. 80년대 전기간이 내게는 시 쓰기가 가장 어렵고 지루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
시집 ‘길’ 속의 시를 쓰면서 나는 서서히 민요의 중압에서 헤어났다. 고지식하게 민요 어쩌고 할 것이 아니라 민요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배울 것이 없으면 배우지 말자는 생각이 든 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란 명제도 그렇다. 그것도 그 시대의 삶에 깊이 뿌리박는 것으로 충분하지 그 이상의 대답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오늘의 내 삶, 우리들의 삶에 충실한 시를 쓰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시 쓰는 일이 조금씩 편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새로 낸 시집 ‘뿔’의 후기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나는 나무를 심는 기분으로 시를 쓴다. 내가 심은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단 열매를 맺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보고도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들 무슨 상관이랴,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보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줄 것인데. 하지만 그 나무는 오늘의 내 삶, 우리들의 삶이 심은 나무요 키워낸 나무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나는 잊지 않고 있다. 신경림, 『낙타』, 창비, 2008, p119
3. 결 론
앞서 살펴본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목계장터』,『낙타』를 통해 우리는 작품 속에 녹아든 작가의 방랑벽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정착\'과 \'방랑\'의 경계에 놓여진 존재가 아닐까 싶다.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간 머물며 사색에 잠기고, 주변의 사물들을 탐구하고, 속세에 젖어있는 도시와 소통을 단절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이번에 조사하게 된 신경림은 그와 반대로 주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그것들을 언어로 빚어내었다. 그 빚어낸 언어들 마다에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난의 서글픔,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잘 반죽해냈다. 그런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방랑의 경계에 치우쳐진 신경림 작가의 삶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가 않다. 최근 발간된 시집 \'낙타\'는 그가 여행했던 수많은 나라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시집으로 남겨져있었고 그는 또다시 떠난다. 떠날 것이다.
이번 발표를 위해 조사한 조원들은 하나 같이 공통점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신경림의 방랑적인 삶으로 이루어진 문학적 가치관을 평가하였고 최근 신작부터 첫 시집까지 한결 같이 살아온 작가의식에 감탄을 하였다.
시인의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방랑을 바라보는 정착의 시선은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그것은 신경림 작품이 주는 메시지이다. 시를 읽다보면 우리는 가보지 않은 곳에 가있으며, 보지 못한 것을 언어라는 매체로 읽어낼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러한 \'방랑벽\'의 삶 속에서 작품을 썼던 그의 구체적인 여행기가 담겨있는 서적들이나, 기행문학을 집필했던 작품들에 대해 좀 더 재해석 해보고 그의 구체적인 삶의 배경까지 미루어 알아본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많은 것을 조사하기보다는 기행문학이라는 큰 부분에서 어쩌면 가장 크게 차지할 지도 모르는 작가 신경 림의 방랑을 찾아낸 것은 보다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번 과제를 통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렇게 다가가는 작가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정착\'과 \'방랑\'을 같이 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독자가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자료
1.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신경림 저, 창비, 1998)
2. 목계장터 (신경림 저, 찾을목, 1997)
3. 낙타 (신경림 저, 창비, 2008)
4. 신경림 시의 창작방법 연구 (공광규 저, 푸른사상, 2005)
5. 신경림 문학의 세계 (구중서 외 저, 창작과 비평사, 1995)
추천자료
 한국 전통무용가의 정체성: 민속지학적 관점
한국 전통무용가의 정체성: 민속지학적 관점 1920년대 시인(주요한, 이상화, 한용운, 김소월,황석우)
1920년대 시인(주요한, 이상화, 한용운, 김소월,황석우) 간호연구레포트
간호연구레포트 루소의 생애와 교육사상
루소의 생애와 교육사상 루소의 교육사상, 교육원리,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유아교육에 끼친 영향 완벽 분석
루소의 교육사상, 교육원리,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유아교육에 끼친 영향 완벽 분석 한국현대시사별 대표작가와 시정리
한국현대시사별 대표작가와 시정리 김시습(金時習)에 대하여
김시습(金時習)에 대하여 시인 신동엽
시인 신동엽 노인복지론4B)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두 가지 이론 성공적 노화모델과 SOC Model(모델)에 대...
노인복지론4B)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두 가지 이론 성공적 노화모델과 SOC Model(모델)에 대... 시인 도종환(都鍾煥)에 대하여
시인 도종환(都鍾煥)에 대하여  이육사에 대하여
이육사에 대하여 [생활과건강] 1)건강한 생활양식 중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술. 2) 효과에 관해 자신의 견해...
[생활과건강] 1)건강한 생활양식 중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술. 2) 효과에 관해 자신의 견해... 성공적 노화 : 성공적 노화모델이론,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구성요인 분석
성공적 노화 : 성공적 노화모델이론,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구성요인 분석 간호이론2017B) 스트레스이론과 관련해 작성. 주변의 만성질환자 1인을 선정하여 인구사회적,...
간호이론2017B) 스트레스이론과 관련해 작성. 주변의 만성질환자 1인을 선정하여 인구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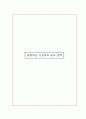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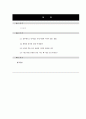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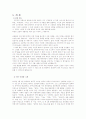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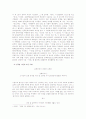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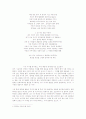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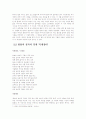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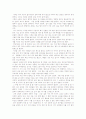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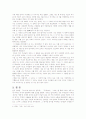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