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관하여 동일한 사실을 긍정함과 동시에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요청하는 원리이다. 또 모순율은 그 속에서 이중부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처음의 긍정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중부정의 원리하고도 한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 알수없어요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요 - 반비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 복종
/타고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것은 과학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논리이다.
배중율은 두 개의 판단 사이에 제 3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리로서 중간을 배척하고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진으로 선택하게 하는 원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의 형식이다 이 원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을 동시에긍정하고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긍정하면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하면 긍정할수 없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을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여
천추에 죽지 않는 논개여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여 - 논개의 애인이되어 그의 묘에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 차라리
/울음과 웃을을 동시에 준다/거나 /죽지 않는 논개여//살 수 없는 논개여/등느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두 모순되는 명제가 공존함으로써 배증율을 거부하는 역설적 표현이다.
휠라이트가 현대시의 기본 방법이라고 주장한 역설을 크게 표층적 역설과 심층적 역설 존재론적 역설 시적 역설로 나누었다. 그럼 표층적 역설에 대하여 보자.
표층적 역설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당연한 의미인 것처럼 통용해온 사물 혹은 관념들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의 沈默 ≫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벌써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의 존재≫
남들은 님을 생각한다지만 나는 님을 잊고저 하여요 ≪나는 잊고저≫
滿足을 얻고보면 얻은 것은 不滿足이요 滿足은 毅然히 앞에 있다.≪滿足≫
이글에서 / 갔지만 가지않았다 / 는 론리적인 이율배반이며 / 사랑을 「사랑」이라면 사랑이 아니다 / , / 님을 생각하지만 잊고 싶다 /, / 만족을 얻고보면 부만족이다 / 등은 동일률에 대한 역설적 론리이다. 이런 모순어법은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이나 상식을 파괴함으로서 명제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보다 효과적인 진리표현의 수단으로 나타내고 있다.
심층적 역설
심층적 역설은 종교적 진리와 같이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데 주로 채용되는 역설이다.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라는 노자의 진술 자체는 벌써 역설이다.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구절처럼 특히 불교는 진리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역설을 채용하고 있다. 만해시에서 많은 역설을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는 향긔로은 남의말소리에 귀먹고 다은 님의얼골에 눈머럿슴니다.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맛날 에 미리 날것을 염녀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아니지만 리별은 밧긔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운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 알수없어요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요 - 반비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 복종
/타고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것은 과학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논리이다.
배중율은 두 개의 판단 사이에 제 3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리로서 중간을 배척하고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진으로 선택하게 하는 원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을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여
천추에 죽지 않는 논개여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여 - 논개의 애인이되어 그의 묘에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 차라리
/울음과 웃을을 동시에 준다/거나 /죽지 않는 논개여//살 수 없는 논개여/등느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두 모순되는 명제가 공존함으로써 배증율을 거부하는 역설적 표현이다.
휠라이트가 현대시의 기본 방법이라고 주장한 역설을 크게 표층적 역설과 심층적 역설 존재론적 역설 시적 역설로 나누었다. 그럼 표층적 역설에 대하여 보자.
표층적 역설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당연한 의미인 것처럼 통용해온 사물 혹은 관념들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의 沈默 ≫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벌써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의 존재≫
남들은 님을 생각한다지만 나는 님을 잊고저 하여요 ≪나는 잊고저≫
滿足을 얻고보면 얻은 것은 不滿足이요 滿足은 毅然히 앞에 있다.≪滿足≫
이글에서 / 갔지만 가지않았다 / 는 론리적인 이율배반이며 / 사랑을 「사랑」이라면 사랑이 아니다 / , / 님을 생각하지만 잊고 싶다 /, / 만족을 얻고보면 부만족이다 / 등은 동일률에 대한 역설적 론리이다. 이런 모순어법은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이나 상식을 파괴함으로서 명제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보다 효과적인 진리표현의 수단으로 나타내고 있다.
심층적 역설
심층적 역설은 종교적 진리와 같이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데 주로 채용되는 역설이다.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라는 노자의 진술 자체는 벌써 역설이다.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구절처럼 특히 불교는 진리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역설을 채용하고 있다. 만해시에서 많은 역설을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는 향긔로은 남의말소리에 귀먹고 다은 님의얼골에 눈머럿슴니다.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맛날 에 미리 날것을 염녀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아니지만 리별은 밧긔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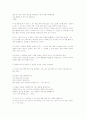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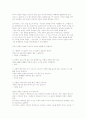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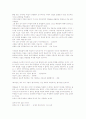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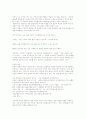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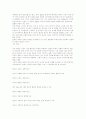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