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승자 만나기
2. 최승자와 마주하기
1) 김현이 만난 최승자
2) 정영자가 만난 최승자
3. 내가 만난 최승자
2. 최승자와 마주하기
1) 김현이 만난 최승자
2) 정영자가 만난 최승자
3. 내가 만난 최승자
본문내용
.
어화 어화 우리 슬픔
여기까지 노저어 왔었나
-<돌아와 이제> 부분
최승자의 처연한 서정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그 아쉬움의 여운 속에 머물고 있다. 때로는 격렬하게 거부와 부정과 파괴로 나타나기도 하고 욕설과 도전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특이한 서정성은 사람에 대한 집요한 관심과 그리움에 있다.
특히 <사랑하는 손>에서는 손을 소재로 하여 사랑의 현시성과 존재의 쓸쓸함을 나타내고 있다. 손의 의미는 가여운 안식과 평화로 묘사된다. 사랑한다고 너의 손을 잡을 때 주체가 가지는 존재의 의미는 이미 각기의 객체를 인정하고 합일할 수 없는 두 손의 잠시 만남에 기인되는 고독과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손의 의미는 남에게 제일 먼저 내어 줄 수 있는 관계의 시작이다. 악수나 만남의 예의로 손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보편화된 양상이다. 그의 손은 육체적 부분의 서정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이면서 사람과 사람 속을 관통하는 사랑의 확인이기도 하다.
그리움 속에서, 자기 자신의 격변기 속에서 이제 사람을 떠나야 하는 원리는 모성회귀이며 자아회귀이고 원형적 패턴이다. 밖에는 그리움, 자신의 내면세계에서는 갈등의 양상을 겪으며 결국 깨달은 것은 단단한 자기세계의 구축이며 그 누구를 기다리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묵상하던 타인이 아닌 자기 본래의 심성과 자기 세계로의 방향전환이 되는 것이다.
파괴는 결국 통과제의라는 성숙된 삶을 공유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의 서정은 목가적이고 전원적 이며 유유자적하는 자기도취와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현실과 시적자아의 적나라한 증언적 내면세계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그의 시는 매우 정직하며 절실하다 독자의 거리는 바로 그 정직한 전달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다.
(5) 강렬성
최승자는 시의 강렬성을 통하여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그 강렬성을 통한 비극적 인식으로 화해되고 구원되고 있다.
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콜처럼
알콜에 엉기는 니코틴처럼
네 게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 균처럼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
-<네게로> 전문
움직이고 싶어
큰 걸음으로 걷고 싶어
뛰고 싶어
날고 싶어
깨고 싶어
부수고 싶어
울부짖고 싶어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치고 싶어
까무러쳤다 십년 후에 깨어나고 싶어
-<나의 시가 되고 싶지 않은 나의 시> 전문
예전에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때 시계가 멈춰버렸죠
그래서 이젠 자야 할 시간도 없어졌어요.
때때로 옛일로 잠 안 오는 밤엔
피가 나도록 피가 나도록
이빨을 닦읍시다.
당신은 동에서, 나는 서에서.
-<중년 식으로> 전문
지랄처럼, 간질 발작처럼
펜지꽃들 미칠미칠 피어나
텅 빈 봄의 전면을 뒤덮고,
오 가벼운 약속의 시간들이며
흐르는 잠과 하품과 구역질의 시간들이여.
만월처럼 現世의 독이 차오르누나.
-<봄의 略史> 부분
흐르는 물에서 현대문명사회의 나쁜 요소인 알콜·니코틴·카페인·매독균처럼 네게로 가겠다는 집요한 메시지. 이 시대의 문명의 이기와 쾌락 때문에 독버섯으로 돋아난 새로운 병균까지 되어 가겠다는 의지는 폭발적인 의지와 집요함으로 나타나고 비명을 지르고 까무러치고 싶은 <나의 시가 되고 싶지 않은 나의 시>는 강렬한 그의 시론이다.
시적화자의 요구가 강렬하다. 이빨을 닦는 작업을 통하여 그리움을 나타내는 특이한 방법은 최승자의 전혀 새로운 감수성이다.
\"지랄처럼, 간질 발작처럼/펜지꽃들 미칠미칠 피어나\"는 <봄의 약사>는 낯설게 하기의 두드러진 표현이다. 낯설게 하기는 전혀 새로운 감각적 표현을 통하여 강렬한 이미지 표출을 시도한다.
3. 내가 만난 최승자
최승자의 시를 다시 접하고 나는 고통스러웠다. 스물 살, 최승자를 처음 만났을 땐 그녀의 시가 어렴풋이 좋다고만 느꼈었는데. (하긴 스물 살 때까지만 해도 자우림이나, 넬, 내 귀의 도청장치 등의 우울한 노래들을 좋아할 적이었다.) 다시 보니 그녀의 시는 ‘날것의 고통’ 그 자체였다. 마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쓸개 하나를 천천히 씹어야만 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시를 읽고 있자니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폭력으로 다가왔다. 심지어 남자친구와의 만남, 해결해야 할 과제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즐거운 방학까지도. 결국 최승자의 시 자체가 내겐 저항하기 힘든 폭력이었다. “깨고 싶어”하고 “부수고 싶어”하고 “울부짖고 싶어”하는 그녀의 육성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시들을 읽으며 나는 몇 번이나 시집을 덮어버렸던가.
동의하지 않아도
봄은 온다.
삼십 삼 세 미혼 고독녀의 봄
실업자의 봄
납세 의무자의 봄.
봄에는 산천초목이 되살아나고
쓰레기들도 싱싱하게 자라나고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이
내 입안에서 오물이 자꾸 커 간다.
-<봄> 부분
그녀에겐 “산천초목이 되살아나”는 봄마저 “동의하지 않”은 폭력일 뿐이다.
최승자의 시를 읽다보니 어쩐지 김민정이 떠올랐다. 김민정과 최승자의 시는 닮아있다. 거칠고, 극단적이며, 난폭하다. 또한 자학적이다. “내가 날 잘라 굽고 있는” 김민정과, “머리통을 떼내어 선반 위에 올려 놓는” 최승자.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계를 공포로 인식하고 있고, 그 공포로부터 달아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학’하며 ‘죽음’을 꿈꾼다.
어느 날 나는 나의 무덤에 닿을 것이다
관 속에서 행복한 구더기들을 키우며
비로소 말갛게 깨어나
홀로 노래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최승자, <주인 없는 잠이 오고> 부분
달려나가던 차들마다 긴 건너려던 사람들마다 웅성웅성 내 주위 로 몰려 든다 군데군데 웅덩이로 고인 짬뽕국물 속에서 퍼즐조각처럼 갈가리 쪼개 진 내가 송장헤엄을 치고 있다
-김민정,<나는 그곳에 서서 내 자신의 무덤을 판다> 부분
김민정은 발랄하고 발칙한 목소리로, 최승자는 음울한 목소리로 시대를 건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스스로를 묻기 위해 열심히 무덤을 파는 것은 결국 말갛게 깨어나 홀로 노래 부르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죽어간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귓전을 아프게 울린다.
*목차
1. 최승자 만나기
2. 최승자와 마주하기
1) 김현이 만난 최승자
2) 정영자가 만난 최승자
3. 내가 만난 최승자
어화 어화 우리 슬픔
여기까지 노저어 왔었나
-<돌아와 이제> 부분
최승자의 처연한 서정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그 아쉬움의 여운 속에 머물고 있다. 때로는 격렬하게 거부와 부정과 파괴로 나타나기도 하고 욕설과 도전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특이한 서정성은 사람에 대한 집요한 관심과 그리움에 있다.
특히 <사랑하는 손>에서는 손을 소재로 하여 사랑의 현시성과 존재의 쓸쓸함을 나타내고 있다. 손의 의미는 가여운 안식과 평화로 묘사된다. 사랑한다고 너의 손을 잡을 때 주체가 가지는 존재의 의미는 이미 각기의 객체를 인정하고 합일할 수 없는 두 손의 잠시 만남에 기인되는 고독과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손의 의미는 남에게 제일 먼저 내어 줄 수 있는 관계의 시작이다. 악수나 만남의 예의로 손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보편화된 양상이다. 그의 손은 육체적 부분의 서정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이면서 사람과 사람 속을 관통하는 사랑의 확인이기도 하다.
그리움 속에서, 자기 자신의 격변기 속에서 이제 사람을 떠나야 하는 원리는 모성회귀이며 자아회귀이고 원형적 패턴이다. 밖에는 그리움, 자신의 내면세계에서는 갈등의 양상을 겪으며 결국 깨달은 것은 단단한 자기세계의 구축이며 그 누구를 기다리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묵상하던 타인이 아닌 자기 본래의 심성과 자기 세계로의 방향전환이 되는 것이다.
파괴는 결국 통과제의라는 성숙된 삶을 공유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의 서정은 목가적이고 전원적 이며 유유자적하는 자기도취와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현실과 시적자아의 적나라한 증언적 내면세계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그의 시는 매우 정직하며 절실하다 독자의 거리는 바로 그 정직한 전달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다.
(5) 강렬성
최승자는 시의 강렬성을 통하여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그 강렬성을 통한 비극적 인식으로 화해되고 구원되고 있다.
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콜처럼
알콜에 엉기는 니코틴처럼
네 게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 균처럼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
-<네게로> 전문
움직이고 싶어
큰 걸음으로 걷고 싶어
뛰고 싶어
날고 싶어
깨고 싶어
부수고 싶어
울부짖고 싶어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치고 싶어
까무러쳤다 십년 후에 깨어나고 싶어
-<나의 시가 되고 싶지 않은 나의 시> 전문
예전에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때 시계가 멈춰버렸죠
그래서 이젠 자야 할 시간도 없어졌어요.
때때로 옛일로 잠 안 오는 밤엔
피가 나도록 피가 나도록
이빨을 닦읍시다.
당신은 동에서, 나는 서에서.
-<중년 식으로> 전문
지랄처럼, 간질 발작처럼
펜지꽃들 미칠미칠 피어나
텅 빈 봄의 전면을 뒤덮고,
오 가벼운 약속의 시간들이며
흐르는 잠과 하품과 구역질의 시간들이여.
만월처럼 現世의 독이 차오르누나.
-<봄의 略史> 부분
흐르는 물에서 현대문명사회의 나쁜 요소인 알콜·니코틴·카페인·매독균처럼 네게로 가겠다는 집요한 메시지. 이 시대의 문명의 이기와 쾌락 때문에 독버섯으로 돋아난 새로운 병균까지 되어 가겠다는 의지는 폭발적인 의지와 집요함으로 나타나고 비명을 지르고 까무러치고 싶은 <나의 시가 되고 싶지 않은 나의 시>는 강렬한 그의 시론이다.
시적화자의 요구가 강렬하다. 이빨을 닦는 작업을 통하여 그리움을 나타내는 특이한 방법은 최승자의 전혀 새로운 감수성이다.
\"지랄처럼, 간질 발작처럼/펜지꽃들 미칠미칠 피어나\"는 <봄의 약사>는 낯설게 하기의 두드러진 표현이다. 낯설게 하기는 전혀 새로운 감각적 표현을 통하여 강렬한 이미지 표출을 시도한다.
3. 내가 만난 최승자
최승자의 시를 다시 접하고 나는 고통스러웠다. 스물 살, 최승자를 처음 만났을 땐 그녀의 시가 어렴풋이 좋다고만 느꼈었는데. (하긴 스물 살 때까지만 해도 자우림이나, 넬, 내 귀의 도청장치 등의 우울한 노래들을 좋아할 적이었다.) 다시 보니 그녀의 시는 ‘날것의 고통’ 그 자체였다. 마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쓸개 하나를 천천히 씹어야만 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시를 읽고 있자니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폭력으로 다가왔다. 심지어 남자친구와의 만남, 해결해야 할 과제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즐거운 방학까지도. 결국 최승자의 시 자체가 내겐 저항하기 힘든 폭력이었다. “깨고 싶어”하고 “부수고 싶어”하고 “울부짖고 싶어”하는 그녀의 육성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시들을 읽으며 나는 몇 번이나 시집을 덮어버렸던가.
동의하지 않아도
봄은 온다.
삼십 삼 세 미혼 고독녀의 봄
실업자의 봄
납세 의무자의 봄.
봄에는 산천초목이 되살아나고
쓰레기들도 싱싱하게 자라나고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이
내 입안에서 오물이 자꾸 커 간다.
-<봄> 부분
그녀에겐 “산천초목이 되살아나”는 봄마저 “동의하지 않”은 폭력일 뿐이다.
최승자의 시를 읽다보니 어쩐지 김민정이 떠올랐다. 김민정과 최승자의 시는 닮아있다. 거칠고, 극단적이며, 난폭하다. 또한 자학적이다. “내가 날 잘라 굽고 있는” 김민정과, “머리통을 떼내어 선반 위에 올려 놓는” 최승자.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계를 공포로 인식하고 있고, 그 공포로부터 달아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학’하며 ‘죽음’을 꿈꾼다.
어느 날 나는 나의 무덤에 닿을 것이다
관 속에서 행복한 구더기들을 키우며
비로소 말갛게 깨어나
홀로 노래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최승자, <주인 없는 잠이 오고> 부분
달려나가던 차들마다 긴 건너려던 사람들마다 웅성웅성 내 주위 로 몰려 든다 군데군데 웅덩이로 고인 짬뽕국물 속에서 퍼즐조각처럼 갈가리 쪼개 진 내가 송장헤엄을 치고 있다
-김민정,<나는 그곳에 서서 내 자신의 무덤을 판다> 부분
김민정은 발랄하고 발칙한 목소리로, 최승자는 음울한 목소리로 시대를 건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스스로를 묻기 위해 열심히 무덤을 파는 것은 결국 말갛게 깨어나 홀로 노래 부르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죽어간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귓전을 아프게 울린다.
*목차
1. 최승자 만나기
2. 최승자와 마주하기
1) 김현이 만난 최승자
2) 정영자가 만난 최승자
3. 내가 만난 최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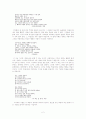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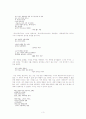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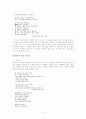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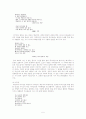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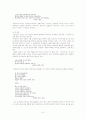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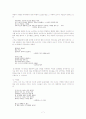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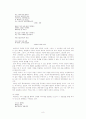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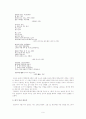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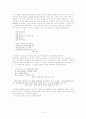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