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타키투스는 왜 게르마니아를 저술하였는가?(책저술 배경)
2.게르만 민족의 개요
3.게르만이동이 유럽 중세사에 미친 영향
4.게르만 이동의 평가
Ⅲ.결론
Ⅱ.본론
1.타키투스는 왜 게르마니아를 저술하였는가?(책저술 배경)
2.게르만 민족의 개요
3.게르만이동이 유럽 중세사에 미친 영향
4.게르만 이동의 평가
Ⅲ.결론
본문내용
봉건제도의 2대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베네피키움은 은혜(恩惠)나 특전(特典)·사물(賜物) 등의 의미로, 고대 로마에서는 3세기 이후 황제가 국경지대를 방비한 게르만인에게 내려준 토지를 베네피키아(beneficia)라고 불렀다.
카롤링거왕조 프랑크에 있어서의 베네피키움은 본래 국왕을 비롯하여 교회·수도원·호족(豪族) 등이 충성과 봉사, 정치적·군사적 결속을 기대하고 토지를 제3자에게 은혜로서 증여하는 토지제도와 토지 자체를 의미하였으며, 메로빙거왕조 말기인 7세기에 생겨나서, 8세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6세기까지 메로빙거왕조의 국왕이나 고(古)게르만 시대의 우두머리들이 전사(戰士)나 종자(從者)에게 증여한 것은 주로 동산(動産 :가축·무기·전리품 등)이었고, 그것도 전공(戰功)·충성 등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의 것이었으므로 베네피키움과는 다르다.
베네피키움이 출현한 7,8세기는 북(北)갈리아(라인강·루아르강 사이 지대)를 중심으로 영주직영지, 농민보유지로 이루어진 고전장원이 형성된 시기이다. 12∼13세기는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농업상의 기술혁신과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향상이 선구적·산발적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그와 함께 토지지배 형태가 모든 인간관계를 규정하게 되었는데, 정치적·군사적 관계(主君·臣下의 관계, 즉 主從關係)를 매개하는 토지가 베네피키움이고, 사회경제적인 영주·농민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프레카리아(Precaria:장원에 있어서의 농민보유지)였다. 그러나 당시 두 가지 말이 혼용되어(프레카리아는 一代限의 토지라는 뜻이지만 사실상은 세습), 모두 토지의 사용수익권자(使用收益權者:臣下·保有農)가 명목적인 증여자인 국왕·교회 또는 세속유력자(世俗有力者)와 어떤 정치적·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표시할 뿐이었다.
11∼12세기에 있어서의 봉건사회 확립, 기사·농민의 신분의 엄격한 구별과 함께 베네피키움은 봉토, 프레카리아는 농민보유지로서 뚜렷이 구분되었다. 이러한 은대지 제도는 프랑크 왕국에서 궁재로 있던 차알스 마르텔이 고안해냈는데 후에 봉건제도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차알스 마르텔은 사라센 격퇴를 위하여 종전의 보병 대신 대규모의 기병을 양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기병의 경우 말의 보유와 이의 사육등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마르텔은 유능한 전사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케 하고, 기병으로서 종군하는 보상으로 은대지를 수여한 것이다. 하지만 전사들에게 수여하는 토지가 왕의 토지만으로써는 부족하여 교회의 토지로 나머지를 충당하였다. 교회의 토지는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사용권만이 허용되는 은대지로 수여되는 것이 관례였다. 전사가 사망하면 그 토지는 응당 교회로 돌아가야 하지만, 마르텔은 이를 다시 유능한 전사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수여하였다. 이렇게 해서 주종제도와 은대지제도가 결합하게 되고, 9세기에 가서 은대지라는 말 대신에 봉토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으며 봉건제도하에서 군신간의 주종관계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봉토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2)프랑크 왕국의 형성
중세 사회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봉건제도는 로마 사회와 게르만 사회의 특성들이 그 시대적 상황속에서 서로 결합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고대말기의 역사가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옛 게르만인 가운데 서게르만 계통 프랑크족이 세운 왕국(486-987)은 부족국가에서 발전하여 차츰 다른 여러 게르만 부족을 정복, 통합하여 피레네산맥에서 엘베강에 이르는 서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나라를 이루었다. 4세기 이후 훈족에 의하여 촉발된 게르만민족대이동 뒤의 혼란을 수습하고 유럽의 문화적·정치적 통일을 실현한 프랑크왕국은 서유럽 최초의 그리스도교적 게르만 통일국가로서 이후 중세의 여러 제도 및 그리스도교 문화의 모체가 되었다. 프랑크왕국의 역사는 그 지배왕조에 의하여 5세기말-8세기 중엽의 메로빙거왕조와 8세기 중엽-10세기말의 카롤링거왕조로 나뉜다.
프랑크족은 라인강 중·하류 동쪽 기슭에 거주하던 여러 부족을 비롯하여 많은 소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집단이었다. 4세기초 이래 라인강 하구에서 북브라반트에 거주하는 살리족, 쾰른을 중심으로 한 라인강유역의 리부아리족, 헨센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上) 프랑크족의 3대부족이 형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살리족은 5세기초 더욱 서쪽으로 나아가 스헬데강 유역까지 퍼졌다. 이 무렵 브뤼셀 부근에 있던 데스파르궁의 소왕(小王) 메로빙거가가 대두하였다. 이 가문에서 나온 클로비스 1세는 살리족을 통일하고 이어 리부아리족과 상프랑크족을 병합하여 5세기말 프랑크왕국을 세웠다.
메로빙거왕조는 486년 루아르강 유역에 남아 있던 로마인 세력을 멸망시켰으며, 500년 무렵에는 부르군트왕국·서고트왕국을 쳐서 갈리아의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또한 클로비스 1세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로마교황과의 제휴를 시도하였다. 그가 죽은 뒤 프랑크의 관습인 분할상속원칙에 따라 왕국은 네 아들에게 나뉘어졌다. 형제는 대외적으로 협력하여 영토를 확장시켰으나, 각 분할국 사이의 이해 대립이 왕국 내분의 원인이 되어 분열과 재통일을 거듭하면서 실권을 잃어가게 되었다. 메로빙거왕조는 명목상 751년까지 존속하였으나 실권은 각 분국(分國)의 궁재(宮宰)가 장악하였고, 특히 아우스트라시아의 궁재직을 세습한 카롤링거가가 크게 대두하였다.
카롤링거家는 688년 피핀(中)이 프랑크왕국 전체의 궁재가 되고, 그 아들 카를 마르텔은 732년 투르-푸아티에싸움에서 이슬람교도의 침입을 무찔러 프랑크왕국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다. 이 기반 위에서 그의 아들 피핀(小)은 751년 쿠데타에 의해 스스로 왕위에 올라 카롤링거왕조시대를 열었다.
피핀의 왕권은 로마 교황에 의해 정통으로 승인되고, 피핀의 아들 카를 대제 통치 아래 프랑크왕국은 전성기를 맞았다. 서쪽은 피레네산맥, 동쪽은 엘베강, 북쪽은 흑해 연안, 남쪽은 이탈리아 중부에 이르는 서유럽 대부분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고 고전문화부흥에도 힘써 이른바 카롤링거왕조 르네상스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카롤링거왕조도 메로빙거왕조와 마찬가지로 분할상속에 의해 분열되었다.
843년 베르
카롤링거왕조 프랑크에 있어서의 베네피키움은 본래 국왕을 비롯하여 교회·수도원·호족(豪族) 등이 충성과 봉사, 정치적·군사적 결속을 기대하고 토지를 제3자에게 은혜로서 증여하는 토지제도와 토지 자체를 의미하였으며, 메로빙거왕조 말기인 7세기에 생겨나서, 8세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6세기까지 메로빙거왕조의 국왕이나 고(古)게르만 시대의 우두머리들이 전사(戰士)나 종자(從者)에게 증여한 것은 주로 동산(動産 :가축·무기·전리품 등)이었고, 그것도 전공(戰功)·충성 등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의 것이었으므로 베네피키움과는 다르다.
베네피키움이 출현한 7,8세기는 북(北)갈리아(라인강·루아르강 사이 지대)를 중심으로 영주직영지, 농민보유지로 이루어진 고전장원이 형성된 시기이다. 12∼13세기는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농업상의 기술혁신과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향상이 선구적·산발적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그와 함께 토지지배 형태가 모든 인간관계를 규정하게 되었는데, 정치적·군사적 관계(主君·臣下의 관계, 즉 主從關係)를 매개하는 토지가 베네피키움이고, 사회경제적인 영주·농민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프레카리아(Precaria:장원에 있어서의 농민보유지)였다. 그러나 당시 두 가지 말이 혼용되어(프레카리아는 一代限의 토지라는 뜻이지만 사실상은 세습), 모두 토지의 사용수익권자(使用收益權者:臣下·保有農)가 명목적인 증여자인 국왕·교회 또는 세속유력자(世俗有力者)와 어떤 정치적·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표시할 뿐이었다.
11∼12세기에 있어서의 봉건사회 확립, 기사·농민의 신분의 엄격한 구별과 함께 베네피키움은 봉토, 프레카리아는 농민보유지로서 뚜렷이 구분되었다. 이러한 은대지 제도는 프랑크 왕국에서 궁재로 있던 차알스 마르텔이 고안해냈는데 후에 봉건제도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차알스 마르텔은 사라센 격퇴를 위하여 종전의 보병 대신 대규모의 기병을 양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기병의 경우 말의 보유와 이의 사육등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마르텔은 유능한 전사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케 하고, 기병으로서 종군하는 보상으로 은대지를 수여한 것이다. 하지만 전사들에게 수여하는 토지가 왕의 토지만으로써는 부족하여 교회의 토지로 나머지를 충당하였다. 교회의 토지는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사용권만이 허용되는 은대지로 수여되는 것이 관례였다. 전사가 사망하면 그 토지는 응당 교회로 돌아가야 하지만, 마르텔은 이를 다시 유능한 전사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수여하였다. 이렇게 해서 주종제도와 은대지제도가 결합하게 되고, 9세기에 가서 은대지라는 말 대신에 봉토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으며 봉건제도하에서 군신간의 주종관계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봉토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2)프랑크 왕국의 형성
중세 사회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봉건제도는 로마 사회와 게르만 사회의 특성들이 그 시대적 상황속에서 서로 결합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고대말기의 역사가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옛 게르만인 가운데 서게르만 계통 프랑크족이 세운 왕국(486-987)은 부족국가에서 발전하여 차츰 다른 여러 게르만 부족을 정복, 통합하여 피레네산맥에서 엘베강에 이르는 서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나라를 이루었다. 4세기 이후 훈족에 의하여 촉발된 게르만민족대이동 뒤의 혼란을 수습하고 유럽의 문화적·정치적 통일을 실현한 프랑크왕국은 서유럽 최초의 그리스도교적 게르만 통일국가로서 이후 중세의 여러 제도 및 그리스도교 문화의 모체가 되었다. 프랑크왕국의 역사는 그 지배왕조에 의하여 5세기말-8세기 중엽의 메로빙거왕조와 8세기 중엽-10세기말의 카롤링거왕조로 나뉜다.
프랑크족은 라인강 중·하류 동쪽 기슭에 거주하던 여러 부족을 비롯하여 많은 소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집단이었다. 4세기초 이래 라인강 하구에서 북브라반트에 거주하는 살리족, 쾰른을 중심으로 한 라인강유역의 리부아리족, 헨센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上) 프랑크족의 3대부족이 형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살리족은 5세기초 더욱 서쪽으로 나아가 스헬데강 유역까지 퍼졌다. 이 무렵 브뤼셀 부근에 있던 데스파르궁의 소왕(小王) 메로빙거가가 대두하였다. 이 가문에서 나온 클로비스 1세는 살리족을 통일하고 이어 리부아리족과 상프랑크족을 병합하여 5세기말 프랑크왕국을 세웠다.
메로빙거왕조는 486년 루아르강 유역에 남아 있던 로마인 세력을 멸망시켰으며, 500년 무렵에는 부르군트왕국·서고트왕국을 쳐서 갈리아의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또한 클로비스 1세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로마교황과의 제휴를 시도하였다. 그가 죽은 뒤 프랑크의 관습인 분할상속원칙에 따라 왕국은 네 아들에게 나뉘어졌다. 형제는 대외적으로 협력하여 영토를 확장시켰으나, 각 분할국 사이의 이해 대립이 왕국 내분의 원인이 되어 분열과 재통일을 거듭하면서 실권을 잃어가게 되었다. 메로빙거왕조는 명목상 751년까지 존속하였으나 실권은 각 분국(分國)의 궁재(宮宰)가 장악하였고, 특히 아우스트라시아의 궁재직을 세습한 카롤링거가가 크게 대두하였다.
카롤링거家는 688년 피핀(中)이 프랑크왕국 전체의 궁재가 되고, 그 아들 카를 마르텔은 732년 투르-푸아티에싸움에서 이슬람교도의 침입을 무찔러 프랑크왕국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다. 이 기반 위에서 그의 아들 피핀(小)은 751년 쿠데타에 의해 스스로 왕위에 올라 카롤링거왕조시대를 열었다.
피핀의 왕권은 로마 교황에 의해 정통으로 승인되고, 피핀의 아들 카를 대제 통치 아래 프랑크왕국은 전성기를 맞았다. 서쪽은 피레네산맥, 동쪽은 엘베강, 북쪽은 흑해 연안, 남쪽은 이탈리아 중부에 이르는 서유럽 대부분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고 고전문화부흥에도 힘써 이른바 카롤링거왕조 르네상스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카롤링거왕조도 메로빙거왕조와 마찬가지로 분할상속에 의해 분열되었다.
843년 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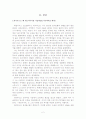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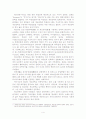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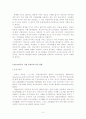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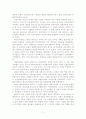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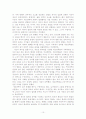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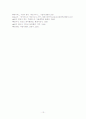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