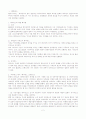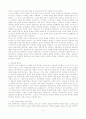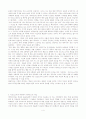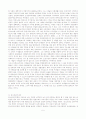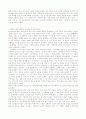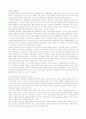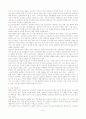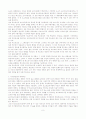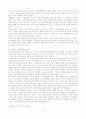목차
Ⅰ. 데카당스
1. 데카당스에 대한 해석들
2. “데카당스”에서 “데카당스 스타일”로
3. 데카당한 행복감
4. 니체의 데카당스론과 모더니티론
5. 마르크스주의 비평에서 데카당스의 개념
Ⅱ. 포스트모더니즘
1. 현대적 에피스테메와 포스트모던 에피스테메
2.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3. 상호 텍스트성
4. 자기반영성과 메타픽션
5. 장르 확산 또는 탈장르 현상
6. ‘억압된 것의 복귀’와 대중문화
1. 데카당스에 대한 해석들
2. “데카당스”에서 “데카당스 스타일”로
3. 데카당한 행복감
4. 니체의 데카당스론과 모더니티론
5. 마르크스주의 비평에서 데카당스의 개념
Ⅱ. 포스트모더니즘
1. 현대적 에피스테메와 포스트모던 에피스테메
2.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3. 상호 텍스트성
4. 자기반영성과 메타픽션
5. 장르 확산 또는 탈장르 현상
6. ‘억압된 것의 복귀’와 대중문화
본문내용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1984)도 자기 반영적 메타픽션으로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소설의 인물은 실제의 인간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핵심에 인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떤 문장, 어떤 은유에서 태어난다.”고 밝히기도 한다. 그렇다면 독자는 지금 화자 ‘나’가 쓰고 있는 소설을 읽고 있는 셈이다.
메타픽션 작가들의 실험성에 대하여 올터는 예술적 ‘자유’가 아니라 예술적 ‘방종’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는 모더니스트라는 거인에게서 태어난 난쟁이 후예로서 삶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자신의 예술을 통하여 일종의 예술적 자위행위의 희열에 빠져 있다” 는 것이다. 실제로 칭찬보다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5. 장르 확산 또는 탈장르 현상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장르와 장르 사이에 놓여 있던 높다란 장벽이 허물어졌다. 한 장르는 다른 장르와의 벽을 허물고 서로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것이 바로 ‘장르 확산’ 또는 ‘탈장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심지어는 저널리즘이나 학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는 시 장르와 소설 장르의 두꺼운 벽이 허물어졌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창백한 불꽃』(1962)은 이러한 장르 붕괴를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예로 꼽을 만하다. 금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이 소설은 인어처럼 반은 운문의 형태로, 반은 산문의 형태로 되어있다. 한편 시인들은 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소설이나 희곡 같은 장르와 결합을 모색한다. 이러한 장르 확산이나 탈장르는 창작과 비평을 엄격히 구분 짓지 않으려는 현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창작과 비평의 긴장이나 갈등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훨씬 누그러졌다. 해체주의자를 비롯한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비평을 ‘제2의 창작’으로 간주하면서 비평에 창조성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비평을 뜻하는 ‘크리티시즘’과 허구를 뜻하는 ‘픽션’을 결합하여 ‘그리티픽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다.
또한 학문과 학문의 경계선도 무너져 버렸다. ‘학제적(學際的)’이니 ‘통학적(通學的)’이니 ‘다학적(多學的)’이니 하는 용어는 하나같이 학문과 학문 사이의 유동성을 일컫는 말이다. 푸코가 역사와 문학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면, 데리다는 철학과 문학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다. 장르 확산이나 탈장르 현상은 사실과 허구, 현실과 공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논픽션 소설’이나 ‘뉴저널리즘’으로 흔히 일컫는 장르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좋은 예이다. 한편으로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직접 보고하고 기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상력에 기초를 둔 허구에 의존한다.
1970년대 말엽과 1980년대 초엽에 이르러 뉴저널리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뉴저널리스트들은 비록 상상력에 기초를 둔 허구에 기대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기술한다는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객관적 보도와 기술에 깊은 회의를 품는 몇몇 저널리스트는 실제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건을 완전히 날조하는 ‘새로운 뉴저널리즘(신뉴저널리즘)’을 내세웠다. 이렇게 新뉴저널리즘에 이르면 허구와 사실, 문학적 상상력과 객관적 보도를 서로 구별 짓는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6. ‘억압된 것의 복귀’와 대중문화
포스트모더니즘은 장르와 장르 사이에 놓여 있는 높다란 벽 사이의 ‘경계선을 넘는’ 일 뿐만 아니라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일에도 관심을 보인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그동안 엘리트주의와 고답주의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던 대중문화가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하는 ‘억압된 것들의 복귀’ 또는 힐턴 크래머가 말하는 ‘속물들의 복수’ 현상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처음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대중문화와의 관련성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도 포스트모더니즘하면 곧 미국의 팝 아트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학에서 모더니즘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몇몇 장르가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공상과학 소설을 비롯하여, 서부개척 소설, 외설 소설, 탐정 소설 따위가 바로 그러하다. 레슬리 피들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 다른 특성을 밝힌 이론가이다. ‘새로운 돌연변종’과 ‘경계선을 넘고 간격을 좁혀라’같은 글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포스트모더니즘을 규정짓는 지표로 삼는다.
흔히 ‘부재(不在)의 문학’이나 ‘불가능성의 문학’으로 일컫는 공상과학 소설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중문학을 대표하는 장르 중 하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공상과학 소설은 자기반영적 메타픽션의 특성을 강하게 띤다. 또한 상호 텍스트성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대중문학을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장르라면 뭐니 뭐니 해도 탐정 소설이다. 애드거 앨런 포우나 아서 코넌 도일, 윌키 콜린스 같은 작가의 작품과는 큰 차이가 난다. 전통적인 탐정 소설은 단순히 오락이나 현실 도피를 위한 대중소설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탐정 소설은 문학에서 자못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모더니즘이 신화와 심층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탐정소설을 중심적인 모티프로 삼는다.
한마디로 포스트모더니즘은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산을 거부한다. ‘사용 가능한 과거’라는 말도 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유산 가운데에서 오직 20세기 후반에 걸맞은 것만을 받아들인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단순히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이나 단절로만 볼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옮겨오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개념은 이미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에서 그 씨앗이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이론가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네오아방가르드’라고 불러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메타픽션 작가들의 실험성에 대하여 올터는 예술적 ‘자유’가 아니라 예술적 ‘방종’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는 모더니스트라는 거인에게서 태어난 난쟁이 후예로서 삶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자신의 예술을 통하여 일종의 예술적 자위행위의 희열에 빠져 있다” 는 것이다. 실제로 칭찬보다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5. 장르 확산 또는 탈장르 현상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장르와 장르 사이에 놓여 있던 높다란 장벽이 허물어졌다. 한 장르는 다른 장르와의 벽을 허물고 서로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것이 바로 ‘장르 확산’ 또는 ‘탈장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심지어는 저널리즘이나 학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는 시 장르와 소설 장르의 두꺼운 벽이 허물어졌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창백한 불꽃』(1962)은 이러한 장르 붕괴를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예로 꼽을 만하다. 금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이 소설은 인어처럼 반은 운문의 형태로, 반은 산문의 형태로 되어있다. 한편 시인들은 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소설이나 희곡 같은 장르와 결합을 모색한다. 이러한 장르 확산이나 탈장르는 창작과 비평을 엄격히 구분 짓지 않으려는 현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창작과 비평의 긴장이나 갈등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훨씬 누그러졌다. 해체주의자를 비롯한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비평을 ‘제2의 창작’으로 간주하면서 비평에 창조성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비평을 뜻하는 ‘크리티시즘’과 허구를 뜻하는 ‘픽션’을 결합하여 ‘그리티픽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다.
또한 학문과 학문의 경계선도 무너져 버렸다. ‘학제적(學際的)’이니 ‘통학적(通學的)’이니 ‘다학적(多學的)’이니 하는 용어는 하나같이 학문과 학문 사이의 유동성을 일컫는 말이다. 푸코가 역사와 문학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면, 데리다는 철학과 문학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다. 장르 확산이나 탈장르 현상은 사실과 허구, 현실과 공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논픽션 소설’이나 ‘뉴저널리즘’으로 흔히 일컫는 장르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좋은 예이다. 한편으로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직접 보고하고 기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상력에 기초를 둔 허구에 의존한다.
1970년대 말엽과 1980년대 초엽에 이르러 뉴저널리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뉴저널리스트들은 비록 상상력에 기초를 둔 허구에 기대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기술한다는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객관적 보도와 기술에 깊은 회의를 품는 몇몇 저널리스트는 실제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건을 완전히 날조하는 ‘새로운 뉴저널리즘(신뉴저널리즘)’을 내세웠다. 이렇게 新뉴저널리즘에 이르면 허구와 사실, 문학적 상상력과 객관적 보도를 서로 구별 짓는다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6. ‘억압된 것의 복귀’와 대중문화
포스트모더니즘은 장르와 장르 사이에 놓여 있는 높다란 벽 사이의 ‘경계선을 넘는’ 일 뿐만 아니라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일에도 관심을 보인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그동안 엘리트주의와 고답주의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던 대중문화가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하는 ‘억압된 것들의 복귀’ 또는 힐턴 크래머가 말하는 ‘속물들의 복수’ 현상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처음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대중문화와의 관련성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도 포스트모더니즘하면 곧 미국의 팝 아트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학에서 모더니즘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몇몇 장르가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공상과학 소설을 비롯하여, 서부개척 소설, 외설 소설, 탐정 소설 따위가 바로 그러하다. 레슬리 피들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 다른 특성을 밝힌 이론가이다. ‘새로운 돌연변종’과 ‘경계선을 넘고 간격을 좁혀라’같은 글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포스트모더니즘을 규정짓는 지표로 삼는다.
흔히 ‘부재(不在)의 문학’이나 ‘불가능성의 문학’으로 일컫는 공상과학 소설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중문학을 대표하는 장르 중 하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공상과학 소설은 자기반영적 메타픽션의 특성을 강하게 띤다. 또한 상호 텍스트성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대중문학을 보여 주는 가장 대표적인 장르라면 뭐니 뭐니 해도 탐정 소설이다. 애드거 앨런 포우나 아서 코넌 도일, 윌키 콜린스 같은 작가의 작품과는 큰 차이가 난다. 전통적인 탐정 소설은 단순히 오락이나 현실 도피를 위한 대중소설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탐정 소설은 문학에서 자못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모더니즘이 신화와 심층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탐정소설을 중심적인 모티프로 삼는다.
한마디로 포스트모더니즘은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산을 거부한다. ‘사용 가능한 과거’라는 말도 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유산 가운데에서 오직 20세기 후반에 걸맞은 것만을 받아들인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단순히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이나 단절로만 볼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옮겨오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개념은 이미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에서 그 씨앗이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이론가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네오아방가르드’라고 불러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