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債務不履行의 여러 類型
Ⅱ. 强制履行과 民事訴訟
Ⅲ. 損害賠償
Ⅳ. 契約의 解除
Ⅴ. 讓渡人의 擔保責任
Ⅱ. 强制履行과 民事訴訟
Ⅲ. 損害賠償
Ⅳ. 契約의 解除
Ⅴ. 讓渡人의 擔保責任
본문내용
그러나 그러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등기까지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소위 단기취득시효가 더욱 문제된다. 이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도 불리운다. 민법 제 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통상의 용도를 충족시킬 수 없게 하는 어떤 흠이 있다거나 성능이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매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주택의 지붕이 비에 샌다든가, 텔레비전을 샀는데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새로 산 냉장고의 내부에 광고와는 달리 성에가 잔뜩 낀다든가 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어떠한 법적 수단을 가지는가? 하나는 매도인이 품질을 보증한다든가 하여 그러한 흠이 없음을 보장하는 약속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흠이 생긴 것에 대하여 무슨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매수인은 아무런 구제수단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민법은 특별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다.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이 준용되어,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으나, 매도인은 신뢰이익의 침해, 즉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족하다. 이에 의하면, 매수인은 최소한 우선 약정한 대금과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의 실제의 가치와의 차액을 손해 배상함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한 책임의 내용을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외에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 말하자면 하자담보책임, 나아가 일반적으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이 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정한 또 하나의 구제수단이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길이 전적으로 폐쇄된다고 하면 이는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이행이익, 나아가 완전성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제조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 최종 구매자의 계약상대방은 대체로 소매상으로서, 재산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피해자로서는 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확대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결함’에 대하여 원천적인 책임이 있고 또 보험가입이나 가격결정에 의하여 책임부담의 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더욱 실효 있는 대처방안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애초 미국에서 인정되어 이제는 세계의 주요한 나라에서 입법 또는 판례에 의하여 두루 인정되고 있다.
민법에서 채용되고 있는 물건의 분류로서는 우선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 외에도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분도 익혀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물/불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의 당사자가 그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이와 같은 특정물, 불특정물의 구분은 목적물의 보관의무, 앞서 본 변제의 장소 등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 외에 하자담보책임에서도 둘 사이에 차이가 난다.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의 기능성이란 양자가 따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에도 독자적인 분야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민법이 다루는 소재를 정리하여 거기에 질서를 주기 위한 체계구성상의 구분일 뿐이고, 그 사이에 허물어서는 안 될 담이 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거기다가 양자 모두에 적용될 것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총칙’까지 합하여 보면 민법 공부는 항상 그 전체를 시야에 두면서 이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매매의 목적물에 통상의 용도를 충족시킬 수 없게 하는 어떤 흠이 있다거나 성능이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매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주택의 지붕이 비에 샌다든가, 텔레비전을 샀는데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새로 산 냉장고의 내부에 광고와는 달리 성에가 잔뜩 낀다든가 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어떠한 법적 수단을 가지는가? 하나는 매도인이 품질을 보증한다든가 하여 그러한 흠이 없음을 보장하는 약속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흠이 생긴 것에 대하여 무슨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매수인은 아무런 구제수단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민법은 특별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다.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이 준용되어,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으나, 매도인은 신뢰이익의 침해, 즉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족하다. 이에 의하면, 매수인은 최소한 우선 약정한 대금과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의 실제의 가치와의 차액을 손해 배상함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한 책임의 내용을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외에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 말하자면 하자담보책임, 나아가 일반적으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법이 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정한 또 하나의 구제수단이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길이 전적으로 폐쇄된다고 하면 이는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이행이익, 나아가 완전성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제조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 최종 구매자의 계약상대방은 대체로 소매상으로서, 재산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피해자로서는 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확대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결함’에 대하여 원천적인 책임이 있고 또 보험가입이나 가격결정에 의하여 책임부담의 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더욱 실효 있는 대처방안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애초 미국에서 인정되어 이제는 세계의 주요한 나라에서 입법 또는 판례에 의하여 두루 인정되고 있다.
민법에서 채용되고 있는 물건의 분류로서는 우선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 외에도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분도 익혀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물/불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의 당사자가 그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이와 같은 특정물, 불특정물의 구분은 목적물의 보관의무, 앞서 본 변제의 장소 등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 외에 하자담보책임에서도 둘 사이에 차이가 난다.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의 기능성이란 양자가 따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에도 독자적인 분야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민법이 다루는 소재를 정리하여 거기에 질서를 주기 위한 체계구성상의 구분일 뿐이고, 그 사이에 허물어서는 안 될 담이 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거기다가 양자 모두에 적용될 것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총칙’까지 합하여 보면 민법 공부는 항상 그 전체를 시야에 두면서 이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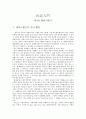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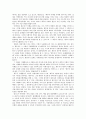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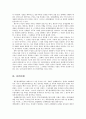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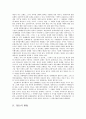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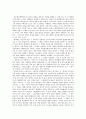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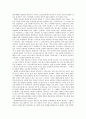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