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오언절구 >
1. 측기격 측성운
2. 측기격 측성운 (1구에도 운자가 있는 것)
3. 평기격 측성운
4. 평기격 측성운 (1구에도 운자가 있는 것)
< 칠언절구 >
1.평기격 측성운
2.평기격 측성운 (1구에도 운자가 있는것)
3. 측기격 측성운
4. 측기격 측성운 (1구에도 운자가 있는 것)
1. 측기격 측성운
2. 측기격 측성운 (1구에도 운자가 있는 것)
3. 평기격 측성운
4. 평기격 측성운 (1구에도 운자가 있는 것)
< 칠언절구 >
1.평기격 측성운
2.평기격 측성운 (1구에도 운자가 있는것)
3. 측기격 측성운
4. 측기격 측성운 (1구에도 운자가 있는 것)
본문내용
)
二十樹下(스무나무 아래) -김삿갓
二十樹下三十客 (이십수하삼십객) 스무나무 아래 서러운 나그네,
四十家中五十食 (사십가중오십식) 망할 놈의 집에서 쉰밥을 먹는구나,
人間豈有七十事 (인간기유칠십사) 인간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不如歸家三十食 (불여귀가삼십식) 차라리 집에 돌아가 선 밥을 먹으리
시인 김삿갓[김병연(金炳淵, 1807∼1863)]은 실존 인물이면서도 마치 전설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전설처럼\'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그와 그의 문학에 대해 정작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는 뜻도 된다. 그에 대한 인상이 \'삿갓\'과 \'죽장(竹杖)\', 그리고 \'뜬구름\'과 같은 \'방랑\'의 이미지로만 구성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시 <스무나무 아래>는 조정해 읽으면 \'이 씨팔 놈아\'다. 그는 속어·욕설·육담·음담패설 등을 통해 세상을 질타했는데, 이 시는 \'한자어로 순수한 우리말을 표기하는 파격적 실험\'을 보여준다. 시에서 \'二十\'은 \'스무\', \'三十\'은 \'서러운\' 또는 \'선\'이고, \'四十\'은 \'망할\'으로 읽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五十\'은 \'쉰\', \'七十\'은 \'이런\'이라는 뜻으로 써서 함경도 어느 부잣집에서 받은 냉대를 노래하고 있다.
二十樹下(스무나무 아래) -김삿갓
二十樹下三十客 (이십수하삼십객) 스무나무 아래 서러운 나그네,
四十家中五十食 (사십가중오십식) 망할 놈의 집에서 쉰밥을 먹는구나,
人間豈有七十事 (인간기유칠십사) 인간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不如歸家三十食 (불여귀가삼십식) 차라리 집에 돌아가 선 밥을 먹으리
시인 김삿갓[김병연(金炳淵, 1807∼1863)]은 실존 인물이면서도 마치 전설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전설처럼\'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그와 그의 문학에 대해 정작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는 뜻도 된다. 그에 대한 인상이 \'삿갓\'과 \'죽장(竹杖)\', 그리고 \'뜬구름\'과 같은 \'방랑\'의 이미지로만 구성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시 <스무나무 아래>는 조정해 읽으면 \'이 씨팔 놈아\'다. 그는 속어·욕설·육담·음담패설 등을 통해 세상을 질타했는데, 이 시는 \'한자어로 순수한 우리말을 표기하는 파격적 실험\'을 보여준다. 시에서 \'二十\'은 \'스무\', \'三十\'은 \'서러운\' 또는 \'선\'이고, \'四十\'은 \'망할\'으로 읽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五十\'은 \'쉰\', \'七十\'은 \'이런\'이라는 뜻으로 써서 함경도 어느 부잣집에서 받은 냉대를 노래하고 있다.
추천자료
 고체시와 근체시의 비교와 두보시의 정형성에 대해
고체시와 근체시의 비교와 두보시의 정형성에 대해 (한문고전강독)한국 한시 중에서 오언절구와 오언율시, 칠언절구와 칠언율시를 각각 한편씩(...
(한문고전강독)한국 한시 중에서 오언절구와 오언율시, 칠언절구와 칠언율시를 각각 한편씩(... 2006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A-E공통(한국한시감상)
2006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A-E공통(한국한시감상) [한문고전강독] 오언시와 칠언시를 각 한 편씩 선택하여 한시 감상법에 의해 감상하시오.
[한문고전강독] 오언시와 칠언시를 각 한 편씩 선택하여 한시 감상법에 의해 감상하시오. 2014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절구,오언율시,칠언절구,칠언율시)
2014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절구,오언율시,칠언절구,칠언율시) [한문고전강독 공통]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를 각 한 편씩 선택하여 한시 ...
[한문고전강독 공통]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를 각 한 편씩 선택하여 한시 ...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는 ...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는 ... [한문고전강독 공통]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를 각 한 편씩 선택하여 한시 ...
[한문고전강독 공통]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를 각 한 편씩 선택하여 한시 ... 2019년 2학기 한국한문학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한시를 고체시와 근체시로 분류)
2019년 2학기 한국한문학의이해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한시를 고체시와 근체시로 분류) [방통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한국한문학의 이해 공통] 한시를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
[방통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한국한문학의 이해 공통] 한시를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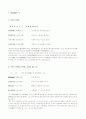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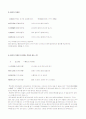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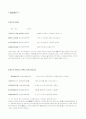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