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작가연구
Ⅱ. 본론
공간으로 살펴 본 [봄·봄]
Ⅲ. 결론
농촌소설 [봄·봄]
* 참고문헌 *
작가연구
Ⅱ. 본론
공간으로 살펴 본 [봄·봄]
Ⅲ. 결론
농촌소설 [봄·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갈 때, 장인의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에 뛰어나온 점순은 주인공의 귀를 잡아당김으로써 지금까지 점순과의 성례를 위해 장인과 싸워온 주인공은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점순의 돌변한 태도에 얼이 빠진 주인공은 장인이 내리치는 매를 피하지 않고 머리가 터지도록 얻어 맞는다.
지금까지 [봄·봄]에서의 모든 행위는 <성례를 요구하다>가 거듭 변형·반복되고 있음이 쉽게 파악된다. 주인공의 성례의 요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실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그의 주관적인 의지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주위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이 영향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점순의 성례요구는 장소의 이동에 따라 강세를 띠고 있음도 보인다.
[성례 시켜달라지 뭘 어떻게?]하고 되알지게 쏘아 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쇰을 잡아채지 그냥뒤, 이 바보야?]하고 얼굴이 발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샐죽하게 튀들어가지 안느냐.
처음 화전밭에서 점순의 충동질은 봄이 지닌 몽환적인 분위기 가운데 수줍음을 띠고 있어서 주인공은 경이와 기쁨속에 점순을 대견하게 여긴다. 그러나 집에서 두 번째의 점순의 청동은 주인공의 줏대없는 처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속에 이루어져, 주인공은 스스로에 대한 절망속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의 성례요구도 장소의 이동에 따라 강세를 띤다. 어제 <논>에서의 성례요구는 모 붓기를 중단하고 장인에게 욕설과 매를 맞는 가운데 행해졌다. <구장집>에서는 시비의 판단을 요구하나 설득과 협박으로 돌아온다. 곧 수동적인 성례요구가 된다. 그러나 오늘 <집>의 마당에서 행해진 성례요구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멍석에 눕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의 내심에는 ‘오늘은 열쪽이 난대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는 능동적인 강한의지로 나타나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고 떠다밀며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기는 원시적 격투로까지 발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인공과 장인 사이의 갈등은 데릴사위에 의지한 노동력의 충당이라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게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더욱, 장인의 데릴사위들에 대한 노동력의 착취 내력은 이미 뭉태에 의해 폭로되어졌으며, 주인공이 앞으로도, 셋째딸의 데릴사위가 들어오기까지, 계속 착취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순진하기만한 주인공은 장인의 권모술수에 또다시 넘어간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짖어주고, 호주머니에 히연 한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갈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갈아라]하고 등을 뚜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누마 고마워서 어느듯 눈물까지 낫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서를하며 불야살야 지게를지고 일터로 갔다.
지금까지 주인공의 핵심행위가 만들어간 의미는 <성례를 요구하다>:<성례의 승낙을 얻다>로 이어진다. 표면적인 상황은 <노동을 거부하다>:<노동을 하다>로 나타난다. 곧 노동의 거부는 성례의 요구이며 노동의 참여가 성례의 승낙에 기인된 거이다. 그러나 성례의 승낙은 장인의 임기응변적인, 위기타개에서 나온 것으로 그 성례는 지연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부정적인 상황>:<긍정적인 상황>으로의 전개가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부정적인 상황>으로의 전개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Ⅲ. 결론
농촌소설 [봄·봄]
이 작품 제목 앞에는 농촌소설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 김유정 소설의 특성인 해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농민의 삶이 생생하게 그려졌으며,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그가 즐겨 사용하는 계절성(봄)이 강하게 어필되어 있다.
[봄과 따라지], [봄밤] 등에서 원용되고 있는 봄의 배경이다. 농촌소설이라는 표식이 암시하듯이 당시의 한국 농촌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은 데릴사위(작중의 화자인 나-소작인)와 장인(마름)의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 작인이 닭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낙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는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라안는다.
지주를 대신해서 마름이 소작인을 착취하는 실태를 그렸다. 지주의 사주를 받은 마름의 횡포이므로, 마름의 홍포와 착취는 곧 지주의 그것이다. 지주가 하루 아침에 소작농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 지주가 농민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착취하게 되면 농민은 당하는 수밖에 없다.
[봄·봄]에서의 장인님과 데릴사위는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와 대응되고, 지주와 소작농민의 관계를 축소판으로 하고 있다. 딸을 미끼로 데릴사위로 들어온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마름의 횡포는 당시 마름(지주)의 횡포와 착취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노동력의 착취, 소작인의 비극, 비인간적인 횡포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폭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는 해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학적으로 빗겨가고 있다. 농촌의 구조적 모순이나 갈등, 그리고 횡포와 착취를 공격하여 비판하려 하지 않는다. 해학적으로 접근하여 모순과 갈등을 드러내고 제시할 뿐이다.
김유정 소설의 대부분이 모델이 있는 것처럼 [봄·봄]도 모델이 있다. 실레마을에 봉필이라는 인물이 실재했으며, 그의 딸들과 데릴사위에 얽힌 사건들이 있었다. 설사 [봄·봄]의 모델이 실제 있었다 할지라도 이 작품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봄·봄]의작품성을 높여 주고, 현실감을 풍부하게 해준다.
* 참고문헌 *
김영기 [김유정 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1992
전상국 [김유정 시대를 초월한 문학성]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유인순 [김유정문학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1988
박정규 [김유정 소설과 시간] 깊은샘, 1992
박동규, 이선영, 인권환 [한국단편과 논술의 실제2] 범한, 1996
지금까지 [봄·봄]에서의 모든 행위는 <성례를 요구하다>가 거듭 변형·반복되고 있음이 쉽게 파악된다. 주인공의 성례의 요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실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그의 주관적인 의지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주위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이 영향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점순의 성례요구는 장소의 이동에 따라 강세를 띠고 있음도 보인다.
[성례 시켜달라지 뭘 어떻게?]하고 되알지게 쏘아 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쇰을 잡아채지 그냥뒤, 이 바보야?]하고 얼굴이 발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샐죽하게 튀들어가지 안느냐.
처음 화전밭에서 점순의 충동질은 봄이 지닌 몽환적인 분위기 가운데 수줍음을 띠고 있어서 주인공은 경이와 기쁨속에 점순을 대견하게 여긴다. 그러나 집에서 두 번째의 점순의 청동은 주인공의 줏대없는 처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속에 이루어져, 주인공은 스스로에 대한 절망속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의 성례요구도 장소의 이동에 따라 강세를 띤다. 어제 <논>에서의 성례요구는 모 붓기를 중단하고 장인에게 욕설과 매를 맞는 가운데 행해졌다. <구장집>에서는 시비의 판단을 요구하나 설득과 협박으로 돌아온다. 곧 수동적인 성례요구가 된다. 그러나 오늘 <집>의 마당에서 행해진 성례요구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멍석에 눕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의 내심에는 ‘오늘은 열쪽이 난대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는 능동적인 강한의지로 나타나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고 떠다밀며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기는 원시적 격투로까지 발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인공과 장인 사이의 갈등은 데릴사위에 의지한 노동력의 충당이라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게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더욱, 장인의 데릴사위들에 대한 노동력의 착취 내력은 이미 뭉태에 의해 폭로되어졌으며, 주인공이 앞으로도, 셋째딸의 데릴사위가 들어오기까지, 계속 착취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순진하기만한 주인공은 장인의 권모술수에 또다시 넘어간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짖어주고, 호주머니에 히연 한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갈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갈아라]하고 등을 뚜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누마 고마워서 어느듯 눈물까지 낫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서를하며 불야살야 지게를지고 일터로 갔다.
지금까지 주인공의 핵심행위가 만들어간 의미는 <성례를 요구하다>:<성례의 승낙을 얻다>로 이어진다. 표면적인 상황은 <노동을 거부하다>:<노동을 하다>로 나타난다. 곧 노동의 거부는 성례의 요구이며 노동의 참여가 성례의 승낙에 기인된 거이다. 그러나 성례의 승낙은 장인의 임기응변적인, 위기타개에서 나온 것으로 그 성례는 지연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부정적인 상황>:<긍정적인 상황>으로의 전개가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부정적인 상황>으로의 전개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Ⅲ. 결론
농촌소설 [봄·봄]
이 작품 제목 앞에는 농촌소설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 김유정 소설의 특성인 해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농민의 삶이 생생하게 그려졌으며,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그가 즐겨 사용하는 계절성(봄)이 강하게 어필되어 있다.
[봄과 따라지], [봄밤] 등에서 원용되고 있는 봄의 배경이다. 농촌소설이라는 표식이 암시하듯이 당시의 한국 농촌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은 데릴사위(작중의 화자인 나-소작인)와 장인(마름)의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 작인이 닭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낙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는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라안는다.
지주를 대신해서 마름이 소작인을 착취하는 실태를 그렸다. 지주의 사주를 받은 마름의 횡포이므로, 마름의 홍포와 착취는 곧 지주의 그것이다. 지주가 하루 아침에 소작농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 지주가 농민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착취하게 되면 농민은 당하는 수밖에 없다.
[봄·봄]에서의 장인님과 데릴사위는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와 대응되고, 지주와 소작농민의 관계를 축소판으로 하고 있다. 딸을 미끼로 데릴사위로 들어온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마름의 횡포는 당시 마름(지주)의 횡포와 착취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노동력의 착취, 소작인의 비극, 비인간적인 횡포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폭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는 해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학적으로 빗겨가고 있다. 농촌의 구조적 모순이나 갈등, 그리고 횡포와 착취를 공격하여 비판하려 하지 않는다. 해학적으로 접근하여 모순과 갈등을 드러내고 제시할 뿐이다.
김유정 소설의 대부분이 모델이 있는 것처럼 [봄·봄]도 모델이 있다. 실레마을에 봉필이라는 인물이 실재했으며, 그의 딸들과 데릴사위에 얽힌 사건들이 있었다. 설사 [봄·봄]의 모델이 실제 있었다 할지라도 이 작품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봄·봄]의작품성을 높여 주고, 현실감을 풍부하게 해준다.
* 참고문헌 *
김영기 [김유정 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1992
전상국 [김유정 시대를 초월한 문학성]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유인순 [김유정문학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1988
박정규 [김유정 소설과 시간] 깊은샘, 1992
박동규, 이선영, 인권환 [한국단편과 논술의 실제2] 범한,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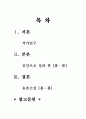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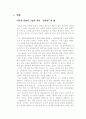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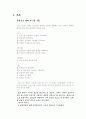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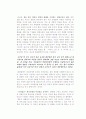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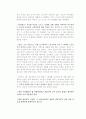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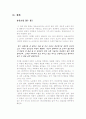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