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강호가사의 개념
Ⅱ. 강호가사 작품 연구
1. 작품선정배경
2. 작품 분석
1) 상춘곡
2) 서호별곡
3) 면앙정가
4) 성산별곡
5)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의 비교
Ⅲ. 조선전기 강호가사의 문학적 특징
Ⅳ. 조선전기 강호가사의 문학사적 의의
Ⅱ. 강호가사 작품 연구
1. 작품선정배경
2. 작품 분석
1) 상춘곡
2) 서호별곡
3) 면앙정가
4) 성산별곡
5)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의 비교
Ⅲ. 조선전기 강호가사의 문학적 특징
Ⅳ. 조선전기 강호가사의 문학사적 의의
본문내용
번의 종학박사, 사헌부 감찰 등을 지내다 성종원년(1470)에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 자제들을 교육하며 후진 양정에 주력했다. 성종3년(1472)에는 자신의 영달을 생각하지 않고 향리자제를 교육한 공으로 3품 산관이 되자 이에 감격하여 임금의 은공을 노래한 <불우헌곡不憂軒曲>, <불우헌가不憂軒歌> 등을 지었다. 이 무렵에 지은 <상춘곡(賞春曲)>이 이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2) 작자
정극인丁克仁(1401~1481). 본관 영광(靈光). 자 가택(可宅). 호 불우헌(不憂軒)·다헌(茶軒)·다각(茶角).전북 태인(泰仁) 출생. 1429년(세종 11) 생원에 합격하고, 문종 때 음보(蔭補)로 인수부승(仁壽府丞)을 지내고 1453년(단종 1)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에 이르렀으나 단종이 왕위를 찬탈당하자 사직하고 고향에서 후진을 가르쳤다. 1472년(성종 3) 절의(節義)가 높고 영달을 탐하지 않고 후진양성에 힘쓴 공으로 삼품교관(三品敎官)이 되었다. 문학에도 특출한 재능을 보여 가사(歌辭) 작품인 《상춘곡(賞春曲)》을 지었다. 예조판서에 추증되고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 배향되었다. 문집에《불우헌집(不憂軒集)》이 있다.
3) 내용 분석
(전략)
엊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 夕陽裏(석양리)예 퓌여 잇고,
綠楊芳草(녹양 방초)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 )造化神功(조화신공) : 만물을 찾오 변화시키는 신령스러운 조물주의 솜씨.
이 物物(물물)마다 헌다. 헌다 : 야단스럽다, 굉장하다, 화려하다
수풀에 우 새 春氣(춘기) 내 계워
소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 일체) 物我一體(물아 일체) :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됨.
어니, 興(흥)이 다소냐.
본사1: 제한된 공간에서의 자연 친화
1) 대자연 조화와 아름다움에 감탄
2) 물아일체의 삶
(생략)
이바 니웃드라 山水 구경 가쟈스라.
踏靑(답청) 踏靑(답청) : 33일. 곧 삼짇날인 답청절에 들에 나가 새봄에 돋은 풀을 밟고 산책하는 민속놀이.
으란 오 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새.
아에 採山(채산) 採山(채산) : 採算採에사 採를 생략한 형태.
고 나조 釣水(조수) 釣水(조수) : 釣水魚를 생략한 형태.
새.
괴여 괴다 : 술, 간장, 식초 따위가 발효하여 거품이 일다.
닉은 술을 葛巾(갈건) 葛巾(갈건) : 칡으로 만든 두건, 은사의 두건, 술 거리는 도구로 쓰임.
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생략)
微吟緩步(미음 완보)微吟緩步(미음 완보) : 나즉히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걸음.
야 시냇의 호자 안자,
(생략)
峰頭(봉두)에 급피 올나 구름 소긔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려 잇.
본사2 : 확장된 공간에서의 자연 친화
1) 자연친화의 공간확장
2) 술을 마시며 즐기는 풍류
3) 무릉도원을 지향하는 길
(생략)
功名(공명)도 날 우고 富貴(부귀)도 날 우니,
淸風明月(청풍 명월) 淸風明月(청풍 명월) :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뜻으로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구절로 자연을 의미하는 말. 준말로 ‘풍월’이다.
外(외)예 엇던 벗이 잇올고.
簞瓢陋巷(단표 누항) 簞瓢陋巷(단표 누항) : 소박한 시골 살림. 청빈한 선비의 살림. ‘단표’는 ‘簞食瓢飮(단사표음-도시락 밥과 표주박 물)’의 준말로 가난한 음식과 생활을, ‘누항’은 누추한 거리를 뜻하나, 여기서는 자기가 사는 마을을 낮추어 일컫는 말로서 빈촌(貧村)을 말함『논어論語』
흣튼 혜음흣튼 혜음 : 헛된 생각, 부귀나 공명.
아니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 엇지리.
결사 : 삶의 자세 - 자연귀의와 안빈낙도
4) 문학사적 의의
<서왕가>를 효시작품으로 보더라도 포교를 목적으로 했던 <서왕가>와 달리 개인의 감성과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상춘곡>이 문학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가사문학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때를 조선시대로 볼 때 <상춘곡>의 중요성은 볼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사대부가사의 첫 작품이며 산림처사로서의 은일생활을 노래하여 사림파 문학의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다.
둘째. 작품의 창작을 계기로 가사문학이 발생되고, 우리나라 시문학 역사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서호별곡<西湖別曲>
1) 개관
<서호별곡>은 「동애유고 부록 가사(東崖遺稿 附錄 哥詞)」 『동애 유고 부록 가사』동애는 허목의 증조부이고, 송호는 허목의 조부이니, 이 가사집은 허목이 무자년(1648)에 편찬한 두 선조의 합동 유고집이라 할 수 있다.
양사언(1517~1584)의 자필첩책 (自筆牒冊)인 「봉래유묵(蓬萊遺墨)」에 전하는 것으로 송호(松湖) 허강(許) (1520~1592)이 한강 일대를 유람하면서 지은 <서호사> 육결을 봉래 양사언이 악부에 올려 삼강팔엽(三腔八葉) 총 삼십삼절(三十三節)로 노래한 것이다. 허강은 부친인 동애(東崖) 좌찬성(左贊成) 허자(許磁)(1496~1551)가 문정왕후 때에 이기(李)의 횡포를 탄핵하다가 귀양가서 죽은 일을 계기로 벼슬을 마다하고 강호[西江]에 은거하여 종신(終身)토록 세상에 나오지 않아 ‘서호처사(西湖處士)’라고 일컬어졌는데, <서호별곡>은 이와 같이 은거할 당시에 지은 작품이다.
2) 작자
허강(許, 1520-1592)은 중종,명종,선조 때의 학자다. <중종,명종실록>과 허목(許穆)이 지은 <기언(記言)>에 의하면, 자는 사아(士牙)이고 호는 송호(松湖) 또는 강호처사(江湖處士)이며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벼슬을 원하지 않았다. 을사사화에 아버지 허자(許磁, 1496-1551)가 평북 홍원(洪原)에 귀양 갔다가 죽자 40년 동안 방랑하면서 아버지가 편찬하던 <역대사감(歷代史鑑)>을 완성했다. 조정에서 내린 전함사(典艦司) 별제(別提)를 사양하고 임진왜란 때 토산에 피란했다가 별세하였다. 성품이 고결했다.
3) 내용 분석
(前腔전강) 성대(聖代)예 일민(逸民) 逸民(일민):벼슬을 하지 않고 세상을 피하여 있는 사람.
되어 호해(湖海)예 누워이셔.
(中腔중강) 시서(時序) 니
2) 작자
정극인丁克仁(1401~1481). 본관 영광(靈光). 자 가택(可宅). 호 불우헌(不憂軒)·다헌(茶軒)·다각(茶角).전북 태인(泰仁) 출생. 1429년(세종 11) 생원에 합격하고, 문종 때 음보(蔭補)로 인수부승(仁壽府丞)을 지내고 1453년(단종 1)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에 이르렀으나 단종이 왕위를 찬탈당하자 사직하고 고향에서 후진을 가르쳤다. 1472년(성종 3) 절의(節義)가 높고 영달을 탐하지 않고 후진양성에 힘쓴 공으로 삼품교관(三品敎官)이 되었다. 문학에도 특출한 재능을 보여 가사(歌辭) 작품인 《상춘곡(賞春曲)》을 지었다. 예조판서에 추증되고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 배향되었다. 문집에《불우헌집(不憂軒集)》이 있다.
3) 내용 분석
(전략)
엊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 夕陽裏(석양리)예 퓌여 잇고,
綠楊芳草(녹양 방초)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 )造化神功(조화신공) : 만물을 찾오 변화시키는 신령스러운 조물주의 솜씨.
이 物物(물물)마다 헌다. 헌다 : 야단스럽다, 굉장하다, 화려하다
수풀에 우 새 春氣(춘기) 내 계워
소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 일체) 物我一體(물아 일체) :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됨.
어니, 興(흥)이 다소냐.
본사1: 제한된 공간에서의 자연 친화
1) 대자연 조화와 아름다움에 감탄
2) 물아일체의 삶
(생략)
이바 니웃드라 山水 구경 가쟈스라.
踏靑(답청) 踏靑(답청) : 33일. 곧 삼짇날인 답청절에 들에 나가 새봄에 돋은 풀을 밟고 산책하는 민속놀이.
으란 오 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새.
아에 採山(채산) 採山(채산) : 採算採에사 採를 생략한 형태.
고 나조 釣水(조수) 釣水(조수) : 釣水魚를 생략한 형태.
새.
괴여 괴다 : 술, 간장, 식초 따위가 발효하여 거품이 일다.
닉은 술을 葛巾(갈건) 葛巾(갈건) : 칡으로 만든 두건, 은사의 두건, 술 거리는 도구로 쓰임.
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생략)
微吟緩步(미음 완보)微吟緩步(미음 완보) : 나즉히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걸음.
야 시냇의 호자 안자,
(생략)
峰頭(봉두)에 급피 올나 구름 소긔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려 잇.
본사2 : 확장된 공간에서의 자연 친화
1) 자연친화의 공간확장
2) 술을 마시며 즐기는 풍류
3) 무릉도원을 지향하는 길
(생략)
功名(공명)도 날 우고 富貴(부귀)도 날 우니,
淸風明月(청풍 명월) 淸風明月(청풍 명월) :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뜻으로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구절로 자연을 의미하는 말. 준말로 ‘풍월’이다.
外(외)예 엇던 벗이 잇올고.
簞瓢陋巷(단표 누항) 簞瓢陋巷(단표 누항) : 소박한 시골 살림. 청빈한 선비의 살림. ‘단표’는 ‘簞食瓢飮(단사표음-도시락 밥과 표주박 물)’의 준말로 가난한 음식과 생활을, ‘누항’은 누추한 거리를 뜻하나, 여기서는 자기가 사는 마을을 낮추어 일컫는 말로서 빈촌(貧村)을 말함『논어論語』
흣튼 혜음흣튼 혜음 : 헛된 생각, 부귀나 공명.
아니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 엇지리.
결사 : 삶의 자세 - 자연귀의와 안빈낙도
4) 문학사적 의의
<서왕가>를 효시작품으로 보더라도 포교를 목적으로 했던 <서왕가>와 달리 개인의 감성과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상춘곡>이 문학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가사문학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때를 조선시대로 볼 때 <상춘곡>의 중요성은 볼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사대부가사의 첫 작품이며 산림처사로서의 은일생활을 노래하여 사림파 문학의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다.
둘째. 작품의 창작을 계기로 가사문학이 발생되고, 우리나라 시문학 역사에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서호별곡<西湖別曲>
1) 개관
<서호별곡>은 「동애유고 부록 가사(東崖遺稿 附錄 哥詞)」 『동애 유고 부록 가사』동애는 허목의 증조부이고, 송호는 허목의 조부이니, 이 가사집은 허목이 무자년(1648)에 편찬한 두 선조의 합동 유고집이라 할 수 있다.
양사언(1517~1584)의 자필첩책 (自筆牒冊)인 「봉래유묵(蓬萊遺墨)」에 전하는 것으로 송호(松湖) 허강(許) (1520~1592)이 한강 일대를 유람하면서 지은 <서호사> 육결을 봉래 양사언이 악부에 올려 삼강팔엽(三腔八葉) 총 삼십삼절(三十三節)로 노래한 것이다. 허강은 부친인 동애(東崖) 좌찬성(左贊成) 허자(許磁)(1496~1551)가 문정왕후 때에 이기(李)의 횡포를 탄핵하다가 귀양가서 죽은 일을 계기로 벼슬을 마다하고 강호[西江]에 은거하여 종신(終身)토록 세상에 나오지 않아 ‘서호처사(西湖處士)’라고 일컬어졌는데, <서호별곡>은 이와 같이 은거할 당시에 지은 작품이다.
2) 작자
허강(許, 1520-1592)은 중종,명종,선조 때의 학자다. <중종,명종실록>과 허목(許穆)이 지은 <기언(記言)>에 의하면, 자는 사아(士牙)이고 호는 송호(松湖) 또는 강호처사(江湖處士)이며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벼슬을 원하지 않았다. 을사사화에 아버지 허자(許磁, 1496-1551)가 평북 홍원(洪原)에 귀양 갔다가 죽자 40년 동안 방랑하면서 아버지가 편찬하던 <역대사감(歷代史鑑)>을 완성했다. 조정에서 내린 전함사(典艦司) 별제(別提)를 사양하고 임진왜란 때 토산에 피란했다가 별세하였다. 성품이 고결했다.
3) 내용 분석
(前腔전강) 성대(聖代)예 일민(逸民) 逸民(일민):벼슬을 하지 않고 세상을 피하여 있는 사람.
되어 호해(湖海)예 누워이셔.
(中腔중강) 시서(時序) 니
추천자료
 <구지가>,<회소곡>,<도솔가>를 통해 본 국가 형성기 상고시가의 제 문제
<구지가>,<회소곡>,<도솔가>를 통해 본 국가 형성기 상고시가의 제 문제 시가 담고 있는 주된 가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시가 담고 있는 주된 가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대부][사대부풍속][사대부진출][사대부문학][사대부시조][사대부가사][사대부교육][풍속][...
[사대부][사대부풍속][사대부진출][사대부문학][사대부시조][사대부가사][사대부교육][풍속][... 2009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09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0년 1학기 일본문학의흐름1 중간시험과제물 공통8(근세 하이카이의 성립과 주요가인)
2010년 1학기 일본문학의흐름1 중간시험과제물 공통8(근세 하이카이의 성립과 주요가인) 한국고전문학개론_가사문학
한국고전문학개론_가사문학 2011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1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2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2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흐름][현대소설][근대소설][국어연구][가사문학]현대소설의 흐름, 근대소설의 흐름, 국어연...
[흐름][현대소설][근대소설][국어연구][가사문학]현대소설의 흐름, 근대소설의 흐름, 국어연... 2013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3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5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5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6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6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고전시가강독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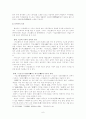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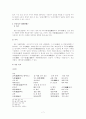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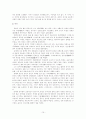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