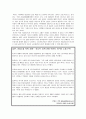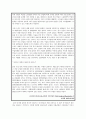본문내용
의류 제조업체들은 중고 헌옷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학교 교복 생산이나 전통의류 생산으로 전문화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거나 업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섬유와 의류 업계는 정부 당국이 중고 헌옷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대폭 올려 국내 섬유와 의류 산업에 경쟁력을 부여해 숨통을 트이게 해달라고 부단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시장을 잠식한 헌옷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중고 의류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상안이 관철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옷을 구입하려는 일반대중의 욕구는 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중은 헐벗으란 말이냐”
헌옷 수입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논쟁도 뚜렷한 결론이나 해법 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고 의류 수입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할 나위 없이 섬유나 의류 제조업자들이 주류를 이룬다. 단기적으로 일반대중들의 의생활을 향상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중고 제품 수입의존형 경제로 귀착됨으로써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산업화는 요원해지고 장기적 국가발전에도 커다란 해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중고 의류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대중들이 엄두도 못 낼 의류를 생산해내는 의류 제조업체들이 국내산업 보호를 들먹이는 행위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박한다. 이는 마치 국내의 섬유와 의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대중들에게 헐벗으라고 요구하는 뻔뻔한 작태와 같다는 논리다. 일반대중들이 헐벗지 않도록 하고 다른 한쪽으론 국내산업 보호를 강구해야만 하는 정부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난감한 지경이다. 크웨레크웨 시장에서 몸에 맞는 옷을 고르는 사람들의 분명한 손놀림만큼 정부의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현실은 그래서 더욱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잔지바르(탄자니아)=양철준 전문위원 YANG.chuljoon@wanadoo.fr
한겨레 2003.08.06
결국 미국에 들어간 중국산 티셔츠는 미국인들의 의해 소비되고 또 많은 미국인들은 철이 지난 티셔츠는 기부한다. 그렇게 버려진 티셔츠들은 굿윌과 구세군에서 구호물자로 쓰이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또 그 물건들은 많은 다른 나라로 팔려간다. 일본과 동유럽 등으로 가져가지는 빈티지 티셔츠를 제외한 거의 모든 티셔츠는 미툼바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다시 입혀지고 있다.
이런 미툼바는 위의 신문기사와 책의 내용에서와 같이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중고티셔츠의 소비로 이제 섬유업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해야할 아프리카에서의 섬유산업은 고사상태이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툼바는 철저히 시장논리에 의해서 판매되어진다. 그래서 그 티셔츠들은 많은 일자리의 생산뿐만 아니라, 오랜 노예생활과 사회주의에 피폐해져 있는 그들에게 자유경제의 스승이 되고 있는점도 있다.
어쨌든, 미툼바 중고티셔츠 시장은 이 티셔츠의 마지막 이며 또한 티셔츠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중 가장 시장논리적인 완벽한 자유무역(관세도 거의 없고 무역장벽도 없다) 이다.
이 책을 읽고
티셔츠 하나로 세계를 다 돌은 느낌이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무역과는 상당히 달랐다. 특히 미국이 목화재배의 우위국 이라는 것 그리고 버려진 티셔츠의 행방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의 쇠고기협상 그리고 FTA와 무관세등을 주창하는 미국이 자신들의 사양 산업을 보호무역을 통해 보호하는 이중적인 면은 공정무역을 위해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가지 시선에서 무역을 보게 될 수 있어 좋은 책이었다. 시간이 된다면 급히 말고 천천히 이 책을 다시보고싶다.
“그렇다고 대중은 헐벗으란 말이냐”
헌옷 수입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논쟁도 뚜렷한 결론이나 해법 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고 의류 수입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할 나위 없이 섬유나 의류 제조업자들이 주류를 이룬다. 단기적으로 일반대중들의 의생활을 향상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중고 제품 수입의존형 경제로 귀착됨으로써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산업화는 요원해지고 장기적 국가발전에도 커다란 해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중고 의류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대중들이 엄두도 못 낼 의류를 생산해내는 의류 제조업체들이 국내산업 보호를 들먹이는 행위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박한다. 이는 마치 국내의 섬유와 의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대중들에게 헐벗으라고 요구하는 뻔뻔한 작태와 같다는 논리다. 일반대중들이 헐벗지 않도록 하고 다른 한쪽으론 국내산업 보호를 강구해야만 하는 정부는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난감한 지경이다. 크웨레크웨 시장에서 몸에 맞는 옷을 고르는 사람들의 분명한 손놀림만큼 정부의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현실은 그래서 더욱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잔지바르(탄자니아)=양철준 전문위원 YANG.chuljoon@wanadoo.fr
한겨레 2003.08.06
결국 미국에 들어간 중국산 티셔츠는 미국인들의 의해 소비되고 또 많은 미국인들은 철이 지난 티셔츠는 기부한다. 그렇게 버려진 티셔츠들은 굿윌과 구세군에서 구호물자로 쓰이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또 그 물건들은 많은 다른 나라로 팔려간다. 일본과 동유럽 등으로 가져가지는 빈티지 티셔츠를 제외한 거의 모든 티셔츠는 미툼바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다시 입혀지고 있다.
이런 미툼바는 위의 신문기사와 책의 내용에서와 같이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중고티셔츠의 소비로 이제 섬유업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해야할 아프리카에서의 섬유산업은 고사상태이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툼바는 철저히 시장논리에 의해서 판매되어진다. 그래서 그 티셔츠들은 많은 일자리의 생산뿐만 아니라, 오랜 노예생활과 사회주의에 피폐해져 있는 그들에게 자유경제의 스승이 되고 있는점도 있다.
어쨌든, 미툼바 중고티셔츠 시장은 이 티셔츠의 마지막 이며 또한 티셔츠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중 가장 시장논리적인 완벽한 자유무역(관세도 거의 없고 무역장벽도 없다) 이다.
이 책을 읽고
티셔츠 하나로 세계를 다 돌은 느낌이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무역과는 상당히 달랐다. 특히 미국이 목화재배의 우위국 이라는 것 그리고 버려진 티셔츠의 행방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의 쇠고기협상 그리고 FTA와 무관세등을 주창하는 미국이 자신들의 사양 산업을 보호무역을 통해 보호하는 이중적인 면은 공정무역을 위해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가지 시선에서 무역을 보게 될 수 있어 좋은 책이었다. 시간이 된다면 급히 말고 천천히 이 책을 다시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