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절 수리권의 의의
1. 우리나라
2. 주요 다른 국가
2절 민법상의 수법관계
1. 민법의 관련조항과 법원
2. 관습상의 권리로서의 용수권
제3절 수리권의 법적 성격
1. 공권인가 사권인가?
2. 수리권은 독립된 재산권인가?
제4절 수법체계상의 분류
1. 수로를 가진 지표수의 법률관계
2. 지하수의 이용관계
3. 수로없이 확산되는 지표수의 법률관계
제 5절 결론
1. 우리나라
2. 주요 다른 국가
2절 민법상의 수법관계
1. 민법의 관련조항과 법원
2. 관습상의 권리로서의 용수권
제3절 수리권의 법적 성격
1. 공권인가 사권인가?
2. 수리권은 독립된 재산권인가?
제4절 수법체계상의 분류
1. 수로를 가진 지표수의 법률관계
2. 지하수의 이용관계
3. 수로없이 확산되는 지표수의 법률관계
제 5절 결론
본문내용
소유권 및 그 이용권의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 예컨대 민법 제214조,205조 등으로 족함에 불구하고 민법 제236조를 특별히 설정한 것은 지하수 이용권을 토지소유권과는 별도로 취급.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든다. 하지만 지하수 이용권을 연역권으로 보는 것에는 반대하고 지하수의 수문지질학적 특성상 대수층을 승역지로 보고 양수하는 토지를 요역지로 보아 지하수 이용권을 공유하천용수권과 같이 지역권의 일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다만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할 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이와는 따로이 양동 및 상속을 할 수 없지 않은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공유하천용수권과 마찬가지로 지하수 이용권을 독립의 재산권으로 확립시켜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양도성과 상속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지하수 이용권을 일반의 지역권과는 다른 특수한 지역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연창, 민법상의 지하수 이용권, 남관 심대식박사 회갑기념논문집, 236,250면
(3) 지하수 이용권의 성립
선점권의 법리하에서의 지하수 이용은 등록이나 허가사항이므로 등록이나 허가에 의해 지하수 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법이 97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지하수이용권에 대하여 등록이니 허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이나 전주로부터의 승계에 의하여 지하수 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
3. 수로없이 확산되는 지표수의 법률관계
눈이나 비로 인하여 지표상을 수로없이 흐르거나 스며드는 물을 지표 확산수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지표 확산수와 관련하여 자연적. 인공적 배수에 관한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나오는 물을 막아서는 안된다. 이를 토지소유자의 승수의무라 하는데, 자신의 토지로 흘러오는 물을 막아 상류의 토지가 물에 잠기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관하여서만 승수의무가 생길 뿐이고, 땅을 높여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경우에는 승수의무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웃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 또는 그 원인의 제거나 배수시설의 설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곽윤직, 318면
(2) 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로 자연히 흘러 내리는 물이 이웃에 필요한 것인 때에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3) 흐르는 물이 저지에 막힌 때에는 고지의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부담에 관하여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4) 인공적 배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처마에 홈통 등의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 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파손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그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거나 또는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5) 예외적으로 남는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공류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 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그 장소와 방법은 저지를 위하여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고지 또는 저지의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타인이 공작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이익을 받은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 5절 결론
원래 수리권은 관습법상의 권리였다. 각 나라에서 점차 성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습법상의 수리권을 성문법에서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리권도 마찬가지로 구법하에서의 판례가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해 온 것을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성문화시킨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농경사회를 이루어 물을 이용하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수리권에 관한 관습법이 풍부할 것이나 이에 관한 전반적인 관습법의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행민법이 제정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연구논문 이외에 수리권에 관한 慣習의 調査 硏究論文으로는 崔柄煜, “한국의 慣行水利權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법학석사학위논문, 1960 ; 李太載, “流水利用權에 관한 慣習, 判例와 法理”, 현대민법학의 제문제(김증한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82 등이 있고, 그 밖에 水利權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논문으로는 崔丙柱, “所有權 水利權を中心としにの法律關係”, 司法協會雜誌 第18卷, 1939; 李好珽, “源泉의 所有 및 利用에 관한 考察”,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61; 邊基燁, “地下水의 利用權 ”, 法曹春秋 제17권 제6호, 1965.6; 具然昌, “公有河川用水權의 再認識”, 月刊法曹, 1975년 3월 및 4월; 金容旭, “溫泉의 法律關係 (上)(下)”, 法曹 제27권(1978) 9호 및 12호; 具然昌, “民法上 地下水利用權”, 勞動法과 現代法의 諸問題, 沈泰植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84 등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법영역보다도 관습에의 의존도가 높다. 민법 제224조, 제229조 제3항, 제234조 참조.
우리 민법상 수리권은 농공업의 경영을 위한 물이용을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당시 우리나라가 농업사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던 관계로 수리권은 특히 농업적 이용을 위한 법리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민법상의 수리권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법규범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오늘날의 산업구조와 물 수요의 변동은 새로운 수리권법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증가와 고도로 발단한 산업화로 인한 물 수요의 급증추세는 물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리권의 이론구성과 법제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수리권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된 새로운 재산권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종합적인 수법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3) 지하수 이용권의 성립
선점권의 법리하에서의 지하수 이용은 등록이나 허가사항이므로 등록이나 허가에 의해 지하수 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법이 97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지하수이용권에 대하여 등록이니 허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이나 전주로부터의 승계에 의하여 지하수 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
3. 수로없이 확산되는 지표수의 법률관계
눈이나 비로 인하여 지표상을 수로없이 흐르거나 스며드는 물을 지표 확산수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지표 확산수와 관련하여 자연적. 인공적 배수에 관한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나오는 물을 막아서는 안된다. 이를 토지소유자의 승수의무라 하는데, 자신의 토지로 흘러오는 물을 막아 상류의 토지가 물에 잠기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관하여서만 승수의무가 생길 뿐이고, 땅을 높여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경우에는 승수의무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웃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 또는 그 원인의 제거나 배수시설의 설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곽윤직, 318면
(2) 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로 자연히 흘러 내리는 물이 이웃에 필요한 것인 때에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3) 흐르는 물이 저지에 막힌 때에는 고지의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부담에 관하여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4) 인공적 배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처마에 홈통 등의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 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파손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그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거나 또는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5) 예외적으로 남는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공류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 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그 장소와 방법은 저지를 위하여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고지 또는 저지의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타인이 공작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이익을 받은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 5절 결론
원래 수리권은 관습법상의 권리였다. 각 나라에서 점차 성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습법상의 수리권을 성문법에서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리권도 마찬가지로 구법하에서의 판례가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해 온 것을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성문화시킨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농경사회를 이루어 물을 이용하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수리권에 관한 관습법이 풍부할 것이나 이에 관한 전반적인 관습법의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행민법이 제정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연구논문 이외에 수리권에 관한 慣習의 調査 硏究論文으로는 崔柄煜, “한국의 慣行水利權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법학석사학위논문, 1960 ; 李太載, “流水利用權에 관한 慣習, 判例와 法理”, 현대민법학의 제문제(김증한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82 등이 있고, 그 밖에 水利權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논문으로는 崔丙柱, “所有權 水利權を中心としにの法律關係”, 司法協會雜誌 第18卷, 1939; 李好珽, “源泉의 所有 및 利用에 관한 考察”,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61; 邊基燁, “地下水의 利用權 ”, 法曹春秋 제17권 제6호, 1965.6; 具然昌, “公有河川用水權의 再認識”, 月刊法曹, 1975년 3월 및 4월; 金容旭, “溫泉의 法律關係 (上)(下)”, 法曹 제27권(1978) 9호 및 12호; 具然昌, “民法上 地下水利用權”, 勞動法과 現代法의 諸問題, 沈泰植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84 등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법영역보다도 관습에의 의존도가 높다. 민법 제224조, 제229조 제3항, 제234조 참조.
우리 민법상 수리권은 농공업의 경영을 위한 물이용을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당시 우리나라가 농업사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던 관계로 수리권은 특히 농업적 이용을 위한 법리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민법상의 수리권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법규범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오늘날의 산업구조와 물 수요의 변동은 새로운 수리권법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증가와 고도로 발단한 산업화로 인한 물 수요의 급증추세는 물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리권의 이론구성과 법제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수리권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된 새로운 재산권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종합적인 수법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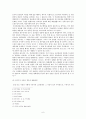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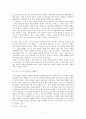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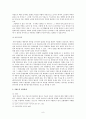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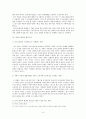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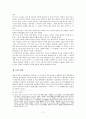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