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학의 플롯 정리
2. 작품 분석
작품 분석 1) 배신
◉ 작가소개
◉ 배신 개관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관점에서 본 해롤드 핀터의 <배신>
◉ 배신의 기타 요소
◉ 결론
작품 분석 2) 메멘토
◉ 작가소개
◉ 메멘토 개관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관점에서 본 크리스토퍼의 <메멘토>
◉ 결론
작품 분석 3) 메멘토■배신 비교, 분석
◉ 메멘토 vs 배신 비교
◉ 시학의 관점으로 본 메멘토 vs 배신
◉ 결론
2. 작품 분석
작품 분석 1) 배신
◉ 작가소개
◉ 배신 개관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관점에서 본 해롤드 핀터의 <배신>
◉ 배신의 기타 요소
◉ 결론
작품 분석 2) 메멘토
◉ 작가소개
◉ 메멘토 개관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관점에서 본 크리스토퍼의 <메멘토>
◉ 결론
작품 분석 3) 메멘토■배신 비교, 분석
◉ 메멘토 vs 배신 비교
◉ 시학의 관점으로 본 메멘토 vs 배신
◉ 결론
본문내용
이 영화가 보여주는 사건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주인공의 메모가 신빙성을 잃게 되는 대반전을 발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주인공이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몸에 있는 문신 중, 반창고로 가려진 \"절대로 전화 받지 말 것\"이라는 문신의 내용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수화기 저 편 인물이 예사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발견을 관객들은 ‘메멘토’의 매 장면 마다 찾아볼 수 있다.
- 배신: 사건과 사건 사이에 급전과 발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합플롯이지만 굳이 두 작품의 차이점을 짚어본다면, ‘배신’은 ‘메멘토’에 비해 긴 시간 간격을 가지고 보여지는 사건의 진행과 사이, 세 부호점, 침묵 등에 의해 전체적인 작품의 호흡이 느리다. 이에 비해 ‘메멘토’는 전환되는 장면 수도 많고 이에 따라 급전과 발견도 많아져서 전체적인 작품의 호흡이 ‘배신’에 비해 빠르다는 점을 차이로 꼽을 수 있겠다.
○ 최상의 단일 구조
- 메멘토: 한 씬의 끝과 다음 씬의 처음이 정확히 맞물리며 사건간의 개연성과 필연성을 가지며 어지럽게 흩트려진 듯한 두 종류의 사건 - ‘과거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흑백화면’, ‘현재로부터 시간의 역순으로 보여지는 칼라화면’은 영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만남으로써 서로간의 개연성을 확립 시켜준다.
- 배신: 앞부분에서 던져준 수수께끼를 뒤에 오는 사건에서 풀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배열이 일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언급된 사건이 다음 장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 - 예를 들어, 로버트가 토르셀로에서 「예이츠」를 읽었던 경험이 있다고 말한 장면이 나오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간 장면에서 직접 로버트가 그 행동을 한다 - 을 볼 때 사건간의 연계가 충분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작품 모두 하나의 결말을 내기 위한 방향으로 사건이 배열되어 있으므로(구체적인 설명문장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텐데 본인은 모르겠음, 아니면 이 표현 말고_ 두 작품 모두 이야기의 통일성을 위한 공통의 장치를 가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통일성을 가진다.
작품들의 진행구조가 시간의 역순을 이용하고 있기에 처음엔 다소 삽화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두 작품은 모두 삽화적이지 않은 최상의 단일 구조라 할 수 있다.
○ 비극적 결함(하마르티아)
- 메멘토: 주인공(레니)은 아내의 살해현장에서 범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뒤 일명 10분 기억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영화의 끝이자, 이야기의 시작인 영화의 끝으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의도적인 기억의 왜곡으로 시작되었다는 대반전을 만날 수 있다. 이로써 ‘메멘토’의 하마르티아는 주인공의 아집, 의도적인 기억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배신:굳이 하마르티아를 찾는다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간의 억지를 부려서 주장한다면 주인공의 성격적인 결함, 판단오류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절친한 친구의 부인인 에마를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 제리의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이야기가 어디에서 어긋난 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연민과 공포
시학에서 ‘연민과 공포가 시각적 요소에서 유발되는 것보다는 플롯의 구조자체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더 훌륭한 방법이다(시학print 38-39)’라고 했는데 이 두 작품의 경우가 그렇다. (시간 역순 전개에 의한 효과를 언급해야함)
○ 행동
- 메멘토: 시학에서 얘기하는 3가지 행동유형 중 (시학 print, 40p. 참조) 에서 두 번째 행동유형을 취한다(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레니는 지미 그랜츠가 자기 아내를 죽인 범인이라고 판단해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난 뒤에 피차의 관계를 테디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 배신: 제리, 애마, 로버트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알고 이해하는 상태에서 행동이 일어나게 하므로 첫 번째 행동유형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 복잡화 과정
복잡화라는 것은 행동의 방향을 바꿔 주는 데 기여하는 모든 새로운 요소를 말한다. 그리고 복잡화의 가장 보편적인 내용은 발견이다. (연극개론, 브로케트, 39p.)
- 메멘토: 레니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과 폴라로이드 사진의 글귀들 하나하나가 사건의 복잡화를 수행하고 이로 인해 영화는 위기의 순간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 배신: 사건의 결과를 통해 그 원인을 끄집어내는 구조가 사건의 복잡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는 로버트가 제리로부터 온 편지를 발견함으로써 에마와 로버트의 행동 방향이 변경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결론
‘메멘토’와 ‘배신’은 두 작품 모두 의도가 있는 역순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사건의 진행순서를 역방향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시학에서 말하고 있는 고전적 법칙을 굉장히 이탈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품을 더욱 깊이 분석해보았을 때, 두 작품의 플롯 모두 시학에서 언급하는 \'처음-중간-끝\'을 갖는 전완체이며, 급전과 발견을 통하여 주인공의 운명이 변화를 일으키며 사건이 진행되는 복합플롯이다. 또 작품들의 진행구조가 시간의 역순을 이용하고 있기에 처음엔 다소 삽화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메멘토’와 매 장면단위, 그리고 ‘배신’에서의 사건과 사건은 그 구성이 서로 개연성과 필연성에 의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에 결론적으로 전혀 삽화적이지 않다, 즉 사건의 배열은 순차적이지는 않지만 서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플롯이 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두 작품 모두 사건의 배열만 시간의 역순구조를 택했을 뿐, 고전의 법칙에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들이 시도한 플롯의 재배열은 고전적 법칙의 파괴가 아니라 응용일 뿐인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시학》에서 플롯을 비극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두 작품을 통하여 평범한 스토리를 가지고도 플롯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극이 새로운 재미와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플롯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할 수 있었다.
- 배신: 사건과 사건 사이에 급전과 발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합플롯이지만 굳이 두 작품의 차이점을 짚어본다면, ‘배신’은 ‘메멘토’에 비해 긴 시간 간격을 가지고 보여지는 사건의 진행과 사이, 세 부호점, 침묵 등에 의해 전체적인 작품의 호흡이 느리다. 이에 비해 ‘메멘토’는 전환되는 장면 수도 많고 이에 따라 급전과 발견도 많아져서 전체적인 작품의 호흡이 ‘배신’에 비해 빠르다는 점을 차이로 꼽을 수 있겠다.
○ 최상의 단일 구조
- 메멘토: 한 씬의 끝과 다음 씬의 처음이 정확히 맞물리며 사건간의 개연성과 필연성을 가지며 어지럽게 흩트려진 듯한 두 종류의 사건 - ‘과거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흑백화면’, ‘현재로부터 시간의 역순으로 보여지는 칼라화면’은 영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만남으로써 서로간의 개연성을 확립 시켜준다.
- 배신: 앞부분에서 던져준 수수께끼를 뒤에 오는 사건에서 풀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배열이 일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언급된 사건이 다음 장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 - 예를 들어, 로버트가 토르셀로에서 「예이츠」를 읽었던 경험이 있다고 말한 장면이 나오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간 장면에서 직접 로버트가 그 행동을 한다 - 을 볼 때 사건간의 연계가 충분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작품 모두 하나의 결말을 내기 위한 방향으로 사건이 배열되어 있으므로(구체적인 설명문장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텐데 본인은 모르겠음, 아니면 이 표현 말고_ 두 작품 모두 이야기의 통일성을 위한 공통의 장치를 가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통일성을 가진다.
작품들의 진행구조가 시간의 역순을 이용하고 있기에 처음엔 다소 삽화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두 작품은 모두 삽화적이지 않은 최상의 단일 구조라 할 수 있다.
○ 비극적 결함(하마르티아)
- 메멘토: 주인공(레니)은 아내의 살해현장에서 범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뒤 일명 10분 기억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영화의 끝이자, 이야기의 시작인 영화의 끝으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의도적인 기억의 왜곡으로 시작되었다는 대반전을 만날 수 있다. 이로써 ‘메멘토’의 하마르티아는 주인공의 아집, 의도적인 기억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배신:굳이 하마르티아를 찾는다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간의 억지를 부려서 주장한다면 주인공의 성격적인 결함, 판단오류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절친한 친구의 부인인 에마를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 제리의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이야기가 어디에서 어긋난 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연민과 공포
시학에서 ‘연민과 공포가 시각적 요소에서 유발되는 것보다는 플롯의 구조자체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더 훌륭한 방법이다(시학print 38-39)’라고 했는데 이 두 작품의 경우가 그렇다. (시간 역순 전개에 의한 효과를 언급해야함)
○ 행동
- 메멘토: 시학에서 얘기하는 3가지 행동유형 중 (시학 print, 40p. 참조) 에서 두 번째 행동유형을 취한다(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레니는 지미 그랜츠가 자기 아내를 죽인 범인이라고 판단해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난 뒤에 피차의 관계를 테디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 배신: 제리, 애마, 로버트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알고 이해하는 상태에서 행동이 일어나게 하므로 첫 번째 행동유형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 복잡화 과정
복잡화라는 것은 행동의 방향을 바꿔 주는 데 기여하는 모든 새로운 요소를 말한다. 그리고 복잡화의 가장 보편적인 내용은 발견이다. (연극개론, 브로케트, 39p.)
- 메멘토: 레니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과 폴라로이드 사진의 글귀들 하나하나가 사건의 복잡화를 수행하고 이로 인해 영화는 위기의 순간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 배신: 사건의 결과를 통해 그 원인을 끄집어내는 구조가 사건의 복잡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는 로버트가 제리로부터 온 편지를 발견함으로써 에마와 로버트의 행동 방향이 변경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결론
‘메멘토’와 ‘배신’은 두 작품 모두 의도가 있는 역순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사건의 진행순서를 역방향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시학에서 말하고 있는 고전적 법칙을 굉장히 이탈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품을 더욱 깊이 분석해보았을 때, 두 작품의 플롯 모두 시학에서 언급하는 \'처음-중간-끝\'을 갖는 전완체이며, 급전과 발견을 통하여 주인공의 운명이 변화를 일으키며 사건이 진행되는 복합플롯이다. 또 작품들의 진행구조가 시간의 역순을 이용하고 있기에 처음엔 다소 삽화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메멘토’와 매 장면단위, 그리고 ‘배신’에서의 사건과 사건은 그 구성이 서로 개연성과 필연성에 의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에 결론적으로 전혀 삽화적이지 않다, 즉 사건의 배열은 순차적이지는 않지만 서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플롯이 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두 작품 모두 사건의 배열만 시간의 역순구조를 택했을 뿐, 고전의 법칙에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들이 시도한 플롯의 재배열은 고전적 법칙의 파괴가 아니라 응용일 뿐인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시학》에서 플롯을 비극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두 작품을 통하여 평범한 스토리를 가지고도 플롯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극이 새로운 재미와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플롯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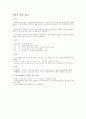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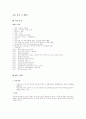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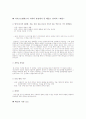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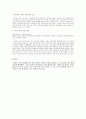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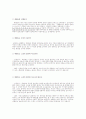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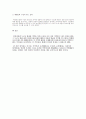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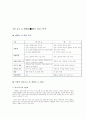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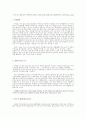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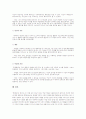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