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국악(한국전통음악)의 두 갈래
1. 아악, 당악, 향악
2. 정악(아악), 민속악
Ⅲ. 판소리
1. 동편제(東便制)
2. 서편제
3. 중고제
4. 강산제
5. 판소리의 조
1) 우조(우조길)
2) 평조(평조길)
3) 계면조(계면길)
4) 설렁제(덜렁제)
5) 경드름
6. 판소리의 발성법과 성음 음악
7. 판소리의 종류
1) 춘향가
2) 심청가
3) 홍보가
4) 수궁가(토별가)
5) 적벽가(일명 화용도 타령)
6) 변강쇠가(가루지기타령, 횡부가)
7) 장끼타령(자치가)
8) 배비장타령
9) 옹고집타령
10) 강릉매화타령
11) 왈자타령(무숙이타령)
12) 숙영낭자타령(가짜신선타령)
Ⅳ. 잡가
1. 잡가의 종류
1) 경기잡가
2) 12잡가(긴잡가)
3) 휘몰이 잡가
4) 입창(立昌) = 선소리
2. 서도잡가
3. 남도잡가
Ⅴ. 민요
1. 경기민요
2. 남도민요
3. 서도민요
Ⅵ. 시조
1. 사대부 시조의 재정비
1) 고응척(1531-1605)
2) 장경세(1547-1615)
3) 이신의(1511-1627)
4) 조존성(1533-1627)
5) 박선강(1555-1617)
2. 사대부 시조의 변이
1) 김광욱(1580-1656)
2) 이휘일(1619-1672)
3) 위백규(1727-1798)
4) 안서우(1664-1735)
5) 신헌조(1752-1809)
Ⅶ. 가곡
Ⅷ. 산조
참고문헌
Ⅱ. 국악(한국전통음악)의 두 갈래
1. 아악, 당악, 향악
2. 정악(아악), 민속악
Ⅲ. 판소리
1. 동편제(東便制)
2. 서편제
3. 중고제
4. 강산제
5. 판소리의 조
1) 우조(우조길)
2) 평조(평조길)
3) 계면조(계면길)
4) 설렁제(덜렁제)
5) 경드름
6. 판소리의 발성법과 성음 음악
7. 판소리의 종류
1) 춘향가
2) 심청가
3) 홍보가
4) 수궁가(토별가)
5) 적벽가(일명 화용도 타령)
6) 변강쇠가(가루지기타령, 횡부가)
7) 장끼타령(자치가)
8) 배비장타령
9) 옹고집타령
10) 강릉매화타령
11) 왈자타령(무숙이타령)
12) 숙영낭자타령(가짜신선타령)
Ⅳ. 잡가
1. 잡가의 종류
1) 경기잡가
2) 12잡가(긴잡가)
3) 휘몰이 잡가
4) 입창(立昌) = 선소리
2. 서도잡가
3. 남도잡가
Ⅴ. 민요
1. 경기민요
2. 남도민요
3. 서도민요
Ⅵ. 시조
1. 사대부 시조의 재정비
1) 고응척(1531-1605)
2) 장경세(1547-1615)
3) 이신의(1511-1627)
4) 조존성(1533-1627)
5) 박선강(1555-1617)
2. 사대부 시조의 변이
1) 김광욱(1580-1656)
2) 이휘일(1619-1672)
3) 위백규(1727-1798)
4) 안서우(1664-1735)
5) 신헌조(1752-1809)
Ⅶ. 가곡
Ⅷ. 산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4) 입창(立昌) = 선소리
선소리 입창(立昌)은 서서 부른다하여 \'입창(立昌)\' 이라고도 한다. 입창(立昌)은 원래 사당패의 소리인데, 한 사람이 장고를 메고 소리를 메기면 소고를 쥔 4,5 인이 일렬로 늘어서서 전진 또는 후퇴하며 발림춤을 추면서 제창으로 소리를 받는다. 산타령은 지방에 따라 경기 산타령, 서도 산타령, 남도 산타령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민요등 앞에서 선창(先昌)하는 사람을 모갑 또는 모가비라고 부른다.
2. 서도잡가
공명가, 초한가, 관동팔경, 제전, 사설공명가, 연변가, 배따라기 등이 있다. 서도잡가는 허득선과 김관준이 특히 유명하다. 서도잡가는 대체도 판소리의 한 대목이나 단가(短歌)와 같이 긴 사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긴 사설을 간단한 가락에 얹어 촘촘이 엮어 나간다. 그리고 경기잡가가 일정한 장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서도잡가는 일정한 장단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3. 남도잡가
보렴, 새타령,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잦은 육자백이 등이 있다. 남도 잡가는 좌창에 한하지 않는다. 남도지방의 노래에는 서도나 경기도와 같이 잡가라고 구분지어 부를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남도지방은 특히 판소리가 성행하였기 때문에 잡가가 뿌리내릴 자리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남도지방에서는 소리광대와 잡가광대를 구별 지어 잡가광대를 비교적 업신여겼으나 소리광대들도 사석에서는 잡가를 많이 불렀다고 한다. 현재 전하고 있는 노래 가운데 굳이 경기도잡가와 비슷한 것을 꼽는다면 새타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Ⅴ. 민요
1. 경기민요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불리는 민요로서 장단은 주로 굿거리, 자진타령, 세마치 등이 쓰이며 5음 음계의 평조 선법에 장, 단 3도 진행이 많다. 민요의 종류로는 노랫가락, 창부타령, 아리랑, 긴아리랑, 이별가, 청춘가, 도라지타령, 사발가, 노들강변, 베틀가, 태평가, 오봉산타령, 오돌독, 양류가,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사설방아타령, 양산도, 군밤타령, 풍년가, 한강수타령, 경복궁타령, 개성난봉가, 사설난봉가, 매화타령, 닐리리야, 는실타령, 사철가, 건드렁타령, 도화타령 등이 있다. 이 중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은 무가(巫歌) 이고, 아리랑, 이별가, 청춘가, 도라지타령, 태평가, 양류가, 닐리리야, 군밤타령 등은 발생 연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속요에 속한다. 또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한강수타령, 경복궁타령 등은 선소리에 속한다. 서도민요나 남도민요에 비하여 맑고 깨끗하며 경쾌하고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 되어 있고, 안비취, 묵계월, 이은주 등이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2. 남도민요
남도 민요는 전라도에 전승되는 모든 민요를 말하는 것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새타령> <육자배기> <잦은 육자배기> <농부가> <잦은 농부가> <흥타령> <진도아리랑> <날개타령> <까투리타령> <둥가타령> <개구리타령> <강강수월래> 등이 있으며 경기나 서도지방 민요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계는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 의 3음으로 구성되며 발성법은 경기의 서정성, 서도의 콧소리에 비하여 극적이고 굵은 목을 쓴다. 장단은 중몰이(흥타령, 긴 농부가 등), 중중몰이(개구리타령, 잦은농부가, 굿거리와 혼용되기도 함) 가 많이 쓰이고, 진양(육자배기), 잦은몰이(까투리타령) 가 가끔 쓰이기도 한다. 대체로 느린 노래는 슬픈 느낌을 주고 빠른 노래는 구성지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준다.
3. 서도민요
서도민요는 평안도 및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는 민요로서 현재 알려져 있는 서도민요에는 <수심가> <엮음 수심가> <배따라기> <자진 배따라기> <영변가> <긴 아지> <자진 염불> <긴 난봉가> <감내기> <자진 난봉가> <사설 난봉가> <사리원 난봉가> <몽금포 타령> 등이 있다.
다른 지방민요에 비해 기악 반주를 가진 것이 거의 없고 채보된 것도 드물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서도민요 특유의 미묘한 장식음 이라든지 창법 등이 채보의 어려움의 한 이유가 될 것이다. 노래는 거의가 일정한 장단이 없으며 간혹 있더라도 사설을 따라서 적당히 쳐주는 불규칙한 장단법이다. 선율형은 완전5도위에 단3도 보다 조금 낮은 3음으로 구성되었는데 음의 장식 방법은 다른 지방과 아주 다르다. 즉 다른 지방의 제 1음인 기음을 굵게 떨어주는데 반하여 서도노래는 제 2음 즉 완전 5도 위의 음을 떨어 주고 마지막 제 3음은 아래로 흘려주는 이른바 <수심가목> 또는 <수심가조> 이다. 창법은 콧소리(asal)로 얕게 탈탈거리며 떨거나, 큰 소리로 길게 뻗다가 갑자기 속소리로 가만히 떠는 방법 등인데 애절한 느낌을 준다. 사설도 인생의 한을 노래한 것이 많아서 다른 지방의 노래보다 비애감에 젖게 한다.
Ⅵ. 시조
1. 사대부 시조의 재정비
1) 고응척(1531-1605)
<대학곡> 28수에서부터 연시조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권 대학책이 엇디 야 됴 글고
2) 장경세(1547-1615)
<강호연군가>13수를 지난연군가의 선례와는 다르게 애절한 심정으로 탄식의 사설을 장황하게 표현함
3) 이신의(1511-1627)
<사우가> 松, 菊, 梅, 竹을 차례로 읊어 일시적인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4) 조존성(1533-1627)
<호아곡>4수로 전원생활의 흥취를 그렸다.
5) 박선강(1555-1617)
훈민시조의 전통을 이어 <오륜가> 8수를 지었다. 임란이후, 사대부시조의 다양한 모습이 재현되며 조동일은 사대부시조가 재 정비된다고 본다.
2. 사대부 시조의 변이
1) 김광욱(1580-1656)
전원시조인 <율리유곡> 17수 사대부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농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에서 나오는 작품들.
뒷집의 술 니 거츤 보리 말 못 다
즈는 것 마고 허 쥐비저 괴아내니
여러날 주렷 입이니 나 나 어이리
2) 이휘일(1619-1672)
<전가팔곡>8수
새배빗 나쟈 나셔 白舌이 소다.
일러라 아들아 밧 보러 가쟈스라
밤이 이슬 긔운에 얼마나 기런고 노라
3) 위백규(1727-1798)
<농가구장>
은 든 대로 듯고 볏슨 대로 다.
4) 입창(立昌) = 선소리
선소리 입창(立昌)은 서서 부른다하여 \'입창(立昌)\' 이라고도 한다. 입창(立昌)은 원래 사당패의 소리인데, 한 사람이 장고를 메고 소리를 메기면 소고를 쥔 4,5 인이 일렬로 늘어서서 전진 또는 후퇴하며 발림춤을 추면서 제창으로 소리를 받는다. 산타령은 지방에 따라 경기 산타령, 서도 산타령, 남도 산타령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민요등 앞에서 선창(先昌)하는 사람을 모갑 또는 모가비라고 부른다.
2. 서도잡가
공명가, 초한가, 관동팔경, 제전, 사설공명가, 연변가, 배따라기 등이 있다. 서도잡가는 허득선과 김관준이 특히 유명하다. 서도잡가는 대체도 판소리의 한 대목이나 단가(短歌)와 같이 긴 사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긴 사설을 간단한 가락에 얹어 촘촘이 엮어 나간다. 그리고 경기잡가가 일정한 장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서도잡가는 일정한 장단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3. 남도잡가
보렴, 새타령,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잦은 육자백이 등이 있다. 남도 잡가는 좌창에 한하지 않는다. 남도지방의 노래에는 서도나 경기도와 같이 잡가라고 구분지어 부를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남도지방은 특히 판소리가 성행하였기 때문에 잡가가 뿌리내릴 자리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남도지방에서는 소리광대와 잡가광대를 구별 지어 잡가광대를 비교적 업신여겼으나 소리광대들도 사석에서는 잡가를 많이 불렀다고 한다. 현재 전하고 있는 노래 가운데 굳이 경기도잡가와 비슷한 것을 꼽는다면 새타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Ⅴ. 민요
1. 경기민요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불리는 민요로서 장단은 주로 굿거리, 자진타령, 세마치 등이 쓰이며 5음 음계의 평조 선법에 장, 단 3도 진행이 많다. 민요의 종류로는 노랫가락, 창부타령, 아리랑, 긴아리랑, 이별가, 청춘가, 도라지타령, 사발가, 노들강변, 베틀가, 태평가, 오봉산타령, 오돌독, 양류가,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사설방아타령, 양산도, 군밤타령, 풍년가, 한강수타령, 경복궁타령, 개성난봉가, 사설난봉가, 매화타령, 닐리리야, 는실타령, 사철가, 건드렁타령, 도화타령 등이 있다. 이 중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은 무가(巫歌) 이고, 아리랑, 이별가, 청춘가, 도라지타령, 태평가, 양류가, 닐리리야, 군밤타령 등은 발생 연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속요에 속한다. 또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한강수타령, 경복궁타령 등은 선소리에 속한다. 서도민요나 남도민요에 비하여 맑고 깨끗하며 경쾌하고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 되어 있고, 안비취, 묵계월, 이은주 등이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2. 남도민요
남도 민요는 전라도에 전승되는 모든 민요를 말하는 것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새타령> <육자배기> <잦은 육자배기> <농부가> <잦은 농부가> <흥타령> <진도아리랑> <날개타령> <까투리타령> <둥가타령> <개구리타령> <강강수월래> 등이 있으며 경기나 서도지방 민요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계는 <떠는 목> <평으로 내는 목> <꺾는 목> 의 3음으로 구성되며 발성법은 경기의 서정성, 서도의 콧소리에 비하여 극적이고 굵은 목을 쓴다. 장단은 중몰이(흥타령, 긴 농부가 등), 중중몰이(개구리타령, 잦은농부가, 굿거리와 혼용되기도 함) 가 많이 쓰이고, 진양(육자배기), 잦은몰이(까투리타령) 가 가끔 쓰이기도 한다. 대체로 느린 노래는 슬픈 느낌을 주고 빠른 노래는 구성지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준다.
3. 서도민요
서도민요는 평안도 및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는 민요로서 현재 알려져 있는 서도민요에는 <수심가> <엮음 수심가> <배따라기> <자진 배따라기> <영변가> <긴 아지> <자진 염불> <긴 난봉가> <감내기> <자진 난봉가> <사설 난봉가> <사리원 난봉가> <몽금포 타령> 등이 있다.
다른 지방민요에 비해 기악 반주를 가진 것이 거의 없고 채보된 것도 드물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서도민요 특유의 미묘한 장식음 이라든지 창법 등이 채보의 어려움의 한 이유가 될 것이다. 노래는 거의가 일정한 장단이 없으며 간혹 있더라도 사설을 따라서 적당히 쳐주는 불규칙한 장단법이다. 선율형은 완전5도위에 단3도 보다 조금 낮은 3음으로 구성되었는데 음의 장식 방법은 다른 지방과 아주 다르다. 즉 다른 지방의 제 1음인 기음을 굵게 떨어주는데 반하여 서도노래는 제 2음 즉 완전 5도 위의 음을 떨어 주고 마지막 제 3음은 아래로 흘려주는 이른바 <수심가목> 또는 <수심가조> 이다. 창법은 콧소리(asal)로 얕게 탈탈거리며 떨거나, 큰 소리로 길게 뻗다가 갑자기 속소리로 가만히 떠는 방법 등인데 애절한 느낌을 준다. 사설도 인생의 한을 노래한 것이 많아서 다른 지방의 노래보다 비애감에 젖게 한다.
Ⅵ. 시조
1. 사대부 시조의 재정비
1) 고응척(1531-1605)
<대학곡> 28수에서부터 연시조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권 대학책이 엇디 야 됴 글고
2) 장경세(1547-1615)
<강호연군가>13수를 지난연군가의 선례와는 다르게 애절한 심정으로 탄식의 사설을 장황하게 표현함
3) 이신의(1511-1627)
<사우가> 松, 菊, 梅, 竹을 차례로 읊어 일시적인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4) 조존성(1533-1627)
<호아곡>4수로 전원생활의 흥취를 그렸다.
5) 박선강(1555-1617)
훈민시조의 전통을 이어 <오륜가> 8수를 지었다. 임란이후, 사대부시조의 다양한 모습이 재현되며 조동일은 사대부시조가 재 정비된다고 본다.
2. 사대부 시조의 변이
1) 김광욱(1580-1656)
전원시조인 <율리유곡> 17수 사대부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농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에서 나오는 작품들.
뒷집의 술 니 거츤 보리 말 못 다
즈는 것 마고 허 쥐비저 괴아내니
여러날 주렷 입이니 나 나 어이리
2) 이휘일(1619-1672)
<전가팔곡>8수
새배빗 나쟈 나셔 白舌이 소다.
일러라 아들아 밧 보러 가쟈스라
밤이 이슬 긔운에 얼마나 기런고 노라
3) 위백규(1727-1798)
<농가구장>
은 든 대로 듯고 볏슨 대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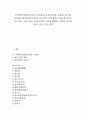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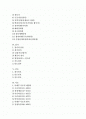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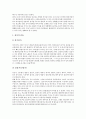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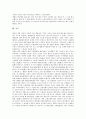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