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두보 (杜甫)
★ 두보 시풍의 변화 성장 <5시기>
★ 두보 시풍의 변화 성장 <5시기>
★ 내용
★ 이백 VS 두보
[三吏・三別]
<新安吏>
<潼关吏>
<石壕吏>
<石壕吏>
<垂老别>
<无家别>
★ 『삼별삼리』의 시대사적 의의
★ 두보 시풍의 변화 성장 <5시기>
★ 두보 시풍의 변화 성장 <5시기>
★ 내용
★ 이백 VS 두보
[三吏・三別]
<新安吏>
<潼关吏>
<石壕吏>
<石壕吏>
<垂老别>
<无家别>
★ 『삼별삼리』의 시대사적 의의
본문내용
어려울 것이라.
城下, 死. 형세가 지난 번 업성과는 달라 비록 죽는다 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人生有合, 衰盛端. 인생에는 떠남과 만남이 있으나,
어찌 늙었을 때와 젊었을 때의 구분이 있는가?
昔少日, 回竟. 옛날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주저하다 마침내 길게 탄식하네.
万征戍, 烽火被. 온 나라가 온통 전쟁중이라, 봉화가 모든 산을 덮었네.
尸草木腥, 流血川原丹. 시체가 쌓여 초목에서 비린내가 나고, 피가 흘러 개울과 언덕이 붉네.
何土? 安敢桓? 어느 고을이 낙토가 되겠는가? 어찌 감히 아직도 주저하는가?
蓬室居, 然肺肝. 초가 살림살이 다 버리니 덜컥 가슴이 찢어지네.
三吏와 같은 시기에 지었을 것으로 본다. 늘그막에 징병되어 하양으로 끌려가는 노인의 슬픔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막바지 싸움에 병사가 모자라 늙은이도 끌어가는 당시의 비참한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 낸 명작이다.
<无家>
寂寞天后,但蒿藜。 적막한 천보 이후에, 정원과 오두막에는 쑥과 명아주 뿐이라.
我里百余家,世各西。우리 동네 백여 호가 난리에 사방으로 흩어졌네.
存者无消息,死者泥。산 사람은 소식이 없고 죽은 이는 흙이 되었네.
子因,蹊。천한 이 몸 전쟁에 패해서, 돌아와 옛 오솔길 찾아보네.
久行空巷,日瘦凄。오래 떠돌다 와 텅 빈 골목을 보니, 햇살도 야위고 공기도 처량해 보이네.
但狐狸,毛怒我啼。다만 여우와 살쾡이 만나니, 털을 세우고 날 보고 우짖네.
四何所有?一二老寡妻。사방 이웃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 두 늙은 과부뿐이라네.
宿本枝,安且栖。깃들던 새는 본래의 나뭇가지를 사랑하니,
어찌 또한 궁핍한 처소라고 사양할까?
方春荷,日暮灌畦。바야흐로 봄이 되어 홀로 호미 메고, 저물녘에 밭 두렁에 물을 대네.
吏知我至,召令鼓。 현의 관리가 내가 온 줄을 알고, 나를 불러다 북 치는 연습을 시키네.
本州役,无所携。비록 이 고을 안에서의 일이지만,
안을 둘러보아도 데리고 갈 사람이라곤 없네.
近行止一身,去迷 가까이 가도 이 한 몸뿐이라, 멀리 가면 마침내 떠돌이 신세일세.
家,近理亦。집과 고향이 이미 다 없어졌으니, 멀거나 가깝거나 이치는 매한가지네.
永痛病母,五年委溪。영원히 애통하기는 긴 병으로 작고한 어머니를,
5년간이나 진구덩이에 버려 둔 일이네.
生我不得力,身酸嘶。나를 낳아 별 힘도 얻지 못하시고, 평생 우리 모자는 슬퍼서 울었을 뿐이네.
人生无家,何以蒸黎 사람이 살아 집 없는 이별을 하니, 어찌 백성이라 하겠는가.
전쟁이 패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시 군인으로 끌려가는 외톨이 노병의 신세를 거침없이 표현하여 민중의 괴로움을 폭로한 평성 제운의 오언고시이다.
가족도 없는 신세가 되어 두 번씩이나 입대해야 하는 노병의 서글픈 정경을 읊은 시로 어머니에 대한 효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수로별이 나라에 대한 충으로 끝을 맺은 것과 대조를 이루어 시경의 뒤를 이을 만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삼별은 한 운을 써서 일운도저로 장편을 이룬 것도 한 장점이라 하겠다.
★ 『삼별삼리』의 시대사적 의의
당대(唐代) 천보연간에 이르러 사회문제와 민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일어난 안사의 난은 당대정치의 전환점이었을 뿐만아니라, 문학발전상에 있어서 중대한 변환을 가져왔다.
이 시기의 문학의 주요한 특징은 낭만주의 정신이 쇠퇴하고 현실주의가 발전되고 성숙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바로 두보(杜甫)이다.
두보의 시편중에서도 『삼별삼리(三別三吏)』는 758년 그가 화주사공찬군으로 좌천되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낙양으로부터 화주로 가는 도중에 쓴 작품인데, 이 작품은 언어사용이나 표현 등에 있어서 민중의 생활상이나 그 당시의 모습 등이 뛰어나게 묘사되어 있어서 두보의 사회시의 대표적 예라 하겠다.
원래 두보는 유가적인 윤리관을 바탕으로 현실 속에서 착실하게 살려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생을 통한 곤궁한 생활과 안록산의 난을 전후한 시기의 사회적인 대혼란은 그의 문학을 현실주의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다.
안록산의 난에 휩쓸리는 동안 그는 온갖 백성들의 고난을 보기도 하고 자신도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현실주의적인 작품세계를 심화시켰다.
난군에게 잡혀 장안에 있는 동안엔 「애왕손」, 「애강두」, 「춘망」 등이 이루어졌고, 벼슬을 버리고 부주로 갔을 적에는 「북정」, 「강촌」 등의 대작을 썼으며, 다시 화주사공참군으로 밀려나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삼별삼리』라는 대표작을 쓰게 된다. 『삼별삼리』는 전체적으로 보아 민중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두보를 흔히 시사라고 이름하는 것은 그의 작품이 드러내는 역사적 현실성 때문인데 이 역사적 현실성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민중들의 삶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해명 외 공저, 『중문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102`~103쪽) 이점에서 두보는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왕유와 아주 다르다.
사회에 대한 치열한 관심이 두보라면 왕유는 자연이라는 대상에 대한 차분한 관조로 이야기될 수 있다. 그런데 두보에게는 왕유와 같은 자연에 대한 차분한 관조도 있는 반면 왕유에게는 두보와 같은 사회적인 관심이 없다. 두보는 때로는 관조적이고 때로는 사실적이다. 『삼별삼리』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처럼 두보의 시가 현실주의적 경향으로 민중의 삶을 소재로 다룬 것은 아마도 그의 시대적 원인이 크다.
안사의 난 이후 새로운 질서, 즉 틀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기존틀의 붕괴와 새로운 틀의 도입사이에서, 두보는 현실주의적 자질을 키웠으며 사회와 민중에 대한 관심을 내보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그의 경향은 이후 백거이 등의 예에서 보듯 민중에 대한 관심이 널리 보편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허세욱 외 공저, 『`중국현실주의문학사』, 법문사, 189쪽)
시는 선동문이나 일기가 아니므로, 작가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서술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나 두보의 경우 유교적 가치관과 현실상의 충돌사이에서 충정이나 위로, 설득 같은 직접적인 관념이 토로된 면도 많다
우리는 두보의 시 한 수를 읽으면서 역사책의 내용보다 더 많은 당대의 민중의 생활상을 짐작하고 간접 체험은 물론 당 시대 민초들의 삶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것이다.
城下, 死. 형세가 지난 번 업성과는 달라 비록 죽는다 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人生有合, 衰盛端. 인생에는 떠남과 만남이 있으나,
어찌 늙었을 때와 젊었을 때의 구분이 있는가?
昔少日, 回竟. 옛날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주저하다 마침내 길게 탄식하네.
万征戍, 烽火被. 온 나라가 온통 전쟁중이라, 봉화가 모든 산을 덮었네.
尸草木腥, 流血川原丹. 시체가 쌓여 초목에서 비린내가 나고, 피가 흘러 개울과 언덕이 붉네.
何土? 安敢桓? 어느 고을이 낙토가 되겠는가? 어찌 감히 아직도 주저하는가?
蓬室居, 然肺肝. 초가 살림살이 다 버리니 덜컥 가슴이 찢어지네.
三吏와 같은 시기에 지었을 것으로 본다. 늘그막에 징병되어 하양으로 끌려가는 노인의 슬픔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막바지 싸움에 병사가 모자라 늙은이도 끌어가는 당시의 비참한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 낸 명작이다.
<无家>
寂寞天后,但蒿藜。 적막한 천보 이후에, 정원과 오두막에는 쑥과 명아주 뿐이라.
我里百余家,世各西。우리 동네 백여 호가 난리에 사방으로 흩어졌네.
存者无消息,死者泥。산 사람은 소식이 없고 죽은 이는 흙이 되었네.
子因,蹊。천한 이 몸 전쟁에 패해서, 돌아와 옛 오솔길 찾아보네.
久行空巷,日瘦凄。오래 떠돌다 와 텅 빈 골목을 보니, 햇살도 야위고 공기도 처량해 보이네.
但狐狸,毛怒我啼。다만 여우와 살쾡이 만나니, 털을 세우고 날 보고 우짖네.
四何所有?一二老寡妻。사방 이웃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 두 늙은 과부뿐이라네.
宿本枝,安且栖。깃들던 새는 본래의 나뭇가지를 사랑하니,
어찌 또한 궁핍한 처소라고 사양할까?
方春荷,日暮灌畦。바야흐로 봄이 되어 홀로 호미 메고, 저물녘에 밭 두렁에 물을 대네.
吏知我至,召令鼓。 현의 관리가 내가 온 줄을 알고, 나를 불러다 북 치는 연습을 시키네.
本州役,无所携。비록 이 고을 안에서의 일이지만,
안을 둘러보아도 데리고 갈 사람이라곤 없네.
近行止一身,去迷 가까이 가도 이 한 몸뿐이라, 멀리 가면 마침내 떠돌이 신세일세.
家,近理亦。집과 고향이 이미 다 없어졌으니, 멀거나 가깝거나 이치는 매한가지네.
永痛病母,五年委溪。영원히 애통하기는 긴 병으로 작고한 어머니를,
5년간이나 진구덩이에 버려 둔 일이네.
生我不得力,身酸嘶。나를 낳아 별 힘도 얻지 못하시고, 평생 우리 모자는 슬퍼서 울었을 뿐이네.
人生无家,何以蒸黎 사람이 살아 집 없는 이별을 하니, 어찌 백성이라 하겠는가.
전쟁이 패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시 군인으로 끌려가는 외톨이 노병의 신세를 거침없이 표현하여 민중의 괴로움을 폭로한 평성 제운의 오언고시이다.
가족도 없는 신세가 되어 두 번씩이나 입대해야 하는 노병의 서글픈 정경을 읊은 시로 어머니에 대한 효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수로별이 나라에 대한 충으로 끝을 맺은 것과 대조를 이루어 시경의 뒤를 이을 만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삼별은 한 운을 써서 일운도저로 장편을 이룬 것도 한 장점이라 하겠다.
★ 『삼별삼리』의 시대사적 의의
당대(唐代) 천보연간에 이르러 사회문제와 민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일어난 안사의 난은 당대정치의 전환점이었을 뿐만아니라, 문학발전상에 있어서 중대한 변환을 가져왔다.
이 시기의 문학의 주요한 특징은 낭만주의 정신이 쇠퇴하고 현실주의가 발전되고 성숙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바로 두보(杜甫)이다.
두보의 시편중에서도 『삼별삼리(三別三吏)』는 758년 그가 화주사공찬군으로 좌천되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낙양으로부터 화주로 가는 도중에 쓴 작품인데, 이 작품은 언어사용이나 표현 등에 있어서 민중의 생활상이나 그 당시의 모습 등이 뛰어나게 묘사되어 있어서 두보의 사회시의 대표적 예라 하겠다.
원래 두보는 유가적인 윤리관을 바탕으로 현실 속에서 착실하게 살려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생을 통한 곤궁한 생활과 안록산의 난을 전후한 시기의 사회적인 대혼란은 그의 문학을 현실주의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다.
안록산의 난에 휩쓸리는 동안 그는 온갖 백성들의 고난을 보기도 하고 자신도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현실주의적인 작품세계를 심화시켰다.
난군에게 잡혀 장안에 있는 동안엔 「애왕손」, 「애강두」, 「춘망」 등이 이루어졌고, 벼슬을 버리고 부주로 갔을 적에는 「북정」, 「강촌」 등의 대작을 썼으며, 다시 화주사공참군으로 밀려나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삼별삼리』라는 대표작을 쓰게 된다. 『삼별삼리』는 전체적으로 보아 민중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두보를 흔히 시사라고 이름하는 것은 그의 작품이 드러내는 역사적 현실성 때문인데 이 역사적 현실성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민중들의 삶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해명 외 공저, 『중문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102`~103쪽) 이점에서 두보는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왕유와 아주 다르다.
사회에 대한 치열한 관심이 두보라면 왕유는 자연이라는 대상에 대한 차분한 관조로 이야기될 수 있다. 그런데 두보에게는 왕유와 같은 자연에 대한 차분한 관조도 있는 반면 왕유에게는 두보와 같은 사회적인 관심이 없다. 두보는 때로는 관조적이고 때로는 사실적이다. 『삼별삼리』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처럼 두보의 시가 현실주의적 경향으로 민중의 삶을 소재로 다룬 것은 아마도 그의 시대적 원인이 크다.
안사의 난 이후 새로운 질서, 즉 틀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기존틀의 붕괴와 새로운 틀의 도입사이에서, 두보는 현실주의적 자질을 키웠으며 사회와 민중에 대한 관심을 내보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그의 경향은 이후 백거이 등의 예에서 보듯 민중에 대한 관심이 널리 보편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허세욱 외 공저, 『`중국현실주의문학사』, 법문사, 189쪽)
시는 선동문이나 일기가 아니므로, 작가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서술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나 두보의 경우 유교적 가치관과 현실상의 충돌사이에서 충정이나 위로, 설득 같은 직접적인 관념이 토로된 면도 많다
우리는 두보의 시 한 수를 읽으면서 역사책의 내용보다 더 많은 당대의 민중의 생활상을 짐작하고 간접 체험은 물론 당 시대 민초들의 삶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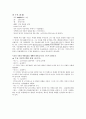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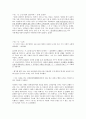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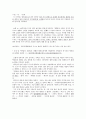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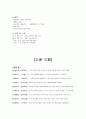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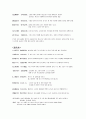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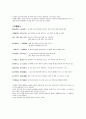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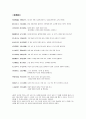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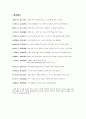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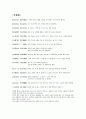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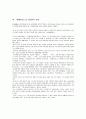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