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헤밍웨이 문학의 남성적인 매력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헤밍웨이 사상의 진수는 좀더 깊은 데 있는 것 같다.
“패배할 때 우리는 크리스챤이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이 이 장편 제26장에 나온다. 패배할 때 인간은 자기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헤밍웨이는 전방에 신부를 등장시켜 많은 말을 시키고 있는 데 신부란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넘어 서서 주로 정신적 가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제시한 인류구원의 길을 찾는 직업이다. 현대의 스트레스, 전쟁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 신부의 일이다. 휴가여행을 떠나는 헨리중위에게 신부는 맑은 산 속의 자기 고향마을에 가서 쉬고 오라고 권한다.
그곳에는 전쟁과 폭력과 타락이 없고 맑은 평화가 있다. 두 연인이 수려한 스위스 산중의 평화 속에서 사랑의 마지막 날들을 즐기게 되는 것도 의미가 깊다. 헤밍웨이의 단편선집 <우리 시대에> (1925)라는 제목이 “우리 시대에 평화를 주시 옵고…”하는 기도문의 한 토막이라는 것도 평화에 대한 갈구가 이 작가에게 얼마나 깊었던가를 암시해 준다.
원래 모험을 좋아하며 사지를 여러 번 넘긴 이 작가는 몸에 상처를 많이 입어 만년에는 신경통 때문에 타이프 원고도 일어선 자세로 쳤다 한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산다는 것이 남달리 괴롭고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은 더욱 절박했을 것이다. 그의 죽음도 어쩌면 이러한 절박감을 참다못한 자살일지 모른다. 인간은 살려고 버둥거리다 다치고, 멋있게 살려고 기를 쓰다 꺾여진다. 이 작가가 주로 다치고 꺾이는 인생을 그려낸 까닭은 어쩌면 인간의 비극성, 나아가 20세기의 불행에 그만큼 민감했던 때문이 아닐까?
이 비극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런 비참한 신세를 벗어나는 길은 어디 있는지 작가는 그 해답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그 비참한 양상만을 제시함으로써 그 해답을 독자 각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신의 상실일까? 폭력일까? 아니면 개개인의 무책임일까? 낙원을 쫓겨난 미련한 인류는 전쟁과 살육과 부상을 그칠 줄 모른다. 세계대전의 대량 살육과 그로 말미암은 무수한 개인들의 고통은 인간의 운명, 인간의 조건을 깊이 반성케 했다. 장편 <무기여 잘있거라> 는 현대와 인류의 기본문제를 은근히 파고들어 광명의 길을 찾아보려는 안타까운 희망의 소산이겠다. 이런 숨은 기조를 간파할 때 이 장편은 20세기의 문제작으로 큰 비중과 규모를 갖추게 된다.
“패배할 때 우리는 크리스챤이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이 이 장편 제26장에 나온다. 패배할 때 인간은 자기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헤밍웨이는 전방에 신부를 등장시켜 많은 말을 시키고 있는 데 신부란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넘어 서서 주로 정신적 가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제시한 인류구원의 길을 찾는 직업이다. 현대의 스트레스, 전쟁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 신부의 일이다. 휴가여행을 떠나는 헨리중위에게 신부는 맑은 산 속의 자기 고향마을에 가서 쉬고 오라고 권한다.
그곳에는 전쟁과 폭력과 타락이 없고 맑은 평화가 있다. 두 연인이 수려한 스위스 산중의 평화 속에서 사랑의 마지막 날들을 즐기게 되는 것도 의미가 깊다. 헤밍웨이의 단편선집 <우리 시대에> (1925)라는 제목이 “우리 시대에 평화를 주시 옵고…”하는 기도문의 한 토막이라는 것도 평화에 대한 갈구가 이 작가에게 얼마나 깊었던가를 암시해 준다.
원래 모험을 좋아하며 사지를 여러 번 넘긴 이 작가는 몸에 상처를 많이 입어 만년에는 신경통 때문에 타이프 원고도 일어선 자세로 쳤다 한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산다는 것이 남달리 괴롭고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은 더욱 절박했을 것이다. 그의 죽음도 어쩌면 이러한 절박감을 참다못한 자살일지 모른다. 인간은 살려고 버둥거리다 다치고, 멋있게 살려고 기를 쓰다 꺾여진다. 이 작가가 주로 다치고 꺾이는 인생을 그려낸 까닭은 어쩌면 인간의 비극성, 나아가 20세기의 불행에 그만큼 민감했던 때문이 아닐까?
이 비극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런 비참한 신세를 벗어나는 길은 어디 있는지 작가는 그 해답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그 비참한 양상만을 제시함으로써 그 해답을 독자 각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신의 상실일까? 폭력일까? 아니면 개개인의 무책임일까? 낙원을 쫓겨난 미련한 인류는 전쟁과 살육과 부상을 그칠 줄 모른다. 세계대전의 대량 살육과 그로 말미암은 무수한 개인들의 고통은 인간의 운명, 인간의 조건을 깊이 반성케 했다. 장편 <무기여 잘있거라> 는 현대와 인류의 기본문제를 은근히 파고들어 광명의 길을 찾아보려는 안타까운 희망의 소산이겠다. 이런 숨은 기조를 간파할 때 이 장편은 20세기의 문제작으로 큰 비중과 규모를 갖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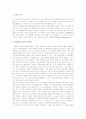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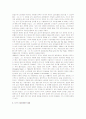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