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
2. 91년 헌법과 93년 헌법
2. 91년 헌법과 93년 헌법
본문내용
결에 대해서도 항소는 가능했고 대개 이는 타 지구법원이 떠맡게 되었다.
형사재판의 경우 3심제가 도입되었다. 코뮌(데빠르뜨망의 하위 행정구역)내의 관리로 구성되는 경범재판소와 경범죄재판소가 설립되어 1심을 담당하였고, 그에 대한 항소심은 데빠르뜨망의 현청소재지에 있는 형사재판소 이 담당하였다. 선거인회에 의해 선출된 3인의 판사로 구성되는 형사재판소에는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Procureur, 이 때 근대적 의미의 검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를 포함하고 있었다.(즉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 내 검사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 기소배심과 판결배심이 도입되었으며 이 배심원단은 역시 능동적시민 중에서 선출되었다.
사법부의 정상에는 항소재판소 혹은 파기원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처럼 법률심을 담당하였으며, 판결의 절차상 하자와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여 본래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국민최고법원이 설치되어 국가안전에 대한 범죄와 고위관리의 범법행위를 관장하였다.
법률상의 변화로는, 이단죄, 대역죄 와 같은 모든 \'가상적 범죄\'를 폐지하였다.
정리하자면 2원적 사법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할 것인데, 현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91년 헌법은 그리 빛을 보지 못하였다.
끊임없이 반혁명을 획책하던 국왕은 부이에 장군과 외무상 브르뙤이유의 도움 하에 1791년 6월 20일에 바렌을 경유한 외국에로의 탈출을 감행하였으나 이는 곧 좌절되었다. 이로 인해 국왕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와해되었고 중층 이하의 부르좌는 국왕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되었다. 결국 1792년 8월 10일의 폭력사태에 의해(이때 뛸르리 궁을 지키던 스위스 위병 700여명이 국민방위대와 쌍-뀔로뜨에 의해 전멸당하였다.) 국왕의 왕권은 정지되었고 곧 이어 9월 21일 국민공회 가 들어서고 제 1공화정이 선포되면서 왕정은 와해되었다. 또한 헌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도 있었다. 이 헌법은 철저하게 부르주아의 이익을 반영한 헌법이었다. 곧, 능동적 시민에게만 부여되는 제한선거권이 보여주듯이, 이 헌법은 부르주아만을 위한 민주정을 규정하고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수동적 시민으로 전락하였으며 이는 진정한 국민주권에 의한 정치는 아니었다.
반면 1793년 헌법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Citoyen Actifs‘이라는 개념(부르주아 중심의 개념)보다는 투표권 상관없이 프랑스 국내에 있는 사람의 인민이라는 개념을 헌법 전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투표권을 통해 의회라는 매개체로 통해 행사되는 국민주권보다는 의회에 양도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상할 수 있는 인민주권을 강조하였다. (1789년 인권선언서 3조에서는 국민주권을 강조한 반면에 1793년 인권선언서 25조에서는 인민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 1791년 헌법에서는 자연권의 개념을 강조하고 ‘자유, 소유권, 안정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라고하여 소유권을 자유 뒤에 바로 두어서 재산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회가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793년 인권선언은 제2조 자연권의 순서를 ‘평등, 자유, 안전, 소유권’의 순서를 둠으로써 평등을 새로 추가시켰고 그것을 앞에 두고 소유권을 맨 뒤에 둠으로써 민중혁명(8월혁명)에 결과 탄생한 국민공회 성격, 즉 인민주권을 강조하고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정부의 역할도 차이를 보이는데 국민의회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국민공회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부의 분배문제에 대해서도 공평성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3심제가 도입되었다. 코뮌(데빠르뜨망의 하위 행정구역)내의 관리로 구성되는 경범재판소와 경범죄재판소가 설립되어 1심을 담당하였고, 그에 대한 항소심은 데빠르뜨망의 현청소재지에 있는 형사재판소 이 담당하였다. 선거인회에 의해 선출된 3인의 판사로 구성되는 형사재판소에는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Procureur, 이 때 근대적 의미의 검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를 포함하고 있었다.(즉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 내 검사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 기소배심과 판결배심이 도입되었으며 이 배심원단은 역시 능동적시민 중에서 선출되었다.
사법부의 정상에는 항소재판소 혹은 파기원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처럼 법률심을 담당하였으며, 판결의 절차상 하자와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여 본래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국민최고법원이 설치되어 국가안전에 대한 범죄와 고위관리의 범법행위를 관장하였다.
법률상의 변화로는, 이단죄, 대역죄 와 같은 모든 \'가상적 범죄\'를 폐지하였다.
정리하자면 2원적 사법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할 것인데, 현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91년 헌법은 그리 빛을 보지 못하였다.
끊임없이 반혁명을 획책하던 국왕은 부이에 장군과 외무상 브르뙤이유의 도움 하에 1791년 6월 20일에 바렌을 경유한 외국에로의 탈출을 감행하였으나 이는 곧 좌절되었다. 이로 인해 국왕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와해되었고 중층 이하의 부르좌는 국왕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되었다. 결국 1792년 8월 10일의 폭력사태에 의해(이때 뛸르리 궁을 지키던 스위스 위병 700여명이 국민방위대와 쌍-뀔로뜨에 의해 전멸당하였다.) 국왕의 왕권은 정지되었고 곧 이어 9월 21일 국민공회 가 들어서고 제 1공화정이 선포되면서 왕정은 와해되었다. 또한 헌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도 있었다. 이 헌법은 철저하게 부르주아의 이익을 반영한 헌법이었다. 곧, 능동적 시민에게만 부여되는 제한선거권이 보여주듯이, 이 헌법은 부르주아만을 위한 민주정을 규정하고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수동적 시민으로 전락하였으며 이는 진정한 국민주권에 의한 정치는 아니었다.
반면 1793년 헌법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Citoyen Actifs‘이라는 개념(부르주아 중심의 개념)보다는 투표권 상관없이 프랑스 국내에 있는 사람의 인민이라는 개념을 헌법 전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투표권을 통해 의회라는 매개체로 통해 행사되는 국민주권보다는 의회에 양도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상할 수 있는 인민주권을 강조하였다. (1789년 인권선언서 3조에서는 국민주권을 강조한 반면에 1793년 인권선언서 25조에서는 인민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 1791년 헌법에서는 자연권의 개념을 강조하고 ‘자유, 소유권, 안정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라고하여 소유권을 자유 뒤에 바로 두어서 재산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회가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793년 인권선언은 제2조 자연권의 순서를 ‘평등, 자유, 안전, 소유권’의 순서를 둠으로써 평등을 새로 추가시켰고 그것을 앞에 두고 소유권을 맨 뒤에 둠으로써 민중혁명(8월혁명)에 결과 탄생한 국민공회 성격, 즉 인민주권을 강조하고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정부의 역할도 차이를 보이는데 국민의회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국민공회 때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부의 분배문제에 대해서도 공평성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추천자료
 역사적인 기록을 위주로 하여 마리 앙트와네트 시대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원인과 진행, 혁...
역사적인 기록을 위주로 하여 마리 앙트와네트 시대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원인과 진행, 혁... 프랑스 혁명의 발단과 전개과정
프랑스 혁명의 발단과 전개과정 명예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재해석
명예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재해석 프랑스 혁명 (부르주아혁명)의 의의와 특징, 파급효과 ,한계
프랑스 혁명 (부르주아혁명)의 의의와 특징, 파급효과 ,한계 프랑스 혁명의 배경 및 원인
프랑스 혁명의 배경 및 원인 프랑스 대혁명(1789~1799년) 에 대해서
프랑스 대혁명(1789~1799년) 에 대해서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혁명의 원인 및 진행과정, 역사적 의미)
프랑스 대혁명 (혁명의 원인 및 진행과정, 역사적 의미) 프랑스 혁명의 발생 과정
프랑스 혁명의 발생 과정 프랑스 문화와 예술 - 프랑스 대혁명의 발발, 전개, 영향 및 한계점에 대해
프랑스 문화와 예술 - 프랑스 대혁명의 발발, 전개, 영향 및 한계점에 대해 프랑스 문화정책과 프랑스 혁명
프랑스 문화정책과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과 베르사이유의 행진. 혁명의 숨겨진 주인공-여성들에 관하여
프랑스 혁명과 베르사이유의 행진. 혁명의 숨겨진 주인공-여성들에 관하여  [프랑스문화와예술]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문화와예술]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전쟁사,프랑스 전쟁사 연대표,십자군 전쟁,백년 전쟁,프랑스 혁명,나폴레옹 전쟁
프랑스 전쟁사,프랑스 전쟁사 연대표,십자군 전쟁,백년 전쟁,프랑스 혁명,나폴레옹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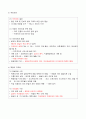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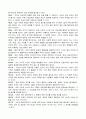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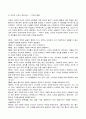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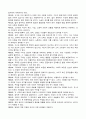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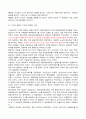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