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녀의 호출은 80년대에 대한 작가의 부재의식에서 비롯된다. 작가는 대학시절 자신과는 “살아왔던 나날”이 “다른 계급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동정하게 되고, 이에 “노동운동을 해보겠다고 공장에 들어간”다. 그러나 작가의 이러한 선택은 일종의 죄책감 그 이상도 이하고 아닌, 인텔리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학졸업자의 신분으로 위장취업이 발각되었을 때, “내심으로 자신을 발각해준 공장주측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9) 김현실, 「공지영론」,『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한길사,1997,356,357쪽.
던 작가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노동자가 될 수 없었던 그녀 자신에 대한 원망과 인텔리 지식인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여기에서 비롯되는 부채의식으로 인해 그녀는 노동자 계층을 표상하는 봉순이 언니를 불러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애 대한 부채의식이 동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작가가 불러낸 봉순이 언니는 당대의 시대적인 표상으로 존재하기에는 미흡한 구석이 있다. 작가가 불러낸 봉순이 언니는 80년대 혹은 70년대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보다는 작가의 기억 속에 아련한 연민의 정서로 존재하는 그런 순종적이고 착한 여자일 뿐이다. 작가의 연민에 가득 찬 서술에 봉순이 언니의 계급성과 정치성은 무화되어 버리고 만다, 작가의 부르조아적인 시선에 의해 형상화되기 때문에 그녀의 대표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녀의 존재가 70·80년대는 물론 90년대를 충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이런점에서 작가가 지향하는 후일담 형식과 페미니즘의 정치성의 조화로운 통합을 통한 글쓰기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민중 문학의 정치적인 감감을 어느 누구 보다도 잘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받아온 그녀의 소설적 운명이 결과적으로 80년대의 치열했던 이념적 현실을 과장된 도덕적 자기 정당성과 자신의 보상받지 못한 젊음에 대한 회한으로 귀착되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소설 역시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1993년 출간된 이후,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뿐만 아니라 우리 문단과 사회에 여성주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작품이다 이덕화, 임옥희, 최혜실, 나병철, 박정애, 이정옥, 이재복, 변신원, 구명숙 공저,『한국 여성 문학의 이해』,예림기획, 2003, 이재복편 : 264~270쪽.
던 작가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노동자가 될 수 없었던 그녀 자신에 대한 원망과 인텔리 지식인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여기에서 비롯되는 부채의식으로 인해 그녀는 노동자 계층을 표상하는 봉순이 언니를 불러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애 대한 부채의식이 동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작가가 불러낸 봉순이 언니는 당대의 시대적인 표상으로 존재하기에는 미흡한 구석이 있다. 작가가 불러낸 봉순이 언니는 80년대 혹은 70년대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보다는 작가의 기억 속에 아련한 연민의 정서로 존재하는 그런 순종적이고 착한 여자일 뿐이다. 작가의 연민에 가득 찬 서술에 봉순이 언니의 계급성과 정치성은 무화되어 버리고 만다, 작가의 부르조아적인 시선에 의해 형상화되기 때문에 그녀의 대표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녀의 존재가 70·80년대는 물론 90년대를 충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이런점에서 작가가 지향하는 후일담 형식과 페미니즘의 정치성의 조화로운 통합을 통한 글쓰기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민중 문학의 정치적인 감감을 어느 누구 보다도 잘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받아온 그녀의 소설적 운명이 결과적으로 80년대의 치열했던 이념적 현실을 과장된 도덕적 자기 정당성과 자신의 보상받지 못한 젊음에 대한 회한으로 귀착되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소설 역시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1993년 출간된 이후,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뿐만 아니라 우리 문단과 사회에 여성주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작품이다 이덕화, 임옥희, 최혜실, 나병철, 박정애, 이정옥, 이재복, 변신원, 구명숙 공저,『한국 여성 문학의 이해』,예림기획, 2003, 이재복편 : 264~2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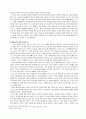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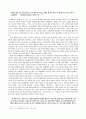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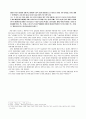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