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희극(喜劇; comedy)
2. 소극(笑劇; farce)
결론
【참고 문헌】
본론
1. 희극(喜劇; comedy)
2. 소극(笑劇; farce)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랴. (아들을 집어 팽개치고 ‘녹수 청산
……’을 부르고 깨끼춤을 추며 퇴장하고, 소무도 자라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 <양주별산대 놀이> 중에서
이 장면은 1인 2역의 말장난, 인형의 사용, 춤의 동작 등을 통하여 웃음을 준다. 이러한 즐거움은 다분히 소극적인 것이다. 그러나 위의 웃음은 ‘말’[학문]의 권위와 가족 관계 등의 기존의 질서 체제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웃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전통극은 주제적인 의미에서는 소극을 넘어선 희극의 세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극은 과장된 행위 등을 통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것에만 목적을 둔 연극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론
희극과 소극은 관객에게 웃음을 제공하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희극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작품 구성 및 웃음의 성격 그리고 웃음을 만드는 기법 등의 차이를 통해서 희극과 소극을 구분할 수 있다.
희극과 소극을 비교해보면 희극과 소극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소극은 희극 이전에 만들어 졌으며, 소극은 관객에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웃음만을 제공하던 초기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연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희극은 대본이 요구하는 복잡한 사건을 통해서 관객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심리적 깊이를 간직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 등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웃음 자체가 제공하는 단순한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는 소극과 인간과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현상의 모순을 수정하려는 희극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희극과 소극은 웃음을 제공한다는 것에서 같은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두 극의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유추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극은 단지 웃음을 자아내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희극은 그것을 통해 지적인 자극을 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희극에 있어서는 인물이 사고를 통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소극은 행동이 사고에 앞서는 수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논리적 원인 결과에 대해 집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한 작품 속에 희극과 소극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소극으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고급 희극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거리가 있다. 이는 소극이란 용어가 중세에 와서야 사용되었지만 소극적인 요소는 연극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해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희극에서 소극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면도 살펴보았다. 이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서 순간마다 과장된 행동 등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웃음들이 모여서 마지막에는 산업화된 현실에서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희극과 소극은 구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분하기 모호한 상황이 등장하기도 한다.
즉, 희극과 소극은 비슷하지만 다른 유형의 극 형태이다. 이 두 유형이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발달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희극과 소극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동권 外 4명(2002), 연극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이근삼(2004), 연극개론, 문학사상사
이명우(1999), 희곡의 이해, 박이정
이성섭(2007), 연극, 연극과 인간
양승국(1996), 희곡의 이해, 태학사
김익두(2003), 연극개론, 한국문학사
김중효(2005), 연극_시간의 거울, 예전사
알랭쿠프리(2000), 연극의 이해, 동문선
앙리 베르그송(1983), 웃음 - 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 종로서적
조남철 外 3명(2009), 한국희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을 부르고 깨끼춤을 추며 퇴장하고, 소무도 자라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 <양주별산대 놀이> 중에서
이 장면은 1인 2역의 말장난, 인형의 사용, 춤의 동작 등을 통하여 웃음을 준다. 이러한 즐거움은 다분히 소극적인 것이다. 그러나 위의 웃음은 ‘말’[학문]의 권위와 가족 관계 등의 기존의 질서 체제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웃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전통극은 주제적인 의미에서는 소극을 넘어선 희극의 세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극은 과장된 행위 등을 통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것에만 목적을 둔 연극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론
희극과 소극은 관객에게 웃음을 제공하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희극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작품 구성 및 웃음의 성격 그리고 웃음을 만드는 기법 등의 차이를 통해서 희극과 소극을 구분할 수 있다.
희극과 소극을 비교해보면 희극과 소극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소극은 희극 이전에 만들어 졌으며, 소극은 관객에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웃음만을 제공하던 초기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연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희극은 대본이 요구하는 복잡한 사건을 통해서 관객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심리적 깊이를 간직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 등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웃음 자체가 제공하는 단순한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는 소극과 인간과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현상의 모순을 수정하려는 희극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희극과 소극은 웃음을 제공한다는 것에서 같은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두 극의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유추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극은 단지 웃음을 자아내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희극은 그것을 통해 지적인 자극을 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희극에 있어서는 인물이 사고를 통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소극은 행동이 사고에 앞서는 수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논리적 원인 결과에 대해 집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한 작품 속에 희극과 소극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소극으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고급 희극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거리가 있다. 이는 소극이란 용어가 중세에 와서야 사용되었지만 소극적인 요소는 연극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해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희극에서 소극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면도 살펴보았다. 이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서 순간마다 과장된 행동 등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웃음들이 모여서 마지막에는 산업화된 현실에서 비인간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희극과 소극은 구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분하기 모호한 상황이 등장하기도 한다.
즉, 희극과 소극은 비슷하지만 다른 유형의 극 형태이다. 이 두 유형이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발달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희극과 소극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동권 外 4명(2002), 연극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이근삼(2004), 연극개론, 문학사상사
이명우(1999), 희곡의 이해, 박이정
이성섭(2007), 연극, 연극과 인간
양승국(1996), 희곡의 이해, 태학사
김익두(2003), 연극개론, 한국문학사
김중효(2005), 연극_시간의 거울, 예전사
알랭쿠프리(2000), 연극의 이해, 동문선
앙리 베르그송(1983), 웃음 - 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 종로서적
조남철 外 3명(2009), 한국희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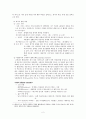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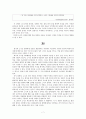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