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이킹의 기원
2. 신분
1)야를
2)카를
3)스랄
3. 바이킹 사회의 특징
4. 바이킹과 바다
1)해상활동
2)진취성
3)바이킹선
4)바이킹의 항해기술과 신앙
Ⅲ. 결론
Ⅱ. 본론
1. 바이킹의 기원
2. 신분
1)야를
2)카를
3)스랄
3. 바이킹 사회의 특징
4. 바이킹과 바다
1)해상활동
2)진취성
3)바이킹선
4)바이킹의 항해기술과 신앙
Ⅲ. 결론
본문내용
곡식, 말 13마리, 개 3마리, 소 1마리도 함께 발굴되었다.
③고크스타트 배
오세베르크 배와 더불어 바이킹 배로 유명한 배가 고크스타트 배이다. 고크스타트 배도 배 무덤으로 사용된 것인데, 무덤의 주인공은 키 175cm, 나이 쉰 살 가량 되는 남자였다. 1880년 노르웨이 남부 고크스타트에서 발굴된 이 배는 850년경에 건조된 것으로 원형이 잘 복원되어 있다. 길이 23m, 너비 5.1m, 깊이 2m인 고크스타트 배는 제대로 된 용골을 갖추고 있고, 배의 안쪽 밑바닥에는 0.9m 간격으로 나무를 대어 횡강력을 보강했다. 배의 바닥 가로들보는 니담 배와 마찬가지로 뱃전판 안쪽에 만들어 놓은 고리에 잡아 묶었다. 그리고 용골에서 0.6m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들보를 대었고, 가로들보 사이에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널빤지를 깔아 갑판 구실을 하도록 했다. 양 뱃전은 널빤지 16장을 겹붙임 방식으로 이어 붙인 뒤 못으로 고정하였고, 위에서 세 번째 널빤지에는 노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좌우에 16개 나 있다. 노의 길이는 5m 정도이며, 고물 오른쪽 뱃전에는 길이 3m 정도 되는 조종키가 달려 있고, 윗층 가로들보 한 가운데에 12m 가량 되는 돛대를 꽂았다. 부장품으로 모형 배 3 척, 공작새, 일상용구, 비단, 양모 조각, 철로 된 띠, 말 12마리, 개 6마리도 함께 출토되어 무덤의 주인공이 유력가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위의 책, 254-256.
④로스킬데 배
바이킹들이 전적으로 싸움 배만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크스타트 배도 길이 대 너비의 비율이 4.5 대 1인 것으로 미루어, 병력을 수송하기 보다는 물건을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킹이 상선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덴마크의 로스킬데에서 발굴된 1000년경 바이킹 배이다. 1956년 코펜하겐 서쪽 32km 떨어진 로스킬데 피요르드에서 바이킹 배 5 척이 발굴되었는데, 이 가운데 2 척이 짐배였다. 로스킬데 짐배 중 한 척은 길이 13.7m, 너비 3.2m이며, 돛대가 세워진 배 한 가운데에 뚜껑이 없는 선창이 있고, 돛대를 기준으로 앞 쪽으로 노 구멍이 다섯 개, 뒤쪽으로 두 개가 각각 만들어져 있다. 또 다른 배는 길이 16.5m, 너비 4.6m로 역시 가운데에 뚜껑이 없는 선창이 있고, 이물과 고물에 갑판이 설치되어 있다.
4)바이킹의 항해기술과 신앙
나침반이나 확실한 지도가 없는 당시에는 바다란 불확실한 세계였으므로 그들은 신에게 의지하며, 또 자연현상을 해석하면서 항해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바이킹들은 정확하게 항로를 따라 항해하거나 배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험으로 알게 된 해와 별, 조류의 흐름을 따라 항해하였다. 바이킹들은 대체로 철새가 이동하는 길을 바라보면서 봄철에 출항했다가 가을 무렵에 돌아왔다. 바다에서 밤을 지샐 때는 가죽으로 만든 침낭에서 잠을 잤고, 청동 취사도구를 싣고 다니면서 배 위에서 취사를 했다. 그러나 갑판에 불이 붙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안에서 식사를 했다. 바이킹들은 배에 ‘바다 뱀’(snake of the sea), ‘바람의 갈가마귀’(raven of the wind), ‘파도의 사자’(lion of the waves)와 같은 이름을 붙였고, 자신들이 하는 항해를 ‘바람의 외투’(cloak of the wind)와 같은 애칭으로 불렀다. 김주식, 『서구의 해양기담집』, p.34.
노르만을 포함한 게르만족들에게 최고의 신은 오딘(Odin)이다. 오딘은 전쟁과 지혜의 신이자 전사들의 수호신이다. 오딘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전투 도중에는 발키리(Valkyries)라는 호전적인 여신을 보내어 죽은 영웅들을 모아서 자신의 궁전인 발할라(Valhalla)로 데려오도록 한다. 바이킹들은 전투 도중에 죽을 경우 발키리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궁전으로 올라가 부활하게 된다고 믿었다. 발할라에서 부활한 용맹한 바이킹 전사자들은 헤이드룬(Heidrun)이라는 염소가 계속해서 퍼다주는 포도주를 마시며 향연을 벌이게 된다.『역사와 바다』, Luc Cuyvers,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9, pp.332-333.
Ⅲ. 결론
바이킹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한 것은 자유, 특히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자주 독립을 표명하는 자유였다. 바이킹은 이를테면, 태어날 때부터 등에 울퉁불퉁한 막대기가 꽂혀 있는 듯 뻣뻣한 자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이런저런 권위에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모든 것에 반항하는 태도를 취했다.
『바이킹 사가』의 저자 루돌프 페르트너
자주 독립 정신이 왕성한 개인주의 사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가 없는 사회, 제도적인 주종 관계가 없는 전투 조직, 계급이 수평적이고 신분 유동성이 높은 사회, 때로는 족장을 실각시킬 수 있을 만큼 완강한 주민들이 직접 참가해 운영되는 공화제 사회,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은 모권사회……. 바이킹이 만든 사회는 다양한 면에서 인습을 배제하고 합리성을 추구한 근대 서양 사회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한마디로 바이킹 사회를 ‘개인이 조직에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였던 것이다.
흔히 “문화의 성숙도는 여성의 지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바이킹 사회는 당시로서 믿기 힘들 정도로 성숙한 문화를 과시하던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영화 속에 소개된 야만인, 미개인으로서의 바이킹보다는 보다는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이를 장점으로 만들어 타개하는 개척정신의 바이킹!
그들의 수천 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에게 조금은 부족했던 강인한 진취성을 엿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바이킹』, 이브 코아, 시공사, 1997
『바이킹의 역사』, 타임라이프 북스, 가람기획, 2004
『바이킹 경영학』, 올래 해드크비스트 & 가니 레이치로, 들녘, 2000
『유럽의 대항해시대』, 김성준, 신서원, 2001
『고대의 배와 항해이야기』, Lionel Casson, 가람기획, 2001
③고크스타트 배
오세베르크 배와 더불어 바이킹 배로 유명한 배가 고크스타트 배이다. 고크스타트 배도 배 무덤으로 사용된 것인데, 무덤의 주인공은 키 175cm, 나이 쉰 살 가량 되는 남자였다. 1880년 노르웨이 남부 고크스타트에서 발굴된 이 배는 850년경에 건조된 것으로 원형이 잘 복원되어 있다. 길이 23m, 너비 5.1m, 깊이 2m인 고크스타트 배는 제대로 된 용골을 갖추고 있고, 배의 안쪽 밑바닥에는 0.9m 간격으로 나무를 대어 횡강력을 보강했다. 배의 바닥 가로들보는 니담 배와 마찬가지로 뱃전판 안쪽에 만들어 놓은 고리에 잡아 묶었다. 그리고 용골에서 0.6m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들보를 대었고, 가로들보 사이에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널빤지를 깔아 갑판 구실을 하도록 했다. 양 뱃전은 널빤지 16장을 겹붙임 방식으로 이어 붙인 뒤 못으로 고정하였고, 위에서 세 번째 널빤지에는 노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좌우에 16개 나 있다. 노의 길이는 5m 정도이며, 고물 오른쪽 뱃전에는 길이 3m 정도 되는 조종키가 달려 있고, 윗층 가로들보 한 가운데에 12m 가량 되는 돛대를 꽂았다. 부장품으로 모형 배 3 척, 공작새, 일상용구, 비단, 양모 조각, 철로 된 띠, 말 12마리, 개 6마리도 함께 출토되어 무덤의 주인공이 유력가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위의 책, 254-256.
④로스킬데 배
바이킹들이 전적으로 싸움 배만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크스타트 배도 길이 대 너비의 비율이 4.5 대 1인 것으로 미루어, 병력을 수송하기 보다는 물건을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킹이 상선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덴마크의 로스킬데에서 발굴된 1000년경 바이킹 배이다. 1956년 코펜하겐 서쪽 32km 떨어진 로스킬데 피요르드에서 바이킹 배 5 척이 발굴되었는데, 이 가운데 2 척이 짐배였다. 로스킬데 짐배 중 한 척은 길이 13.7m, 너비 3.2m이며, 돛대가 세워진 배 한 가운데에 뚜껑이 없는 선창이 있고, 돛대를 기준으로 앞 쪽으로 노 구멍이 다섯 개, 뒤쪽으로 두 개가 각각 만들어져 있다. 또 다른 배는 길이 16.5m, 너비 4.6m로 역시 가운데에 뚜껑이 없는 선창이 있고, 이물과 고물에 갑판이 설치되어 있다.
4)바이킹의 항해기술과 신앙
나침반이나 확실한 지도가 없는 당시에는 바다란 불확실한 세계였으므로 그들은 신에게 의지하며, 또 자연현상을 해석하면서 항해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바이킹들은 정확하게 항로를 따라 항해하거나 배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험으로 알게 된 해와 별, 조류의 흐름을 따라 항해하였다. 바이킹들은 대체로 철새가 이동하는 길을 바라보면서 봄철에 출항했다가 가을 무렵에 돌아왔다. 바다에서 밤을 지샐 때는 가죽으로 만든 침낭에서 잠을 잤고, 청동 취사도구를 싣고 다니면서 배 위에서 취사를 했다. 그러나 갑판에 불이 붙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안에서 식사를 했다. 바이킹들은 배에 ‘바다 뱀’(snake of the sea), ‘바람의 갈가마귀’(raven of the wind), ‘파도의 사자’(lion of the waves)와 같은 이름을 붙였고, 자신들이 하는 항해를 ‘바람의 외투’(cloak of the wind)와 같은 애칭으로 불렀다. 김주식, 『서구의 해양기담집』, p.34.
노르만을 포함한 게르만족들에게 최고의 신은 오딘(Odin)이다. 오딘은 전쟁과 지혜의 신이자 전사들의 수호신이다. 오딘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전투 도중에는 발키리(Valkyries)라는 호전적인 여신을 보내어 죽은 영웅들을 모아서 자신의 궁전인 발할라(Valhalla)로 데려오도록 한다. 바이킹들은 전투 도중에 죽을 경우 발키리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궁전으로 올라가 부활하게 된다고 믿었다. 발할라에서 부활한 용맹한 바이킹 전사자들은 헤이드룬(Heidrun)이라는 염소가 계속해서 퍼다주는 포도주를 마시며 향연을 벌이게 된다.『역사와 바다』, Luc Cuyvers,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9, pp.332-333.
Ⅲ. 결론
바이킹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사랑한 것은 자유, 특히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자주 독립을 표명하는 자유였다. 바이킹은 이를테면, 태어날 때부터 등에 울퉁불퉁한 막대기가 꽂혀 있는 듯 뻣뻣한 자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이런저런 권위에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모든 것에 반항하는 태도를 취했다.
『바이킹 사가』의 저자 루돌프 페르트너
자주 독립 정신이 왕성한 개인주의 사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가 없는 사회, 제도적인 주종 관계가 없는 전투 조직, 계급이 수평적이고 신분 유동성이 높은 사회, 때로는 족장을 실각시킬 수 있을 만큼 완강한 주민들이 직접 참가해 운영되는 공화제 사회,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은 모권사회……. 바이킹이 만든 사회는 다양한 면에서 인습을 배제하고 합리성을 추구한 근대 서양 사회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한마디로 바이킹 사회를 ‘개인이 조직에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였던 것이다.
흔히 “문화의 성숙도는 여성의 지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바이킹 사회는 당시로서 믿기 힘들 정도로 성숙한 문화를 과시하던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영화 속에 소개된 야만인, 미개인으로서의 바이킹보다는 보다는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이를 장점으로 만들어 타개하는 개척정신의 바이킹!
그들의 수천 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에게 조금은 부족했던 강인한 진취성을 엿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바이킹』, 이브 코아, 시공사, 1997
『바이킹의 역사』, 타임라이프 북스, 가람기획, 2004
『바이킹 경영학』, 올래 해드크비스트 & 가니 레이치로, 들녘, 2000
『유럽의 대항해시대』, 김성준, 신서원, 2001
『고대의 배와 항해이야기』, Lionel Casson, 가람기획,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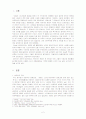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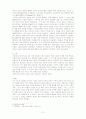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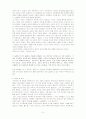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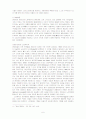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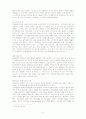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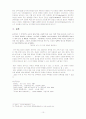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