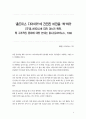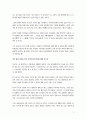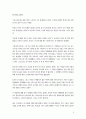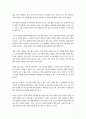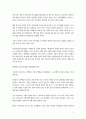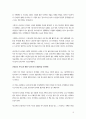목차
나는 왜 올미다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는가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건전한 비판을 ’허‘하라
\'패륜‘ 낙인찍히면 검열해도 되나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건전한 비판을 ’허‘하라
\'패륜‘ 낙인찍히면 검열해도 되나
본문내용
방송에서 다룬 학대받는 노인까지 '뒷방'으로 물러난 어르신들의 현 주소를 따뜻한 웃음과 진지한 시선으로 보여주었다.
<올미다>의 노인들은 재력과 권력이라는 유산을 무기로 젊은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존 드라마의 어르신들이 아니다. '늙음'이란 자연현상으로 노동과 로맨스에서 배제된 외롭고 힘없는 존재지만 연륜과 지혜로 자신들의 삶을 의미 있게 꾸려갈 뿐더라 젊은 세대를 조언하고 응원하는 후원자들이었다. 바로 올드미스들의 부모님 이야기이기에 <올미다>는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팬인 올드미스들의 도덕교과서 구실을 해왔다.
전통윤리 지키고자 했던 <올미다>가 패륜방송 낙인찍혀
그런데 지금 세상은 <올미다>가 견지해온 시각과 의도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음악캠프>보다 <올미다>가 더 애처롭다. 누구보다 전통윤리를 지키고자 자신의 주 시청자 층을 불편하게 해왔음에도, 아무도 그 의도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이 패륜으로 낙인찍혀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 낙인도 불편하다. <올미다>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비난이 비롯된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 언제든 사고치기만 벼르고 있던 보수언론의 준비된 맹공이란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올미다>의 심장을 지져대고 있는 패륜의 낙인을 지켜보노라면, 미국의 한 흥겨운 소설 <허클베리핀의 모험>이 생각난다. 마크 트웨인의 대표 작품인 이 소설은 발표 당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판금도서로 분류되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는 것을 우려하는 교육기관과 부모들이 있다.
<톰소여의 모험>이란 지극히 미국적 동화를 써서 대중적 명성을 얻고 그 속편으로 기획한 <허클베리핀의 모험>은 부랑아 헉핀의 가족과 사회를 떠난 유랑, 교육받지 않은 토속어 사용 등도 아이들에게 동화로 읽히기엔 교육적으로 유해하다고 생각했지만, 무엇보다 이 아이가 본 미국의 부패하고 치졸한 그리고 편견 가득한 현실 재현이 더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 작품은 미국인들이 자랑스레 내놓는 명작 가운데 하나다.
<올미다>가 진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시트콤이 무슨 짓이냐는 비아냥이 있었다. 그럼에도 <올미다>는 집요하게 시트콤이란 장르의 오락성을 무기로 진지한 얘기를 해왔다. '시트콤이 웃기면 다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웃기기만 하는 시트콤은 내리깔고 보는 게 또 그 분들 아닌가. 시트콤은 편안히 즐기기만 하게 해줘도 된다. 하지만 웃음 속에서 슬며시,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아프게 꼬집어 주는 것도 시트콤의 순기능이다.
우리 사회의 화두를 던지고 열띤 토론으로 이끄는 문제의식 역시 코미디의 순기능이다. 진지한 주제를 던지는 시트콤. 그것도 환영이다. 만일 <올미다>가 비난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시트콤으로써 서툰 작품성이 문제점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서툴음이 재발되지 않게 질타하고 조언하여 그 기획의도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한번도 제대로 시청하지 않았다면 방송 말할 자격 없다
두 젊은 대중예술의 무모한 시도가 이제 유죄판결을 앞두고 있다. 적어도 이들은 시청률에서 멀어 있었다. 지금 칼날을 시퍼렇게 세우고 계신 보수언론의 높은 분들도 사설에서는 '시청률' 운운했지만 속으로는 저런 바보같은 놈들이 있나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무덤을 판 격이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상업방송과 재벌언론에서는 이런 낭패스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철저히 이윤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윤리에 입각한 방송제작은 광고주와 시청자의 구미를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무리수도 두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발빠르게 방송법 개정을 국회에 발의했다. 동의한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들어오는 외국의 저질 프로그램과 이를 모방한 유사 저질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있어야 하고 예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선의의 법들이 대중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젊은 방송인의 모험과 용기를 꺾는 협박용 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두 방송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보수언론의 논리와 방송폐지 결정이 또 하나의 검열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방송의 자기정화능력을 믿는다. 그건 제작자와 방송사에 대한 순진한 신뢰가 아니다. 성숙한 시민이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송을 외면할 것이고 방송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음악캠프>든 <올미다>든 한 번도 제대로 시청해본 적 없는 시청자라면, 그가 거대언론의 논객이든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이든 방송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해준 힘을 믿고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생산물을 폐기처분하라고 언성을 높이는 그 소양의 후진성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질적 향상을 막는 장애물이 아닐까. 대중예술에 대한 검열을 시도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유신정권에 빙의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두 프로그램이 지향해온 선의를 생각한다면 두 방송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은 일단 '존재'를 전제로 한 건설적 조언과 충고에서 비롯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다른 볼거리도 많은데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사람들이야말로 매체 충성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숫자는 적어도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고정 청취자 층이 분명 존재합니다. 낡은 틀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저흰 지금 단순히 밥그릇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흰 성우라는 직업의 의미를 단순히 돈 버는 일에만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는 좋은 성우가 될 수도 없구요. 저도 집에 할머님이 계십니다, 다른 볼거리를 접하기 힘든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라디오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희가 청취율 자체를 무시한다는 얘긴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숫자에 밀릴 수만은 없는 커다란 의미를 지켜내고 싶어서 이렇게 건의 드리러 온 것입니다."
문제의 <올미다> '패륜방송분'에서 여주인공이 자신의 방송폐지를 눈앞에 두고 국장과 나누는 대화 내용이다. <올미다>는 아마 자신의 무모한 방송으로 시청률에서 더 밀려날 것을 스스로 의식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패륜의 선고를 받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올미다>의 노인들은 재력과 권력이라는 유산을 무기로 젊은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존 드라마의 어르신들이 아니다. '늙음'이란 자연현상으로 노동과 로맨스에서 배제된 외롭고 힘없는 존재지만 연륜과 지혜로 자신들의 삶을 의미 있게 꾸려갈 뿐더라 젊은 세대를 조언하고 응원하는 후원자들이었다. 바로 올드미스들의 부모님 이야기이기에 <올미다>는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팬인 올드미스들의 도덕교과서 구실을 해왔다.
전통윤리 지키고자 했던 <올미다>가 패륜방송 낙인찍혀
그런데 지금 세상은 <올미다>가 견지해온 시각과 의도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음악캠프>보다 <올미다>가 더 애처롭다. 누구보다 전통윤리를 지키고자 자신의 주 시청자 층을 불편하게 해왔음에도, 아무도 그 의도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이 패륜으로 낙인찍혀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 낙인도 불편하다. <올미다>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비난이 비롯된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 언제든 사고치기만 벼르고 있던 보수언론의 준비된 맹공이란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올미다>의 심장을 지져대고 있는 패륜의 낙인을 지켜보노라면, 미국의 한 흥겨운 소설 <허클베리핀의 모험>이 생각난다. 마크 트웨인의 대표 작품인 이 소설은 발표 당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판금도서로 분류되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는 것을 우려하는 교육기관과 부모들이 있다.
<톰소여의 모험>이란 지극히 미국적 동화를 써서 대중적 명성을 얻고 그 속편으로 기획한 <허클베리핀의 모험>은 부랑아 헉핀의 가족과 사회를 떠난 유랑, 교육받지 않은 토속어 사용 등도 아이들에게 동화로 읽히기엔 교육적으로 유해하다고 생각했지만, 무엇보다 이 아이가 본 미국의 부패하고 치졸한 그리고 편견 가득한 현실 재현이 더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 작품은 미국인들이 자랑스레 내놓는 명작 가운데 하나다.
<올미다>가 진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시트콤이 무슨 짓이냐는 비아냥이 있었다. 그럼에도 <올미다>는 집요하게 시트콤이란 장르의 오락성을 무기로 진지한 얘기를 해왔다. '시트콤이 웃기면 다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웃기기만 하는 시트콤은 내리깔고 보는 게 또 그 분들 아닌가. 시트콤은 편안히 즐기기만 하게 해줘도 된다. 하지만 웃음 속에서 슬며시,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아프게 꼬집어 주는 것도 시트콤의 순기능이다.
우리 사회의 화두를 던지고 열띤 토론으로 이끄는 문제의식 역시 코미디의 순기능이다. 진지한 주제를 던지는 시트콤. 그것도 환영이다. 만일 <올미다>가 비난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시트콤으로써 서툰 작품성이 문제점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서툴음이 재발되지 않게 질타하고 조언하여 그 기획의도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한번도 제대로 시청하지 않았다면 방송 말할 자격 없다
두 젊은 대중예술의 무모한 시도가 이제 유죄판결을 앞두고 있다. 적어도 이들은 시청률에서 멀어 있었다. 지금 칼날을 시퍼렇게 세우고 계신 보수언론의 높은 분들도 사설에서는 '시청률' 운운했지만 속으로는 저런 바보같은 놈들이 있나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무덤을 판 격이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상업방송과 재벌언론에서는 이런 낭패스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철저히 이윤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윤리에 입각한 방송제작은 광고주와 시청자의 구미를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무리수도 두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발빠르게 방송법 개정을 국회에 발의했다. 동의한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들어오는 외국의 저질 프로그램과 이를 모방한 유사 저질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있어야 하고 예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선의의 법들이 대중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젊은 방송인의 모험과 용기를 꺾는 협박용 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두 방송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보수언론의 논리와 방송폐지 결정이 또 하나의 검열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방송의 자기정화능력을 믿는다. 그건 제작자와 방송사에 대한 순진한 신뢰가 아니다. 성숙한 시민이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송을 외면할 것이고 방송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음악캠프>든 <올미다>든 한 번도 제대로 시청해본 적 없는 시청자라면, 그가 거대언론의 논객이든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이든 방송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사회가 이들에게 부여해준 힘을 믿고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생산물을 폐기처분하라고 언성을 높이는 그 소양의 후진성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질적 향상을 막는 장애물이 아닐까. 대중예술에 대한 검열을 시도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유신정권에 빙의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두 프로그램이 지향해온 선의를 생각한다면 두 방송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은 일단 '존재'를 전제로 한 건설적 조언과 충고에서 비롯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다른 볼거리도 많은데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사람들이야말로 매체 충성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숫자는 적어도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고정 청취자 층이 분명 존재합니다. 낡은 틀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저흰 지금 단순히 밥그릇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흰 성우라는 직업의 의미를 단순히 돈 버는 일에만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는 좋은 성우가 될 수도 없구요. 저도 집에 할머님이 계십니다, 다른 볼거리를 접하기 힘든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라디오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은 위안을 받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희가 청취율 자체를 무시한다는 얘긴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숫자에 밀릴 수만은 없는 커다란 의미를 지켜내고 싶어서 이렇게 건의 드리러 온 것입니다."
문제의 <올미다> '패륜방송분'에서 여주인공이 자신의 방송폐지를 눈앞에 두고 국장과 나누는 대화 내용이다. <올미다>는 아마 자신의 무모한 방송으로 시청률에서 더 밀려날 것을 스스로 의식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패륜의 선고를 받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