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중국 고대의 천문성도 역사
3. 고구려와 한당대의 벽화천문
4. 일본 고대의 기토라 천문도와 고구려의 천문전통 문제
5. 고려의 벽화천문과 고구려, 기토라고분과의 연계성 문제
6. 요나라의 벽화천문과 동서통합적인 우주론
7. 결 론
2. 중국 고대의 천문성도 역사
3. 고구려와 한당대의 벽화천문
4. 일본 고대의 기토라 천문도와 고구려의 천문전통 문제
5. 고려의 벽화천문과 고구려, 기토라고분과의 연계성 문제
6. 요나라의 벽화천문과 동서통합적인 우주론
7. 결 론
본문내용
늘어져 있다. 또 그 각수와 진수 사이에 28수가 아닌 듯한 별자리 2개가 보인다. 북두칠성을 겹쳐 붙인 모양의 각수 옆 9성 별자리와 ㅈ형의 5성 별자리는 張匡正墓(M10)에서도 비슷하게 그려진 것이다. 이 역시 앞으로 고찰해볼 만한 별자리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요묘의 천문벽화는 동서의 우주론을 통합하고 고금의 우주론을 종합하여 묘실천정을 장엄하려 하였다. 불교적인 벽화천문이 여기에서부터 본격화되는 측면은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접변 문제를 풀어내는 또하나의 관점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중원의 두 전통을 함께 고민하여야 하고, 지역적으로 고려와 중원을 잇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7. 결 론
지금까지 고대 동아시아의 벽화천문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어보았다. 일차적으로 墓葬文化의 측면에서 벽화천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문의 형식적인 문제가 주목되었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 벽화에서는 벽화천문의 고대적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천문 요소를 동시에 구축하는 흐름을 보였다. 천문의 대표적인 요소인 해와 달을 비롯하여 천공의 28수 별자리를 분속하기 위하여 창출되었던 사신도 제재와 그 28수를 대표하는 방위론적인 사방위 별자리 제재가 고구려 벽화에 묘사되어 있었는 바, 이들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천문우주관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무덤을 단순한 매장터로 본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동반되었던 무덤의 구조 곧 궁륭형 석실고분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여 무덤의 공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엮어 놓았다. 이곳이 천공의 우주 공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제재는 천정 벽화에 가득 그려진 별자리그림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내세의 삶을 이같은 천공의 우주 공간에서 마련한 것이다. 그 벽화 속의 천공을 온갖 신화 영물들이 수식하는 가운데 선인옥녀들이 유영을 하고 천상수렵하는 모습에서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으려는 昇仙적인 사후 관념을 엿보게 된다. 이처럼 천공의 우주공간에서 생사의 세계관을 마련하려 하였던 흐름은 고대 동아시아의 벽화천문이 지향한 중요한 특성의 하나라 여겨진다.
그렇지만 묘실벽화에 담겨있는 별자리그림들은 다시 2차적으로 당시의 천문관측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또하나의 열쇠가 된다. 당송대 이후에야 비로소 전문적인 천문도가 전해지기 시작하는 자료의 흐름을 감안하면, 벽화천문의 내용들은 그 이전 시대의 천문성도에 대한 1차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기토라고분 천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천천문도로서 손색이 없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특히 남송의 『소주순우천문도』와 조선초의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비로소 완비된 내규와 외규, 적도와 황도의 四規 작도 방식이 그보다 훨씬 이전인 7-8세기의 기토라 천문도에 구현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천문학적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판독이 가능한 50여좌의 별자리와 300여개의 별들은 동양의 고대 성좌 역사를 복원하고 조망하는 데 가장 초기의 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토라 천문도의 관측지가 38.4도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일월상과 사신도의 천문 형식이 고구려 벽화에 맞닿아 있는 점 그리고 별자리의 내용이 고구려의 천문전통을 이었다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근접하는 점, 또한 내규 가운데에 고구려의 북극3성 별자리가 추정되는 점 등은 기토라의 천문도를 결국 고구려의 천문 내용으로 환원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였던 북극3성 별자리는 중국 천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일월상 및 북두칠성 등과 함께 고려시대의 능묘벽화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의 천문전통이 고려의 벽화천문으로 지속되어 간 중요한 흔적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처럼 고구려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원천을 이루는 벽화천문전통을 이룩하였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양 별자리의 핵심이 되는 28수 별자리가 모두 그려진 자료로는 5-6세기 고구려의 덕화리2호분과 진파리4호분 외에 그 흐름을 이은 7-8세기 고송총과 기토라고분 정도에 불과하다. 中唐 이후로 가면 28수 그림자료가 중국에서도 보이는데, 돈황성도를 비롯하여 투르판 지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특히 당말 오대 사이에 吳越 錢元瓘墓(941)와 吳漢月墓(952) 등에서 보이듯이 28수 벽화천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북방의 요나라는 다시 11-12세기에 벽화천문전통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서역의 불교 천문을 통하여 유입된 새로운 천문요소인 황도십이궁도와 수당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에서 널리 채용되었던 십이지신상을 자신들의 천문우주관을 장엄하는 주요 테마로 벽화 속에 담았으며, 여기에다 역시 불교 천문의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구요와 십일요 등의 천체를 묘사하고자 하였다. 물론 그 기저에는 이미 고구려와 당송에서 일반화되었던 전통적인 이십팔수도와 일월상 및 북두칠성을 함께 그려 놓았다.
이렇게 요나라의 벽화천문은 시대적인 변화상을 반영하여 동서의 천문우주론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내보이었다. 그리고 별자리 묘사에서 고구려 천문에서 보이던 북극3성과 북두칠성 형식이 추정되기도 하는 등 요나라는 그 지역적인 위치로 인하여 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흐름과 당송의 중원으로 흘러가는 두 천문전통을 종합하는 접점에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묘실벽화에 당시의 모든 체계적인 천문우주론을 통합 구현하려는 마인드는 상당히 고구려적인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개진한 벽화천문으로서의 접근이 고대 동아시아의 천문전통 모두를 포괄한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의 천문관측과 역법의 과정 역사가 어디까지나 그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벽화천문전통이 또한 천문역법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던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함과 아울러 고구려의 벽화천문이 가지는 시대적인 역할과 그 역사적인 의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이렇게 요묘의 천문벽화는 동서의 우주론을 통합하고 고금의 우주론을 종합하여 묘실천정을 장엄하려 하였다. 불교적인 벽화천문이 여기에서부터 본격화되는 측면은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접변 문제를 풀어내는 또하나의 관점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중원의 두 전통을 함께 고민하여야 하고, 지역적으로 고려와 중원을 잇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7. 결 론
지금까지 고대 동아시아의 벽화천문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어보았다. 일차적으로 墓葬文化의 측면에서 벽화천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문의 형식적인 문제가 주목되었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 벽화에서는 벽화천문의 고대적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천문 요소를 동시에 구축하는 흐름을 보였다. 천문의 대표적인 요소인 해와 달을 비롯하여 천공의 28수 별자리를 분속하기 위하여 창출되었던 사신도 제재와 그 28수를 대표하는 방위론적인 사방위 별자리 제재가 고구려 벽화에 묘사되어 있었는 바, 이들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천문우주관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무덤을 단순한 매장터로 본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동반되었던 무덤의 구조 곧 궁륭형 석실고분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여 무덤의 공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엮어 놓았다. 이곳이 천공의 우주 공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제재는 천정 벽화에 가득 그려진 별자리그림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내세의 삶을 이같은 천공의 우주 공간에서 마련한 것이다. 그 벽화 속의 천공을 온갖 신화 영물들이 수식하는 가운데 선인옥녀들이 유영을 하고 천상수렵하는 모습에서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으려는 昇仙적인 사후 관념을 엿보게 된다. 이처럼 천공의 우주공간에서 생사의 세계관을 마련하려 하였던 흐름은 고대 동아시아의 벽화천문이 지향한 중요한 특성의 하나라 여겨진다.
그렇지만 묘실벽화에 담겨있는 별자리그림들은 다시 2차적으로 당시의 천문관측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또하나의 열쇠가 된다. 당송대 이후에야 비로소 전문적인 천문도가 전해지기 시작하는 자료의 흐름을 감안하면, 벽화천문의 내용들은 그 이전 시대의 천문성도에 대한 1차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기토라고분 천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천천문도로서 손색이 없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특히 남송의 『소주순우천문도』와 조선초의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비로소 완비된 내규와 외규, 적도와 황도의 四規 작도 방식이 그보다 훨씬 이전인 7-8세기의 기토라 천문도에 구현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천문학적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판독이 가능한 50여좌의 별자리와 300여개의 별들은 동양의 고대 성좌 역사를 복원하고 조망하는 데 가장 초기의 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토라 천문도의 관측지가 38.4도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일월상과 사신도의 천문 형식이 고구려 벽화에 맞닿아 있는 점 그리고 별자리의 내용이 고구려의 천문전통을 이었다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근접하는 점, 또한 내규 가운데에 고구려의 북극3성 별자리가 추정되는 점 등은 기토라의 천문도를 결국 고구려의 천문 내용으로 환원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였던 북극3성 별자리는 중국 천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일월상 및 북두칠성 등과 함께 고려시대의 능묘벽화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의 천문전통이 고려의 벽화천문으로 지속되어 간 중요한 흔적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처럼 고구려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원천을 이루는 벽화천문전통을 이룩하였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양 별자리의 핵심이 되는 28수 별자리가 모두 그려진 자료로는 5-6세기 고구려의 덕화리2호분과 진파리4호분 외에 그 흐름을 이은 7-8세기 고송총과 기토라고분 정도에 불과하다. 中唐 이후로 가면 28수 그림자료가 중국에서도 보이는데, 돈황성도를 비롯하여 투르판 지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특히 당말 오대 사이에 吳越 錢元瓘墓(941)와 吳漢月墓(952) 등에서 보이듯이 28수 벽화천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북방의 요나라는 다시 11-12세기에 벽화천문전통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서역의 불교 천문을 통하여 유입된 새로운 천문요소인 황도십이궁도와 수당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에서 널리 채용되었던 십이지신상을 자신들의 천문우주관을 장엄하는 주요 테마로 벽화 속에 담았으며, 여기에다 역시 불교 천문의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구요와 십일요 등의 천체를 묘사하고자 하였다. 물론 그 기저에는 이미 고구려와 당송에서 일반화되었던 전통적인 이십팔수도와 일월상 및 북두칠성을 함께 그려 놓았다.
이렇게 요나라의 벽화천문은 시대적인 변화상을 반영하여 동서의 천문우주론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내보이었다. 그리고 별자리 묘사에서 고구려 천문에서 보이던 북극3성과 북두칠성 형식이 추정되기도 하는 등 요나라는 그 지역적인 위치로 인하여 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흐름과 당송의 중원으로 흘러가는 두 천문전통을 종합하는 접점에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묘실벽화에 당시의 모든 체계적인 천문우주론을 통합 구현하려는 마인드는 상당히 고구려적인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개진한 벽화천문으로서의 접근이 고대 동아시아의 천문전통 모두를 포괄한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의 천문관측과 역법의 과정 역사가 어디까지나 그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벽화천문전통이 또한 천문역법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던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함과 아울러 고구려의 벽화천문이 가지는 시대적인 역할과 그 역사적인 의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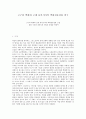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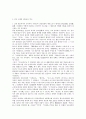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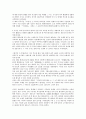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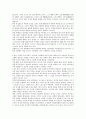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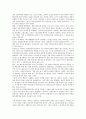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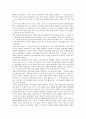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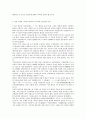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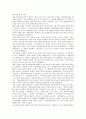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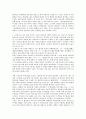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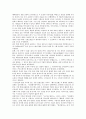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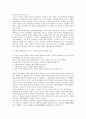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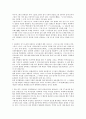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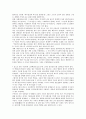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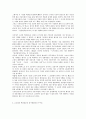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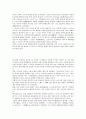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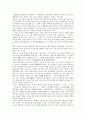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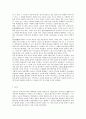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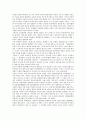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