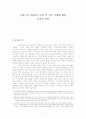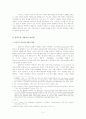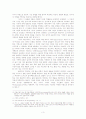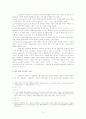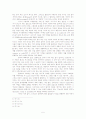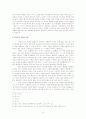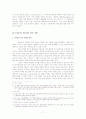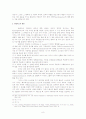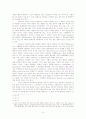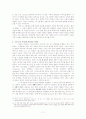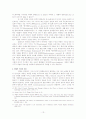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들뢰즈와 가타리의 자아관
1.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적 방법
2. 배치, 생성, 기관 없는 신체
3. 비인격적, 익명의 주체
III. 들뢰즈와 가타리의 언어 이해
1. 자아관과 언어 이해의 관계
2. 명령어로의 환원
IV. 성경적 비판의 시도
1.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자아관과의 비교
2. 빌레몬서의 언어적 측면과의 비교
V. 나가는 말
II. 들뢰즈와 가타리의 자아관
1.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적 방법
2. 배치, 생성, 기관 없는 신체
3. 비인격적, 익명의 주체
III. 들뢰즈와 가타리의 언어 이해
1. 자아관과 언어 이해의 관계
2. 명령어로의 환원
IV. 성경적 비판의 시도
1.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자아관과의 비교
2. 빌레몬서의 언어적 측면과의 비교
V. 나가는 말
본문내용
로기적 억압과 감시, 통제 등을 배격하는 과정 속에서 권위가 그 정당성을 가지고 말을 통해 시행될 수 있는 적법성까지도 함께 부정하고 있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경우 정당한 ‘행사행위’(directive)가 가지는 적법한 자리를 협박이나 강압에 의한 화효행위(perlocutionary action)와 잘 구분하고 있다. 보라, J.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2 vols (London: Polity Press, 1984-87, 독일어원본 1981), I, 295.
명령의 화행은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강요와 억압에 의한 화효행위(perlocution)와 구분해서 화수행위(illocution) 속에서 명령의 화행이 가지는 정당한 위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면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언어 이해에 있어서 무시되고 있는 요소인 화행들의 언어외적(extra-linguistic) 사태의 정황과 기구적 측면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측면이다.
b. 명령어 이상의 차원
명령은 정당하다. 그러나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런 논의를 한 차원 더 넘어선다. 바울은 도망한 노예인 오네시모의 일을 두고 빌레몬에게 ‘명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8절). 제임스 던(J.D.G. Dunn)이 잘 지적하는 것처럼, 명령한다(epitassein)는 이 말은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진다. J.D.G. 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6), 325.
상위자가 하위자 위에 말로써 그 권위를 나타내는 일을 가리킨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의 말보다는 오히려 ‘권면’(parakalo)의 말을 택하고 있다. 양자의 경우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적 요소(propositional content)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것을 ‘명령’으로 말할 때와 ‘권면’으로 말할 때의 화수력(illocutionary force)은 큰 차이를 가진다.
명령이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화행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 그 자체는 아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그 일을 자신의 책임과 자의 속에서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던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과 같이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도망 노예를 벌하는 것이 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일 것이다. 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325. 빌레몬서의 사회적 정황에 대한 연구로는 참고, Norman R. Petersen, Rediscovering Paul: Philemon and the Sociology of Paul's Narrative World (Philadelphia: Fortress, 1985.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자아’가 그 새 사람됨의 본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바울이 명령의 말이 아닌 간구의 말을 택함으로 빌레몬의 행동에 있어서 기대되는 것도 ‘억지로’(kata ananken)가 아닌 ‘자의로’(kata hekousion)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14절). 바울이 명령하니까 마지못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자아를 넘어서는 길이다. 간구의 말은 이런 자발성을 증진시킨다.
이는 우리의 언어행위가 놓여져야 할 새로운 차원을 우리 앞에 열어주고 있다. 일상영역 속에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일방적 차원의 언어행위들(perlocutions)이 지배적임을 본다. 좀 더 나은 차원에서 마틴 부버가 설파하는 것처럼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 ‘나와 당신’의 관계 속에서 보다 진정한 대화적 차원에서의 언어행위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상 이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언어행위를 보여준다. 단지 상대인간을 위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차원의 자발성으로 행하여질 수 있게 하는 차원이다. 안타깝게도 들뢰즈와 가타리는 명령과 통제로만 이해하고 있는 ‘일자’를 버리는 가운데서 모든 언어를 명령어로 환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언어의 이 가장 높은 차원의 추구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실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손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들뢰즈 자신은 하나님을 제외한 ‘n-1’의 열린 공간 속에서 무한대의 접속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겠지만, 결국 그 ‘-1’의 결정적 결핍 때문에 닫힌 한계 밖에는 보지 못하였고, 이것이 그를 자살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
V. 나가는 말
“우리는 부분적 대상들, 벽돌들 및 잔여물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앙띠 오이디푸스>, 69.
들뢰즈와 가타리의 외침이다. 그것이 그들의 ‘차이의 철학’과 ‘비표상적 사유’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의 모습인지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해체하여 놓은 세상의 모습인지 모른다. 그 가운데서 자아는 상실되고 오직 욕망하는 기계들의 배치들만이 놓여 있다. 그 배치들의 일부를 이루는 언어 또한 말하는 자의 자아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자신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약속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약속도 사랑도 미래도 없는 세상 속에 살면 될까? 그것이 들뢰즈와 가타리가 그리고 있는 “부분적 대상들, 벽돌들 및 잔여물들의 시대”일까? 그것은 그들의 감옥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빛나고 있는 성경의 더 찬란하고 풍성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말씀들이 살아 있는 곳, 변화된 자아들의 사랑과 순종이 살아 있는 곳에.
명령의 화행은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강요와 억압에 의한 화효행위(perlocution)와 구분해서 화수행위(illocution) 속에서 명령의 화행이 가지는 정당한 위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면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언어 이해에 있어서 무시되고 있는 요소인 화행들의 언어외적(extra-linguistic) 사태의 정황과 기구적 측면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측면이다.
b. 명령어 이상의 차원
명령은 정당하다. 그러나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런 논의를 한 차원 더 넘어선다. 바울은 도망한 노예인 오네시모의 일을 두고 빌레몬에게 ‘명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8절). 제임스 던(J.D.G. Dunn)이 잘 지적하는 것처럼, 명령한다(epitassein)는 이 말은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진다. J.D.G. 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6), 325.
상위자가 하위자 위에 말로써 그 권위를 나타내는 일을 가리킨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의 말보다는 오히려 ‘권면’(parakalo)의 말을 택하고 있다. 양자의 경우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적 요소(propositional content)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것을 ‘명령’으로 말할 때와 ‘권면’으로 말할 때의 화수력(illocutionary force)은 큰 차이를 가진다.
명령이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화행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 그 자체는 아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그 일을 자신의 책임과 자의 속에서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던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과 같이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도망 노예를 벌하는 것이 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일 것이다. 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to Philemon, 325. 빌레몬서의 사회적 정황에 대한 연구로는 참고, Norman R. Petersen, Rediscovering Paul: Philemon and the Sociology of Paul's Narrative World (Philadelphia: Fortress, 1985.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자아’가 그 새 사람됨의 본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바울이 명령의 말이 아닌 간구의 말을 택함으로 빌레몬의 행동에 있어서 기대되는 것도 ‘억지로’(kata ananken)가 아닌 ‘자의로’(kata hekousion)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14절). 바울이 명령하니까 마지못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자아를 넘어서는 길이다. 간구의 말은 이런 자발성을 증진시킨다.
이는 우리의 언어행위가 놓여져야 할 새로운 차원을 우리 앞에 열어주고 있다. 일상영역 속에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일방적 차원의 언어행위들(perlocutions)이 지배적임을 본다. 좀 더 나은 차원에서 마틴 부버가 설파하는 것처럼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 ‘나와 당신’의 관계 속에서 보다 진정한 대화적 차원에서의 언어행위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내용상 이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언어행위를 보여준다. 단지 상대인간을 위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차원의 자발성으로 행하여질 수 있게 하는 차원이다. 안타깝게도 들뢰즈와 가타리는 명령과 통제로만 이해하고 있는 ‘일자’를 버리는 가운데서 모든 언어를 명령어로 환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언어의 이 가장 높은 차원의 추구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실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손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들뢰즈 자신은 하나님을 제외한 ‘n-1’의 열린 공간 속에서 무한대의 접속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겠지만, 결국 그 ‘-1’의 결정적 결핍 때문에 닫힌 한계 밖에는 보지 못하였고, 이것이 그를 자살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
V. 나가는 말
“우리는 부분적 대상들, 벽돌들 및 잔여물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앙띠 오이디푸스>, 69.
들뢰즈와 가타리의 외침이다. 그것이 그들의 ‘차이의 철학’과 ‘비표상적 사유’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의 모습인지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해체하여 놓은 세상의 모습인지 모른다. 그 가운데서 자아는 상실되고 오직 욕망하는 기계들의 배치들만이 놓여 있다. 그 배치들의 일부를 이루는 언어 또한 말하는 자의 자아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자신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약속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약속도 사랑도 미래도 없는 세상 속에 살면 될까? 그것이 들뢰즈와 가타리가 그리고 있는 “부분적 대상들, 벽돌들 및 잔여물들의 시대”일까? 그것은 그들의 감옥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빛나고 있는 성경의 더 찬란하고 풍성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말씀들이 살아 있는 곳, 변화된 자아들의 사랑과 순종이 살아 있는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