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2. 「白頭大幹」式 산맥표기
1) 최초출현
2) 표기특징
3) 사용기간
4) 오늘날式 표기의 출현
3. 백두대간식 표기의 장 단점
4. 결론 및 향후 과제
2. 「白頭大幹」式 산맥표기
1) 최초출현
2) 표기특징
3) 사용기간
4) 오늘날式 표기의 출현
3. 백두대간식 표기의 장 단점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等地理附圖]의 조선全圖 및 부분도들, 그리고 위 [초등지리]의 해설집인 [初等地理書解說]의 총설 및 각 지방론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함경, 태백, 소백, 노령 등 다수 산맥名이 표기되어 있다.
위처럼 1908년 이후 신식표기가 日帝기간(1910-1945) 동안 계속 쓰였고 해방을 맞이하자 그 표기는 日帝時 공부한 大韓民國 第一世代 지리인들(교수, 교사 등)에 의해 국내 중등학교 지리 교과서들과 1957 년에 발간된 大學用 韓國地理책에 자연스럽게 도입 사용된 것이다.
그러한 예를 몇 개 들면 다음과 같다. 1950년에 나온 당시 국내 중등지리교육계에 큰 영향을 끼친 최복현 이지호 김상호 공저 중등학교용 [최신 우리 나라지리](해방 후 軍政의 교수요목 의거) 내의 지질과 지형 부분에는 앞에서 언급한 3개의 산맥주향과 그들에 속하는 오늘날 쓰이는 이름의 산맥들이 제시되었다(산맥지도는 실리지 않음). 일제 때 日人들의 표현과 다른 것은 조선 방향을 \'반도 방향\'으로, 요동 방향을 \'서서남주\'로, 중국 방향을 \'서남주\'로 표기한 점이었다. 그리고 구조선과 산맥방향과의 관계도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해방 후 한국인 地理學者에 의해 최초로 출간된 대학용 姜錫午저 [槪觀韓國地理](1957) 내 산지의 융기상태 부분에는 전게 [일본지리대계 조선편]에 들어있는 中村의 지질구조선 圖가 인용 제시되었고 中村과 전게 佐佐木가 논의한 바 있는 式의 3방향 산맥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위 3방향에 해당되는 산맥들이 예시되어 있다.
3. 백두대간식 표기의 장 단점
물론 어느 방식이나 장 단점을 각기 지니게 마련이다. 어느 부분이 좋으면 다른 어느 부분은 문제점일 수가 있는 것이다. 객관적이고도 학문적 입장에서 두 방식의 장단점을 제시할 것인데, 우선 오랫동안 쓰였던 古 한국식인 백두대간식의 장단점을 먼저 논의키로 한다.
백두대간식 산맥표기는 장점으로서
첫째, 경관상 잘 보여지는 無斷切의 分水嶺들을 잘 표기했기 때문에 하천流域들을 파악하기가 아주 쉽다. 그리고 보이는 것 위주의 知覺-認知的 表記法을 사용했기 때문에 生活과 地形과의 관계파악 및 생활이용에 편리함을 준다.
둘째, 무단절 분수령들을 잘 나타내어서 산 및 산맥 줄기의 파악이 쉽고, 산맥들의 分岐 관계 파악도 용이하다. 그러므로 山地利用 계획이나 그 실천에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백두산을 祖宗山으로 지각한 외에, 백두산과 백두산-지리산 연맥과의 관계를 水根-木幹 관계로 보았으므로 風水地理와 관련해서 한국지형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편리하다. 풍수지리관은 묘지(음택)풍수 시각을 제외하고는 건전한 한국전래-전통적인 土地觀이요 나아가 世界觀의 일부이어서 風水地理的으로 한국지형을 파악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뜻 있는 일이다.
반면 단점 내지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國際的 表記관행과 어긋나는 점이다. 백두대간식 표기에서는 \'漢北(한강 북쪽)正脈\' 등처럼 주로 江에 연유해서 산맥이름을 붙였거니와, 국제적 관행은 산맥 내 어느 한 산에 연유해서 산맥名을 붙이거나, 江과는 무관한 산맥名을 따로 지어서 쓰는 것이다. 백두대간식 표기를 쓰게 되면 세계적 普遍性에서 멀어지고 불편해지며,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미루어 보아도 이익될 것이 없겠다.
둘째, 地域地理學的 차원의 地形理解에는 좋지만 成因과 관련된 산맥이해에는 약점이 드러난다. 成因관련 이해에는 地體構造 바탕의 이해가 따라야 편리하다. 그런 까닭에 한국의 산맥들을 인식 내지 이해하려고 할 때 지역지리로서의 <한국지리>를 알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구 내부관계 지형학 내지 지구과학적 차원에서 成因위주로 산맥들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한다. 後者의 경우라면 백두대간식 표기는 약점을 크게 지니게 된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그러면 向後 우리 지리학자들의 課題는 무엇인가? 필자는 그 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싶다.
첫째는 적어도 국내 지리학자들이 地域地理로서의 韓國地理를 교육하거나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지질-지체구조式 산맥이해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지각-경관식 산맥이해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해야한다. 지질-지체구조 바탕의 오늘날식 표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일부 산맥들의 分岐點 시정만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광주산맥과 노령산맥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中部地方에 맥상을 보이고 있는 산줄기들을 예의 관찰해서 새로운 산맥명칭을 부여하는 일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가령 용문산맥).
이러한 산맥 재검토 명명 작업을 북한 당국(국가과학원 지리학부분 심의위원회)은 이미 1996년 1월에 완료하였는바, 북한은 기존의 오늘날식 표기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일부 산맥들의 줄기를 재조정하였고, 또한 일부 산맥들은 폐기(가령 강남산맥)하였는가하면 몇몇 산맥은 새로이 설정 명명(가령 무등산 줄기)하였으며 기존의 \' 산맥\'은 \' 산줄기\'로 바꾸어 쓰기로 하였다. \'산맥\'을 \'산줄기\'로 바꾸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남한 학계도 주목 검토해야 할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필자는 개인 레벨에서 이미 그 같은 작업을 필자의 저서 [우리국토 전체와 각 지역(I)](1992)에서 일부 수행한 바 있다.
둘째는 백두대간식의 전통적인 산맥표기가 <한국지리>교육에서는 소개되어야할 것인지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하는 일이다. 속단키 어려운 문제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학문적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와 권혁재는 일단 先人들의 관점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보았다. 필자의 경우, [우리국토 전체와 각 지역(II)](1992)에 백두대간의 시작 산과 백두대간을 언급했고, 조금은 자유롭게 써도 괜찮은 교양지리서 [읽고 떠나는 국토순례](1994)에는 앞의 경우보다 많은 분량으로 백두대간과 이 말을 쓰게 된 意識上의 배경을 소개한 바 있다. 권혁재의 경우, 최근의 [한국지리(총론)] 제 2판과 同書지방편(둘다 1996)에서 \'이른바 백두대간\'이라는 표현방식을 동원하여 이 대간과 태백산맥-소백산맥의 관계를 약간씩 소개하였다. 그의 1987년의 [한국지리(총론)] 초판본에는 없었던 것이 금번의 개정판과 同書지방편에는 소개된 것이다.
위처럼 1908년 이후 신식표기가 日帝기간(1910-1945) 동안 계속 쓰였고 해방을 맞이하자 그 표기는 日帝時 공부한 大韓民國 第一世代 지리인들(교수, 교사 등)에 의해 국내 중등학교 지리 교과서들과 1957 년에 발간된 大學用 韓國地理책에 자연스럽게 도입 사용된 것이다.
그러한 예를 몇 개 들면 다음과 같다. 1950년에 나온 당시 국내 중등지리교육계에 큰 영향을 끼친 최복현 이지호 김상호 공저 중등학교용 [최신 우리 나라지리](해방 후 軍政의 교수요목 의거) 내의 지질과 지형 부분에는 앞에서 언급한 3개의 산맥주향과 그들에 속하는 오늘날 쓰이는 이름의 산맥들이 제시되었다(산맥지도는 실리지 않음). 일제 때 日人들의 표현과 다른 것은 조선 방향을 \'반도 방향\'으로, 요동 방향을 \'서서남주\'로, 중국 방향을 \'서남주\'로 표기한 점이었다. 그리고 구조선과 산맥방향과의 관계도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해방 후 한국인 地理學者에 의해 최초로 출간된 대학용 姜錫午저 [槪觀韓國地理](1957) 내 산지의 융기상태 부분에는 전게 [일본지리대계 조선편]에 들어있는 中村의 지질구조선 圖가 인용 제시되었고 中村과 전게 佐佐木가 논의한 바 있는 式의 3방향 산맥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위 3방향에 해당되는 산맥들이 예시되어 있다.
3. 백두대간식 표기의 장 단점
물론 어느 방식이나 장 단점을 각기 지니게 마련이다. 어느 부분이 좋으면 다른 어느 부분은 문제점일 수가 있는 것이다. 객관적이고도 학문적 입장에서 두 방식의 장단점을 제시할 것인데, 우선 오랫동안 쓰였던 古 한국식인 백두대간식의 장단점을 먼저 논의키로 한다.
백두대간식 산맥표기는 장점으로서
첫째, 경관상 잘 보여지는 無斷切의 分水嶺들을 잘 표기했기 때문에 하천流域들을 파악하기가 아주 쉽다. 그리고 보이는 것 위주의 知覺-認知的 表記法을 사용했기 때문에 生活과 地形과의 관계파악 및 생활이용에 편리함을 준다.
둘째, 무단절 분수령들을 잘 나타내어서 산 및 산맥 줄기의 파악이 쉽고, 산맥들의 分岐 관계 파악도 용이하다. 그러므로 山地利用 계획이나 그 실천에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백두산을 祖宗山으로 지각한 외에, 백두산과 백두산-지리산 연맥과의 관계를 水根-木幹 관계로 보았으므로 風水地理와 관련해서 한국지형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편리하다. 풍수지리관은 묘지(음택)풍수 시각을 제외하고는 건전한 한국전래-전통적인 土地觀이요 나아가 世界觀의 일부이어서 風水地理的으로 한국지형을 파악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뜻 있는 일이다.
반면 단점 내지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國際的 表記관행과 어긋나는 점이다. 백두대간식 표기에서는 \'漢北(한강 북쪽)正脈\' 등처럼 주로 江에 연유해서 산맥이름을 붙였거니와, 국제적 관행은 산맥 내 어느 한 산에 연유해서 산맥名을 붙이거나, 江과는 무관한 산맥名을 따로 지어서 쓰는 것이다. 백두대간식 표기를 쓰게 되면 세계적 普遍性에서 멀어지고 불편해지며,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미루어 보아도 이익될 것이 없겠다.
둘째, 地域地理學的 차원의 地形理解에는 좋지만 成因과 관련된 산맥이해에는 약점이 드러난다. 成因관련 이해에는 地體構造 바탕의 이해가 따라야 편리하다. 그런 까닭에 한국의 산맥들을 인식 내지 이해하려고 할 때 지역지리로서의 <한국지리>를 알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구 내부관계 지형학 내지 지구과학적 차원에서 成因위주로 산맥들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한다. 後者의 경우라면 백두대간식 표기는 약점을 크게 지니게 된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그러면 向後 우리 지리학자들의 課題는 무엇인가? 필자는 그 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싶다.
첫째는 적어도 국내 지리학자들이 地域地理로서의 韓國地理를 교육하거나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지질-지체구조式 산맥이해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지각-경관식 산맥이해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해야한다. 지질-지체구조 바탕의 오늘날식 표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일부 산맥들의 分岐點 시정만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광주산맥과 노령산맥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中部地方에 맥상을 보이고 있는 산줄기들을 예의 관찰해서 새로운 산맥명칭을 부여하는 일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가령 용문산맥).
이러한 산맥 재검토 명명 작업을 북한 당국(국가과학원 지리학부분 심의위원회)은 이미 1996년 1월에 완료하였는바, 북한은 기존의 오늘날식 표기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일부 산맥들의 줄기를 재조정하였고, 또한 일부 산맥들은 폐기(가령 강남산맥)하였는가하면 몇몇 산맥은 새로이 설정 명명(가령 무등산 줄기)하였으며 기존의 \' 산맥\'은 \' 산줄기\'로 바꾸어 쓰기로 하였다. \'산맥\'을 \'산줄기\'로 바꾸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남한 학계도 주목 검토해야 할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필자는 개인 레벨에서 이미 그 같은 작업을 필자의 저서 [우리국토 전체와 각 지역(I)](1992)에서 일부 수행한 바 있다.
둘째는 백두대간식의 전통적인 산맥표기가 <한국지리>교육에서는 소개되어야할 것인지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하는 일이다. 속단키 어려운 문제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학문적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와 권혁재는 일단 先人들의 관점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보았다. 필자의 경우, [우리국토 전체와 각 지역(II)](1992)에 백두대간의 시작 산과 백두대간을 언급했고, 조금은 자유롭게 써도 괜찮은 교양지리서 [읽고 떠나는 국토순례](1994)에는 앞의 경우보다 많은 분량으로 백두대간과 이 말을 쓰게 된 意識上의 배경을 소개한 바 있다. 권혁재의 경우, 최근의 [한국지리(총론)] 제 2판과 同書지방편(둘다 1996)에서 \'이른바 백두대간\'이라는 표현방식을 동원하여 이 대간과 태백산맥-소백산맥의 관계를 약간씩 소개하였다. 그의 1987년의 [한국지리(총론)] 초판본에는 없었던 것이 금번의 개정판과 同書지방편에는 소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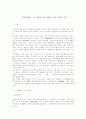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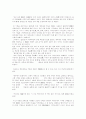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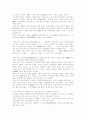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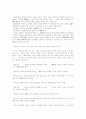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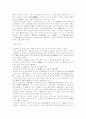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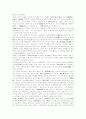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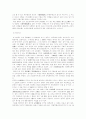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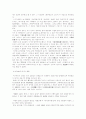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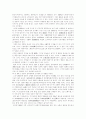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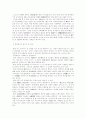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