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삼국시대 비구니의 활약상
III. 고려시대 비구니의 활약상
IV. 조선시대 비구니의 활약상
V. 근․현대 비구니의 활약상
VI. 맺음말
II. 삼국시대 비구니의 활약상
III. 고려시대 비구니의 활약상
IV. 조선시대 비구니의 활약상
V. 근․현대 비구니의 활약상
VI. 맺음말
본문내용
는 비구니들의 숫자도 상당하다.
그리고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승가고시가 강화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4급에 응시한 사미 199명, 사미니 174명 가운데, 합격자는 사미 173명, 사미니 172명으로 도합 345명이 합격하였다.
또한 3급에 응시한 비구 218명, 비구니 196명 가운데 합격자는 비구 156명, 비구니 164명으로 도합 320명이 합격 上同
함으로서 종단의 위계질서 확립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강원 강사직에 종사하는 비구비구니가 80여명이고, 승가대동국대 등에서 활동하는 비구비구니도 60여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한국 비구니는 성직자의 신분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수행과 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각 분야별 활동상황은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개별적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이상은 생략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수행은 물론, 교육과 포교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다양성과 감수성을 중시하는 사람들, 특히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마찬가지로 승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 산업화와 함께 서서히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적 수요는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생산양식이 발전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비구니 승가가 담당해야 할 실천적 과제도 그 영역이 점차 넓혀져 가고 있다.
VI. 맺음말
불교신앙의 궁극적 목표를 자신의 깨달음(自利)과 타인의 구제(利他)라고 한다면, 비구니의 삶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승려로서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대중을 교화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비구니는 비구와 더불어 종교적사회적 기능의 실천가로서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해왔다. 더구나 신라 때에는 비구니 승단(僧團)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를 일컫는 도유나랑(都唯那娘)이라는 니승직(尼僧職)이 있었을 정도로 비구니의 활동이 주목된 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불교전래 후 승관제도(僧官制度)를 만들 때 최고 통솔자인 승통(僧統) 다음에 도유나랑(都唯那娘)이라는 니승교단을 통솔하는 직책을 둔 것은 비구니가 사회적으로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일례로 왕과 왕비들이 출가하여 본격적으로 수행생활에 나설 정도였다면 당시 신라사회에서의 출가 수행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왕실의 비호 속에서 수행과 포교를 겸하며 고려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비구니들도 상당히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불교정책 자체가 숭유억불(崇儒抑佛)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왕실의 호불(好佛) 성향에 힘입어 비구니들은 사원과 왕실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자임함으써 교단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선대의 탁월한 비구니의 정신을 본받아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수행자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자로서, 사찰을 창건하고 지키는 가람 수호자로서, 이익 중생을 향한 자비 실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비구니의 위상정립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승가고시가 강화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4급에 응시한 사미 199명, 사미니 174명 가운데, 합격자는 사미 173명, 사미니 172명으로 도합 345명이 합격하였다.
또한 3급에 응시한 비구 218명, 비구니 196명 가운데 합격자는 비구 156명, 비구니 164명으로 도합 320명이 합격 上同
함으로서 종단의 위계질서 확립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강원 강사직에 종사하는 비구비구니가 80여명이고, 승가대동국대 등에서 활동하는 비구비구니도 60여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한국 비구니는 성직자의 신분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수행과 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각 분야별 활동상황은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개별적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이상은 생략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수행은 물론, 교육과 포교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다양성과 감수성을 중시하는 사람들, 특히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마찬가지로 승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 산업화와 함께 서서히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적 수요는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생산양식이 발전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비구니 승가가 담당해야 할 실천적 과제도 그 영역이 점차 넓혀져 가고 있다.
VI. 맺음말
불교신앙의 궁극적 목표를 자신의 깨달음(自利)과 타인의 구제(利他)라고 한다면, 비구니의 삶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승려로서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대중을 교화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비구니는 비구와 더불어 종교적사회적 기능의 실천가로서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해왔다. 더구나 신라 때에는 비구니 승단(僧團)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를 일컫는 도유나랑(都唯那娘)이라는 니승직(尼僧職)이 있었을 정도로 비구니의 활동이 주목된 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불교전래 후 승관제도(僧官制度)를 만들 때 최고 통솔자인 승통(僧統) 다음에 도유나랑(都唯那娘)이라는 니승교단을 통솔하는 직책을 둔 것은 비구니가 사회적으로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일례로 왕과 왕비들이 출가하여 본격적으로 수행생활에 나설 정도였다면 당시 신라사회에서의 출가 수행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왕실의 비호 속에서 수행과 포교를 겸하며 고려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비구니들도 상당히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불교정책 자체가 숭유억불(崇儒抑佛)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왕실의 호불(好佛) 성향에 힘입어 비구니들은 사원과 왕실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자임함으써 교단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선대의 탁월한 비구니의 정신을 본받아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수행자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자로서, 사찰을 창건하고 지키는 가람 수호자로서, 이익 중생을 향한 자비 실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비구니의 위상정립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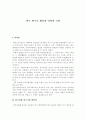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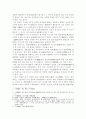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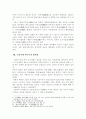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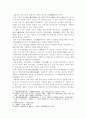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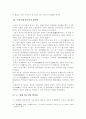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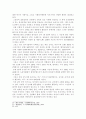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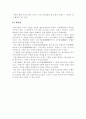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