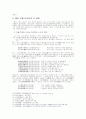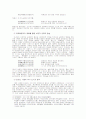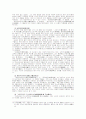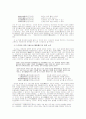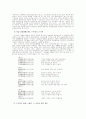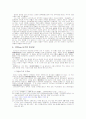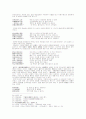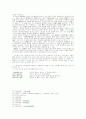목차
1. 들어가며
2. 이규보의 생애生涯와 문학관文學觀
3. 젊은 시절 이규보의 시 세계
4. 인천仁川 시기의 이규보
2. 이규보의 생애生涯와 문학관文學觀
3. 젊은 시절 이규보의 시 세계
4. 인천仁川 시기의 이규보
본문내용
이었고, 술로 인해 그는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였다고 한다. 박성규,〈이규보 자연시에 대한 이해〉,《이규보연구》, 새문사, 1986, p.Ⅰ-58.
그런데 桂陽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곤궁함을 안겨주었던 듯하다. 술을 빚을 돈이 없어 마실 수 없다며 悲感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我本嗜酒人 내 본래 술 즐기는 사람이라
口不離杯 입에 잔 뗀 적 없었네
雖無與飮客 비록 함께 마실 손 없으나
獨酌亦不辭 독작도 사양치 않는다네
顧無樽中緣 술통에 익은 술 없으니
燥吻何由滋 마른 입을 무엇으로 적시리
憶昨在京輦 지난 서울 시절 생각하니
月俸有餘 월급은 쓰고도 남았네
釀得如許甕 이만한 독에 술 빚어 놓고
酌無停時 잔 들기 그칠 때 없었지
家或未繼 집 술이 더러 이어대지 못하면
沽飮良足怡 사온 술로 기쁨을 만족시켰네
嗟嗟桂陽守 슬프다 계양을 지키는 사람
祿薄釀難支 월급이 적어 술 빚기 어렵네
蕭條數家村 몇 집 안 되는 쓸쓸한 시골에
何處有靑旗 어느 곳에 청기 청기(靑旗) : 술파는 집. 술을 파는 집에 푸른 기를 달기 때문이다. 靑 또는 靑이라고도 한다.
가 있을는지
亦無好事者 또한 일 좋아하는 사람 없어
載酒相追隨 술 싣고 쫓아오지 않네
端坐一堂上 단정히 당 위에 앉아
竟日獨支 온종일 홀로 턱만 괴고 있네
(후략) 文集 卷15, 「無酒」
‘蕭條數家村’에서 한적하여 쓸쓸하기까지 한 시골의 풍광이 그의 시적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으며, 부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端坐一堂上 竟日獨支’에서 알 수 있듯 적막한 생활 속에서 그는 할 일도 없어 더욱 궁궐의 생각이 간절하다. 누워 바람을 쐬거나 대자리 못이 몸에 박히도록 잠을 자는 일이 고작일 뿐이다. 신경쓸 이 없으니 산발하고 산책을 하고, 마실 술도 없으니 갈등을 해소할 방도도 없이 망연할 따름이며 따라서 마음은 약해지는 것이다.
退公無一事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寂寞似孤村 적막하기 고촌 같구나
(중략)
笑矣殘城守 우스워라 잔성을 지키는 사람
徒勞夢掖垣 부질없이 궁궐만 꿈꾸네
退公無一事 퇴근하여 일 없으니
高臥北軒風 북헌에 높이 누워 바람 쐬네
(중략)
退公無一事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署氣蒸人 더운 기운 부질없이 사람을 찌네
眠多印身 잠이 많으니 몸에 대자리 못 박히네
碁閑遊毒手 바둑판이 한가로우니 독수가 늘고
酒盡錮脣 술이 다되니 입도 다물었네
(중략)
退公無一事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散髮自逍遙 산발하고 자유로이 산책하도다
對客蒸蔬菜 손에겐 나물 삶아 드리고
呼兒灌藥苗 아이 불러 약묘에 물 주라 하네
顔因世變 얼굴엔 세상 변한 것 싫어하는 빛이고
首爲望京翹 머리 돌려 서울을 바라보네
笑矣殘城守 우스워라 잔성을 지키는 사람
剛腸老亦銷 늙으니 강한 마음도 약해지네
‘顔因世變’에서 자신이 다시 서울에 입성할 때까지 변하는 것이 없길 소망하는 작자의 진심이 엿보인다.
이규보는 求宦期에 자신은 凡人들처럼 처자나 먹여 살리기 위한 벼슬아치가 될 생각은 없고, 玉堂에 올라 代言視草하고 批勅(비칙), 訓令, 帝誥之詞를 지어 사방에 宣暢하는 것이 뜻을 펴는 일이며 기필코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었다. 또한 9세부터 광범한 독서를 하고 手不釋卷하면서 文才를 연마하여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였다고 하였다. 文集 卷26, 「上趙太尉書」
이 글을 보면 그가 일생동안 청렴하게 살면서 文翰의 職을 맡았거나 그 분야로 승진되었을 때는 몹시 기뻐하고 그 외의 職에 전보되었을 때는 불만을 吐露한 이유도 명백해진다. 그는 文翰의 任務 외에서는 생의 보람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신용호, 『이규보의 의식세계와 문학론연구』, 국학자료원, 1990, p.108.
이처럼 “육체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의 이원성에 심한 갈등을 나타내었던 그였지만 그의 자연에 대한 애착과 티없이 깨끗하고 순박한 정서적 세계”(장덕순, 1986)는 그의 갈등을 어느정도 완화시켜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시도 현실 脫皮가 아닌 현실 克復과 자연에의 歸依라는 肯定的인 양상을 띤다.
이러한 詩作은 현실에서의 좌절감과 울분을 昇華시킬 수 있는 智慧이자 自己救援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桂陽自娛堂記」를 보면 자기가 거처하는 집을 처자나 종들은 모두 쳐다보려 하지 않지만, 이규보 자신은 홀로 즐거워하며 먼지를 쓸고 거처하면서 당의 이름을 ‘自娛堂’으로 짓고 또 記를 지을 정도로 여유를 되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김 영, 전게서, p.4.
현상인(玄上人)과 壽量寺에서 즐긴 여흥을 기록한 시 文集 卷15.
에서는 자연풍광의 황홀함에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하여 마음이 탁트인다 하였으며, 녹이 적으나 더 바랄 게 없다하기도 하고 벼슬이 미미해도 오히려 좋다고까지 하는 관대함까지 보인다. 또한 茅亭에서 놀며 지은 시 文集 卷15.
를 보면 그가 心中의 煩을 자연친화로 달랬음을 알 수 있다.
「望海志」나「草亭記」에서 보이는 부평의 옛 모습은 물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데 매우 차고 맑아서 얼음같으며 반송과 무성한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고 맑은 바람이 저절로 불어와 피서하기에 좋은 곳이며 文集 卷24.「桂陽草亭記」
萬日寺의 누대에 올라서 보이는 경관은,
“큰 배가 파도 가운데 떠 있는 것이 마치 오리가 헤엄치는 것과 같고, 작은 배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머리를 조금 드러낸 것과 같으며, 돛대가 가는 것이 사람이 우뚝 솟은 모자를 쓰고 가는 것과 같고, 뭇 산과 여러 섬은 묘연하게 마주 대하여, 우뚝한 것, 벗어진 것, 추켜든 것, 엎드린 것, 등이 나온 것, 상투처럼 솟은 것, 구멍처럼 가운데가 뚫린 것, 일산처럼 머리가 둥근 것 등등이 있다.” 文集 卷24, 桂陽望海志
고 느낄 정도로 자연풍광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Loc. cit.
또 그는 농사와 농부의 중요함을 읊기도 한다.
一國瘠肥民力內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건 민력에 달렸고
萬人生死稻芽中 만인의 생가는 벼 싹에 매였네
他時玉粒堆千 다른 날 옥 같은 곡식이 일천 창고에 쌓이리니
請記今朝汗滴功 청컨대 땀 흘린 오늘의 공을 기록하소 文集 卷15, 「雨中親耕者贈書記」
그런데 桂陽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곤궁함을 안겨주었던 듯하다. 술을 빚을 돈이 없어 마실 수 없다며 悲感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我本嗜酒人 내 본래 술 즐기는 사람이라
口不離杯 입에 잔 뗀 적 없었네
雖無與飮客 비록 함께 마실 손 없으나
獨酌亦不辭 독작도 사양치 않는다네
顧無樽中緣 술통에 익은 술 없으니
燥吻何由滋 마른 입을 무엇으로 적시리
憶昨在京輦 지난 서울 시절 생각하니
月俸有餘 월급은 쓰고도 남았네
釀得如許甕 이만한 독에 술 빚어 놓고
酌無停時 잔 들기 그칠 때 없었지
家或未繼 집 술이 더러 이어대지 못하면
沽飮良足怡 사온 술로 기쁨을 만족시켰네
嗟嗟桂陽守 슬프다 계양을 지키는 사람
祿薄釀難支 월급이 적어 술 빚기 어렵네
蕭條數家村 몇 집 안 되는 쓸쓸한 시골에
何處有靑旗 어느 곳에 청기 청기(靑旗) : 술파는 집. 술을 파는 집에 푸른 기를 달기 때문이다. 靑 또는 靑이라고도 한다.
가 있을는지
亦無好事者 또한 일 좋아하는 사람 없어
載酒相追隨 술 싣고 쫓아오지 않네
端坐一堂上 단정히 당 위에 앉아
竟日獨支 온종일 홀로 턱만 괴고 있네
(후략) 文集 卷15, 「無酒」
‘蕭條數家村’에서 한적하여 쓸쓸하기까지 한 시골의 풍광이 그의 시적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으며, 부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端坐一堂上 竟日獨支’에서 알 수 있듯 적막한 생활 속에서 그는 할 일도 없어 더욱 궁궐의 생각이 간절하다. 누워 바람을 쐬거나 대자리 못이 몸에 박히도록 잠을 자는 일이 고작일 뿐이다. 신경쓸 이 없으니 산발하고 산책을 하고, 마실 술도 없으니 갈등을 해소할 방도도 없이 망연할 따름이며 따라서 마음은 약해지는 것이다.
退公無一事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寂寞似孤村 적막하기 고촌 같구나
(중략)
笑矣殘城守 우스워라 잔성을 지키는 사람
徒勞夢掖垣 부질없이 궁궐만 꿈꾸네
退公無一事 퇴근하여 일 없으니
高臥北軒風 북헌에 높이 누워 바람 쐬네
(중략)
退公無一事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署氣蒸人 더운 기운 부질없이 사람을 찌네
眠多印身 잠이 많으니 몸에 대자리 못 박히네
碁閑遊毒手 바둑판이 한가로우니 독수가 늘고
酒盡錮脣 술이 다되니 입도 다물었네
(중략)
退公無一事 퇴근하여 아무 일 없으니
散髮自逍遙 산발하고 자유로이 산책하도다
對客蒸蔬菜 손에겐 나물 삶아 드리고
呼兒灌藥苗 아이 불러 약묘에 물 주라 하네
顔因世變 얼굴엔 세상 변한 것 싫어하는 빛이고
首爲望京翹 머리 돌려 서울을 바라보네
笑矣殘城守 우스워라 잔성을 지키는 사람
剛腸老亦銷 늙으니 강한 마음도 약해지네
‘顔因世變’에서 자신이 다시 서울에 입성할 때까지 변하는 것이 없길 소망하는 작자의 진심이 엿보인다.
이규보는 求宦期에 자신은 凡人들처럼 처자나 먹여 살리기 위한 벼슬아치가 될 생각은 없고, 玉堂에 올라 代言視草하고 批勅(비칙), 訓令, 帝誥之詞를 지어 사방에 宣暢하는 것이 뜻을 펴는 일이며 기필코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었다. 또한 9세부터 광범한 독서를 하고 手不釋卷하면서 文才를 연마하여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였다고 하였다. 文集 卷26, 「上趙太尉書」
이 글을 보면 그가 일생동안 청렴하게 살면서 文翰의 職을 맡았거나 그 분야로 승진되었을 때는 몹시 기뻐하고 그 외의 職에 전보되었을 때는 불만을 吐露한 이유도 명백해진다. 그는 文翰의 任務 외에서는 생의 보람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신용호, 『이규보의 의식세계와 문학론연구』, 국학자료원, 1990, p.108.
이처럼 “육체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의 이원성에 심한 갈등을 나타내었던 그였지만 그의 자연에 대한 애착과 티없이 깨끗하고 순박한 정서적 세계”(장덕순, 1986)는 그의 갈등을 어느정도 완화시켜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시도 현실 脫皮가 아닌 현실 克復과 자연에의 歸依라는 肯定的인 양상을 띤다.
이러한 詩作은 현실에서의 좌절감과 울분을 昇華시킬 수 있는 智慧이자 自己救援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桂陽自娛堂記」를 보면 자기가 거처하는 집을 처자나 종들은 모두 쳐다보려 하지 않지만, 이규보 자신은 홀로 즐거워하며 먼지를 쓸고 거처하면서 당의 이름을 ‘自娛堂’으로 짓고 또 記를 지을 정도로 여유를 되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김 영, 전게서, p.4.
현상인(玄上人)과 壽量寺에서 즐긴 여흥을 기록한 시 文集 卷15.
에서는 자연풍광의 황홀함에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하여 마음이 탁트인다 하였으며, 녹이 적으나 더 바랄 게 없다하기도 하고 벼슬이 미미해도 오히려 좋다고까지 하는 관대함까지 보인다. 또한 茅亭에서 놀며 지은 시 文集 卷15.
를 보면 그가 心中의 煩을 자연친화로 달랬음을 알 수 있다.
「望海志」나「草亭記」에서 보이는 부평의 옛 모습은 물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데 매우 차고 맑아서 얼음같으며 반송과 무성한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고 맑은 바람이 저절로 불어와 피서하기에 좋은 곳이며 文集 卷24.「桂陽草亭記」
萬日寺의 누대에 올라서 보이는 경관은,
“큰 배가 파도 가운데 떠 있는 것이 마치 오리가 헤엄치는 것과 같고, 작은 배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머리를 조금 드러낸 것과 같으며, 돛대가 가는 것이 사람이 우뚝 솟은 모자를 쓰고 가는 것과 같고, 뭇 산과 여러 섬은 묘연하게 마주 대하여, 우뚝한 것, 벗어진 것, 추켜든 것, 엎드린 것, 등이 나온 것, 상투처럼 솟은 것, 구멍처럼 가운데가 뚫린 것, 일산처럼 머리가 둥근 것 등등이 있다.” 文集 卷24, 桂陽望海志
고 느낄 정도로 자연풍광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Loc. cit.
또 그는 농사와 농부의 중요함을 읊기도 한다.
一國瘠肥民力內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건 민력에 달렸고
萬人生死稻芽中 만인의 생가는 벼 싹에 매였네
他時玉粒堆千 다른 날 옥 같은 곡식이 일천 창고에 쌓이리니
請記今朝汗滴功 청컨대 땀 흘린 오늘의 공을 기록하소 文集 卷15, 「雨中親耕者贈書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