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군담소설
1.1. 군담소설의 개념
1.2. 군담소설의 종류
1.3. 군담소설의 공통구조
2. 임병양란
Ⅱ본론
1. 역사군담소설
1.1. <임진록>
1.1.1. <임진록>의 줄거리
1.1.2. <임진록>의 등장인물
1.1.3. <임진록>의 구성
1.1.4. <임진록>의 해석
1.1.5. <임진록>의 이본
1.2. <임경업전>
1.2.1. <임경업전>의 임경업
1.2.2. <임경업전>의 줄거리
1.2.3. <임경업전>의 해석
1.2.4. <임경업전>의 의의
1.3. <박씨전>
1.3.1. <박씨전>의 줄거리
1.3.2. <박씨전>의 해석
1.3.3. <박씨전>의 여성의식과 한계
1.3.4. <박씨전>의 의의와 한계
2. 창작군담소설
2.1. <유충렬전> - 줄거리
2.2. <소대성전> - 줄거리
Ⅲ결론
1. <임진록>, <임경업전>, <박씨전>을 통한 소설적 형상화 과정
2. 역사군담소설과 창작군담소설의 비교
Ⅳ마무리하며
1. 군담소설
1.1. 군담소설의 개념
1.2. 군담소설의 종류
1.3. 군담소설의 공통구조
2. 임병양란
Ⅱ본론
1. 역사군담소설
1.1. <임진록>
1.1.1. <임진록>의 줄거리
1.1.2. <임진록>의 등장인물
1.1.3. <임진록>의 구성
1.1.4. <임진록>의 해석
1.1.5. <임진록>의 이본
1.2. <임경업전>
1.2.1. <임경업전>의 임경업
1.2.2. <임경업전>의 줄거리
1.2.3. <임경업전>의 해석
1.2.4. <임경업전>의 의의
1.3. <박씨전>
1.3.1. <박씨전>의 줄거리
1.3.2. <박씨전>의 해석
1.3.3. <박씨전>의 여성의식과 한계
1.3.4. <박씨전>의 의의와 한계
2. 창작군담소설
2.1. <유충렬전> - 줄거리
2.2. <소대성전> - 줄거리
Ⅲ결론
1. <임진록>, <임경업전>, <박씨전>을 통한 소설적 형상화 과정
2. 역사군담소설과 창작군담소설의 비교
Ⅳ마무리하며
본문내용
Ⅲ결론
1. <임진록>, <임경업전>, <박씨전>을 통한 소설적 형상화 과정
충격적인 역사적 체험은 그 사실(史實)을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을 창출시킨다. 우리 문학사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임진왜란이 우리 민족에게 준 충격은「임진록」과 「남윤전」등을 창출시켰고, 병자호란은「박씨부인전」과「임경업전」을 창출케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충격파가 전쟁과 영웅의 이야기인 군담소설류(軍談小說類)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음은 널리 인정된 일이다. 즉 역사적으로 패배한 전쟁을 비범한 능력을 갖춘 주인공을 내세워 이기는 전쟁으로 바꿈으로써 패배의 역사에서 입는 상처를 허구를 통해서나마 치유하고자 하는 소망을 들어낸다.
임진록의 이본은 여러 가지가 전해 오는데,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된 계열과 허구적인 재편(再編)을 일으킨 흔적을 보이는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두 계열 사이의 선후관계를 간단히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史實)의 허구적인 재편은 역사적 체험의 구전물이나 사실(史實)의 기록물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임진록의 여러 이본이 전해져서 일제 때에 금서(禁書)로 수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종의 이본이 학계에 소개되고 있음은 이 작품이 매우 널리 읽힌, 인기 있는 독서물의 하나임을 증명해 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진록의 이본에서 사실(史實)을 허구화하고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 도 그러한 허구적 사실(史實)이 즐겨 읽힌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임진왜란은 역사적 사실로 기억하기엔 지나치게 참혹한 일이므로 그 역사적 체험 자체를 해체해 버리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열망은 사실을 허구화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된 세계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데에 충실하지 않았으나, 상상적인 역사 경험을 하도록 짜여진다. 예컨대, 김응서(金應瑞)와 강홍립(姜弘立)의 왜국 정벌이 임진록에 나타나는데, 이는 병자호란 전의 사실을 차용한 것이다. 대부분의 이본에서 이러한 차용이 확인되는데 김응서와 강홍립은 작품 안에서 상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로 부각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을 오인한 결과로 나타난 오류하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릴 순 없다. 오히려 의도적인 착각적 견인작용에 의한 차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임진왜란이 던진 역사적 충격과 병자호란이 던진 역사적 충격을 복합적으로 흡수하여 상상적 경험을 통해 극복하려면 대외출정(對外出征)의 역사적 체험을 재생시켜 이를 변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김덕령(金德齡)의 부각, 이여송(李如松)의 수욕(受辱), 사명당(泗溟當)의 활약 등에서 우리는 외침에 대한 전민족적 응전의지의 형상화를 넉넉히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임진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임진록이 단순히 역사적 체험을 재구(再構)하는데 머물지 않고, 사실(史實)을 재경험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과거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허구적 재편(再編)을 꾀한 작가의 산물이란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허구적으로 재편되어 열리는 새로운 차원의 역사의 장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으로 생생하게 살아 나오게 된다. 또 이것은 과거적인 사실의 퇴적에 뿌리 내렸지만 현재적 열망을 향해 잎을 내어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과거적인 것을 비료삼아서 상상의 세계를 열매맺는 일이다.
민족적 감정의 응어리를 역사 허구물(historical fiction)에서 찾는 서양의 한 연구가(Avrom Fleishman)의 눈을 빌리지 않더라도, 임진록은 임진왜란에 대한 민족적 응전의식과 저항의지의 소산이라는 점을 명백히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민족적 응전의식과 저항의지는 동일세력에 의해 외침이 반복적으로 자행될 때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라 피침(被侵)의 역사적 체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도 강렬해질 수 밖에 없다.
2. 역사군담소설과 창작군담소설의 비교
창작군담소설과 역사군담소설의 공통점은 주로 영웅 일대기적 구조 혹은 그와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전쟁소설로서 소설의 주 배경이 실재했든 허구이든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전 소설답게 대부분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비록 주인공이 죽는다 하여도 그 후에는 업을 기리는 등의 비극적이나 결국은 해피엔딩의 결말을 맺는다.
차이점은 역사군담소설은 임병양란과 같은 실재했던 전쟁, 그리고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구체적인 장소, 인물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역사의 상처 극복으로서의 매개체로 전유되었다. 반면 창작 군담소설은 허구적인 주인공, 가공된 배경 등 실제 역사와는 무관하며 소설의 배경 역시 주로 중국이다. 또 역사의 상처 극복이라기보다 그저 전쟁을 배경으로 한 단순한 영웅소설로 읽혀졌다.
이처럼 역사군담소설과 창작군담소설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가지는 의의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군담소설의 두 종류를 단순히 군담소설의 분류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의의를 지닌 소설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Ⅳ마무리하며
우리는 군담소설에 대해서, 특히 임병양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군담소설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뼈아픈 민족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단순한 영웅의 일대기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치유의 노력으로 소설을 사용한 점은 매우 독특하고도 창의적이다.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뼈아픈 역사적 현실에서 피해가려고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긴 여정의 끝을 맺고자 한다. 도서관에서 수많은 논문 속에서 파묻혀서, 익숙하지 않은 글들을 읽으며 우리가 깨닫고 느낀 것들이 다른 학우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조금이나마 기대한다. 부족한 만큼 더 노력할 것이고, 미숙한 만큼 더 공부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주기를 부탁한다. 이로써 시험기간이란 빠듯한 시간동안 자취방에서 오순도순 모여 하룻밤을 꼬박 새가면서 만든 우리의 작품을 마친다.
1. <임진록>, <임경업전>, <박씨전>을 통한 소설적 형상화 과정
충격적인 역사적 체험은 그 사실(史實)을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을 창출시킨다. 우리 문학사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임진왜란이 우리 민족에게 준 충격은「임진록」과 「남윤전」등을 창출시켰고, 병자호란은「박씨부인전」과「임경업전」을 창출케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충격파가 전쟁과 영웅의 이야기인 군담소설류(軍談小說類)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음은 널리 인정된 일이다. 즉 역사적으로 패배한 전쟁을 비범한 능력을 갖춘 주인공을 내세워 이기는 전쟁으로 바꿈으로써 패배의 역사에서 입는 상처를 허구를 통해서나마 치유하고자 하는 소망을 들어낸다.
임진록의 이본은 여러 가지가 전해 오는데,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된 계열과 허구적인 재편(再編)을 일으킨 흔적을 보이는 계열로 나눌 수 있다. 두 계열 사이의 선후관계를 간단히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史實)의 허구적인 재편은 역사적 체험의 구전물이나 사실(史實)의 기록물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임진록의 여러 이본이 전해져서 일제 때에 금서(禁書)로 수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종의 이본이 학계에 소개되고 있음은 이 작품이 매우 널리 읽힌, 인기 있는 독서물의 하나임을 증명해 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진록의 이본에서 사실(史實)을 허구화하고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 도 그러한 허구적 사실(史實)이 즐겨 읽힌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임진왜란은 역사적 사실로 기억하기엔 지나치게 참혹한 일이므로 그 역사적 체험 자체를 해체해 버리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열망은 사실을 허구화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된 세계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데에 충실하지 않았으나, 상상적인 역사 경험을 하도록 짜여진다. 예컨대, 김응서(金應瑞)와 강홍립(姜弘立)의 왜국 정벌이 임진록에 나타나는데, 이는 병자호란 전의 사실을 차용한 것이다. 대부분의 이본에서 이러한 차용이 확인되는데 김응서와 강홍립은 작품 안에서 상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물로 부각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을 오인한 결과로 나타난 오류하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릴 순 없다. 오히려 의도적인 착각적 견인작용에 의한 차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임진왜란이 던진 역사적 충격과 병자호란이 던진 역사적 충격을 복합적으로 흡수하여 상상적 경험을 통해 극복하려면 대외출정(對外出征)의 역사적 체험을 재생시켜 이를 변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김덕령(金德齡)의 부각, 이여송(李如松)의 수욕(受辱), 사명당(泗溟當)의 활약 등에서 우리는 외침에 대한 전민족적 응전의지의 형상화를 넉넉히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임진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임진록이 단순히 역사적 체험을 재구(再構)하는데 머물지 않고, 사실(史實)을 재경험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과거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허구적 재편(再編)을 꾀한 작가의 산물이란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허구적으로 재편되어 열리는 새로운 차원의 역사의 장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으로 생생하게 살아 나오게 된다. 또 이것은 과거적인 사실의 퇴적에 뿌리 내렸지만 현재적 열망을 향해 잎을 내어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과거적인 것을 비료삼아서 상상의 세계를 열매맺는 일이다.
민족적 감정의 응어리를 역사 허구물(historical fiction)에서 찾는 서양의 한 연구가(Avrom Fleishman)의 눈을 빌리지 않더라도, 임진록은 임진왜란에 대한 민족적 응전의식과 저항의지의 소산이라는 점을 명백히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민족적 응전의식과 저항의지는 동일세력에 의해 외침이 반복적으로 자행될 때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라 피침(被侵)의 역사적 체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도 강렬해질 수 밖에 없다.
2. 역사군담소설과 창작군담소설의 비교
창작군담소설과 역사군담소설의 공통점은 주로 영웅 일대기적 구조 혹은 그와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전쟁소설로서 소설의 주 배경이 실재했든 허구이든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전 소설답게 대부분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비록 주인공이 죽는다 하여도 그 후에는 업을 기리는 등의 비극적이나 결국은 해피엔딩의 결말을 맺는다.
차이점은 역사군담소설은 임병양란과 같은 실재했던 전쟁, 그리고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구체적인 장소, 인물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역사의 상처 극복으로서의 매개체로 전유되었다. 반면 창작 군담소설은 허구적인 주인공, 가공된 배경 등 실제 역사와는 무관하며 소설의 배경 역시 주로 중국이다. 또 역사의 상처 극복이라기보다 그저 전쟁을 배경으로 한 단순한 영웅소설로 읽혀졌다.
이처럼 역사군담소설과 창작군담소설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가지는 의의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군담소설의 두 종류를 단순히 군담소설의 분류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의의를 지닌 소설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Ⅳ마무리하며
우리는 군담소설에 대해서, 특히 임병양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군담소설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뼈아픈 민족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단순한 영웅의 일대기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치유의 노력으로 소설을 사용한 점은 매우 독특하고도 창의적이다.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뼈아픈 역사적 현실에서 피해가려고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긴 여정의 끝을 맺고자 한다. 도서관에서 수많은 논문 속에서 파묻혀서, 익숙하지 않은 글들을 읽으며 우리가 깨닫고 느낀 것들이 다른 학우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조금이나마 기대한다. 부족한 만큼 더 노력할 것이고, 미숙한 만큼 더 공부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주기를 부탁한다. 이로써 시험기간이란 빠듯한 시간동안 자취방에서 오순도순 모여 하룻밤을 꼬박 새가면서 만든 우리의 작품을 마친다.
추천자료
 고전소설론 작품론 《임진록》연구
고전소설론 작품론 《임진록》연구 [인문과학] 고전소설의 유형론 - 애정소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고전소설의 유형론 - 애정소설을 중심으로 『조웅전(趙雄傳)』의 특징과 고전소설교육의 방향
『조웅전(趙雄傳)』의 특징과 고전소설교육의 방향 국문학 개론- 고전소설의 전반적 성격, 전기소설, 몽유소설, 의인소설
국문학 개론- 고전소설의 전반적 성격, 전기소설, 몽유소설, 의인소설 [고전소설][운영전][고전문학][고전][소설]고전소설 운영전의 특징, 고전소설 운영전의 소개,...
[고전소설][운영전][고전문학][고전][소설]고전소설 운영전의 특징, 고전소설 운영전의 소개,... [운영전][고전소설][고전문학][고전][소설][문학]운영전(고전소설)의 등장인물, 운영전(고전...
[운영전][고전소설][고전문학][고전][소설][문학]운영전(고전소설)의 등장인물, 운영전(고전... [고전문학][설화][고전][문학][소설][고전소설]고전문학과 설화, 고전문학과 장르, 고전문학...
[고전문학][설화][고전][문학][소설][고전소설]고전문학과 설화, 고전문학과 장르, 고전문학... [고전소설][고대소설][영화화][게임화][시트콤화][동화화]고전소설(고대소설)의 영화화와 고...
[고전소설][고대소설][영화화][게임화][시트콤화][동화화]고전소설(고대소설)의 영화화와 고... 고전소설의 개념에서 비추어볼 때, 소설의 효시는 무엇인가 개념 정리 후, 그 개념에 적합한 ...
고전소설의 개념에서 비추어볼 때, 소설의 효시는 무엇인가 개념 정리 후, 그 개념에 적합한 ... 소설의 기원, 고전소설 시대의 소설관, 소설의 본질
소설의 기원, 고전소설 시대의 소설관, 소설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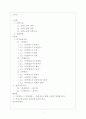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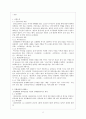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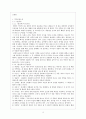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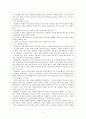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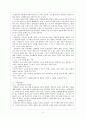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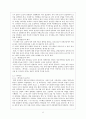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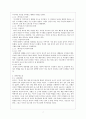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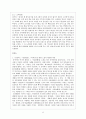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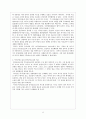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