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구운몽』의 서사구조
1. 남녀결연서사 구조
2. 환몽구조(幻夢構造)의 입장에서 본『구운몽』의 서사구조
3. 주인공의 의식 변화에 의한 구조
4. 그 외 다른 시각으로 본『구운몽』의 서사구조
ⅱ. 김만중의 문학관
1. 김만중의 생애
2. 김만중의 문학관
Ⅲ. 결 론
Ⅱ. 본 론
ⅰ. 『구운몽』의 서사구조
1. 남녀결연서사 구조
2. 환몽구조(幻夢構造)의 입장에서 본『구운몽』의 서사구조
3. 주인공의 의식 변화에 의한 구조
4. 그 외 다른 시각으로 본『구운몽』의 서사구조
ⅱ. 김만중의 문학관
1. 김만중의 생애
2. 김만중의 문학관
Ⅲ. 결 론
본문내용
이 도에 입각해 직언을 한 것은 광해군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항복이 지은 문학(노래)은 광해군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이기에 감동은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쾌락이면서 교훈이고, 교훈이면서 쾌락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쾌락과 교훈이 별개의 것이고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져 다른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김만중의 감동론은 문학의 기능을 쾌락기능과 교화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양단논법적인 사고를 거부한다. 김만중의 감동론은 문학은 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載道論的 文學觀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2) 비평의 독자적 의의 인식
김만중이 살던 시대는 중세이고, 중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제와는 유리된 관념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그렇기에 가상을 깨뜨리고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조의 사상사는 주자학이 그 주조를 이루었는데 금강산에 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글, 그림을 뒤적이면서 금강산을 알았다고 하듯이 가상에 매달려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믿었다. <九雲夢>에서 불교로써 유가적인 인생관을 부정한 것도 가상을 깨뜨리고 실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김만중에게서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객관성)를 유지하면서 가상을 격파하고 실상을 드러내려고 한 탐구정신과 비판의 지혜이다.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자세를 가지고 비판의 지혜를 활용해 가상을 제거하고 실상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창작 경험이나 주관을 가지고 남의 작품을 보면 가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비평은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작에는 능하되 비평에는 약한 이수광과, 창작에는 결함이 있으나 비평에는 강한 허균의 예를 들면서, 창작의 능력과 비평의 능력은 별개의 것임을 상기시켰다.
(3) 구비문학에 대한 이해와 국어 문학의 가치인식
金萬重 『西浦漫筆』 - 鸚鵡之人言
人心之發於口者 爲言 言之有節奏者 爲歌詩文賦
사람의 마음이 입에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이 절주(가락)를 가지면 歌, 詩, 文, 賦가 된다.
四方之言雖不同 苟有能言者 各因其言而節奏之 則皆足以動天地通鬼神 不獨中華也
사방 여러나라의 말이 비록 같지 않으나, 진실로 말을 능숙하게 하는 자가 있어
각각 그 말로 인하여 가락을 붙인다면, 모두 족히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에 통할 것이니
유독 중국(말)뿐만이 아니다.
今我國詩文 捨其言而學他國之言 設令十分相似 只是鸚鵡之人言
지금 우리나라의 시와 문장이 그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한문)을 배워서
설령 십분 서로 같더라도 다만 이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요
而閭巷間樵童汲婦啞而相和者 雖曰鄙俚
거리사이의 초동급부가 흥얼거리며 서로 화답하는 것(민요)이 비록 비루하다고 하나
若論眞 則固不可與學士大夫所謂詩賦者 同日而論
만약 참과 거짓을 논한다면 진실로 학사대부의 소위 시부와 같은 날에 논하기에 불가하다.
況此三別曲者 有天機之自發 而無夷俗之鄙俚 自古左海眞文章 只此三篇
하물며 이 세 별곡(송강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은
천기가 자연스럽게 발하여서 세상 풍속의 비루함이 없으니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진실된 문장은 다만 이 세편이니라.
然又就三篇而論之 則後美人尤高 關東前美人 猶借文字語 以飾其色耳
그러나 또 세편에 나아가서 논한다면 곧 후미인(속미인곡)이 더욱 뛰어나니
관동별곡과 전미인(사미인곡)은 문자어(한자)를 빌려서 그 색(표현)을 꾸몄기 때문이다.
당시 재도론적 문학관과 주자학적 가치를 지닌 조선조의 사대부들에게 팽배해 있던 중국문학(한문학)의 절대적 전범성을 부정하고, 문학에는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진 보편성과 각 민족 나름의 특수성, 독자성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앵무새처럼 남의 문학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천기가 발현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풀어내는 국문문학(민요)를 진정한 문장이라고 찬양하였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구운몽』의 서사구조와 김만중의 문학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운몽』에서 남녀결연, 환몽구조, 주인공 의식 변화의 관점과 여러 학자들의 논의 등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서사구조가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만중은 문학의 본질적 기능이 독자를 감동시키는데 있다고 보았고, 대상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객관성)를 유지하면서 가상을 격파하고 실상을 드러내려고 한 탐구정신과 비판의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재도론적 문학관과 주자학적 가치를 지닌 조선조의 사대부들에게 팽배해 있던 중국문학(한문학)의 절대적 전범성을 부정하고, 문학에는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진 보편성과 각 민족 나름의 특수성, 독자성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남의 문학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천기가 발현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풀어내는 국문문학(민요)를 진정한 문장이라고 찬양하였다.
김만중은 당시 사회의 주자학적 가치 기준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평가의 기준을 다원화 한데서는 놀라운 혜안을 볼 수 있다. 평가의 기준을 다원화함으로써 문학의 가치평가에 아주 새롭고도 중요한 시야를 개척했다. 유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선악이니 귀천이니 하는 전래적이고 인습적인 기준과는 달리 진위라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한 것이 그것이다. 가상을 격파하고 실상을 드러내야 한다고 한 주장에서는 진위의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어있다. 진위에는 창의와 모방, 자주와 의존이라는 개념도 결부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가 기준의 다원화는 국문학을 다루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학 일반론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김만중은 소설의 장르적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 주었다는 점에서 그 소설사적 기여가 크다. 작품에서는 사상적 심도, 구성의 원숙성, 문체나 수사의 세련미, 일상생활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초창기 소설의 장르적 미숙성이 청산되었다는 사실과 소설 장르가 완숙된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 작자가 고위관직에서 활약하던 집권사대부라는 점이 소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2) 비평의 독자적 의의 인식
김만중이 살던 시대는 중세이고, 중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제와는 유리된 관념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그렇기에 가상을 깨뜨리고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조의 사상사는 주자학이 그 주조를 이루었는데 금강산에 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글, 그림을 뒤적이면서 금강산을 알았다고 하듯이 가상에 매달려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믿었다. <九雲夢>에서 불교로써 유가적인 인생관을 부정한 것도 가상을 깨뜨리고 실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김만중에게서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객관성)를 유지하면서 가상을 격파하고 실상을 드러내려고 한 탐구정신과 비판의 지혜이다.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자세를 가지고 비판의 지혜를 활용해 가상을 제거하고 실상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창작 경험이나 주관을 가지고 남의 작품을 보면 가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비평은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작에는 능하되 비평에는 약한 이수광과, 창작에는 결함이 있으나 비평에는 강한 허균의 예를 들면서, 창작의 능력과 비평의 능력은 별개의 것임을 상기시켰다.
(3) 구비문학에 대한 이해와 국어 문학의 가치인식
金萬重 『西浦漫筆』 - 鸚鵡之人言
人心之發於口者 爲言 言之有節奏者 爲歌詩文賦
사람의 마음이 입에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이 절주(가락)를 가지면 歌, 詩, 文, 賦가 된다.
四方之言雖不同 苟有能言者 各因其言而節奏之 則皆足以動天地通鬼神 不獨中華也
사방 여러나라의 말이 비록 같지 않으나, 진실로 말을 능숙하게 하는 자가 있어
각각 그 말로 인하여 가락을 붙인다면, 모두 족히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에 통할 것이니
유독 중국(말)뿐만이 아니다.
今我國詩文 捨其言而學他國之言 設令十分相似 只是鸚鵡之人言
지금 우리나라의 시와 문장이 그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한문)을 배워서
설령 십분 서로 같더라도 다만 이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요
而閭巷間樵童汲婦啞而相和者 雖曰鄙俚
거리사이의 초동급부가 흥얼거리며 서로 화답하는 것(민요)이 비록 비루하다고 하나
若論眞 則固不可與學士大夫所謂詩賦者 同日而論
만약 참과 거짓을 논한다면 진실로 학사대부의 소위 시부와 같은 날에 논하기에 불가하다.
況此三別曲者 有天機之自發 而無夷俗之鄙俚 自古左海眞文章 只此三篇
하물며 이 세 별곡(송강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은
천기가 자연스럽게 발하여서 세상 풍속의 비루함이 없으니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진실된 문장은 다만 이 세편이니라.
然又就三篇而論之 則後美人尤高 關東前美人 猶借文字語 以飾其色耳
그러나 또 세편에 나아가서 논한다면 곧 후미인(속미인곡)이 더욱 뛰어나니
관동별곡과 전미인(사미인곡)은 문자어(한자)를 빌려서 그 색(표현)을 꾸몄기 때문이다.
당시 재도론적 문학관과 주자학적 가치를 지닌 조선조의 사대부들에게 팽배해 있던 중국문학(한문학)의 절대적 전범성을 부정하고, 문학에는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진 보편성과 각 민족 나름의 특수성, 독자성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앵무새처럼 남의 문학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천기가 발현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풀어내는 국문문학(민요)를 진정한 문장이라고 찬양하였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구운몽』의 서사구조와 김만중의 문학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운몽』에서 남녀결연, 환몽구조, 주인공 의식 변화의 관점과 여러 학자들의 논의 등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서사구조가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만중은 문학의 본질적 기능이 독자를 감동시키는데 있다고 보았고, 대상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객관성)를 유지하면서 가상을 격파하고 실상을 드러내려고 한 탐구정신과 비판의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재도론적 문학관과 주자학적 가치를 지닌 조선조의 사대부들에게 팽배해 있던 중국문학(한문학)의 절대적 전범성을 부정하고, 문학에는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진 보편성과 각 민족 나름의 특수성, 독자성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남의 문학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천기가 발현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풀어내는 국문문학(민요)를 진정한 문장이라고 찬양하였다.
김만중은 당시 사회의 주자학적 가치 기준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평가의 기준을 다원화 한데서는 놀라운 혜안을 볼 수 있다. 평가의 기준을 다원화함으로써 문학의 가치평가에 아주 새롭고도 중요한 시야를 개척했다. 유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선악이니 귀천이니 하는 전래적이고 인습적인 기준과는 달리 진위라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한 것이 그것이다. 가상을 격파하고 실상을 드러내야 한다고 한 주장에서는 진위의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어있다. 진위에는 창의와 모방, 자주와 의존이라는 개념도 결부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가 기준의 다원화는 국문학을 다루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학 일반론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김만중은 소설의 장르적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 주었다는 점에서 그 소설사적 기여가 크다. 작품에서는 사상적 심도, 구성의 원숙성, 문체나 수사의 세련미, 일상생활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초창기 소설의 장르적 미숙성이 청산되었다는 사실과 소설 장르가 완숙된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 작자가 고위관직에서 활약하던 집권사대부라는 점이 소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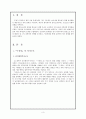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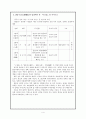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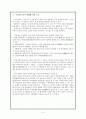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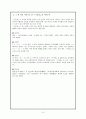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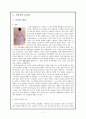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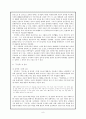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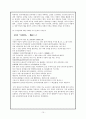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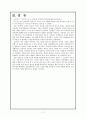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