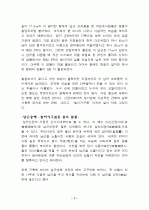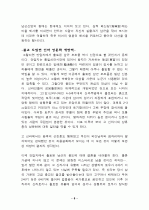목차
1. 안압지(雁鴨池)에 대하여
2. 안압지의 본래 이름은 월지(月池) 이다
3. 안압지의 웅장한 크기와 특징
4. 안압지 출토 유물
1) 금동초심지가위
2) 금동삼존판불
3) 나무주사위
4) 와전류
5)칠기 연꽃봉오리 장식
6) 나무배
2. 안압지의 본래 이름은 월지(月池) 이다
3. 안압지의 웅장한 크기와 특징
4. 안압지 출토 유물
1) 금동초심지가위
2) 금동삼존판불
3) 나무주사위
4) 와전류
5)칠기 연꽃봉오리 장식
6) 나무배
본문내용
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기록에 보이는 남근숭배 신앙의 예는 고구려에 보인다. 즉 10월이 되면 나무로 다듬은 남근을 두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이 남근을 신좌(神坐)위에 놓는다고 했다.
남근신앙의 형태는 현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삼척 해신당(海神堂)에는 마을 제사를 지내면서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실물크기 남근을 깎아 모시는데 이것은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영혼인 해신을 위로하고 풍어와 다산을 염원하는 행사이다.
-불교 도입전 신라 성문화 개방적-
그렇다면 안압지에서 출토된 남근 모조품 역시 신앙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안압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있어서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東宮)이 있었던 곳이고 한편으로는 임해전(臨海殿)이 마련되어 임금이 정사를 논하고 신하들에게 향연을 베풀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곳에서 출토된 남근 모조품은 일단 신분이 높은 여성이거나 그들에 속해있는 여성들 가운데 누군가 사용했던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용도는 무엇인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신라인들의 성생활문화는 대체적으로 개방되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古)신라시대인 4~5세기대의 신라무덤에서 출토되는 흙으로 적당히 빚어만든 토우(土偶) 가운데 남녀의 성기가 과장되게 표현되거나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대체로 2~3㎝정도이고 커보았자 10㎝ 미만인데 토기항아리나 고배 뚜껑에 장식처럼 붙어있다. 이러한 토우가 장식된 유물이 함께 묻힌 무덤의 주인공 역시 보통사람들의 무덤이 결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지위가 높은 분이거나 신분이 있는 사람의 무덤임이 분명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 신라시대 상류층의 성문화에 대한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고 신라에서는 왕족의 근친혼도 행해졌고 부인이 외간남자와 잠자리하다 발각되어도 관대했던 것이 처용설화에서 보이는 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성 개방의 결과라 생각된다.
이제 안압지에서 출토된 남근의 용도에 대해 결론을 내려볼까 한다. 물론 가설에 지나지 않고 이 문제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긴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 신라시대 유물에 나타난 성행위의 토우가 6세기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신라는 당시 삼국 가운데 고급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고구려나 백제보다 무려 2세기 늦은 6세기에 들어와 법흥왕이 국가종교로 공인하고 있는데 이후 아직까지 신라토기나 출토된 유물에 앞서의 성기나 성행위의 토우가 장식된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돌기로 봐서 ‘內室 자위용’ 유력-
신라는 불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토속적인 다신신앙이 성행했겠지만 일단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불교 사상적인 측면에서 금욕 등 사회규범이 생활문화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성 모럴이 형성되어 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신라시대에 마련된 안압지에서 출토된 남근은 분명 실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시대에만 해도 비교적 개방되었던 성문화가 폐쇄적으로 변하자 엄밀하게 행해지거나 아니면 자위행위로 만족을 찾아야 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이유를 더하면 소나무를 가지고 다듬어 만든 남근 모조품에서 볼 수 있다. 즉 음경부분에 옹이를 이용해서 3개의 돌기가 마련된 것이다. 단순한 성기숭배신앙에서 본다면 돌기까지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자위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왕녀 누군가가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궁녀 누군가가 사용한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어 이 문제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다.
한편 기록에 보이는 남근숭배 신앙의 예는 고구려에 보인다. 즉 10월이 되면 나무로 다듬은 남근을 두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이 남근을 신좌(神坐)위에 놓는다고 했다.
남근신앙의 형태는 현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삼척 해신당(海神堂)에는 마을 제사를 지내면서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실물크기 남근을 깎아 모시는데 이것은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영혼인 해신을 위로하고 풍어와 다산을 염원하는 행사이다.
-불교 도입전 신라 성문화 개방적-
그렇다면 안압지에서 출토된 남근 모조품 역시 신앙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안압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있어서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東宮)이 있었던 곳이고 한편으로는 임해전(臨海殿)이 마련되어 임금이 정사를 논하고 신하들에게 향연을 베풀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곳에서 출토된 남근 모조품은 일단 신분이 높은 여성이거나 그들에 속해있는 여성들 가운데 누군가 사용했던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용도는 무엇인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신라인들의 성생활문화는 대체적으로 개방되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古)신라시대인 4~5세기대의 신라무덤에서 출토되는 흙으로 적당히 빚어만든 토우(土偶) 가운데 남녀의 성기가 과장되게 표현되거나 다양한 형태의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대체로 2~3㎝정도이고 커보았자 10㎝ 미만인데 토기항아리나 고배 뚜껑에 장식처럼 붙어있다. 이러한 토우가 장식된 유물이 함께 묻힌 무덤의 주인공 역시 보통사람들의 무덤이 결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지위가 높은 분이거나 신분이 있는 사람의 무덤임이 분명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 신라시대 상류층의 성문화에 대한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고 신라에서는 왕족의 근친혼도 행해졌고 부인이 외간남자와 잠자리하다 발각되어도 관대했던 것이 처용설화에서 보이는 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성 개방의 결과라 생각된다.
이제 안압지에서 출토된 남근의 용도에 대해 결론을 내려볼까 한다. 물론 가설에 지나지 않고 이 문제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긴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 신라시대 유물에 나타난 성행위의 토우가 6세기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신라는 당시 삼국 가운데 고급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고구려나 백제보다 무려 2세기 늦은 6세기에 들어와 법흥왕이 국가종교로 공인하고 있는데 이후 아직까지 신라토기나 출토된 유물에 앞서의 성기나 성행위의 토우가 장식된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돌기로 봐서 ‘內室 자위용’ 유력-
신라는 불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토속적인 다신신앙이 성행했겠지만 일단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불교 사상적인 측면에서 금욕 등 사회규범이 생활문화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성 모럴이 형성되어 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신라시대에 마련된 안압지에서 출토된 남근은 분명 실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시대에만 해도 비교적 개방되었던 성문화가 폐쇄적으로 변하자 엄밀하게 행해지거나 아니면 자위행위로 만족을 찾아야 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이유를 더하면 소나무를 가지고 다듬어 만든 남근 모조품에서 볼 수 있다. 즉 음경부분에 옹이를 이용해서 3개의 돌기가 마련된 것이다. 단순한 성기숭배신앙에서 본다면 돌기까지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자위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왕녀 누군가가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궁녀 누군가가 사용한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어 이 문제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