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활터의 현황
(ㄱ) 옛 활터의 역사
(ㄴ) 현재의 활터
(2) 활터의 구조
(3) 실내국궁장 등의 필요성
(ㄱ) 옛 활터의 역사
(ㄴ) 현재의 활터
(2) 활터의 구조
(3) 실내국궁장 등의 필요성
본문내용
대를 하늘로 날려 보낸 것으로 추측되며 자세히 보면 관(2푼)에 23중 변(1푼)에 26중으로 49중에 72푼임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국궁의 사거리와 과녁 및 점수제 등에 보다 많은 연구와 고증을 통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옛 자료나 그림들을 보면 과녁을 천으로 만든 솔포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천에는 호랑이, 곰 등 짐승의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과녁의 주변에는 활을 쏠 때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붉은색 천으로 만든‘풍향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과녁의 뒤쪽에 설치하거나 옆에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인들에게 활터의 존재를 알리어 위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무겁터의 과녁과 뒤쪽의 풍향기 및 과녁 좌우의 고전막(서울 남산 석호정)
또한 활터에는 과녁의 주변을‘무겁터’라고도 하는데 과녁을 향해 쏜 화살을 수거하여 사대로 운반하는 기계식 전기운송장치인‘운시대’가 있고 과녁주변에서 화살의 적중여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고전’이라하고 고전이 머무는 장소를‘고전막’이라 하는데 옛날에는‘개자리’라 하여 과녁 앞에 웅덩이를 파고 고전이 들어가 앉아 적중여부를 확인하였다고도 한다.
운시대 활걸이
그밖에 활터에는 사대뒤에 활을 놓아 두는 ‘활걸이’가 있고 화살을 놓아두는 ‘화살받이’등이 있으며 ‘주살대’라 하여 활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가 활쏘는 자세 등을 익히기 위하여 화살을 줄에 매어 세운 기둥이 있다.
(3) 실내국궁장 등의 필요성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국궁장은 도시의 외곽이나 산속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활터가 사대에서 과녁까지의 거리가 145m인 획일적인 사거리로 인한 활터의 넓은 면적의 필요성과 안전성 등의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전국 거의 모든 활터에 145m의 사거리를 정하여 과녁을 설치한 것은 1963년 당시 대한궁도협회에서 조선시대 무과시험 과목이자 민간의 활쏘기용이던 유엽전의 관행을 참고하여 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 활터의 145m 사거리는 어느 정도 궁력을 갖춘 궁사들만이 이용가능하므로 초보자들이나 청소년들도 쉽게 활쏘기를 할 수 있도록 사거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대한국궁문화협회는 30m, 50m, 90m, 115m, 145m 등 5가지로 사거리를 다양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궁장을 새로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거리의 다양화 등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또한 확실하게 안전시설을 마련하여 실외공간이나 실내에 국궁장을 설치할 경우에 사거리를 20m 또는 30m 등 짧은 거리로 설치 보급하면 국궁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누구나 쉽게 활을 배우거나 활쏘기로 심신연마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한 연구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m 사거리에서의 습사 청소년국궁대회의 짧은 사거리
그러므로 전통국궁의 사거리와 과녁 및 점수제 등에 보다 많은 연구와 고증을 통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옛 자료나 그림들을 보면 과녁을 천으로 만든 솔포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천에는 호랑이, 곰 등 짐승의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과녁의 주변에는 활을 쏠 때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붉은색 천으로 만든‘풍향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과녁의 뒤쪽에 설치하거나 옆에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인들에게 활터의 존재를 알리어 위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무겁터의 과녁과 뒤쪽의 풍향기 및 과녁 좌우의 고전막(서울 남산 석호정)
또한 활터에는 과녁의 주변을‘무겁터’라고도 하는데 과녁을 향해 쏜 화살을 수거하여 사대로 운반하는 기계식 전기운송장치인‘운시대’가 있고 과녁주변에서 화살의 적중여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고전’이라하고 고전이 머무는 장소를‘고전막’이라 하는데 옛날에는‘개자리’라 하여 과녁 앞에 웅덩이를 파고 고전이 들어가 앉아 적중여부를 확인하였다고도 한다.
운시대 활걸이
그밖에 활터에는 사대뒤에 활을 놓아 두는 ‘활걸이’가 있고 화살을 놓아두는 ‘화살받이’등이 있으며 ‘주살대’라 하여 활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가 활쏘는 자세 등을 익히기 위하여 화살을 줄에 매어 세운 기둥이 있다.
(3) 실내국궁장 등의 필요성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국궁장은 도시의 외곽이나 산속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활터가 사대에서 과녁까지의 거리가 145m인 획일적인 사거리로 인한 활터의 넓은 면적의 필요성과 안전성 등의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전국 거의 모든 활터에 145m의 사거리를 정하여 과녁을 설치한 것은 1963년 당시 대한궁도협회에서 조선시대 무과시험 과목이자 민간의 활쏘기용이던 유엽전의 관행을 참고하여 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 활터의 145m 사거리는 어느 정도 궁력을 갖춘 궁사들만이 이용가능하므로 초보자들이나 청소년들도 쉽게 활쏘기를 할 수 있도록 사거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대한국궁문화협회는 30m, 50m, 90m, 115m, 145m 등 5가지로 사거리를 다양화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궁장을 새로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거리의 다양화 등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또한 확실하게 안전시설을 마련하여 실외공간이나 실내에 국궁장을 설치할 경우에 사거리를 20m 또는 30m 등 짧은 거리로 설치 보급하면 국궁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누구나 쉽게 활을 배우거나 활쏘기로 심신연마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한 연구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m 사거리에서의 습사 청소년국궁대회의 짧은 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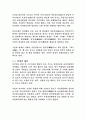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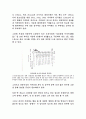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