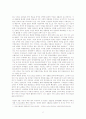본문내용
북한 측과 협의 없이도 자동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중조우호협력조약 제2항 때문이다. 제2항은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 평양으로 진주할 경우, 북한이 ‘특정 국가, 또는 몇 개 국가가 연합한 무장 침공을 받을 경우’에 해당하게 돼 중국군이 자동개입할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한국군과 함께 평양으로 진주한 미군이 중국군과 전투를 벌이는 그런 그림은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 환경에서는 결코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 될 것이다. 그보다는 중국이 미국과 협의해서 평양의 급변사태를 중국 자신들의 주도로 해결하는 그런 그림이 훨씬 현실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실제로 천안함 침몰로 남북한 간에 무력충돌이 빚어지고 미국은 한국군을, 중국은 북한군을 지원하는 장면이 전개될 경우 중국군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또 한반도를 겨냥한 중국군의 배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선 한반도 전역을 타깃으로 한 장거리 미사일부대가 지린(吉林)성에 배치돼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부대의 존재는 지난 1996년 대만(臺灣)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리덩후이(李登輝) 후보와 천수이볜(陳水扁) 후보가 대결할 때, 대륙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지휘에 따라 타이완에 대한 미사일 시범공격을 할 때 알려졌다. 당시 관영 <신화통신>은 타이완섬 주변의 4개의 좌표(座標)를 타전하면서 “각국 선박은 좌표 근처를 항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예정된 시각에 지린성 미사일부대에서 발사된 4발의 미사일은 4개의 해상좌표를 명중시키는 정확성을 과시했다. 지린성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대만 근해의 좌표를 정확히 명중시킬 정도면, 한반도의 타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치 않다.
중국군은 1978년에 시작된 개혁개방으로 부국강병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병대(海軍陸戰隊)를 창설했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60년 전의 6·25전쟁 때 중공군은 해병대라는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북쪽의 압록강 근처에 집결해서 지금의 단둥(丹東)에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진군해 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산둥(山東)성에서 과거의 노(魯)와 제(齊)나라의 경계를 이루는 랑야(琅)를 경계로 FTX (Field Training Exercise·야전훈련)와 해병대 상륙훈련을 꾸준히 해 온 중국군들은 일단 유사시 산둥성에서 발진해서 한반도 서해안 곳곳에 해병대를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낙하산으로 공정대를 투하하는 능력과 장비도 이미 갖추고 있다.
한반도에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반도에 전개될 중국 군사력의 양상은 60년 전과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다. 중국군은 산둥성 칭다오(靑島) 공항에 공중조기경보기를 세워놓고 있는 광경이 많은 한국인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반도 급변사태 때 군사력으로 해결한다는 전략을 쉽사리 채택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에 갖고 있던 ‘군사비전(軍事備戰·전쟁에 대비한다)’이라는 전략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폐기했으며, 덩샤오핑(鄧小平)은 모든 국력을 경제발전에 우선 투입한다는 ‘하나의 중심(一個中心·경제발전)’ 전략과 ‘평화발전(Peacefull Development)’ 전략을 국가 기본전략으로 채택했다. 또 그의 후임 장쩌민도 그런 덩샤오핑의 전략을 계승했고, 현 최고지도자 후진타오도 ‘국제정세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짜여야 한다’는 허셰(和諧) 국제정세론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만난 4월 12~13일의 워싱턴 핵정상회의(Nuclear Summit)에서 후진타오가 오바마에게 귀엣말로 전한, 한반도 서해안 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한 중국의 해결책은 “남북한을 쿨 다운(cool down)시키자”는 처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중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도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결합력이 강해지고, 북한과 중국의 결합력이 강해지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한 외교행동을 보여준 반면, 중국은 냉정한 남북한 등거리에서 북한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태도를 취함으로써 빚어진 구도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후 형성된 그런 국제정치학적 구도는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한 당시의 냉전구도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실로 우려스러운 구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실제로 천안함 침몰로 남북한 간에 무력충돌이 빚어지고 미국은 한국군을, 중국은 북한군을 지원하는 장면이 전개될 경우 중국군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또 한반도를 겨냥한 중국군의 배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선 한반도 전역을 타깃으로 한 장거리 미사일부대가 지린(吉林)성에 배치돼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부대의 존재는 지난 1996년 대만(臺灣)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리덩후이(李登輝) 후보와 천수이볜(陳水扁) 후보가 대결할 때, 대륙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지휘에 따라 타이완에 대한 미사일 시범공격을 할 때 알려졌다. 당시 관영 <신화통신>은 타이완섬 주변의 4개의 좌표(座標)를 타전하면서 “각국 선박은 좌표 근처를 항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예정된 시각에 지린성 미사일부대에서 발사된 4발의 미사일은 4개의 해상좌표를 명중시키는 정확성을 과시했다. 지린성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대만 근해의 좌표를 정확히 명중시킬 정도면, 한반도의 타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치 않다.
중국군은 1978년에 시작된 개혁개방으로 부국강병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병대(海軍陸戰隊)를 창설했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60년 전의 6·25전쟁 때 중공군은 해병대라는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북쪽의 압록강 근처에 집결해서 지금의 단둥(丹東)에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진군해 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산둥(山東)성에서 과거의 노(魯)와 제(齊)나라의 경계를 이루는 랑야(琅)를 경계로 FTX (Field Training Exercise·야전훈련)와 해병대 상륙훈련을 꾸준히 해 온 중국군들은 일단 유사시 산둥성에서 발진해서 한반도 서해안 곳곳에 해병대를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낙하산으로 공정대를 투하하는 능력과 장비도 이미 갖추고 있다.
한반도에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반도에 전개될 중국 군사력의 양상은 60년 전과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다. 중국군은 산둥성 칭다오(靑島) 공항에 공중조기경보기를 세워놓고 있는 광경이 많은 한국인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반도 급변사태 때 군사력으로 해결한다는 전략을 쉽사리 채택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에 갖고 있던 ‘군사비전(軍事備戰·전쟁에 대비한다)’이라는 전략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폐기했으며, 덩샤오핑(鄧小平)은 모든 국력을 경제발전에 우선 투입한다는 ‘하나의 중심(一個中心·경제발전)’ 전략과 ‘평화발전(Peacefull Development)’ 전략을 국가 기본전략으로 채택했다. 또 그의 후임 장쩌민도 그런 덩샤오핑의 전략을 계승했고, 현 최고지도자 후진타오도 ‘국제정세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짜여야 한다’는 허셰(和諧) 국제정세론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만난 4월 12~13일의 워싱턴 핵정상회의(Nuclear Summit)에서 후진타오가 오바마에게 귀엣말로 전한, 한반도 서해안 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한 중국의 해결책은 “남북한을 쿨 다운(cool down)시키자”는 처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중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도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결합력이 강해지고, 북한과 중국의 결합력이 강해지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한 외교행동을 보여준 반면, 중국은 냉정한 남북한 등거리에서 북한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태도를 취함으로써 빚어진 구도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후 형성된 그런 국제정치학적 구도는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한 당시의 냉전구도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실로 우려스러운 구도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