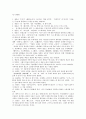목차
<1> 경법편
<2> 간령편
<2> 간령편
본문내용
는 네 개의 군이 있었다. 그리고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현은 군에 속하게 되었다.
14. 원문은‘기불음’(氣不淫)이다.‘정신이 음란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정신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원문은‘용’(庸)으로 용(傭)과 같다. 여기서 용(傭)은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16. 대부(大夫)는 선비〔士〕보다 높고 경(卿)보다는 낮은 벼슬이다. 가장(家長)은 오늘날 우리들이 의미하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다. 대부가 제후로부터 땅을 부여받아 그가 관할하는 지역을 가(家)라고 하고, 그 관할지역의 책임자를 가주(家主) 또는 가장(家長)이라고 한다.
17. 원문은 ‘조심’(躁心)으로 ‘마음을 조급히 하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본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이상한 것을 보면 생각이 그곳으로 쏠리게 된다. 그래서 돌아다니며 여인숙에서 묵게 되는 것이다.
18. 국가가 산림과 호수의 관리권을 독점하여 백성들이 마음대로 나무를 베고 광산을 개발하고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19. 원문은‘상고’(商賈)이다. 상(商)은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이고, 고(賈)는 한 곳에 앉아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4. 원문은‘기불음’(氣不淫)이다.‘정신이 음란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정신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원문은‘용’(庸)으로 용(傭)과 같다. 여기서 용(傭)은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16. 대부(大夫)는 선비〔士〕보다 높고 경(卿)보다는 낮은 벼슬이다. 가장(家長)은 오늘날 우리들이 의미하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다. 대부가 제후로부터 땅을 부여받아 그가 관할하는 지역을 가(家)라고 하고, 그 관할지역의 책임자를 가주(家主) 또는 가장(家長)이라고 한다.
17. 원문은 ‘조심’(躁心)으로 ‘마음을 조급히 하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본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이상한 것을 보면 생각이 그곳으로 쏠리게 된다. 그래서 돌아다니며 여인숙에서 묵게 되는 것이다.
18. 국가가 산림과 호수의 관리권을 독점하여 백성들이 마음대로 나무를 베고 광산을 개발하고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19. 원문은‘상고’(商賈)이다. 상(商)은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것이고, 고(賈)는 한 곳에 앉아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