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 즉, 결과보다는 행위 그 자체를 위한 참여들이 한국에서의 ‘반미’를 언제나 지면에서 반쯤 뜬 상태로 보이게 하며, 격렬한 과정들은 언제나 이슈가 되지만 말미로 갈수록 매체에서도, 기억에서도 잊혀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반미가 전세계적 스포츠이지만 아직도 미국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에는 언제나 끝이 있다. 축구는 90분, 야구는 9회, 피겨는 7분…. 그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만 분노의 분출이 가능하며 경기가 끝난 후의 회포도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격렬함은 전날 내린 눈처럼 녹아 사라진다. 결국 네거티브의 무덤이 되어 체제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수많은 체 게바라 도서들.
한국에서도 ‘체 게바라의 반미’와 ‘까탈루냐의 분리주의’가 소비된다. 그러나 쿠바에서 체 게바라는 관광산업의 아이콘이고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바르셀로나에서 까탈루냐인들의 독립의지는 30%를 전전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소비주체들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결론의 도출’이 아니라 ‘과정의 감정’이다. 가장 뜨거운 부분만이 포장되어 소비되고 반미주의며 모든 체제 전복적인 행위들은 개별적인 이벤트처럼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사건’으로서 명멸할 뿐이다. 이미 모멘텀을 지닌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존재하는 한 모든 반미들은 일시적 현상일 수 밖에 없으며 지금의 20대가 기성세대로 명찰을 바꿔 단 후에는 ‘반미’란 ‘반지구촌’과 의미를 같이 할지도 모른다.
2010년 월드컵이 끝난 직후 바르셀로나 축구팀의 내한이 예정되었을 때, 바르셀로나 팬들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게시하려고 했던 걸개. 이후 많은 논란 속에 무산되었다.
5)의 걸개에 대한 바르셀로나 축구팀 팬의 반응이다.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를 보충하자면 ‘무엇보다도 Cataluna in not Spain이라는 문구로 바르셀로나의 정체성을 드러낼수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모멘텀을 흔들기 위해서는 모든 이익관계들의 균열이 필요하다. 즉, 일요일에도 혁명이 가능해야 한다. 불안함을 씻기 위한 소모를 멈추어야 한다.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소비인지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탈미의 상상력은 부단히 자기를 부정하고 갱신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재건하는 쉼없는 영구혁명이다.’(이병한, 218p) 그리고 미국의 바깥에서 시작된 이 직시를 ‘미국’이라는 ‘세계’속으로 팽팽하게 끌어당기는 작업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한 개인의 탈미가 아닌 미국의 도그마를 축출해내는 혁명 혁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반체제성에 대한 두려움은 지난날 우리가 ‘빨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졌던 막연하고 거대한 두려움과 닮아 있다. ‘반미’니 ‘혁명’이니 하는 단어들을 터부시하는 체제의 규정 속에서 점차 쓸 수 있는 언어의 세계가 좁아진다. 이데올로기가 씌워 놓은 의미들로 인해 본질에서 축출되어 허공을 떠도는 단어들을 다시 지면에 끌어내리고 싶었다. 이제 단어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을 위해서.
반미가 전세계적 스포츠이지만 아직도 미국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에는 언제나 끝이 있다. 축구는 90분, 야구는 9회, 피겨는 7분…. 그 제한된 시공간 안에서만 분노의 분출이 가능하며 경기가 끝난 후의 회포도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격렬함은 전날 내린 눈처럼 녹아 사라진다. 결국 네거티브의 무덤이 되어 체제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수많은 체 게바라 도서들.
한국에서도 ‘체 게바라의 반미’와 ‘까탈루냐의 분리주의’가 소비된다. 그러나 쿠바에서 체 게바라는 관광산업의 아이콘이고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바르셀로나에서 까탈루냐인들의 독립의지는 30%를 전전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소비주체들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결론의 도출’이 아니라 ‘과정의 감정’이다. 가장 뜨거운 부분만이 포장되어 소비되고 반미주의며 모든 체제 전복적인 행위들은 개별적인 이벤트처럼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사건’으로서 명멸할 뿐이다. 이미 모멘텀을 지닌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존재하는 한 모든 반미들은 일시적 현상일 수 밖에 없으며 지금의 20대가 기성세대로 명찰을 바꿔 단 후에는 ‘반미’란 ‘반지구촌’과 의미를 같이 할지도 모른다.
2010년 월드컵이 끝난 직후 바르셀로나 축구팀의 내한이 예정되었을 때, 바르셀로나 팬들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게시하려고 했던 걸개. 이후 많은 논란 속에 무산되었다.
5)의 걸개에 대한 바르셀로나 축구팀 팬의 반응이다.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를 보충하자면 ‘무엇보다도 Cataluna in not Spain이라는 문구로 바르셀로나의 정체성을 드러낼수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모멘텀을 흔들기 위해서는 모든 이익관계들의 균열이 필요하다. 즉, 일요일에도 혁명이 가능해야 한다. 불안함을 씻기 위한 소모를 멈추어야 한다.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소비인지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탈미의 상상력은 부단히 자기를 부정하고 갱신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재건하는 쉼없는 영구혁명이다.’(이병한, 218p) 그리고 미국의 바깥에서 시작된 이 직시를 ‘미국’이라는 ‘세계’속으로 팽팽하게 끌어당기는 작업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한 개인의 탈미가 아닌 미국의 도그마를 축출해내는 혁명 혁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반체제성에 대한 두려움은 지난날 우리가 ‘빨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졌던 막연하고 거대한 두려움과 닮아 있다. ‘반미’니 ‘혁명’이니 하는 단어들을 터부시하는 체제의 규정 속에서 점차 쓸 수 있는 언어의 세계가 좁아진다. 이데올로기가 씌워 놓은 의미들로 인해 본질에서 축출되어 허공을 떠도는 단어들을 다시 지면에 끌어내리고 싶었다. 이제 단어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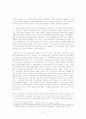











소개글